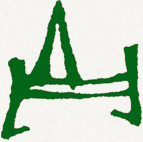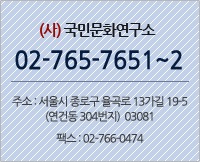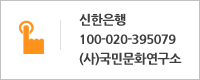|
|
 |
A.3-6 문화적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
|
|
 |
A.3-6 문화적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에 맞게 문화적 아나키즘을 정의해 두자. 문화적 아나키즘이란, 사회의 여러 측면 중에서 「경제」나 「정치」가 아닌 「문화」의 영역에 속한다고 전통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 예를 들면, 미술·음악·연극·문학·교육·육아 육성의 실천·성도덕·기술 등 - 을 통해서 반권위주의적 가치관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통적 문화형태는 권위주의적 가치관이나 자세를, 특히 지배와 착취에 관한 것을 촉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경향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한에 있어서 문화적 표현은 아나키즘적이 된다. 따라서 군국주의의 사악함을 그리고 있는 소설은 그것이 단순한 「전쟁은 지옥」형식 이상의 것으로, 군국주의가 어떻게 해서 권위주의적 제도(자본주의나 국가 주권주의 등)나 권위주의적 조건을 붙이는 방법(전통적 가부장 가족에서의 예절)과 관련하고 있는가를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면 문화적 아나키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존 클라크John Clark가 말했듯이 문화적 아나키즘은 「지배 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밝히고, 자유와 지역사회에 기초한 가치관 시스템을 지배 시스템과 대비시키고 있는 아트나 미디어 등의 상징형식의 발달」을 의미한다. 이 「문화적 투쟁은 다차원의 해방실천을 사용해 경제적·정치적·인종적·종교적·성적인 모든 지배계급의 물질적·이념적 권력과 싸우는」 전체적 투쟁의 일부가 될 것이다. 즉, 「계급분석 개념의 확대」와 「계급투쟁 실천의 증폭」은 「파업·보이콧·항의행동·점거, 직접행동 그룹의 조직과 리버타리안 노동자 그룹의 연합, 노동자 집회·컬렉티브·협동조합의 정비와 같은 경제적 활동」과 「정부의 억압적 정책의 실시에 대한 적극적 방해」와 같은 「정치적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의 엄격한 조직화와 관료화에 대한 불복종·저항」과 「의사결정과 그 지역의 관리에 대한 직접참여를 증대시키는 운동에 대한 참가」도 포함되는 것이다[The Anarchist Moment, p. 31].
문화적 아나키즘은 중요하다. 실제로 본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가치관은 정치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측면을 가진 지배 시스템 전체에 편입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거기에 대다수 민중의 근본적 심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권위주의적 가치관은 경제적 혁명과 정치적 혁명을 접목시켜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시스템에서 대중의 묵인은 인간의 심적 구조(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의 표현을 사용하면 「인격 구조」)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 5∼6천 년 사이에 걸쳐,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명과 함께 발달한 많은 조건화나 사회화의 형태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국가가 내일 전복된다 하더라도, 민중은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권위를 그 자리에서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복종적·권위주의적 인격은 권위 - 강력한 지도자, 명령의 연쇄, 명령을 부여해 스스로 생각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사람 - 를 가장 쾌적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인류의 대다수는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한다. 사실 참된 자유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몇 번이고 반복된 일련의 실패한 혁명과 자유획득 운동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평등이라는 혁명적 이상은 배신당하고 새로운 히에라르키와 지배계급이 곧바로 만들어졌다. 이들의 실패는 일반적으로는 반동적 정치가나 자본가의 음모와 혁명 지도자의 배신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동적 정치인이 그 추종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격구조에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이상을 성장시키는 데 적합한 토양이 있기 때문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나키즘 혁명의 전제조건은 일정 기간의 의식 각성이다. 그 기간에 민중은 자신에게 있는 복종적·권위주의적 특성을 점차 깨닫게 되고 조건부여에 의해서 그러한 특성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문화형태, 특히 육아와 교육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특성을 경감하고 배제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이 문제는 섹션 B.1-5(권위주의적 문명을 지지하는 대중 심리의 기반은 어떤 것인가?) 섹션 J.6(아나키스트가 주창하는 육아 방법은 무엇인가?) 섹션 J.5-13(「근대학교」란 무엇인가?)에서 더 충분히 탐구할 것이다.
문화적 아나키스트의 생각은 아나키스트 사상의 거의 모든 학파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의식의 각성은 어떤 아나키스트 운동에서도 본질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구세계의 껍질 속에서 신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나키스트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그 활동의 일부다. 그러나 의식 각성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아나키스트는 거의 없다. 거기서 문화적 아나키스트 활동은 조직 만들기, 직접행동의 사용,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리버타리안 대체사회의 구축과 조합되게 된다. 아나키스트 운동은 실천적 자주활동을 문화적 활동과 조합한 것으로, 이 두 가지 활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A.3-5 아나르카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
|
|
 |
A.3-5 아나르카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19세기 초기 페미니스트 가운데서도 국가와 모든 권위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제기됐으나 1960년대 시작된 현대 페미니스트 운동은 아나키스트 실천에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나르카 페미니즘Anarcha-Feminism이라는 말의 유래이며, 보다 큰 페미니즘 운동, 아나키즘 운동 속에서 활동하는 여성 아나키스트를 가리키며 그녀들에게 그 근본 원리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현대의 아나르카 페미니스트anarcha-feminists는 그 이전의 아나키스트(남성이든 여성이든)가 갖고 있던 페미니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은 항상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왔다. 많은 뛰어난 페미니스트는 아나키스트이기도 했다. 그 중에는 선구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여성권리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의 저자), 파리 코뮌 참가자인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 미국인 아나키스트인 볼테린 드 클라이어Voltairine de Cleyre, 여성의 자유를 추구한 지칠 줄 모르는 투사 엠마 골드만(『여성매매The Traffic in Women』,『여성의 참정권Woman Suffrage』,『여성해방의 비극The Tragedy of Woman's Emancipation』,『결혼과 사랑Marriage and Love』,『도덕의 희생자Victims of Morality』등의 유명한 에세이를 참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나키스트 신문 『자유Freedom』는 1886년에 샬럿 윌슨Charlotte Wilson이 발간했다. 빌리지아 안드레아Virgilia D’Andrea와 로즈 페소타Rose Pesota는 리버타리안 운동과 노동운동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혁명 중인 스페인에서의 「무헤레스 리브레Mujeres Libres」(자유로운 여성들)운동은 여성 아나키스트가 자신들의 기본적 자유를 방어하고,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려고 해서 조직을 만든 고전적 실례이다(이 중요한 조직의 자세한 것은 마사 애크스 버그Martha Ackelsberg의 저서 「스페인의 자유로운 여성Free Women of Spain」을 참조). 게다가 주된 남성 아나키스트 사상가(프루동은 제외)는 모두 여성 평등의 확고한 지지자였다. 예를 들면, 바쿠닌은 가부장제에 반대해, 법률이 어떻게 해서 「(여성을) 남성의 절대 지배 하에 두게」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었다. 여성이 「자신다운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평등의 권리가 남성과 여성에 속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가 바란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재판소와 같은 가족」의 종말과 「여성의 완전한 성의 해방」이었다[Bakunin on Anarchism, p. 396 and p. 397].
즉 아나키즘은 1860년대 이래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가부장제(남성에 의한 통치)에 대한 같은 정도로 강력한 비판을 해왔던 것이다. 아나키스트, 특히 여성 아나키스트는 현대사회가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안나 마리아 모조니(Ana Maria Mozzoni: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이탈리아 이민자 아나키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여성은 「알 것이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제는 남성이다. 자신을 탄압하는 입법자는 남성이다. 자신을 물건으로 폄하하는 남편은 남성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방탕한 자는 남성이다. 다른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게 않고 자신만 벌고 있는 자본가, 당신 육체의 대가를 냉정하게 착복하고 있는 투기꾼은 남성인 것이다」. 당시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가부장제는 지금도 존재하며, 『사회문제 La Questione Sociale』라는 아나키스트 신문을 인용하면 아직도 여성은 「사회생활이나 사적생활에 있어서도 노예라는 것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자신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면 두 폭군을 갖게 된다. 남성과 보스다. 부르주아 계급이라면 자신에게 남겨진 주권은 경박함과 아첨에 관계하는 것뿐이다」[Jose Moya, Italians in Buenos Aires's Anarchist Movement, pp. 197-8 and p. 200 에서 인용].
아나키즘은 가부장제와 싸우는 것이 국가나 자본주의와 싸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을 인용하자.
우선 첫째로 바꿔야 하는 것은 성별 간의 관계다.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 두 종류가 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립하고 있다. 「보다 약한」 쪽을 「보다 강한」 쪽이 통제한다든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 한,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The Red Virgin: Memoirs of Louise Michel, p.1 139]
아나키즘은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와 싸우고, 여성의 평등을 위해 싸운다. 아나키즘도 페미니즘도 공통의 역사를 많이 갖고, 여성 멤버의 개인적 자유·평등·존엄에 대해 관심을 갖고있다. (하지만, 다음에서 더 깊게 설명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주류파나 리버럴한 페미니즘은 불충분하다고 하여 언제나 상당히 비판적이다). 따라서 60년대의 새로운 페미니즘 물결이 아나키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엠마 골드만과 같은 아나키스트 인물로부터 많은 영감을 끌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캐시 레빈Cathy Levine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시기에는 「독립한 여성 집단은 남성 좌익이 갖고 있던 구조, 지도자, 기타 잡역부 없이 기능하기 시작했다. 독자적으로 같은 시기에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장소에 존재하던 아나키스트 조직과 유사했다. 어느 쪽이나 우연이 아니었다」[The Tyranny of Tyranny, Quiet Rumours: An Anarcha-Feminist Reader, p. 66]. 우연이 아니다. 페미니스트 학자가 썼듯이 가부장제와 지배 이데올로기는 신석기 시대 후기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은 그 히에라르키 사회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 마릴린 프렌치Marilyn French가 「권력을 넘어서Beyond Power」에서 말하듯이 인류종에서 최초로 커다란 사회 계층화가 생긴 것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였으며, 그 결과 여성은 「저급」하고 「열등」한 사회계급이 되고 만 것이다.
아나키즘과 현대 페미니즘은 사상과 행동 양쪽에서 이어져 있다. 주도적 페미니스트 사상가 캐럴 페이트먼Carole Patema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신의 「논의(계약이론과 그 권위주의적·가부장제적 기반)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리버타리안 사상 즉, 「사회주의 운동의 아나키즘파」이다[The Sexual Contract, p. 14]. 또한 1980년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지난 20년간 권위주의·히에라르키·비민주주의 조직 비판의 중심은 여성운동이었다. 제1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가 바쿠닌을 패배시킨 이후 노동운동·국유산업·좌익섹트에서 만연했던 조직 형태는 국가의 히에라르키를 모방했다. 여성운동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바쿠닌과 같은 아나키스트) 사상을 탈환하고, 실천해 왔다. 사회변혁 운동과 사회변혁 실험은 미래의 사회조직을 예시해야 한다」[The Disorder of Women, p. 201].
페기 커네거Peggy Kornegger는 페미니즘과 아나키즘의 이론상·실천상의 강력한 연결을 지적하고 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견해는 거의 순전한 아나키즘이다」고 그녀는 썼다. 「그 기본이론의 전제는, 모든 권위주의 시스템의 기반은 핵가족이라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교사로부터 직장의 보스로부터 신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가 배우는 교훈은 익명의 권위의 위대한 목소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을 졸업하고 성인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의문을 갖는 것도 명료하게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한 사람의 자동기계가 되는 것이다」[Anarchism: The Feminist Connection, "Quiet Rumours: Anarcha-Feminist Reader, p. 26]. 마찬가지로 제로 콜렉티브Zero Collective가 논하고 있듯이,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속의 아나키즘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려 하는 것으로 성립되고 있다」[「Anarchism/Feminism」, pp. 3-7, The Raven, no. 21, p. 6].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지배·착취·공격성·경쟁성·무감각화 등의 권위주의적 특징과 가치관이 히에라르키 문명 속에서 매우 중시되어, 전통적으로 「남자다움」으로 기술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협동·공유·동정·감수성·온화함 등의 비권위주의적 특성과 가치관은, 전통적으로 「여성적」 특성으로 간주되며 멸시받고 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 현상을 청동기 시대 초기의 가부장제 사회의 발전과 협동에 바탕을 둔 「유기적」 사회의 정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찰하고 있다. 유기적 사회에서는 「여성적」 특성과 가치관이 폭넓게 퍼져 존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기적 사회가 정복된 이후 이러한 가치관은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열등하다」고 간주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가부장 제도 하에서 남성이 지배와 착취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리앤 아이슬러Riane Eisler 저 『성배와 칼The Chalice and the Blade』과 엘리스 볼딩Elise Boulding저 『역사의 저면 The Underside of History』등을 참조). 그러므로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협동, 공유, 상호부조 등에 근거한 비권위주의적 아나키스트 사회의 창조를 「사회의 여성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사회의 「여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관리와 분권화가 필수라고 하고 있다. 아나르카 페미니스트가 전복하려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전통이 히에라르키 속에 편입되어 그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분권화의 의미도 포함하며, 결과적으로 자주관리도 시사하고 있다. 많은 페미니스트는 이를 인식하고 히에라르키 구조와 경쟁적 의사결정을 배제한 콜렉티브 형태의 페미니스트 조직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중에는 직접민주주의 조직이 특히 여성의 정치형태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다[예를 들면, 제이라 아이젠슈타인Zeila Eisenstein 편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사회주의 페미니즘 옹호론 Capitalist Patriarchy and the Case for Socialist Feminism』 56~77페이지 수록, 낸시 핫속Nancy Hartsock 저 『페미니즘 이론과 혁명전략의 개발 Feminist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Revolutionary Strategy』을 참조]. 모든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자기해방이 여성평등의 열쇠이며, 따라서 여성자유의 열쇠라고 인식하고 있다.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성의 발달·자유·독립은 여성 스스로 여성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은 하나의 인격이며, 성의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아이 갖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신·국가·사회·남편·가족 등을 섬기는 입장을 거부하며 자신의 삶을 단순하지만 깊이 있고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즉, 인생의 의미와 본질을 그 막대한 복잡함 속에서 배움으로써 여론이나 세상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Anarchism and Other Essays, p.211]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우익이나 좌익의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그들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나르카 페미니즘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직접행동과 자조이지, 개혁주의의 대중정치 캠페인이 아니다. 그러한 정치 캠페인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 페미니즘 운동이다. 히에라르키적 중앙집권적 조직을 만들어 여자보스·여성의원·여군병사를 늘리는 것이 「평등」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환상을 갖고있는 것이다.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여성이 자본주의 기업 가운데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경영학」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임금 노동자를 대기업 히에라르키 안에서 관리하고 착취하기 위한 테크닉 세트이다. 반대로 사회를 「여성화하기」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임금노예와 경영관리자의 지배를 함께 배제해야 한다.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효과적 착취자나 억압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등은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무헤레스 리브레Mujeres Libres의 멤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남성의 히에라르키를 페미니스트 히에라르키로 치환하려고는 하지 않았다」[Martha A. Ackelsberg, Free Women of Spain. p. 2에서 인용]. 또한 가부장 제도와 히에라르키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논하고 있는 섹션 B 1-4도 참조).
이로 인해 아나키즘은 여성의 해방과 평등을 지지하지만, 리버럴한 (주류 측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적대하고 있다. 페데리카 몬테니(Federica Montseny: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운동의 요인)는, 그러한 페미니즘은 여성의 평등을 옹호하고 있지만 기존의 모든 제도에는 도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류 측의)페미니즘이 갖는 「유일한 야망은, 기존의 특권 시스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특정계급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고 말했고, 이런 제도들이 「남성이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불공정하다면, 여성이 거기에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Martha A. Ackelsberg, 전게서, pp. 90-91 and p 91에서 인용]. 따라서 아나키스트에게 여성의 자유는 보스가 되거나, 임금노예가 되거나, 유권자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기도 하는 기회를 평등하게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유대 속에서 평등자로서 협력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될 기회를 평등하게 갖는 것이다. 페기 커네거Peggy Kornegger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기업에서의 여성의 힘이니 여성 대통령이니 하는 의미가 아니다. 기업력도 대통령도 필요 없다는 뜻이다. 남녀 평등헌법 수정 사항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히에라르키 경제에 진출하기 위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뿐이다. 성차별에 도전하는 것은 모든 히에라르키 - 경제적·정치적·사적 -에 도전하는 것이다. 즉, 아나르카 페미니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전게서, p. 27].
잘 알겠지만, 아나키즘에는 계급분석과 경제분석이 포함돼 있다. 이 분석은 페미니즘 주류파에는 없다. 동시에, 주류의 사회주의 운동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가정관계, 성에 근거하는 권력관계도 아나키즘은 의식하고 있다. 이 의식은 히에라르키에 대한 증오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모조니Mozzoni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는 모든 억압받는 쪽의 대의를 옹호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여성의) 대의를 옹호한다. 아아! 여성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영역에서나 사적영역에서도, 이중으로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모야Moya, 전게서, p. 203에서 인용]. 즉, 중국의 아나키스트를 인용하면, 「성별 사이의 평등」에 의해 아나키스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남성이 여성을 향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다.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억압받지 않고, 여성이 다른 여성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기를 우리는 원한다」. 따라서 여성은 「지배권을 완전히 타도하고, 남성에게 그 특권 모두를 포기하게 해서 여성에 대해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억압도 남성의 억압도 없는 세계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He Zhen의 말, Peter Zarrow, Anarchism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p. 147에서 인용].
마사 애크스 버그Martha Ackelsberg가 쓰고 있듯이, 역사적인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리버럴한 페미니즘과 주류파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의 전략으로 너무 시야가 좁았다」고 생각됐다. 「성(性)의 투쟁을 계급투쟁이나 아나키즘의 프로젝트 전체로 부터 떼어낼 수는 없다」[전게서,p.91].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가부장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히에라르키가 잘못되어 있으며, 페미니즘이 단순히 남성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스가 될 기회를 여자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바란다면, 페미니즘 자체가 갖고 있는 이상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의 수중에 있는 권력이 강제가 없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하고, 「엘리트 지도자가 있는 대중운동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지」도 않는 것이다. 「중심이 되는 문제는, 항상 권력과 사회적 히에라르키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에만, 자유로운 것이다」[Carole Ehrlich,'Socialism, Anarchism and Feminism', Quiet Rumours: Anarcha-Feminist Reader, p. 44].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이 말하듯이 「프롤레타리아가 노예라고 한다면, 프롤레타리아의 아내는 더욱 노예다」[전게서, p. 141]. 같은 수준의 억압을 아내가 확실히 경험하도록 하고, 남편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모든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자유의 부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평등한 기회를 가진」 자본주의가 여성을 해방시킨다는 이념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노동자계급인 여성은 보스(남성이건 여성이건)에 의해 억압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아나르카 페미니스트에게 있어서 여성해방의 투쟁은 히에라르키 그 자체에 대한 투쟁과 구별되지 않는다. L 수잔 브라운L. Susan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적 관심사에 적용되는 아나키즘적 감성의 한 표현으로서 개인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반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개인의 실존적 자유를 보존하는 비도구적 경제에 찬동한다.[The Politics of Individualism, p. 144].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히에라르키 문명이 갖는 권위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생태위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페미니스트 학자가, 자연의 지배는 여성의 지배와 평행이며, 여성은 역사를 통해 자연과 동일시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예를 들면 1980년에 출판된 캐롤라인 마찬트Caroline Merchant 저, 『자연의 죽음The Death of Nature』을 참조). 여성도 자연도 권위주의적 인격을 특징짓는 강박적 통제관념의 희생자인 것이다. 이로 인해 점차로 수많은 급진적 생태학자와 페미니스트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히에라르키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의 중요함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도 생각하게 한다. 즉,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에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아주 흔한 일이지만 많은 남성 아나키스트는 자신들은 (이론상) 성차별주의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실제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잘못되었다.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이론과 실천의 일치라는 문제를 사회적 활동주의의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가 외적인 구속뿐 아니라 내적인 구속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성적 평등을 말하는 남성 아나키스트의 성차별주의에 직면해 스페인의 여성 아나키스트는 무헤레스 리브레Mujeres Libres를 조직해 이것과 싸웠다. 혁명 이후의 어느 날인가 자신들이 해방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 해방은 스페인 혁명에 없어서는 안 되었고, 오늘도 착수되어야 했다. 활동 중에 그녀들이 도달한 결론은 미국 일리노이주 탄광마을에서 아나키스트 여성들이 도달한 것과 같았다. 일리노이주의 아나키스트 여성들은 지긋지긋했다. 남성 동지가 「미래사회에서」 성의 평등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 여기에서 성의 평등에 대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특히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했다. 「굶주림으로 죽을 것 같은 대중에게, 천국에 포상이 있다는 등 불성실한 약속을 하는」 사제에게서 남성 동지를 비교한 것이다. 그녀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성의 차이는 권리의 불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반항」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을 도덕적·육체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려는 남성의 억압에 대해 싸워야 한다」[Ersilia Grandi의 말, Caroline Waldron Merithew, Anarchist Motherherhood, p. 227에서 인용]. 그녀들은 「루이즈 미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스페인의 동지들이 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일리노이 계곡 북부의 탄광촌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해 30년에 걸쳐 싸워왔다.
아나르카 페미니스트에게 있어서 성차별과 싸우는 것은 자유를 요구한 투쟁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페미니즘 발흥 이전에 주장했듯이 자본주의에 대한 「진짜」 투쟁을 우회하는 것, 혁명 이후 어떤 이유인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투쟁의 본질적 부분이다.
당신의 직함 따위 필요 없다.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식·교육·자유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후의 투쟁을 벌이기 위해 당신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최후투쟁의 일부를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만들 만큼 강하지 않은가?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함께 모든 인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이다. [Louise Michel, 전게서, p. 142]
현대사회를 혁명화하는 중요한 대처는, 현재의 성별 간의 관계를 변환하는 것이다. 결혼은 특히 나쁘다. 왜냐하면 「성서에 근거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오래된 결혼 형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권을 남성의 변덕과 명령에 완전히 여성이 복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자의 하인, 자녀의 출산자로서의 기능으로」환원되고 있는 것이다[Goldman, 전게서, pp.220-1]. 결혼 대신에 아나키스트는 자유연애를 기도한다. 즉, 파트너 중 한쪽이 권위를 갖고 다른 쪽은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등자 간의 자유합의에 기초한 커플·가족이다. 이러한 결합은 교회나 국가에 의한 허가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두 개의 존재가, 제3자로부터 성관계를 갖는 허락을 받을 필요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Mozzoni의 말, Moya, 전게서, p.200에서 인용].
평등과 자유는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에 해당한다. 남성도 국가도 여성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말해선 안 된다. 즉 여성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컨트롤해야 하며, 당연히 자기 자신의 생식기관도 컨트롤해야 한다. 즉, 아나키스트 전반도 그렇지만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낙태 찬성이며,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여성이 스스로 생식 결정을 컨트롤하는 권리)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의 입장이다. 엠마 골드만은 피임방법과, 여성은 언제 임신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과격한 의견을 공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에 기소되어 투옥됐다(페미니스트 저술가 마가렛 엔더슨Margaret Anderson에 따르면 「1916년, 엠마 골드만은 『여성이 항상 입을 다물고 자궁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투옥됐다」).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나키즘 전반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었던 것이다. 「가정에서의 자유의 결핍과 자유의 결여가, 공장·노동자 착취 공장·백화점·사무실에서의 자유의 결핍과 자유의 결여로 치환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립을 획득할 수 있을까?」 즉, 여성의 평등과 자유란 모든 장소에서 쟁취해야 하며, 모든 히에라르키에 대항해 방어되어야 했던 것이다. 투표에 의해 달성할 수도 없다. 진정한 해방은 직접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아나르카 페미니스트는 주장한다. 아나르카 페미니즘은 여성의 자주활동·자기해방에 근거한다. 「투표권·평등한 시민권은 충분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투표에 의해서도, 재판에 의해서도 시작되지 않는다. 여성의 영혼으로 시작된다. 여성의 자유는 자유를 달성하는 힘이 미치는 범위까지 도달하는 것이다」[Goldman, 전게서, p. 216 and p. 224].
여성운동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진보는 오로지 밑에서부터, 여성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생겼다. 루이즈 미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 여성은 멍청한 혁명가가 아니다. 아무에게도 구걸을 하지 않고, 우리는 투쟁 속에 몸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제기하며,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전게서, p. 139].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 행동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성의 사회적 입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투표권의 획득도 그렇다. 여성의 투표권을 요구한 전투적 보통선거 운동에 직면해, 영국의 아나키스트 로즈 윗코프Rose Witcop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었다. 「이 운동은 지금까지 주인인 남성에 대해서 매우 복종적이었던 여성이, 그들 주인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의 힘에 의해서」라고 주장했다[Sheila Rowbotham, Hidden from History, pp. 100-1 and p 101에서 인용].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운동이 이 분석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평등한 투표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입장은 1920년대부터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나키스트 릴리 게일 윌킨슨Lily Gair Wilkinson이 강조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선거권』의 요구는 자유의 요구가 될 수 없다. 투표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일까? 투표하는 것은 어느 의원에 의한 지배를 받아들일지를 등록하는 것이다」[Sheila Rowbotham, 전게서, p. 102에서 인용]. 투표는 문제의 핵심에, 즉 히에라르키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권위주의적 사회관계에 도달하지 않는다. 가부장제는 이 사회관계의 일부일 뿐이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성적이든 모든 보스를 배제함으로서 비로소 여성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녀 안에서 주장과 활동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충분히 표현되어야 한다. 모든 인공적 장애물을 파괴해야 한다. 더 큰 자유로 가는 여정에는 수세기에 걸친 복종과 예속의 모든 흔적이 지워져야 하는 것이다」[Emma Goldman, 전게서, p. 214]. |
|
|
|
|
|
|
|
 |
A.3-4 아나키즘은 평화주의인가 |
|
|
 |
A.3-4 아나키즘은 평화주의인가
평화주의적인 경향은 아나키즘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레프 톨스토이Leo Tolstoy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런 경향의 아나키즘을 흔히 「아나르코 평화주의anarcho-pacifism」라 부르기도 한다. (때로는 「비폭력 아나키스트non-violent anarchist」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는 그 외의 아나키즘 운동을 「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그런 것은 진실이 아니다!). 아나키즘과 평화주의의 결합은 아나키즘의 근본이념과 주장을 이해한다면 전혀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폭력 자체와 폭력과 위해를 이용한 협박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중대한 수단인 것이다. 피터 마샬Peter Marshall이 지적했듯이, 「아나키스트가 개인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아나키즘의 가치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폭력으로 폭력이 아니다」[Demanding the Impossible, p. 637]. 마라테스타Malatesta는 더욱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의 주요 강령은 인간관계에서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는 「폭력에 반대한다」[Life and Ideas, p. 53].
그러나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주의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동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본질적으로 평화주의적은 아니다(언제 어떤 형태의 폭력에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아나키즘은 반군국주의다.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에는 반대하지만 압제하는 쪽의 폭력과 압박당하는 쪽의 폭력과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스트 운동이 언제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군사기구와 자본주의 전쟁에 반대하고, 동시에 억압에 대항하는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조직하는 이유가 이것이다.(러시아 혁명의 와중에 적군과 백군 모두에 저항한 마프노주의자의 군대나 스페인 혁명 중에 파시스트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아나키스트 시민군이 그 예다. - 섹션 A.5-4와 A.5-6을 참조)
비폭력의 문제에 관해 대략적인 경험에서 아나키즘 운동은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와 사회적 아나키스트, 두 가지의 경향으로 갈라진다. 대부분의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사회변혁에 대해 상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비폭력 전략을 지지한다. 그러나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그 대부분은 공격에 대한 자기방위라는 형태로 폭력을 인정한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혁명적 폭력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으며, 견고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자본주의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단, 『폭력의 정복The Conquest of Violence』이라는 비전론의 고전적 명저를 쓴 사람은 바트 드 리히트Bart de Ligt라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였지만). 마라테스타가 말하듯이 폭력은 「본질적으로 악」이지만 「자기 자신이나 타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되며, 「노예는 언제나 정당방위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스나 압제자에 대한 그 폭력은 언제든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전게서, p. 55 and pp. 53-54]. 그 이상으로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바쿠닌의 말을 빌려, 사회적 억압은 「개개인으로 부터가 아니라, 사물의 조직이나 사회적 입장」에서 생기는 이상, 아나키스트는 인간이 아니라 「지위나 사물을 가차없이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나키즘 혁명의 목적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계급으로서의」 특권층의 종언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Richard B. Saltman,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Michael Bakunin p. 121, p. 124 and p. 122에서 재인용]
확실히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에게 있어 폭력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폭력을 찬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 투쟁이나 혁명의 와중에서도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아나키스트라면 네덜란드의 평화주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바트 드 리히트가 내놓은 다음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폭력과 전쟁이 개인의 해방과 공존할 수는 없다. 폭력과 전쟁은 자본주의의 특징적 조건이며, 개인의 해방은 착취당하고 있는 계급의 역사적 사명이다. 폭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혁명은 약화된다. 그것이 비록 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말이다[The Conquest of Violence, p. 75].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은 바트 드 리히트의 책 한 장의 붙여진 제목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부조리」라는 용어의 사용도 적극 지지한다. 드 리히트와 다른 모든 아나키스트들에게 있어 폭력은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으며 자본주의를 평화주의적으로 전환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운명에 있다. 그 이유는 다른 한편으로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경쟁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경제위기에 처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경제투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대립을 통해 얻으려 한다. 다른 한편으로, 「폭력은 현대사회에서 불가결하다. (왜냐하면) 폭력이 없으면 각국의 지배계급은 개개의 국가에서 착취당하는 대중에 대해 그들의 특권적 입장을 전혀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군대는 무엇보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유지된다」[Bart de Ligt, 전게서, p. 62]. 국가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폭력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주의 아나키스트들에게 있어, 일관된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나키스트여야 하며, 일관된 아나키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평화주의자가 아닌 아나키스트에게 폭력은 압정과 착취의,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인 동시에 특권계급에게 그 권력과 포기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해야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민중을 계속 노예상태로 있게 하는 더 크고 영속적인 폭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폭력이 필요한 것이다 [Malatesta, 전게서, p. 55]. 폭력이냐 비폭력이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즉 어떻게 이 사회를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갈까 하는 현실적 문제를 놓치게 되어 버린다.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이 지적하듯이 평화주의 아나키스트는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마치「작업에서 일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을 작업 그 자체로 여기는」것처럼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 반대로 「혁명의 전투적 측면은, 단지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일 뿐이다. 정말 실질적인 작업은 그다음부터다」[What is Anarchism?, p. 183].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투쟁과 사회혁명은 비교적 평화롭게(파업이나 점거 등으로) 시작된다. 그것이 폭력적으로 변질하는 것은 권력자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뿐이다(대표적인 예를 들면 1920년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에 의한 공장점거 후에 파시스트들의 테러가 일어난 것이다. - 섹션 A.5-5를 참조).
앞서 말했듯이, 모든 아나키스트는 반군국주의자들이며 군사기구(그리고 『방위』산업도)와 국가주의자나 자본주의자의 전쟁에 반대한다.(루돌프 로커Rudulf Rocker와 샘 달고프Sam Dolgoff와 같은 소수의 아나키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반파시스트 자본주의자를 더 작은 악이라 해서 지지했지만).
아나키스트와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에 의한 반군사기구 메시지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영국과 북미 생디칼리스트들에 의해 선전됐으며 병사에게 명령을 따르지 말고, 동료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지 말 것을 호소한 프랑스 CGT를 재발행해서 뿌렸다. 엠마 골드만과 알렉산더 버크만은 1917년에 「징병제 거부 동맹」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미국에서 추방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다수의 아나키스트들이 1, 2차 대전 중에 징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의 영향을 받은 IWW는 그 조직적 반전 메시지가 권력을 가진 호전적인 엘리트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대대적인 잔혹한 탄압으로 궤멸되어 버렸다. 최근에도 아나키스트들(노엄 촘스키Noam Chomsky나 폴 굿맨Paul Goodman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은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직도 존재하는 징병제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또한 아나키스트는 베트남 전쟁, 포클랜드 분쟁, 1991년과 2003년의 걸프 전쟁(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걸프 전쟁에 대항해서 파업을 조직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등의 전쟁에 반대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계급전쟁 이외의 전쟁은 멈춰라No war but the class war」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1991년 걸프 전쟁 중이었다. 이 구호는 아나키스트들의 반전론을 잘 요약하고 있다. 즉, 전쟁은 계급제도가 가져오는 해악으로 각국의 억압받는 계급이 지배자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서로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이 조직화된 대학살에 가담하지 말고 노동자가 그 주인의 관심사가 아닌 자신의 관심사를 위해 싸우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와 임금노예, 지배자와 지배받는 쪽과의 틈새를 깊게 하라. 민중 사이의 교류, 모든 민중의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사유재산의 수용과 국가의 파괴를 전도하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준비를 해야 한다. [Malatesta, 전게서, p. 251]
여기서 한마디 해야겠지만, 마라테스타가 이렇게 쓴 이유 중 일부는 표트르 크로포트킨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크로포트킨은 그만이 알 수 있는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중 그가 그 이전에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독일의 권위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동맹을 나쁜 가운데서도 나은 편이라고 지지했다. 물론 마라테스타가 지적했듯이 「어떤 정부든, 어떤 자본가 계급이든, 자기 나라의 노동자와 반역자에 대항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전게서, p. 246]. 마라테스타은 알렉산더 버크만, 엠마 골드만 등 수많은 아나키스트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에 반대하는 국제 아나키스트 선언에 서명했다.이글은 대부분의 아나키즘 운동(당시 그리고 그 후의)이 전쟁과 전쟁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갖고있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아래에 인용하자.
특권의 양식인 국가, 이 존재야말로 전쟁의 원인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국가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치장하든 특권을 가진 소수자를 이롭게 하는 조직적 억압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중시하는 국민의 불행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 음모적인 외교를 동반한 국가·민주주의·정치정당에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고의로 배신당해 왔다. 지금도 계속 배신을 당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신문잡지의 도움을 받아 이 전쟁이 해방전쟁이라고 모든 민중에게 믿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 간의 모든 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아나키스트의 역할은, 해방전쟁은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 공언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착취자에 대해 착취당하는 쪽이 벌이는 전쟁이다. 우리의 역할은 주인에게 반역하듯 노예들을 분기시키는 것이다.
아나키스트의 행동과 선전은 여러 나라를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며 반역의 혼을 길러 국민과 군대에 불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끊임없이 행해진다.
우리는 반란을 선동하고, 모든 사회악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혁명을 조직하기 위해 모든 반역의 운동·모든 불평불만을 활용해야 한다. 사회정의는 생산자의 자유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전쟁과 군국주의는 폐기된다. 그리고 국가와 그 모든 파멸적 기관의 폐지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획득한다[「Anarchist Manifesto on the War」, Anarchy! Anthology of Emma Goldman's Mother Earth, pp. 386-8].
그러므로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의 평화주의의 매력은 분명하다. 폭력은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다. 그리고 폭력의 사용은 아나키즘의 원리에 모순된다. 아나키스트는 말라테스타의 다음 말에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하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투쟁은 가능한 한 평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바라고 있다」[Malatesta, 전게서, p. 57]. 전부가 아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엄격한 평화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폭력은 역효과이며 민중을 소외시키고 사회변혁을 가져오려는 아나키스트 운동과 민중운동 양쪽을 탄압할 구실을 국가에 부여할 수 있다고 평화주의자가 논한다면, 아나키스트는 거기에 동의한다. 아나키스트는 모두 비폭력 직접행동과 시민의 불복종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요약하자면 순수한 평화주의 아나키스트는 드물다. 대부분이 필요악으로 폭력의 사용을 받아들이고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모든 아나키스트는 폭력을 제도화하는 혁명은 국가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력을 파괴하거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고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폭력의 사용은 자기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고, 이 경우라 하더라도 폭력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
|
|
|
|
|
|
 |
A.3-3 녹색 아나키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
|
 |
A.3-3 녹색 아나키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오늘날 여러 아나키즘 중에서 공통의 주제가 되는 것이 생태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아나키즘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19세기 후반에 표토르 크로포트킨과 에리제 르크류Elisee Reclus의 저작에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르크류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었다. 「지구와, 지구를 키우는 인간과의 사이에는 비밀의 조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솔한 사회가 이 조화를 파괴할 때 항상 그런 사회는 결국 후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문명화된 인간은 자신의 성질이 만인의 이익과 자연의 이익에 결부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그 사람은 선인들이 일으킨 피해를 복구하고 자신의 영지를 개선하려고 일한다[George Woodcock, 「Introduction」 Marie Fleming, The Geography of Freedom, p. 15에서 인용].
크로포트킨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아나키즘 사회는 지역사회의 연합에 근거한다. 그 지역사회에서는 공업과 농업을 분권화해 통합하면서 육체노동과 두뇌노동을 통합할 것이다(크로포트킨의 고전적 명저 『전원·공장·작업장Fields, Factories, and Workshops』을 참조). 「작은 것은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에른스트 슈마허E.F. Schumacher의 고전적 저작의 제목)고 하는 이러한 경제관은 녹색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70년대 제안되었다. 크로포트킨은 그의 책 『상호부조Mutual Aid』에서 종 내부에서의 협동과, 종간種間이나 그 환경과의 협력이 경쟁보다 종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크로포트킨의 저작은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르크류Reclus 형제(둘 다 크로포트킨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지리학자였다)등 많은 사람들의 저작과 함께 생태계 문제에 대한 지금의 아나키스트의 관심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고전적 아나키즘에 많은 생태학(에콜로지)적 성질을 포함한 테마가 존재하고 있다고는 해도, 생태학(에콜로지)적 사고와 아나키즘과의 유사성이 전면에 나오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 되고 나서다.(기본적으로 머레이 북친의 고전적 에세이 『생태학과 혁명사상Ecology and Revolutionary Thought』이 1965년에 출판된 후이다). 실제로 머레이 북친의 생각과 저작이야말로 아나키즘의 중심에 생태학과 생태계의 문제로 삼고 녹색운동의 여러 측면에 아나키스트의 이상과 분석방법을 들여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녹색 아나키즘 (에코 아나키즘이라고도 불린다)의 종류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아나키즘과 생태학(에콜로지)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를 엄밀히 설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머레이 북친의 말을 인용하자. 「생태주의자와 아나키스트는 자발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주의자와 아나키스트는 모두, 끊임없이 증대되어 가는 공동체의 결합은 다양한 분화에 의해 이룩된다고 믿는다. 각 부분들이 제각기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면서 하나의 전체가 점점 더 확장되어간다」 뿐만 아니라, 「생태주의자가 생태계의 범위를 넓히고 종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듯이, 아나키스트들 또한 갖가지 사회적 실험의 범위를 넓히고 그 발전을 방해하는 속박들을 제거해 나가려고 노력한다」[Post-Scarcity Anarchism, p. 72, p. 78].
자유로운 성장·권력분산·다양성·자발성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관심은 생태학적 사고와 관심 속에 반영되고 있다. 히에라르키·중앙집권·국가·부의 집중은 정말로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줄이며 개인과 그 커뮤니티의 자유로운 발달을 방해한다. 그 결과 사회적 생태시스템뿐만 아니라 인간사회가 그 일부가 되고있는 실제 생태계도 약화시킨다. 북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태학이 갖는 재생 메시지는 우리는 다양성을 보전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며 개성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표준화되고 통제되며 대중화된 것들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있다」[전게서, p. 76, p. 65]. 아나키즘의 목적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분산하고, 그것으로 개개인과 사회생활이 확실히 자유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자연에서의 다양성을 키우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브라이언 모리스Brian Morri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이다. 「생태학을 보완하고, 말하자면 생태학과 완전히 연결된 - 순수하게 진짜 방식으로 - 유일한 정치적 전통은 아나키즘의 전통이다」[Ecology and Anarchism, p. 132].
그런데, 녹색 아나키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 것일까? 거의 모든 형태의 현대 아나키즘은 스스로 생태학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코 아나키즘에서 특별히 뚜렷한 조류는 두 가지다. 「사회적 생태주의Social Ecology」와 「윈시주의primitivist」 아나키즘이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어떤 아나키스트들은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회적 생태주의가 지금도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다. 사회적 생태주의는 머레이 북친의 사상 및 저작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북친은 1950년대부터 생태계 문제에 대해 글을 쓰고, 1960년대부터는 혁명적 사회적 아나키즘과 생태계 여러 문제를 연계해 논했다. 그의 저작에는 『욕망 충족의 아나키즘Post-Scarcity Anarchism』,『생태조화 사회를 향해Toward an Ecological Society』,『자유의 생태학The Ecology of Freedom』등 다수가 있다.
사회적 생태주의는 생태계 위기의 근원이 인간 사이의 지배관계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자연의 지배는 인간사회에서 볼 수 있는 지배의 산물로 간주되지만, 이 지배가 위기로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뿐이다. 머레이 북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는 개념은 인간의 인간에 의한 지배에서 직접 생겼다. 그러나 이 관계가 출현한 것은 유기적 공동체 관계가 시장의 관계로 흡수될 때였다. 시장관계 하에서는 이 행성 그 자체가 착취대상의 하나의 자원으로 환원되었다. 최근 몇 세기에 걸친 경향의 최악의 발전형태가 현대 자본주의이다. 경쟁적 성질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사회는 인간끼리를 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상대로 대다수의 인류를 싸우게 하고 있다.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되는 것처럼 자연의 모든 영역이 상품으로 전락되고 자원은 마음대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 시장에서의 인간 영혼의 약탈은 자본에 의한 지구의 약탈과 평행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게서, p. 63]
북친은 강조하고 있다. 「생태학이 사회변혁을 향한 반히에라르키·반지배의 감성·구조·전략을 의식적으로 키우지 않는 한, 인간성과 자연과의 새로운 균형을 추구한 목소리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그리고 진정한 생태조화 사회를 향한 그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사회적 생태주의자는 북친이 「환경 보호주의」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하고 있다. 사회적 생태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라는 개념을 폐지하려 하지만, 환경 보호주의는 「도구적」 즉 기술적 감성을 보여준다. 이 감성에서는 자연은 단순한 수동적 습성, 외적 물체와 힘의 결합으로 간주된다.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상관없이, 인간이 이용하기에 더 『실용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주의는 현대사회의 근저에 있는 개념, 특히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는 개념을 의문시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배가 가져오는 위험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그 지배를 촉진하려고 하려는 것이다」[Murray Bookchin, Towardan Ecological Society, p. 77].
사회적 생태주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사회비전을 제공한다. 이는 「자본주의 기술과 부르주아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특징짓는 모든 경향 - 기계와 노동의 면밀한 특수화, 거대한 공업사업과 도시적 사업체에 대한 자원과 인간의 집중, 자연과 인간의 계층화와 관료화 - 를 근본적으로 뒤엎는다」. 그런 에코토피아ecotopia는 「지역사회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예술적으로 편입되는 완전히 새로운 에코 커뮤니티를 확립한다」. 크로포트킨에 동의하면서 북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한 에코 커뮤니티는 지적작업과 육체작업을 융합함으로써 직무과제의 교대나 다양화 속에서 공업을 농업과 융합함으로써 마을과 시골, 정신과 육체의 분단을 치료해 준다」. 이 사회는 적절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의 사용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 - 즉 환경기술 - 은 유연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기계로 구성되어, 그것이 실제의 생산에 응용되면, 내구성과 품질이 중시될 것이다. 진부화나 조악한 상품의 경솔한 대량생산, 일회용 상품의 급속한 유통 속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에코 기술은 공해를 내지 않는 소재나 폐기 시에 재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에코 커뮤니티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이 갖고 있는 무진장한 에너지 용량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이나 바람, 조수의 간만이나 수로, 지구의 온도차나 우리 주위에 다량 존재하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Bookchin, 전게서, pp. 68-9].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북친이 강조하는 것처럼, 생태 조화사회는 「인간과 자연계 사이에 증대하고 있는 불균형을 조사하려는 사회 이상의 것이다. 사회의 기능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환원하는 이러한 지루한 견해는, 생태학에 의한 비판이 제기한 여러 문제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생태계 문제들에 대한 순수하고 기술적이며 도구적인 접근을 유도한다. 사회적 생태주의는 우선 첫째로 감성이다. 그것은 히에라르키와 지배의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재건의 전망을 포함해, 차이를 히에라르키형 질서로 구조화하지 않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윤리에 의해 이끌어진다. 참여와 분화야말로 그러한 윤리를 향한 지침인 것이다[The Modern Cris, pp. 24-5].
따라서 사회적 생태주의자는 생태계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문명 그 자체가 아니라 히에라르키와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사회적 생태주의는 「원시주의Primitivist」 아나키스트와 생각을 달리하는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원시주의」아나키스트는 현대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해, 훨씬 비판적인 경우가 많고, 「문명의 종언」 - 확실히 모든 형태의 기술과 모든 대규모 조직도 포함된다 ?을 요구하는 자도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섹션 A.3-9에서 논하기로 한다.
기록해 둬야 하겠지만, 다른 아나키스트는 사회 생태주의의 분석과 시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사회 생태주의가 자치단체 선거에서 후보를 옹립하려 하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회 생태주의자는 후보자 옹립을, 자율관리형 민중집회를 만들어내고, 국가에 대한 대항권력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아나키스트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본질적으로 개량주의이며, 사회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선거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소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는 섹션 J.5-14에서 하겠다). 이러한 아나키스트는 선거는 급진주의 사상에 물타기를 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파행이 될 결말이라고 거부하면서 아나키즘 사상과 생태학 사상의 추진 수단으로 직접행동을 계획하는 것이다[섹션 J.2「직접행동은 무엇인가?」를 참조].
마지막이 되겠지만, 「심층 생태주의」가 있다. 그러나 그 생물 중심주의적 성질 때문에 많은 아나키스트는 「심층 생태주의」는 반인간이라며 거절한다. 많은 심층 생태주의자가 제시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나키스트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머레이 북친은 심층 생태주의와 심층 생태주의로 결합되는 경우의 많은 비인간 사상에 대해 특히 거리낌 없이 솔직한 비판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생태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향할까?Which Way for the Ecology Movement?」를 참조). 데이비드 왓슨도 심층 생태주의에 반대하고 있다.(조지 브래드 포드George Bradford의 이름으로 쓰인 「심층 생태주의는 얼마나 깊은가?How Deep is Deep Ecology?」를 참조).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문제는 인간이 아니라 현행 시스템이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머레이 북친의 말을 인용하자.
(심층 생태주의의 문제는) 조잡한 생물학주의가 갖는 권위주의적 경향에서 비롯됐다. 이 생물학주의는 인간성의 감각이 영속적으로 왜소화되고 있음을 감추기 위해 「자연법」을 이용하고, 사회현실에 관한 심각한 무지를 뒤덮기 위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성」이라든지 「사회」라 불리는 추상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p. 160]
즉, 모리스Morris가 강조하고 있듯이 「『인간성』이라는 카테고리에 모든 초점을 맞춤으로써 심층 생태주의자는 생태계 여러 문제의 사회적 기원을 무시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게 한다. 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생태학적 비판과 분석을 인류에 대한 단순화된 항의로 뒤덮는 것은 생태계 파괴의 진정한 원인과 그 역동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이 파괴의 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말해서 사람들의 생활·지역사회·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아무런 본질적 발언권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책임져야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익과 권력을 민중과 행성보다 높게 가치 매기고 있는 것은 경제시스템·사회시스템이다. 「인간성」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부자와 가난뱅이, 남자와 여자, 백인과 유색인종, 착취하는 쪽과 당하는 쪽, 압제자와 피압박자 사이의 구별을 간과함으로써)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무시되고 그 결과 생태계 여러 문제의 제도적 원인도 무시되어 버린다. 이것은 「그 의미에서 반동적이고 권위적인 것으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실의 사회적 여러 문제와 사회적 염려에 관한 비판적 연구를, 『자연』의 소박한 이해로 대체해 버리는 것이다」[Morris, 전게서, p. 135].
아나키스트가 그 발언자의 생각 몇 가지를 일관되게 비판함으로써, 많은 심층 생태주의자는 그 운동과 결부되어 있던 반인간적 생각을 외면하고 있다. 심층 생태주의, 특히 「Earth First!」 (EF!)라는 조직은, 시간에 따라 중대한 변천을 이루어 지금은 「세계 산업노동자」(IWW)라는 생디칼리스트 조합과 함께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다. 심층 생태주의는 에코 아나키즘의 일파는 아니지만,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EF!가 그 염세적 생각을 거부하고, 인류가 아닌 히에라르키가 문제라고 보기 시작함에 따라, 아나키스트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머레이 북친과 「Earth First!」의 주도적 멤버 데이브 포어맨Dave Foreman과의 논의는 「지구를 지킨다Defending the Earth」라는 책을 참조).
|
|
|
|
|
|
|
|
 |
A.3-2 사회적 아나키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
|
|
 |
A.3-2 사회적 아나키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그렇다. 사회적 아나키즘에는 네 가지의 큰 경향이 있다. 상호주의, 집산주의, 공산주의, 생디칼리즘 등이다.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단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있다.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는, 상호주의와 다른 사회적 아나키즘의 사이에 있다. 상호주의는 시장 사회주의의 한 형태 - 노동자의 협동조합이 커뮤니티 은행 시스템을 통해 노동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 -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상호은행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전체에 의해 어떤 개인이나 계급에 특별한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져, 리스크와 경비를 커버하는 데 충분한 부분을 빼고 무이자로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을 끝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호주의를 교환과 신용대출에 도입함으로써 모든 곳에 상호주의를 도입하게 되고, 노동이 새로운 측면을 갖고 실로 민주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Charles A. Dana, Proudhon and his “Bank of the People”, pp. 44-45 and p. 45].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상호주의는 독립된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코뮌)이 상호은행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의 것과 다르다. 이로써 자본주의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협동조합에 투자자금이 반드시 제공되게 된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사회적 아나키즘의 상호주의자 가운데는 리버타리안 지역사회(프루동은 코뮌이라 했다)의 연합을 보완하기 위해 프루동이 「농공연합」이라고 한 것의 창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업과 공업」이나 도로나 철도 등의 대규모 개발 「에서 상호 안전을 가져오기 위해 의도된 연합」이다. 「특정 연합협정」의 목적은 「내외의 자본주의적 봉건제도와 금융 봉건제도로부터, 연합국가(원문 그대로!)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우익은 경제적 우익에 의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농공연합은 사회가 갖는 아나키즘적 성질을 시장교환이 갖는 불안정화 효과(이것이 부의 불평등, 나아가 권력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시스템은 연대의 실제 사례일 것이다. 「모든 산업은 자매와 같은 것이다. 같은 몸의 일부인 것이다. 하나가 힘들면 다른 산업도 그 고통을 공유한다. 따라서 함께 흡수 합병하거나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반영하는 여러 조건을 서로 보증하기 위해 여러 산업은 연합해야 한다. 그런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그 산업의 자유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의 자유에 새로운 안전과 힘을 주는 것이다」[The Principle of Federation, p.70, p. 67 and p. 72].
그 밖의 사회적 아나키즘은 상호주의자처럼 시장을, 비록 그것이 비자본주의적인 것이었다 해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생산수단을 공유해 산물과 정보를 협동조합 간에 자유롭게 나눠줌으로써 자유가 최대한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회적 아나키즘은 개개의 협동조합이라는 상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과 코뮌의 연합에 의한 공유(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바쿠닌의 말을 인용하자. 「미래의 사회조직은 노동자의 자유제휴 혹은 자유연합에 의해 먼저 조합에서, 그리고 코뮌으로, 지방으로, 국가로, 최종적으로는 국제적이고 세계규모의 대연합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토지나 작업도구 등의 자본은 모두, 사회 전체의 집단적 재산이 되어 노동자만이, 바꿔 말하면 농업조직과 공업조직만이, 그것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Michael Bakunin: Selected Writings, p. 206 and p. 174]. 개개의 작업장을 넘어 오직 협동의 원리를 확대함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하고 보호할 수 있다(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시장제도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섹션 I.1-3을 참조). 이처럼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일종의 지반을 프루동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방은 「생산용구의 상호사용을 보장할 것이다. 생산용구는 개별적인 이러한 그룹의 재산이며, 상호계약에 의해 연합 전체의 집단적 재산이 된다. 이같이 하여, 여러 가지 그룹의 연합은 변동하는 사회요구를 채우기 위해 생산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James Guillaume, Bakunin on Anarchism, p. 376].
이들 아나키스트는 협동조합 내에서의 근로자에 의한 생산의 자기관리를 상호주의자들과 똑같이 지지하고 있지만 상호부조 발현의 초점을 시장이 아니라 이런 조합의 연합으로 보고 있다. 작업장의 자율성과 자율관리가 모든 연합의 기반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 공장의 노동자들은 겨우 손에 넣은 생산용구를 「회사」라고 자칭하는 상위 권력에 양도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Guillaume, 전게서, p. 364]. 이 산업규모의 연합에 더해서 특정 산업연합의 전문 관할 밖이거나 수용능력의 범위 밖이거나 하는 작업이나 사회적 성질을 가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간의 연합과 지역사회의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또한 프루동의 상호주의 사상과의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생산수단(순수하게 개개인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공유에 대한 확고한 신조를 공유해 사용자가 생산수단을 「매각」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썼듯이 만약 이 일이 가능해지면 자유사회 속에서 자본주의와 국가주의를 재건하는 발판이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호주의 이외의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상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리버타리안 사회주의로 개량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자본주의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은 사회혁명에 따른 자유사회뿐이다.
집산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주된 차이는 혁명 후에 「화폐제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이다. 무정부 공산주의자(아나르코 코뮤니스트Anarcho-communists)는 화폐제도의 폐기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정부 집산주의자(아나르코 콜렉티비스트anarcho-collectivists)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정부 집산주의는 「생산에 필요한 것 전부를 노동자 집단과 자유 코뮌이 공유하는 정황을 기술하는 한편, 노동의 응보의 방법(즉, 분배)이 공산주의인가 다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집단 독자적으로 해결하게 된다」[Anarchism, p. 295]. 즉, 공산주의도 집산주의도 생산자 협회를 통해 공동생산을 조직하지만 그 차이는 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이다. 공산주의는 만인의 자유소비에 근거한다. 집산주의는 공헌한 노동에 따른 물품의 분배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 단, 대부분의 무정부 집산주의자는 시간과 함께 생산성이 증대하고, 지역사회의 감각이 강해짐에 따라 화폐제도는 소멸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양쪽 모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공산주의 격언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일치하지 않는 점은 얼마나 빨리 이것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뿐이다[섹션 I.2-2를 참조].
무정부 공산주의자는 혁명 후에 「공산주의 - 적어도 부분적인 -는 집산주의보다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전게서, p. 298].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집산주의로서 절대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집산주의는「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실시한 작업에 따라 보수를 주는 시스템, 즉 불평등을 재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되돌림으로써 즉시 자설을 뒤집기」 때문이다 [Alexander Berkman, What is Anarchism?, p.230].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새로운 불평등이 발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입장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실제로는 사회혁명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아나키즘을 도입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의 수준이 개개의 영역에서 어느 시스템이 채용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생디칼리즘은 사회적 아나키즘의 또 다른 큰 형태다. 다른 생디칼리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들은 아나키스트의 생각에 기초한 산업 노동조합 운동을 창조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권력분산형으로 연합주의적인 조합을 옹호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갖기 까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직접행동을 사용해 개량을 얻으려 하고 있다. 무정부 집산주의도 노동운동 속에서 아나키스트가 활동하고 미래의 자유사회를 미리 제시하는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점에서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은 새로운 형태의 무정부 집산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도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는 「자유로운 생산자의 자유로운 연합」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연합이 「실천적 아나키즘 학교」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혁명의 전 단계에서는 노동자 조직이 「이념뿐만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에 관련된 다양한 사실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바쿠닌의 코멘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는 모든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것은 한 정부에 의한 포고나 법령이 아니라, 각각의 전문 생산부문에서 손과 머리를 쓰는 노동자가 연대해 협력하는 것뿐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룹·공장·부문이 총체적인 경제 유기체의 독립 멤버이며, 자유로운 상호합의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의 이익이 되는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자 자신이 모든 공장설비의 관리를 점유함으로써 그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Rudolf Rocker, Anarcho-syndicalism, p. 55].
거듭 말하지만 모든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는 노동조합이 암시하고 있는 집단투쟁과 조직을 아나키즘의 학교라고 간주하고 있다. 유진 벌린Eugene Varlin(제1 인터내셔널에서 활동했으며, 파리 코뮌 마지막에 살해된 아나키스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조는 「사람들을 집단생활에 익숙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 확대된 사회조직의 준비를 시키는 데 대해 막대한 이점을 갖고 있다. 조합은 서로를 잘 대하고, 서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조직하고 토론하며 집단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사람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을 지금 여기서 경감함과 동시에, 조합은 「미래의 사회적 구성물의 자연스러운 요소를 형성한다. 노조야말로 생산자 협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 노조야말로 사회의 구성요소를 만들어내고 생산노동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Julian P. W. Archer, The First International in France, 1864-1872, p. 196에서 인용].
생디칼리스트와 다른 혁명적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차이는 사소한 것이며, 순수한 차이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있다. 무정부 집산주의자들은 리버타리안 노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운동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노동자 대중의 사회적(그 결과로서 반정치적)힘의 발전과 그 힘을 가진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Bakunin, Michael Bakunin: Selected Writings, p. 197]. 무정부 공산주의자도 노동운동 속에서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인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생디칼리스트 조합을 만들어 노동자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투쟁 중인 노동자가 생디칼리즘적 조직을 만들고, 그것으로 「반역의 혼」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물론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도 그런 자율적 투쟁과 조직을 지지하는 것으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무정부 공산주의자들은 작업장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 히에라르키와 지배에 반대하는 작업장 밖에서의 투쟁은, 작업장 내부에서의 투쟁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는 여기에 동의할 것이며 많은 경우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정부 공산주의자 가운데는 노동운동을 본질적으로 절망적일 정도로 개량주의라며 거부하고 노동운동 내부에서의 활동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다.
무정부 공산주의자나 무정부 집산주의자도 아나키스트가 순수한 아나키스트 조직으로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나키스트가 자신들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타인에게 전달해 가기 위해서, 아나키스트로서 함께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디칼리스트는 많은 경우, 아나키스트 그룹이나 연합의 중요성을 부정한다. 혁명적 산업조합·혁명적 지역조합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생디칼리스트는 아나키즘 운동과 조합운동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의 아나키스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생디칼리스트는 조합주의가 갖는 개량주의적 성질을 지적하고 있으며, 생디칼리스트 조합을 혁명적으로 두기 위해서는 아나키스트가 아나키스트 집단과 아나키스트 연합의 일부로서 조합 내부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생디칼리스트는 아나키즘과 조합주의의 융합(fusion)은 혼란(confusion)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결과 어느 쪽 운동도 각각 중시하고 있는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섹션 J.3-8(그리고, 많은 아나키스트가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의 여러 측면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섹션 J.3-9)를 참조하기 바란다. 강조해야겠지만 비생디칼리스트인 아나키스트는 노동자에 의한 집단적 투쟁과 조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에게 특유의 신화이며, 섹션 H.2-8을 참조하기 바란다).
현실적으로는 아나키스트 연합의 필요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는 없으며, 완전한 반생디칼리스트인 아나키스트도 별로 없다. 예컨대 바쿠닌은 무정부 공산주의의 생각에도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크로포트킨, 마라테스타, 버크먼, 골드만 같은 무정부 공산주의자들도 모두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운동과 사상에 공명해 왔던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아나키즘에 대해 더욱 읽어 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아래의 것을 추천한다. 상호주의는 프루동의 저작과 결부된 것이 많다. 집산주의는 바쿠닌과, 공산주의는 크로포트킨, 마라테스타, 골드만, 버크만과 연결돼 있다. 생디칼리즘은 약간 다르다. 이는 「유명한」 인물의 저작이라기보다,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학자들로는 조르주 소렐George Sorel을 생디칼리즘의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있지만, 그는 단지 이미 존재한 생디칼리즘 운동에 대해 글을 썼을 뿐이다. 노동자 계급 민중이 자기 자신의 사상을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학자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루돌프 로커Rudolf Rocker는 주도적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이론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 페르난도 페르티에Fernand Pelloutier와 에밀 푸제Emile Pouget의 저작은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을 이해하는데 필수의 읽을거리다. 사회적 아나키즘의 발전과 그 주도적 인물의 중요 저작을 개관하는 것이라면, 다니엘 게랑Daniel Guerin의 뛰어난 선집 『신도 없고 지배자도 없고No Gods No Masters』에 필적하는 것은 없다. |
|
|
|
|
|
|
|
 |
A.3-1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와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
|
|
 |
A.3-1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와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느 쪽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든 서로 「상대의 생각은 모종의 국가창설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와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어느 쪽이든 반국가·반권위·반자본주의다. 큰 차이는 다음에 기술하는 두 가지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일으킬지(그리고 아나키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라는 점이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일반적으로 교육과 대체기관(예를 들면 상호은행, 조합, 코뮌 등)의 창설을 선호한다. 그들은 보통 파업 등 비폭력의 사회항의(예를 들어 집세불납이나 세금납부 거부 등)를 지지한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개혁주의자이지 혁명가는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아나키스트가 직접행동을 사용해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혁명은 자본가의 재산을 수용한다. 즉, 권위주의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아나키즘 원리와 모순된다고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대체 경제시스템(상호은행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을 사용해 소유권이 사회로 부터 빼앗은 부를 사회로 되돌리려 한다. 이렇게 해서 수용이 아닌 개량에 따라 야기되는 아나키즘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청산」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아나키스트도 교육과 대체기관(리버타리안 조합과 같은) 창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생각으로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리버타리안 여러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사회투쟁을 실시하고 개량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본주의가 조금씩 아나키를 향해 개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권위(국가건 자본주의건)를 파괴하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므로 혁명이 아나키즘 원리와 모순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혁명에 의한 자본가 계급의 수용과 국가의 파괴란 리버타리안의 행위이지 권위주의의 행위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실로 본질상 사회혁명은 대다수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진화론자(점진적 발전론자)이자 혁명론자이다. 자본주의 속에서 리버타리안 여러 경향을 강화하려고 하면서도 사회혁명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폐기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아나키스트 중에도 순전한 점진적 발전론자들이 있듯이, 이런 차이는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개인주의자를 구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큰 차이의 두 번째는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아나키스트 경제체계와 관련되어있다. 개인주의자는 시장에 근거한 분배 시스템을,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필요에 근거한 분배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나 현행 자본주의적 소유권 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생활수단의 소유권(즉, 집세·이자·이윤 - 이러한 부정한 삼위일체에 대해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를 좋아하는 말을 사용하면 「폭리」)으로 사용권이 대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요컨대, 어느 학파나 프루동의 고전적 저작 『소유란 무엇인가?What is Property?』에 따라 자유사회에서는 점유가 소유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소유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한 논의는 섹션 B.3을 참조)
그러나 이 사용권의 틀 속에서 아나키즘의 두 학파는 각기 다른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공동체적(사회적) 소유와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포함되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점유상태이지만 그것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즉, 「너의 시계는 너의 것이지만 시계공장은 민중의 것이다」. 버크만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실제의 사용이 유일한 권리라고 간주될 것이다 - 그것은 소유권이 아니고, 점유권인 것이다. 예를 들어 탄광 노동자 조직은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운영기관으로서 탄광을 관리한다.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관리되는 집단적 점유는 이윤을 추구해 사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적 소유를 대신할 것이다.[What is Anarchism?, p.217]
이 시스템의 기반은 노동의 노동자 자주관리,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는) 노동산물의 자유공유(즉, 금전이 없는 경제시스템)가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공업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며 모든 생산부문이 다른 부문 모두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제품의 개인주의적 기원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지지할 수 없기」때문 인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만인이 그 축적에 공헌하고 있는 부에 대해 개개인의 몫을 어림잡는 것」등은 불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노동기구의 공유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공동노동의 결실을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Kropotkin, The Conquest of Bread, p. 45 and p.46]. 이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단지, 만인이 생산한 사회적 산물을 만인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으로 사회에 대해 공헌한 개개인이 필요한 만큼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섹션 I.2-2에서 논하고 있듯이, 그러한 이상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는 논쟁점이다). 이러한 리버타리안(자유) 공산주의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회적 아나키스트도 있다. 예를 들어 상호주의자가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다수의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금전의 폐기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매의 폐기를 지향하고 있다. 단, 모든 아나키스트는 다음의 것에 동의하고 있다. 아나키는 「평등하고 공정한 교환」(프루동과 같은)에 의해서든, 자유공유(크로포트킨과 같은)에 의해서든 「모든 장소에서 자본주의와 소유주의 착취가 끝나고」「임금시스템이 폐기되는」것을 보게 될 것이다[Proudhon, The 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 p. 281].
반대로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상호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용권 시스템에 노동의 산물이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사회적 소유가 아니라 시장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그 시스템에서는 노동자는 자기 독자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신의 노동의 산물을 다른 노동자와 자유롭게 교환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실제로는 진정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자는 국가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권력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발목을 잡혀 있다는 것이다(바꿔 말하면 시장원칙은 노동자 계급을 위해, 국가 원조는 지배계급을 위해서, 인 것이다). 국가가 창조한 독점(금전·토지·관세·특허)과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재산권 집행이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의 원천인 것이다. 정부의 폐기와 함께 진정한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와 자본가에 의한 착취의 종언을 확실히 만들어 낼 것이다(벤저민 터커의 에세이 「국가사회주의와 아나키즘State Socialism and Aanarchism」은 이 주장을 아주 잘 정리했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생산수단(토지를 제외)이 개인노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바란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생산수단을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의 재산권을 거부하고 「점유와 사용」 시스템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생산수단(예를 들어 토지)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공유로 되돌려서 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호주의로 불리는 이 시스템이 생산의 노동자 관리를 낳고, 자본가의 착취와 폭리를 끝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점유와 사용」 제도는 논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임금노동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작업장에 그것을 운영하는 집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작업장을 소유하는 것은 사용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한 개인이 그 작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 외의 사람들도 그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분명히 「점유와 사용」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소유자가 작업장을 사용하기 위해 타자를 고용했을 경우 이 보스는 노동자의 노동산물을 훔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은 충분한 산물을 받아야 한다는 격언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모든 원리는 반자본주의의 결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섹션 G.3 참조].
이 두 번째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주의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지역사회에 무리하게 참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타자와 자유롭게 교환할 자유도 포함한다)가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막스 스티르너는 이런 입장을 다음과 같이 멋지게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을 폐기함으로써 나를 타인에게, 즉 일반성이나 집단성에 더욱 의존하도록 되돌려 놓을 뿐이다. (이것은) 나의 자유운동을 방해하는 조건, 나에 대해 미치게 되는 주권이다. 공산주의는 확실히 내가 개개의 소유주로부터 받는 압력에 대해 올바르게 반역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성의 수중에 놓인 힘은 더욱 무서운 것이다[The Ego and Its Own, p. 257]. 프루동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공산주의 아래에서는 지역사회가 소유자가 된다. 즉,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도 소유에, 따라서 권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소유란 무엇인가? What is Property?』의 「공산주의의 특징과 소유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communism and of property」이라는 섹션을 참조]. 즉 어떤 형태의 공산주의도 개인을 사회와 코뮌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사회적 소유는 개인의 자유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이 명령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다. 「사회」가 노동자에게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를 알리고, 노동자의 노동의 산물을 빼앗는 이상, 사회화는 사실상 근로자 관리를 배제할 것이라고 그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보스에 의한 착취와 권력이 「사회」에 의한 착취와 권력으로 치환되는 것 뿐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즉 사회적 소유 전반)는 자본주의와 유사하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의 의견은 다르다.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슈티르너와 프루동의 의견은 완전히 옳다고 주장한다. - 단지 그것은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48년 이전에 제시된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자유에 대한 공산주의의 효과에 대해 왜 프루동이 불신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낡은 공산주의의 생각은 연장자의 엄격한 지배나 사제를 이끄는 과학자의 엄격한 지배 하에서의 금욕적 지역사회라는 생각이었다. 인간이 그런 공산주의를 경험해야 했다면 자유와 개인 에너지의 마지막 흔적마저 파괴되어 버렸을 것이다」[Act for Yourselves, p.98]. 크로포트킨은 항상 주장했다. 무정부 공산주의communist-anarchism는 새로운 발전이며 1870년대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프루동과 슈티르너의 견해는 그들이 무정부 공산주의를 알지 못했던 이상, 무정부 공산주의에게 향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유는 재산소유자의 권력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폐기한다. 그것으로 공유는, 개인을 지역사회로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의 전면에서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무정부 공산주의는 개인적 「재산」 전부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소유물과 개인적 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크로포트킨은 「모두가 같은 집에 살고 그 결과, 「형제 자매」와 억지로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가족을 모델로 지역사회를 관리하려는」 형태의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자유와 가정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가족」을 강요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이다」[Small Communal Experiments and Why They Fail, pp. 8-9].
다시 크로포트킨을 인용하면, 무정부 공산주의의 목적은 「자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소비할 자유를 개인에게 맡기면서 수확물과 제품을 만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The Place of Anarchism in the Evolution of Socialist Thought, p. 7]. 이렇게 함으로서 개인의 기호와 희망, 그리고 개성의 표현이 확보되는 것이다 - 소비와 생산 쌍방에서.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노동자 자주관리의 확고한 지지자다.
따라서 사회적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공산주의에 대한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의 반대는 국가 공산주의나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에만 통용되는 것이며, 무정부 공산주의의 근본적 성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정부 공산주의자는 개성을 지역사회에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를 이용해 개성을 방위한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회」에 개인을 관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아나키즘은 개성과 개인적 표현의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무정부 공산주의는 모든 정복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인 - 개인의 자유 - 를 유지하고 나아가 그것을 확충해 정치적 자유에 현혹되지 않는 확고한 기반 - 경제적 자유 - 을 제공한다. 무정부 공산주의는 신·보편적 폭군·신神인 왕·신神인 의회를 거부한 개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절차보다도 무서운 신 - 공동체의 신 - 을 자신에게 부여하도록, 혹은 자신의 자립, 의지, 취향을 그 제단에 포기하고, 십자가에 걸린 신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한 금욕의 맹세를 다시 시작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대의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개인이 자유롭지 못하면 어떤 사회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전게서, pp. 14-15]
나아가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집단화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항상 인정하고 있다. 사람이 자력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크로포트킨 지음 『빵의 쟁취The Conquest of Bread』p.61 와 「자주행동론Act for Yourselves」, pp. 104-5, 또는, 마라테스타 저 「엔리코 마라테스타Errico Malatesta: 인생과 사상His Life and Ideas p. 99 and p. 103을 참조]. 사회적 아나키스트가 이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 원리나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적 성질과 뭔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외도 「사용권」시스템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는 섹션I.6-2를 참조). 또한 사회적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하나의 조직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조직은 공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협력하는 수단이다. 모든 아나키스트는 아나키스트 사회의 기반으로서 자유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모든 아나키스트는 아래의 바쿠닌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다.
집산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노예에 대해서 뿐이다. 즉, 이러한 집산주의 등은 인간성의 부정인 것이다.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 집산주의는 위로부터 강요된 정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운동이 만들어 낸 정황의 압력을 통해서만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Bakunin on Anarchism, p. 200]
개인주의자가 자력으로 일하고 타자와 산물을 교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아나키스트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키즘의 두 가지 형태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코뮌에 참가하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지지한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공산주의적인 조직을 포함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재산을 모으는 개개인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주의statism를 다시 만들어내려는 이 시도를 즉각 배격한다. 아나키스트는 지배자가 되는 「자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루이기 갈레아니Luigi Galleani를 인용하자.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라는 편안한 외투에 숨어 지배관념을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그렇게 세련되어있지 않다. 억지를 늘어놓는 변명 정도다. 하지만 지배의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에고라는 이름 아래 타자의 순종적이고 체념적이며 활발치 않는 에고에 대해 개인주의를 행사할 생각인 것이다. [The End of Anarchism?, p. 40]
나아가 사회적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생산수단을 매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나키스트 사회에 사유 재산제도가 다시 도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자유시장에는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프루동이 주장했듯이 경쟁에서는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한다. 어떤 사람의 협상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면 어떤 「자유교환」이라도 더 강한 쪽을 이롭게 할 것이다. 즉, 시장은 비자본주의 시장이라 하더러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와 권력을 평등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런 일은 더욱 뚜렷하다. 자신의 노동력밖에 팔 수 없는 사람들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즘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개인주의 아나키스트 사회가 그 뜻에 완전히 반해서 공평한 교환에서 자본주의로 다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있을 법한 일이지만 만약 「실패한」 경쟁자가 억지로 실업상태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살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성공자」에게 팔아야 한다. 이는 권위주의적 사회관계를 만들어 내고 「자유계약」을 통한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만든다. 이러한 계약(등 그와 비슷한 다른 계약)의 시행은 아마도, 「국가의 모든 기능을 『방위』라는 명목 하에 재구성하기 위한 길을 여는 것이다」[Peter Kropotkin, Anarchism, p. 297)].
벤저민 터커는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관념에 가장 영향을 받은 아나키스트지만 그도 추상적 개인주의의 모든 학파들과 관련된 문제 - 특히 권위적 사회관계를 「자유」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 -에 주력했다. 이는 재산이 국가와 유사한 데 기인한다. 터커는 국가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라고 했다. 그것은 공격성과 「일반적으로 신민의 완전 억압과 국경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특정영역과 국가내부에 있는 만인에게 미치는 권력이라는 전제」다[Instead of a Book, p. 22]. 그러나 보스와 지주들도 일정 영역(해당 소유지)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노동자와 소작인)에 대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행동을 관리한다. 마치 국가가 시민과 신민을 지배하듯이. 즉, 개인적 소유는 국가가 창출하는 것과 같은 사회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양쪽은 같은 원천(일정 영역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권력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에 의한 개인적 소유의 수용, 그리고 그 개인주의적인 개인적 자유의 개념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권위주의·국가주의의 사회적 모든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주의자들은 추상적인 자유의 개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현실의 구체적인 자유는 연대와 자발적 협력과의 성과라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상론하지 못하고 있다」[The Anarchist Revolution, p. 16]. 예를 들어 임금노동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보스와의 관계는 시민권에 있어서의 시민과 국가의 관계와 같다. 즉, 지배와 종속의 관계인 것이다. 소작인과 지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국가의 다른 측면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앨버트 멜쳐Albert Meltzer가 지적했듯이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국가주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벤저민 터커 학파는 - 그 개인주의로 인해 - 파업을 깨부수는 경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고용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른바 개인주의자인 학파는 모두 경찰기구의, 나아가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나키즘의 중요한 정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인 것이다[Anarchism: Arguments For and Against, p. 8]. 사회적 아나키스트가 개인의 자유를 실천하는 최선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소유를 지지하는 이유의 일부가 이것이다.
개인적 소유를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를 「벗어나기」위해서는 프루동(터커의 상호주의 관념의 원천이다)을 따라서, 한 사람 이상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으로 지주를 효과적으로 폐기하게 되는 토지의 「점유와 사용」을 개인적 아나키스트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 필연적으로 보완된다.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그 자원을 소유한다면, 개인적 소유는 히에라르키형의 권력(즉, 국권주의와 자본주의)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다. 섹션G에서 논하는 이 해결책을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조셉 라바디는 자신의 자식에게 임금소득과 「타자의 지배」로부터 멀어지도록 설득하는 글을 썼다[Carlotta Abderson, All American Anarchist, p. 222 에서 인용].
윌리엄 겔리 클라인William Gary Kline이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자신들 중에서 어느 누구와도 큰 빈부의 차가 없는, 대부분이 자영업 노동자로 구성된 사회를 기대했다」[The Individualist Anarchists, p. 104]. 그들의 사상이 진짜 아나키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영업자 사회의 비전인 것이다.
그 이상으로, 개인주의자는 「폭리」를 공격하는 한편으로 자본의 축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무시하고 있다. 자본의 축적이야말로 시장진입에 대한 자연스러운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폭리를 다시 만들어 낸다(섹션 C.4 왜 시장은 대기업에 지배되도록 되었는가? 를 참조). 따라서 터커 등의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은행의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협동조합의 투자가 아니라 자본가의 투자를 지원하는 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진(협동조합보다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대은행에 의한 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은 프루동이 원래부터 바랐듯이 지역사회가 은행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뿐이다.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의 발전을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제휴한 협동에 의한 지방자치적, 따라서 지방분권적인 생산형태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의 생각에 관한 논의는, 섹션 G「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적인가?」를 참조)
|
|
|
|
|
|
|
|
 |
A.3 아나키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
|
 |
A.3 아나키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아나키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새 알 수 있는 것의 하나는 아나키즘은 단일 형식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나키즘 사상의 여러 학파가 존재하며 그것들은 많은 문제에서 서로 의견의 상이점을 갖는다. 이들 유형은 일반적으로 전술 및 또는 목표에 의해 구별되며, 후자(자유로운 사회의 비전)가 주된 요소다.
아나키스트는 모두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어떤 경제체계가 인간의 자유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대략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형태의 아나키스트도 하나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루돌프 로커Rudolf Rocker를 인용하자.
사회주의 창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들도 모든 경제독점의 파기·토지를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한다. 생산수단은 만인이 구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는 만인에 대한 평등한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비로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운동 그 자체 속에서 아나키스트는 자본주의에 대한 전쟁은 동시에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모든 기구에 대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경제착취는 항상 정치적·사회적 억압과 손을 잡고 걸어왔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것,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이것들을 떼어 놓을 수는 없다. 한편은 다른 한편의 전제인 것이다. [Anarcho-Syndicalism, pp. 62-3]
아나키스트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큰 틀의 범위 내에서의 일이다. 주된 차이는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와 「사회적」 아나키스트에 있다. 다만 각자 원하는 경제체계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들 두 가지 중 사회적 아나키스트(무정부 공산주의자·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등)는 어느 시대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인주의 아나키즘은 그 대부분이 북미에서 볼 수 있다. 이 섹션에서는 아나키즘 운동 내에 있는 이러한 주요 경향의 차이를 제시할 것이다. 금새 밝혀지겠지만, 사회적 아나키스트도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도 국가와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자유사회의 성질(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사회문제에 대해 공동체형 해결책을 선호하고, 좋은 사회(즉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촉구하는 사회)의 비전도 공동체형인 것을 선호하고 있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 개인적 해결책을 선호하며, 좋은 사회의 비전은 더욱더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 따라 양쪽이 공유하는 것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이나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하고 국가와 자본주의에 의한 지배와 착취를 끝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큰 차이에 더해 아나키스트 중에는 생디칼리즘·평화주의·라이프 스타일주의」·동물애호 등 수많은 생각에 대한 의견차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요하지만 아나키즘이 갖는 여러 측면일 뿐이다. 자유롭게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운동이라 예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관건이 되는 생각을 제외하고 아나키즘 운동은 (인생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변화·논의·사색의 상태에 항상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견을 말하자면 우리 FAQ 작성자는 아나키즘 안에서도 「사회적인」 입장을 확고히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주의 아나키즘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생각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회적 아나키즘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 내어,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사회에 보다 가까운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
|
|
|
|
|
|
 |
A.2-20 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무신론자인가 |
|
|
 |
A.2-20 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무신론자인가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무신론자, 이는 사실이다. 아나키스트는 신神이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모든 형태의 종교, 특히 조직종교에 적대한다. 오늘날 비종교화된 서방국가들에서는 종교는 사회 속에서 그 이전에 가졌던 지배적 지위를 잃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우 아나키즘의 전투적 무신론은 기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가 갖는 부정적인 역할을 이해한다면 리버타리안 무신론의 중요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아나키스트가 종교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종교반대론을 선전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종교와 종교기관들이 갖는 역할 때문이다.
왜 그렇게까지 많은 아나키스트는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가장 단순한 답은 다음과 같다. 무신론은 아나키즘 사상의 논리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무신론자인 것이다. 아나키즘이 부당한 권위의 거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최고권위·신의 거부라는 얘기가 된다. 아나키즘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이성·논리·과학적 사고이지 종교적 사고가 아니다. 아나키스트는 신봉자가 아니라 회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교회는 위선 투성이며 성경은 모순·불합리·공포가 충만한 조작으로 간주한다. 성경이 여성의 품위를 폄훼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성차별주의는 악명이 높다. 그러나 남성으로서도 약간 나은 취급을 받고 있을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삶·자유·행복·존엄·공평·자치의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곳은 없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죄인·벌레·노예이다(비유적으로도 문자 그대로도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다). 신이 모든 권리를 갖고 인간은 무가치한 것이다. 종교의 성질을 생각하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잘 말하고 있다.
신이라는 관념은 인간이성과 정의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적 자유를 가장 결정적으로 부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인간의 노예화를 반드시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예화와 타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학의 신이나 형이상학의 신 중 어느 것에게도 아주 사소한 양보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 신비로운 문자체계에서는 A로 시작하는 자는 반드시 Z로 끝난다. 신을 숭배하려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해 유치한 환상을 품지 말고 자신의 자유와 인간성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노예다. 이제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God and the State, p.25].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에게 무신론이 필요한 것은 종교의 성질 때문이다.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성이 갖는 웅대하고, 공정하며,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 모두를 신적인 것으로 선언하는 것은, 인간성 그 자체로는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 즉, 인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질은 비참하고 부정하고 저열하며 추악한 것이다 - 고 넌지시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서 우리들은 모든 종교의 본질 - 바꿔 말하면 신성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인간성을 비난하는 것 - 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과 인간이 가진 잠재적인 가능성을 위해 정의를 행하도록, 아나키스트는 신이라는 유해한 신화나 신에 부수되는 모든 것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존엄·번영」을 위해서 「강탈당한 능력을 천국으로 부터 구해내 지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전게서, p. 37 and p. 36].
종교는 인간성과 인간의 자유를 이론적으로 타락시킬 뿐 아니라 아나키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더 실제적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종교는 불평등과 억압의 원천이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은 정치적·사회적 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나 억압세력이었다(신에 대한 직접적 유대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사회를 창조하는 확실한 길이다). 교회는 거의 2천 년에 걸쳐 사회적 억압을 행하고 대량살육을 저질렀으며 모든 압제자를 정당화하는 세력이었다. 기회가 주어지면 교회는 군주나 독재자만큼이나 잔혹하게 지배한 것이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신이 전부라면 현실세계와 인간이란 없다. 신이 진실·정의·선·미·힘·그리고 삶이라 한다면 인간은 허위·부정·악·추악·무능·죽음인 것이다. 신이 주인이라면 인간은 노예이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정의·진실·영원의 생명을 찾을 수 없고,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계시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선지자든, 구세주이든, 예언자이든, 사제이든, 입법자이든 신 자신에 의해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성의 성스러운 지도자로서 구제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 자신에게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많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수동적 복종을 할 의무를 가진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이성에 대항하는 인간이성 따위는 없고, 신의 정의에 대해 지상의 정의 따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Bakunin, 전게서, p. 24]
기독교가 관용적이며 평화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은 그것이 권력이 없을 때뿐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권력자를 옹호하는 역할을 계속했다. 아나키스트가 교회에 적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이다. 억압의 원천이 되어있지 않았을 때도 교회는 억압을 정당화하고 그 지속을 확고히 했다. 지상의 권위가 지배하는 것을 시인하고, 노동자에게 이 권위와 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몇 세대에 걸쳐 노예로 만들어 갔던 것이다. 정치적(지배자들은 신의 뜻에 따라 권좌에 있다고 주장한다)이건 경제적(부자는 신에게 포상을 받은 것이다)이건, 지상의 지배자들은 천상의 신으로부터 정통한 것으로 간주됐다. 성경은 복종을 찬양하고 가장 큰 미덕이라고 추켜세운다. 개신교 노동윤리 같은 최근의 발명도 노동자의 종속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권력자의 이권을 조장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역사에서 바로 찾아 볼 수 있다. 종교는 억압받는 쪽을 순종케 하고 천국에서의 포상을 기다리도록 설득함으로써 인생에서 자신의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엠마 골드만은 이렇게 주장했다. 기독교(일반 종교도 그렇지만)는 「권위와 부의 체제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기부정과 자기희생, 참회와 후회를 지지하며 인류에게 강요당한 모든 모욕, 모든 폭거의 면전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Red Ema Speaks, p. 234].
세 번째로 종교는 언제나 사회 속의 보수 세력이라는 것이다. 이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종교는 현실세계의 조사와 분석이 아니라 위에서 건너 내려온 진실과 몇 가지 성스러운 서적에 담긴 진실을 반복하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론은 「추측이론」이며 무신론은 「실증과학」이다. 「한 쪽은 이해를 넘어선 것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구름으로 드리워있으며, 다른 한쪽은 대지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구제받고자 한다면 인간이 구원해야 하는 것은 지상이지 천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신론은 「인간정신의 확충과 성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편 유신론은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다」. 「무신론이 저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은 유신론의 절대주의와 인간에 대한 그 유해한 영향과 사상과 행동을 혼란시키는 그 효과인 것이다」[Emma Goldman, 전게서, p. 243, p. 245 and pp. 246-7].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아나키스트도 여기에 동의하지만, 교회와는 달리 이 진실을 종교에도 적용한다. 그러므로 아나키스트는 대체로 무신론자다. 우리는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파괴적 역할을 인식하고 조직적 일신교, 특히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효과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엠마 골드만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종교는 「이성에 대한 무지의 음모, 빛에 대한 비밀 음모, 자립과 자유에 대한 복종과 예속의 음모,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음모, 삶의 향유와 영광을 긍정하는 것에 대한 음모다」[전게서 p, 240].
그런데 교회의 결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그것을 근절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자! 이성과 자유의 수목을 심자! 라고.
그렇기는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종교가 중요한 윤리사상과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는 강력하고 애정이 넘치는 커뮤니티나 그룹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소외와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만물이 매물로 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행동을 일으키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수나 붓다의 삶과 가르침의 많은 측면은 우리를 고무하며 따를 만하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종교가 단순한 권력자의 도구였다면 종교는 이미 오래전에 거절당했을 것이다. 오히려 종교는 이중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사상과 권력 호교론 양쪽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중적 성질을 갖지 있지 않은 경우, 억압받는 쪽은 종교를 신봉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가진 쪽은 위험한 이단이라며 종교를 탄압할 것이다.
사실 탄압은 급진적 메시지를 전도하던 모든 그룹의 운명이었다. 중세시절 수많은 혁명적 기독교 운동과 교파가 주류 교회의 확고한 지원을 받았던 지상의 당국에 의해 파괴됐다. 스페인 시민전쟁 중 카톨릭교회는 프랑코의 파시스트들을 지지하고, 공화국 지지자들이 프랑코를 지지하는 목사를 살해했다고 비난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 바스크 목사를 프랑코군이 살해한 것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망한 프랑코 지지 목사를 성자로 추대하려 했으나 공화국 지지 목사에 대해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엘살바도르의 대주교 오스카 아르눌포 로메로Oscar Arnulfo Romero는 당초 보수적이었지만 정치적·경제적 권력이 민중을 착취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들의 노골적인 대변인이 됐다. 이 때문에 그는 1980년 우익 민병조직에 의해 암살됐다. 이것은 해방신학(사회주의 사상과 기독교적 사회견해를 융합시키기 위해 복음서를 급진적으로 해석한)의 지지자들 대다수에게 닥친 운명이었다.
또한 아나키스트가 종교에 반대한다고 해서 종교인이 사회를 개량해야 할 사회투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르다. 종교인은 교회 히에라르키 멤버를 포함해 1960년대의 미국 시민권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멕시코 혁명 당시 사빠타Emiliano Zapata의 농민군 내부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나키스트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사실, 농민군은 아나키스트 투사 리까르도 플로레스 마곤Ricardo Flores Magon의 사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종교의 이중성질이야 말로 많은 민중운동과 민중봉기(특히 농민들의)가 종교적 수사를 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자신들 신념의 좋은 측면을 계속 지키려는 것이 지상의 불공정과 싸우게 한 것이었다.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공정과 싸우려는지 어떤지 여부이지, 사람이 신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반란을 꺾는 것이지,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주류 사제들이나 우익의 사제들에 비해, 급진적 사제는 단지 한 줌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분석의 타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교회와 종래의 종교가 가진 생각에 대해 철저하게 적의를 품는 한편, 민중이 자신만의, 혹은 그룹으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단, 그 실천은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이다. 예를 들어 인간을 제물로 삼거나 노예로 만들어야 하는 숭배적인 종교는 아나키즘 사상과는 정반대이며 아나키스트는 이에 반대한다. 하지만 평화적 신념 시스템은 아나키스트 사회내부에서도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 아나키즘의 관점은, 종교는 무엇보다도 사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지 타인에게 그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한, 타인과 관계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각을 논의하고 그 잘못을 설득하려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아나키스트이기 위해서는 무신론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반대다. 섹션 A. 3-7에서 논하는 것처럼 신이나 어떤 종교를 확실히 신봉하고 있는 아나키스트도 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는 리버타리안 사상을 헌신적인 기독교 신념과 조합하고 있었다. 그의 사상은 프루동의 사상과 함께 아나키스트 도로시 데이Dorothy Day와 피터 모린Peter Maurin이 1933년 설립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노동자 조직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반세계화 운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스타호크Starhawk는 아나키스트 운동가인 동시에 주도적 이교도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엠마 골드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아나키즘 사상은 논리적으로 무신론을 이끈다. 「신을 부정하는 것은 동시에 인간을 가장 강하게 긍정하는 것이다. 인간을 통해서 인생·목적·아름다움에 영원한 찬동을 하는 것이다[Red Ema Speaks, p. 248].
|
|
|
|
|
|
|
|
 |
A.2-19 아나키스트의 윤리관은 어떠한 것인가 |
|
|
 |
A.2-19 아나키스트의 윤리관은 어떠한 것인가
아나키스트의 윤리관은 그것을 주장하는 개개인에 의해 매우 다르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의 공통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 속에서 자신의 윤리감각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아나키스트는 막스 스티르너의 말, 개인은 기존 도덕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그런 도덕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옳은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자신 외에 올바른 것은 없는 것이다」[The Ego and Its Own, p. 189].
그러나 아나키스트의 대부분은 스티르너 정도까지, 나아가 사회적 윤리개념도 거부하고 있지 않다.(즉, 스티르너는, 이기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편적 개념에 신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도덕 상대주의는,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도덕 절대주의와 거의 같은 정도로 나쁜 것인 것이다(도덕 상대주의란, 한 개인에게 적합한가 어떤가를 넘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견해이며, 도덕 절대주의란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견해다).
현대사회는 과잉 「에고이즘」, 즉 도덕 상대주의 때문에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잘못이다. 도덕 상대주의가 확산되는 한 그것은 여러 도적 주의자나 진리 신봉자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도덕적 절대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 상대주의 그 자체는 개개인의 이성이라는 생각에 빈약하기는 하지만,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덕 상대주의는 윤리의 존재(바람직함)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항 대상의 단순한 거울 영상일 뿐이다.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든 개인에게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방하는 것도 아니다.
그 결과 어느쪽 태도나 권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사물에 대해 의견을 갖지 못하는(그리고 어떤 것에도 참을 뿐인)서민이나, 지배계급 엘리트의 명령에 맹종할 뿐인 서민은,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어느 쪽 태도나 거부하고, 윤리에 대한 진화론 접근방식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윤리의 진화론 접근은 다양한 윤리개념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인간이성과, 그러한 개념을 개인 내, 사회 내에서의 윤리적 태도로 일반화하기 위해 대인적 감정이입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에 대한 아나키즘적 접근은 도덕 상대주의가 나타내고 있는 개인의 비판적 탐구를 공유하며 동시에 선악에 관한 공통감정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진보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떠한 개혁이든 어떤 악습을 고발하는 것에 의하고 있다. 각각의 새로운 생각은, 낡은 생각이 불충분하다고 증명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윤리규범이 인생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진화과정에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 그 때문에 아나키스트는 「신의 법」이나 「자연법」 등 여러 가지 관념을 거부하고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의문시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완전히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한 윤리 발달 이론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나키스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나키스트의 기초를 만든 사색자의 한 사람인 미하일 바쿠닌은 이 철저한 회의주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어떤 이론이든, 어떤 기성 시스템이든 지금까지 쓰여진 어떤 책이든 세계를 구하지는 않는다. 나는 어떤 시스템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구도자다.
어떠한 윤리 시스템도 그것이 개인의 의문에 입각하지 않으면 권위주의가 될 뿐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권위주의 윤리는, 선악을 아는 인간의 능력을 무시한다. 규범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개인을 초월한 권위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성과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위의 경외, 그리고 복종자가 느끼는 약함과 의존성에 근거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권위자에게 맡기는 것은 권위자가 마력을 지니는 것이 된다. 권위자의 결정은 의문시할 수 없고 의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즉 그 내용에 따르면 권위주의 윤리는 주로 복종자가 아니라 권위자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선악의 문제를 해결한다. 복종자가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이익을 거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권위주의 윤리는 착취적인 것이다.[Man For Himself, p. 10]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과학적 접근법을 취한다. 아나키스트는 영혼의 도움과 같은 신화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정신이 갖는 장점에 따라 윤리판단을 한다. 이는 논리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윤리적 판단은 도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습적인 종교와 같은 구시대적 권위주의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며, 도덕 상대주의의 「선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보다 훨씬 낫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윤리개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을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윤리학 교사라고 인식해야 한다. 사교적인 동물 전부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내재하는 사교본능, 이것이 모든 윤리적 개념 그리고 그에 이은 도덕발달 전부의 기원이다」.[Ethics, p. 45]
다시 말하면, 삶이 아나키즘 윤리의 기초다. 본질적으로(아나키스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윤리 견해는 다음의 3가지 기본적 원천에서 도출된다.
(1)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로부터다. 크로포트킨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의 도덕 개념은 어느 시점·어떤 장소에서 전제로 되 있던 사회생활의 형태에 완전히 의존한다. 이것(사회생활)은 그 시대의 인간의 도덕개념과 도덕교육으로 나타나 있다」[전게서, p. 315]. 바꿔 말하면, 인생경험과 생활경험으로부터다.
(2)상기한 것처럼 개인에 의한 사회의 윤리기준의 비판적 평가로부터다. 이것이 에리히 프롬의 주장의 핵심이다.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을 행사했을 때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힘을 공개하고, 생산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 [Man for Himself, p. 45]. 바꿔 말하면 개개인의 사고와 발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3)감정이입으로 부터다.「도덕적 정서의 진정한 기원은, 단순히 동정이라는 감정에 있다」[Anarchist Morality, Anarchism, p.94]. 바꿔 말하면, 경험과 생각을 타자와 공감하고 공유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부터다.
이 마지막 요인은 윤리감각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너의 상상력이 강력하면 할수록, 어떤 생물이든 그것이 괴로움을 겪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의 도덕적 감각은 깨끗이 연마되어 예민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상황에 의해서, 또는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또는 너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의 강함에 의해서, 네가 너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이 너를 몰아세우도록 행동하는 데 익숙해짐에 따라 도덕적 정서가 너의 안에서 자랄 것이다. 도덕적 정서는 습관이 될 것이다」[전게서, p. 95].
즉, 아나키즘은 「비슷한 상황 아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하라」는 윤리적 격언에(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입장에 대해 말하자면, 아나키스트는 에고이스트도 아니고 이타주의자도 아니다. 단지 인간인 것이다.
크로포트킨이 말하는 것처럼, 「에고이즘」과 「이타주의」는 같은 동기에서 발생했다. 「인간성의 결과로서 생기는 두 가지 행위에 큰 차이가 있더라도 그 동기는 같다. 향락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전게서, p. 85].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개인의 윤리 감각이란 그 사람 자신이 발달시켜야 하는 것이며 사회집단의 일부로서,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그 사람이 정신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등 권위의 여러 형태는 개인의 상상력을 약화시키고 히에라르키의 시체더미와 커뮤니티의 붕괴 아래에서 민중이 자신의 이성을 행사할 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의 특징은, 타자의 완전무시와 윤리행동의 결여에 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사회 속에서 불평등이 이룬 역할이 이런 요인으로 결합된다. 평등 없이 어떤 진정한 윤리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란 평등을 의미한다. 타자를 대등하다고 간주하는 자만이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된다』는 룰을 따를 수 있다. 농노소유자·노예상인은 농노(또는 노예)에 관해 (사람들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다룬다고 하는) 이 『지상명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평등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사회에서 일정한 도덕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평등이 없는 것이다. 진정한 평등이 없으면 정의의 감각이 보편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 정의란 평등의 의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Peter Kropotkin, Evolution and Environment, p. 88 and p. 79].
자본주의 사회는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윤리행동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도덕 상대주의와 도덕 절대주의 사이를 넘나드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에고이즘과 자기 중심주의가 혼동하게 된다. 개개인이 자신의 윤리개념을 발달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외적인 권위에 맹종할 것을 권유함으로써(개개인 모두가 권위자의 권력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라도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성과 에고를 불모의 것으로 하고 있다. 에리히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문화의 실수는 그 개인주의 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덕은 사리사욕의 추구와 같은 뜻이라는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리사욕의 의미가 타락되어 버렸다는 점에 있다.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개의치 않는다는 데 있지 않고, 진정한 나의 이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Man for Himself, p. 139]
엄밀히 말하면 아나키즘은 에고이즘 원리에 근거한다. 즉 윤리개념은 전체적으로 개인(합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이성이나 정서도)에게 향락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로 인해 모든 아나키스트는 에고이즘과 이타주의와의 잘못된 부분을 배제하게 된다. 모든 아나키스트는 많은 사람들(예를 들어 자본주의자)이 「에고이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개인의 자기부정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편협한 에고이즘의 선동에 맞서 이타주의를 발달시키려는 의도에서 인간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동물사회와 인간사회에서 진화해온 도덕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에고이즘」과 「이타주의」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개인의 향락이 섞여있지 않은 -결국은 에고이즘이 없는 - 순수한 이타주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윤리학의 목적은 사회습관의 발달과 편협한 개인습관의 약화이다. 편협한 개인습관은, 한 개인을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게 해서 사회로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들고 그 결과, 그 목표 즉 그 개인의 복지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 반대로, 협동과 전반적 상호부조 습관의 발달은 가족에 있어서도 사회에서도 일련의 유익한 결과를 이끈다.[Ethics, pp. 307-8]
즉, 아나키즘은 도덕 절대주의(「신의 법」, 「자연법」, 「인간의 성질」, 「A는 A다」)의 거부를, 그리고 도덕 상대주의에 매우 쉽게 순응하는 편협한 에고이즘의 거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아나키스트는 자신의 행위의 자기평가 외에 선악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이유는 인간성의 사교적 성질에 있다. 크로포트킨에 따르면 개인 간의 거래는 사교상의 격언을 낳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 유효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선이다. 그것은 유해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악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인류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가는 보편적이지 않고 「무엇이 유효하고 무엇이 유해한가의 평가는 변화하지만, 그 기반은 언제나 같다」[「Anarchist Morality」, 전게서, p. 91 and p 92].
비평정신에 바탕을 둔 감정이입의 감각이 사회윤리의 근본 기반이다. 「있어야 할 모습」이 진리의 윤리적 기준이며, 객관적인 「현재의 모습」이 타당한지 어떤지의 윤리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 윤리의 근원을 찾아내면서도 아나키스트는 윤리를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라고 본다. 개개인이 창조하고 사회적 생활과 커뮤니티가 일반화된 삶·사고·진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나키스트는 무엇을 반인륜적 행동으로 보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가장 귀중한 역사적 공적 즉, 개인의 자유·개성·존엄을 부정하는 모든 것이다.
개개인은 어떤 행위가 반인륜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감정이입을 통해 그 행위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자신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을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서로 관계하고 있다)의 이유로 반인륜적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개성의 존중과 발달은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다양성으로 인해 개개인에게 기쁨을 준다. 이 에고이즘적 윤리기반은 두 번째의 (사회적)이유로 인해서 강화되고 있다. 즉, 개성은 커뮤니티 생활과 사교생활을 강화하고 그 생활을 성장시켜 진화시킴으로써 풍성하게 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바쿠닌이 일관되게 논하고 있듯이 진보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이행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또한 하버트 리드Herbert Read의 말을 빌리면 진보는 「한 사회 내에서의 분화의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 개인이 조직집단의 한 유닛unit에 지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삶은 제한되고 생채가 없으며 기계적인 것이 될 것이다. 개인이 각각의 행위를 행할 여지와 가능성을 가진 자기 자신의 한 유닛unit이라면, 그 사람은 장점·생명력·기쁨을 자각하면서 발달 - 이 말이 갖는 유일한 참된 의미의 발달이다 - 할 수 있을 것이다」[The Philosophy of Anarchism, [Anarchy and Order, p. 37].
이 개성의 옹호는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에코 시스템에서 다양성은 장점이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은 기본적인 윤리 통찰의 원천이 된다.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은 「우리들의 행위 중에서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을 추진하는 것과 그것을 저해하는 것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는」[Murray Bookchin, The Ecology of Freedom, p. 442] 지표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윤리개념은 「모든 동물세계에 내재하고 있는 사교본능의 감정과, 인간이성의 근본적 판단의 하나인 평등의 관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나키스트는 「보다 큰 사회성의 발달, 그리고 사회성 발달의 결과로서 생긴 삶의 강도의 증대라는 불변적 이중 경향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개인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진보(신체적·지적·도덕적인)를 낳는 것이다」[Kropotkin, Ethics, pp. 311-2 and pp. 19-20].
개개인의 자유가 첫 번째 관심사이며 타자의 감정을 공유하고 자기 자신을 타자 속에서 본다고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바꿔 말하자면 기본적인 평등과 공통의 개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윤리적 신념으로 부터 권위·국가·자본주의·사적소유권 등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태도는 생겨나는 것이다.
일정 상황과 행동에 관해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평등자끼리 그 평가를 감정이입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논의함으로써 개인 간의 객관적 결론이 도출된다. 아나키즘은 이들 두 가지 과정을 조합하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윤리사상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사회와 개인발달에 따라 진화하는 접근방식이다. 윤리적인 사회에서는,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가 경험과 현상의 통일을 충실케 하는 요소로서 존중되고, 더 말하자면 길러진다. (서로 다른 부분은) 그 복잡함으로 인해 더욱 더 풍족해지는 전체의 일부라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Murray Bookchin, Post Scarcity Anarchism, p. 82].
|
|
|
|
|
|
|
|
 |
A.2-18 아나키스트는 테러리즘을 지지하는가 |
|
|
 |
A.2-18 아나키스트는 테러리즘을 지지하는가
아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테러란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이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아나키를 만들어 내야 한다. 타인을 폭파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나키즘은 자기해방self-liberation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관계를 폭파할 수는 없다. 극히 일부 엘리트가 대다수를 위해 지배자에 대해 파괴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유는 창조할 수 없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수 세기에 걸친 역사에 근거한 구조를, 수 킬로의 폭약으로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Martin A. Millar, Kropotkin, p. 174에서 인용한 Kropotkin의 말].
민중이 지배자를 필효하다고 느끼는 한 히에라르키는 존재한다(상세한 것은 섹션A.2-14를 참조).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나키즘은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의 해방을 요구하며 혁명이 실행될 때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K.J. Kenafick에 의해 인용된 Michael Bakunin and Karl Marx, p. 125]. 아나키스트들의 생각으로는 수단이 목적을 결정한다. 테러는 본래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아나키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혁명의 역사는 크로포트킨의 다음과 같은 통찰을 증명하고 있다. 「테러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면 미래의 혁명은 매우 슬퍼질 것이다」[Millar, 전게서, p. 175에서 인용].
그 이상으로 아나키스트가 반대하는 것은 개개인이 아닌, 특정 개인이 타인에 대해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남용(즉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사회관계이다. 아나키즘 혁명이란 그런 구조를 파괴하는 데 관련이 있지, 민중의 파괴가 아니다. 바쿠닌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신분과 그 필요조건의 폐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나키즘은 「부르주아 계급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노동자계급과 경제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실체로서의 부르주아 계급의 죽음을 원하는 것이다」[The Basic Bakunin, p. 71 and p. 70」. 테러에 반대하는 아나키즘의 주장을 나타낸 팜플렛의 제목을 인용하면 「사회관계를 폭파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나키즘은 어떻게 폭력과 연관지어 버린 것일까? 이 이유의 일부로서 국가와 언론이 본래 아나키스트가 아닌 테러리스트를 아나키스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더 마인호프Bader-Meinhoff는 스스로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스트」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안타깝게도 욕설은 퍼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나키즘 운동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나키스트가 죄를 뒤집어써야 했던 (폭력) 행위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신문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직접 행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에 의해 조장되었던 것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Red Emma Speaks, p. 262].
이런 프로세스가 작용하고 있는 실제 예는 현재의 반세계화 운동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애틀Seattle에서는 미디어는 시위자(특히 아나키스트)에 의한 「폭력」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몇 개의 유리창이 깨졌다는 정도였다. 시위자에 대해 경찰이 저지른 더 큰 실제의 폭력(내친 김에 말하자면 이건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 시작되었다)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 후에 반세계화 데모를 미디어가 보도할 때는 이런 패턴이 답습되었다. 시위자는 국가의 손에 의한 큰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굳건하게 아나키즘으로 연결되었다. 아나키스트 활동가인 스타호크Starhawk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의 공격에 반격하는 것이 『폭력』이라면 새로운 말을 가르쳐 달라. 경찰관이 무저항의 사람들을 혼수상태에 만들 때 사용해야 할 수천 배 강렬한 말을 가르쳐 줘라」[Staying on the Streets, p. 130].
역시 2001년 제노바Genoa 시위행동에서 주류 언론은 시위행동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묘사했다. 국가가 시위자 한 명을 살해하고 수천 명 이상을 입원시켰는데도 말이다. 시위자 가운데 공작원 경찰관이 있어, 폭력 행위를 한 것은 미디어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타호크는 그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노바에서 「우리들은 주의 깊게 획책된 국가테러의 정치캠페인을 마주쳤다. 이 캠페인에는 유언비어·스파이와 공작원 이용, 공공연한 파시스트 그룹과의 결탁, 비폭력 그룹을 의도적으로 노린 최루탄과 폭행, 이탈리아 특유의 경찰의 잔혹행위, 죄수의 고문, 주최자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반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방면의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의 정치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전게서, pp. 128-9]. 당연히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후의 시위행동에서도 언론은 더 많은 반 아나키스트 사기에 경도된 것을 볼 수 있다. 아나키스트는 집단폭력을 계획하고 있는, 증오에 찬 개개인이라는 기사를 날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2004년의 아일랜드Ireland에서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나키스트들이 더블린Dublin에서 열리는 EU 관련 식전에서 독가스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물론 그런 계획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런 행동도 없었다. 아나키스트가 조직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거짓 정보는 런던에서 행해진 반자본주의 메이데이 시위와 뉴욕에서 행해진 공화당 전국대회 반대시위 행동 때도 이어졌다. 이벤트가 끝나면 언제나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항상 아나키스트의 폭력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활자로 만든다(예를 들어 시애틀에서는, 기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건을 날조하고, 나아가 아나키즘을 악인으로 취급하기까지 했다). 즉 아나키즘이 폭력과 같다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아나키스트에 의한 (존재하지 않는) 폭력의 위협을 부추기고 있는 신문은 이들 이벤트에서 발생한 시위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실제로 행사한 폭력과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 그 (증거 없는) 파멸 기사가 그 후의 이벤트에서 난센스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사과문을 게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나키스트가 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한 적이 있다(다른 정치운동이나 종교운동의 멤버처럼). 테러와 아나키즘이 관련지어지는 주된 이유는,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행위에 의한 선전」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대체로 1880년부터 1900년까지), 소수였던 아나키스트들이 빈번하게 지배계급 멤버(왕족이나 정치가 등)를 암살했다. 더 나쁜 것은 이 시기에 표적이 된 것은 부르주아 계급이 자주 가는 극장이나 소상점이었다. 이런 행위가 「행동에 의한 선전」이라고 이름 붙었다. 아나키스트는 러시아의 민중주의자Populists(나로드니키Narodniki)가 1881년에 알랙산더 2세를 암살한 것에 자극받아 이 전술을 지지하게 되었다.(압제자의 암살과 대역을 칭찬한 요한 모스트Johann Most의 유명한 논설 「드디어! At Last」는 이 사건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전술을 아나키스트가 지지했던 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노동자계급 인민에게 향해진 탄압행위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압제자를 쓰러뜨릴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민중의 반란을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를 살펴볼 때 행동에 의한 선전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코뮌을 잔혹하게 탄압해 2만 명 이상의 민중을 죽였고 많은 아나키스트도 살해당했다. 흥미롭게도 파리 코뮌의 복수로 아나키스트가 행한 폭력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코뮌 지지자를 국가가 대량으로 살육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아나키스트 가에타노 브레시Gaetano Bresci가 이탈리아의 국왕 움베르토Umberto를 암살했던 것이나 1892년에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이 카네기 철강 회사의 경영자인 헨리 클레이 프릭Henry Clay Frick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도 알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움베르토의 군대가 시위행동을 하던 농민을 발포해서 살해했던 것이나, 프릭이 소유하고 있던 핑거톤Pinkertons이 홈스테드Homestead공장에서 갖혀있는 노동자들을 살해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주의자statist와 자본가들의 폭력이 이처럼 축소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막스 스티르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행동은 폭력이며 그 폭력을 국가는 『법률』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인의 폭력은 『범죄』라고 하는 것이다」[The ego and Its Own, p. 197]. 아나키스트의 폭력은 비난받고, 그것을 촉발시킨 탄압(많은 경우 더 가혹한 폭력)은 무시되고 잊힌다. 아나키스트는 자신들을 「폭력적」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사기꾼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주장은 정부 지지자나 현실의 정부 그 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폭력을 통해 태어났다. 폭력을 통해 권좌에 계속 있으며, 반역을 억압하거나 타국을 위협하기 위해 일관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Howard Zinn, The Zinn Reader, p. 652].
국가폭력에 대한 비아나키스트의 반응을 보면 비아나키스트들에 의한 아나키스트의 폭력 규탄에 빠져있는 위선을 느낄 수 있다. 예컨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수많은 자본주의 신문과 자본가는 무솔리니와 히틀러만 아니라 파시즘을 칭찬했다. 이와는 반대로 아나키스트들은 죽는 순간까지 싸우며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 분명히 살인적 독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것이 「폭력」과 「테러」라고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아나키스트는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인 국가·전쟁·파업과 소란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들을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나키스트들은 「폭력적」이고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 가운데는 탄압과 국가폭력과 자본가의 폭력이라는 행동에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론 국가규칙을 강요할 때 실제로 이뤄지는 경찰의 폭력을 지지하거나 더 심하게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한편, 예를 들어 시애틀에서 유리창을 몇 개 깨뜨렸다고 해서 아나키스트의 「폭력」을 비난하는 것 등은 사기의 극치이다. 누군가를 폭력적이라고 봐야 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명백한 이치를 모르고, 「국가가 비난하는 종류의 폭력을 비난하고, 국가가 실천하고 있는 폭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Christie and Meltzer, The Floodgates of Anarchy, p. 132].
당시에도 대다수의 아나키스트들은 이러한 전략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위에 의한 선전」을 실천했던 사람들(이들은 「attentats(테러행위)」라고 불리기도 했다) 중에 머레이 북친의 지적에 의하면 「아나키스트 그룹의 멤버는 극소수였다. 대다수는 단독 행동주의자였다」[The Spanish Anarchists, p. 102]. 다시 말할 것 없이 국가와 언론은 모든 아나키스트를 싸잡아 비난했다. 지금도 그것은 여전하며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이 전술이 아나키스트 주변에서 논해지기 수년 전에 바쿠닌은 죽었는데도, 이러한 행동의 책임이 있다고 바쿠닌을 비난한 것처럼!).
결국, 「행위에 의한 선전」시대의 아나키즘은 실패였다. 대다수의 아나키스트는 곧바로 그것을 이해했다. 크로포트킨이 그 전형적인 예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행위에 의한 선전에 단 한 번도 호감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혁명적 행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이 슬로건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879년 그는 여전히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attentats(테러행위)에 커다란 동정과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이런 「집단적 행동」은 「노동조합과 코뮌의 차원에서」행해진 것이라 여겨졌다). 1880년 그는 1880년에 그는 「집단적 행동에 그다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고, 개인이나 소집단에 의한 반역 행위에 대한 열정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으며, 크로포트킨은 곧바로 「고립된 반역행위의 중요성을 점차 절감하게」되었다. 그는 특히 「새로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집단행동이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보았던」때는 그랬었다[Caroline Cahm, Kropotkin and the Rese of Revolutionary Anarchism, p. 92, p. 115, p. 129, pp. 129-30, p. 205].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 초기까지 크로포트킨은 이런 폭력행위에 동참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유의 일부는 그 행위에 혐오감(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1892년 헤레즈Jerez 봉기에 가담했던 아나키스트들을 정부가 살해한 것에 대한 복수로써 행해졌던 바로셀로나 극장 폭파나 국가탄압에 대해 에밀 헨리Emile Henry의 카페 폭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일부는 이런 행위가 아나키즘의 대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크로포트킨은 인식하고 있었다. 1880년대에 「폭주하는 테러리즘 행위」는 「운동에 대한 탄압을 당국이 자행」하도록 했고, 「크로포트킨의 관점에서는 아나키즘 이념과는 일치하지 않아, 민중반란을 촉진하기 위해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더욱이 그는 「대중으로부터의 운동의 고립을 불안하게 여기고」있었다. 이것은, 행동에 의한 선전「에 몰두한 결과, 경감하지 않고 증대했다」. 그는 「노동운동에 새로운 전투성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혁명의 최고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이후 그의 주목의 초점은 점차 반역의 혼을 발달시키기 위해 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소수파의 중요성에 맞춰졌던 것이다」. 다만, 개인의 반역행위(행동에 의한 선전이 아니라 하더라도)를 지지하던 1880년대 초반까지도 그는 집단적 계급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크로포트킨은 항상 혁명을 이끄는 투쟁에서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전게서, pp. 205-6, p. 208 and p. 280].
이것은 크로포트킨 뿐만이 아니었다. 점차 아나키스트들은 「행동에 의한 선전」 은 아나키즘 운동과 노동운동 양쪽 모두를 탄압하는 이유를 국가에 주는 것으로 간주하게 됐다. 그 이상으로, 아나키즘을 비정한 폭력과 관련짓는 기회를 언론(과 아나키즘의 적대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운동으로부터 소외시켜 버렸다. 이 잘못된 연관성이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사건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행동에 의한 선전」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했지만, 이들도 언론에 의해 「폭력적」이고 「테러리스트」로 중상을 당하고 있었다).
덧붙여, 크로포트킨도 지적했지만, 행동에 의한 선전의 배후에 있는 전제, 즉, 누구나가 반란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는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민중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시스템의 산물이다. 따라서 민중은 그 시스템을 존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신화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행동으로 인한 선전의 실패와 함께 아나키스트는 그 운동의 대부분 그와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행했던 것으로 되돌아갔다. 계급투쟁과 자기해방 프로세스의 장려로 되돌아간 것이다. 아나키즘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1890년 이후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발흥에서 볼 수 있다(섹션 A.5.3 참조).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이 행동에 의한 선전에는 전술상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테러로 생각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암살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쟁 중에 거기에 적이 한 명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온 마을을 폭격하는 것이야말로 테러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독재자나 억압국가의 수장을 암살하는 것은 기껏해야 「방어」이며 아무리 못해도 「복수」인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이 예전부터 지적해 왔듯이 테러가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상 최대의 테러리스트는 국가인 것이다.(이 행성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최대의 폭탄 등 대량파괴 병기를 갖고 있는 것도 국가이다). 만약 공포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 아나키스트라면 그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부대적인 손해」는 유감이지만 피할 수 없다는 국가주의자의 상투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행동에 의한 선전」행위의 대부분은 대통령이나 왕족 등 지배계층의 개개인에게로 향했고, 그 이전에 국가와 자본가들이 저지른 폭력의 결과였던 것인데 그 이유가 이것이다.
아나키스트는 테러리즘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정치이론으로서의 아나키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 그 자체가 아니라 11명의 철강 노동자의 잔혹한 살해가 알렉산더 버크만의 행동을 촉발시킨 것이다」[전게서, p. 268].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그룹이나 종교그룹의 멤버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런던의 프리덤 그룹Freedom Group of Lond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거리의 평범한 시민 남녀들이 아나키스트들이나 혐오의 대상 된 특정 당파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 그 불법폭력 행위가 저질러지게 된 맥락으로서의 진실은 늘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살인적인 분노는 태고부터 궁지에 몰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계급과 개인들이 동료 인간들의 만행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공격적이건 억압적이건 간에, 폭력에 대한 폭력적인 특정한 반응이다. 이러한 행동의 동기는 특별한 신념이 아니라 인간 본성 그 자체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적으로도, 역사의 발자취 전체에 이런 증거가 널려있는 것이다.[Emma Goldman, 전게서, p. 259]
다른 많은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집단이나 당파들도 테러를 저질러 왔다. 예를 들어, 기독교도·마르크스주의자·힌두교도·민족주의자·공화주의자·이슬람교도·시크교도·파시스트·유태교도·애국주의자 모두 테러를 자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 이런 운동이나 생각이 「본질적으로 테러리즘」이라고 규정되거나 항상 폭력과 연관되는 일은 없었다. 이런 사실이 아나키즘은 현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사상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의적인 사람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그 사상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견해나 이상도 없이 단지 파괴로의 미친 본능만을 가진 「파괴범」이라고 묘사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테러리즘은 비도덕적이고 역효과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대다수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한해서 테러에 대한 반대 성명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테러리스트의 극히 소수가 아나키스트이며 아나키스트의 극히 일부가 테러리스트였다. 아나키즘 운동 전체로는 암살하거나 폭파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항상 인식하고 있다. 국가와 자본주의의 폭력에 비해, 아나키스트 폭력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보다 더 미미하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나키스트의 폭력을 불러일으킨 국가와 자본에 의한 폭력이나 탄압행위 보다도 소수의 아나키스트들의 행위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A.2-17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사회를 만드는데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
|
|
 |
A.2-17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사회를 만드는데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아나키즘 FAQ에 이 질문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많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민중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사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자본주의자의 정치의제 구석구석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레닌주의자든 페비언Fabians주의자든 객관주의자든 그 전제는 선택된 소수자만이 창조적이고 지적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타인을 통치해야 한다.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진부한 문구에 관한 유창하고 화려한 수사 뒤에 이 엘리트주의는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수사나 이데올로그들이 민중의 비판적 사고를 누그러뜨리려고 민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자연스런」 엘리트를 믿는 무리들은 항상 자신을 히에라르키의 정점에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객관주의자」 중에서, 자신을 많은 「중고 구매자」의 한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아인 랜드Ayn Rand의 사상을 원숭이 흉내내기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흉내 내기만 하는 녀석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은, 언제 봐도 재미있는 것이다!)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자본주의의 「이상 상태」에서 일개의 화장실 청소부가 되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 엘리트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선택받은 소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엘리트주의 사회에서 엘리트의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이 그 잠재적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역사를 검증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청동기 시대에 국가와 계급이 생겨난 이래 하나의 기본적인 엘리트주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했고 이것이 국가와 지배계급 모두를 본질적으로 정당화해 왔다. 이 이데올로기는 현대에도 그 의상만 바꿔 입었을 뿐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중세 암흑시대에서 이 이데올로기는 기독교 원리주의에 물들어있어 교회 히에라르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엘리트 성직자에게 있어 가장 유용한 「성스러운 것이 밝힌」교리란 「원죄」였다. 이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타락한 불완전한 생물로, 보통의 인간과 「신」과의 사이에 필요한 편리한 중개자로서의 성직자가 있다고 한다. 평균적인 민중은 기본적으로 무능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암흑시대의 유물인 이 교리를 이어받은 것이다.
대다수는 「중고 구매」이던가 「노동조합의 양심」정도 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역사를 특히 노동운동을 표면적으로 보기만 해도 이 주장들은 참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를 추구해 투쟁했던 사람들의 창의력은 많은 경우, 정말로 놀랄 만한 것이었다. 이 지적능력intellectual power과 영감inspiration이 「보통」사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히에라르키에 의한 무기력화 효과와 권력에 의해 만들어 내는 복종정신을 가장 명백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히에라르키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섹션 B.1을 참조). 밥 블랙Bob Black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지루하고 멍청하고 단조로운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 자신이 지루하고 멍청하고 단조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은 왜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이 끔찍한 백치가 되어버리는 가를 텔레비전이나 학교교육과 같이 중대한 우둔화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자신의 인생 모두가 조직화되어, 학교 교육에서 시작해 직장으로 넘겨지고, 처음에는 가족에서 시작되어 끝내는 양로원에 묶이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히에라르키에 익숙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노예가 되어버린다. 본래 갖고 있던 자유에의 경향이 위축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자유의 공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 받는 복종훈련은 자신이 이룬 가족으로 옮겨져, 여러가지 방면에서 그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내고 그것이 정치·문화· 그 외 모든 것에 미친다. 일단 직장에서 사람들의 활력을 고갈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히에라르키와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길들어져 버리는 것이다.[The Abolition of Work and other essays, pp. 21?2]
엘리트주의자들이 민중의 해방에 이해를 나타내는 경우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해방은 친절한 엘리트(레닌주의자의 경우)나 멍청한 엘리트(객관주의자의 경우)에 의해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해방 뿐이다. 권위가 갖는 파괴적이고 왜곡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활동 뿐이다. 이런 자기해방의 실례는 적지만 그 이전에는 자유 따위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대다수의 민중이 그 과제를 향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무리는 공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가 약체화되고 민중이 그 권위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면서 「위대한 인간은 우리의 무릎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막스 스티르너의 말을 실감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권위와 권력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엠마 골드만은 여성의 평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의 모든 단계 속에서 여성이 행한 남다른 위업은 여성이 열등하다는 근거 없는 언설 때문에 영원히 묵살되고 말았다. 아직도 이런 미신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조차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권위의 특징이다. 주인이 자신의 경제적 노예에게 대하는 경우든,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경우든 그렇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여성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고, 모든 곳의 여성은 자유를 향해 큰 걸음으로 전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Vision on Fire, p. 256].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스페인 혁명 중에 행해진 노동자들의 자기관리 실험의 성공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민중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아나키즘은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즉시 보복을 당할 뿐이다. 예를 들어 아나키보다도 민주주의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이 주장을 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루이지 갈레아니Luigi Galleani가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민중이 자신의 지배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지배자를 선택할 정치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지배자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경제적 증오가 근절될 경우에는 그렇다」[The End of Anarchism?, p. 37]. 즉, 아나키즘에 반대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훌륭한 유권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도할 양치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수많은 바보의 투표로 한 사람의 천재가 선택된다는 사회적 연금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Malatesta, Anarchy, pp. 53-4]
독재체제를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왜, 이러한 독재자는 이 분명히 보편적인 인간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일까.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말하고 있다. 「누가 베스트일까? 누가 사람 안에 있는 성질을 인식할 수 있을까?」[전게서, p. 53]. 독재자는 「어리석은」대중을 들먹이며 왜 독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착취하고 학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점에 대해 말하자면 독재자는 대중보다도 지력이 뛰어나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독재정부와 군주정부의 역사가 이런 의문에 분명히 답하고 있지 않은가. 같은 논법이, 한정된 선거권에 기초한 체제와 같은 다른 비민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가에 의한 지배에 기초한 국가라는 존 로크John Locke 철학(즉, 고전적 자유주의, 우익 리버타리안)의 이념은 유복한 소수자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다수를 억압하는 체제에 지나지 않게 될 운명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가 엘리트 집단 이외는 거의 보편적으로 어리석다는 생각(「객관주의」의 비전)은 아인 랜드Ayn Rand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완벽한 시스템만큼 이상적이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자신들을 다루는 억압적인 보스를 참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엘리트는 민중을 근본적으로 「야만스러운 대군」으로 여기고 있느데 어떻게 민중 자신의 자기이익을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견해를 양립시킬 수 없으며 순수한 자본주의라는 「미지의 이상」 등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만큼이나 야비하고 억압적으로 소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아나키스트는 인민대중의 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한 아나키 반대론은, 본질적으로 자기모순이다(명백한 독선은 아니라고 해도), 라고 단호하게 확신하고 있다. 민중이 아나키즘에 대해 너무 어리석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언급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들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 된다. 궁극적으로 아나키스트는, 이러한 관점은 생물종으로서의 인간성과 역사를 성실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히에라르키 사회가 만들어 낸 비열한 정신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루소를 인용하자.
벌거벗은 야만인 무리들이, 유럽을 휩쓰는 관능성을 경멸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기아·화재·무력·죽음을 견디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노예가 자유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Noam Chomsky, Marxism, Anarchism, and Alternative Futures, p. 780에서 인용]
|
|
|
|
|
|
|
|
 |
A.2-16 아나키즘에는 「완전한」인간이 필요한가 |
|
|
 |
A.2-16 아나키즘에는 「완전한」인간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아나키는 유토피아, 즉 「완전한」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 관련된 여러 문제·희망·공포 등 모두를 가진 인간의 사회가 될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아나키가 기능하기 위해 인간이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로워져야 한다. 스튜어트 크리스티Stuart Christie와 앨버트 멜쳐Albert Meltz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혁명적 사회주의revolutionary socialism(즉 아나키즘)는 노동자를 「이상화」하고 있으며, 혁명적 사회주의가 실패의 독주회가 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계급투쟁설을 논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오류가 있다. 도덕·윤리의 완성 없이도 자유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실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 그러나 (기존)사회 전복에 관한 한 민중이 갖고 있는 결점과 편견이라는 사실은, 그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인텔리」의 사회적 품위를 획득하거나, 가족의 규율에서 외국인 혐오까지 현대사회의 편견 모두를 버리게 되기 훨씬 전에,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직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런 걱정도 없이 생각할 수 있다. 노동자가 주인 없이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상, 무엇이 문제인가? 편견은 자유 속에서 위축한다. 편견이 만연하는 것은 사회의 풍조가 편견을 선호할 때뿐이다. 일단 위로부터의 권위의 강요 없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그때까지 강요당하던 권위가 노동자로 부터의 봉사가 없어져 소멸해 버리면 권위주의의 편견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교육 과정만이 그 치료법인 것이다.[The Floodgates of Anarchy, pp. 36-7]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개성과 욕구와 타인의 개성과 욕구를 조화시키는 사람들을 자유사회는 만들어내고, 그 결과 개개인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남게 되는 대인적 문제는 합리적 방법, 예를 들면 배심제도나 쌍방에 있어서의 제 3자, 커뮤니티나 직장에서의 집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다(반사회적 활동이나 쟁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섹션 I.5.8을 참조).
「아나키즘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고 있다」는 논법처럼(섹션 A.2.15를 참조), 아나키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인간 - 권위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권력에 탐닉하지 않는 인간, 히에라르키나 특권 등의 왜곡된 효과에 기묘하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 - 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는 인간의 완성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이나 엘리트의 손에 막대한 권력이 쥐어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록해 둬야 하지만 아나키즘은 「새로운」(완전한)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아나키즘의 적대자가 제기하고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나키즘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그리고 통상 히에라르키형 권위의, 특히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에 있는 히에라르키형 권위의 유지를 정당화하고 있다)것이다. 결국 민중은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될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이런 적대자들은 아나키즘을 비현실적이라며 무시하기 위해, 정부가 붕괴된 모든 실례에 덤벼들어 결국은 혼란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난한다. 「법과 질서」가 붕괴하고 약탈이 자행되고 있을 때 언론은 그 나라가 「아나키」상태에 빠졌다고 크게 기뻐하며 선언하는 것이 상례다.
아나키스트는 이런 주장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잠깐 생각하면 알겠지만 이런 비방 중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나키스트가 없는 아나키즘 사회를 상정한다는 기본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익 「아나르코」캐피탈리스트도 진짜 아나키즘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론異論」은 아나키스트가 없는 아나키즘 사회를 어둠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주장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아직도 권위·재산·국가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아나키」따위는, 곧바로 권위주의(즉, 비아나키즘) 사회로 회귀해 버릴 것이다. 정부가 내일 전복돼도 똑같은 시스템이 금방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점은 정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 있다. 대폭군은 바보일 수는 있지만 초인은 아니다. 그 사람의 강함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민중의 미신에 있다. 그런 미신이 존재하는 한 해방자가 폭정의 목을 베어내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중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 민중은 자신들 밖에 있는 무언가에 의존하는데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George Barrett, Objections to Anarchism, p. 355].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제도는 특정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사상이 믿어지고 있는 한, 그 위에 구축되어 있는 제도는 안전하다. 정부가 강력한 것은, 민중이 정치적 권위와 법적 강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런 경제시스템이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악하고 억압적인 여러 조건을 양성하는 사상이 약해진다는 것이, 정부와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What is Anarchism? p.xii]
바꿔 말하면 아나키를 만들어내고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아나키스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나키스트가 완전할 필요는 없다. 명령-복종관계와 자본주의적 소유권이 필요하다는 미신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해방을 한 사람이라면 좋은 것이다. 아나키에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의 이면에는,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을 필요로 하는 아나키는 실패한다고 하는 자명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유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자주적 활동과 자기해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역사는 지배하는 쪽과 당하는 쪽과의 투쟁이다」[Peter Kropotkin, Act for Yourselves, p. 85]. 사상은 투쟁을 통해서 변화한다. 그 결과 억압과 착취에 대한 투쟁에서 우리는 세계를 바꿀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활과 지역사회에, 이 행성에 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자유를 요구한 투쟁이다.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이 자유사회에서 평등자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아나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멸했을 때 가끔 생기는 혼란은 아나키anarchy도 아니며 실제로 아나키즘에 불리한 사건조차도 아니다. 단지 아나키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뿐이다. 아나키는 사회의 중핵에서의 집단투쟁의 산물이지 외적 쇼크의 산물이 아니다. 나아가 강조해 두겠지만 아나키스트는 그런 사회가 「하룻밤에」출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나키즘의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인 것이다. 어떻게 아나키즘 사회가 기능하는가에 관한 자세한 것은 즉석에서 완전한 형태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시간과 함께 진화해 가는 것이다(마르크스주의자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섹션 H.2-5를 참조).
아나키스트는 아나키즘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완전한」인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가진 해방자가 아니라 자유의 획득을 요구해 투쟁하고 있는 인간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서 만약 어떠한 외적 수단에 의해서 아나키즘 혁명이, 말하자면 지급된 기성제품이 되어, 민중에 강요당하는 일이 있으면 민중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전의 사회를 재구축 할 것이다. 반대로 민중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스스로 발달시켜 민중 자신의 손으로 폭군의 마지막 보루 - 정부 -를 없앤다면 반드시 그 혁명은 영구히 계속 달성 될 것이다」[George Barrettt, 전게서, p. 3. 3].
그렇다고 아나키즘 사회는 만인이 아나키스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권력자가 갑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그 특권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대규모로 계속 성장하는 아나키즘 운동에 직면하게 되면 지배 엘리트는 항상 사회에서의 그 입장을 방위하기 위해 탄압을 행사해 왔다. 스페인(섹션 A.5-6)과 이탈리아(섹션 A.5-5)에서의 파시즘의 이용은 자본가 계급이 어디까지 깊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나키즘은 소수 지배자에 의한 억압에 직면해 창조되었으며, 그 결과 권위를 재창조하려는 시도에 대해 방어되는 것이다.(아나키스트는 반혁명에 대해 아나키즘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을 거절하고 있다고 마르크스주의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한 논박은 섹션 H.2-1을 참조)
반대로 아나키스트는 자신들의 활동의 초점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런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원인인 사회제도를 파괴함으로써 억압과 착취를 끝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중의 직접행동에 의해 사회적 유기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겠다는 우리들의 분명한 과제를 달성할 만큼의 넉넉한 힘을 가진 세력을 구축하도록 대중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대중에게 다가가 있는 그대로의 대중을 받아들이고 그 계층 내부로부터 가능한 한 대중을 「뒷받침」해야 한다」[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 pp. 155-6].
이것은 아나키즘으로 향하는 급속한 진화를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겠지만 「하지만 점차로 대중을 향한 표현 방법을 찾아 감에 따라 인민대중 속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파가 인민들에게, 대다수가 되어, 빈곤과 국가에 반대해 일어선 대중이 무정부 공산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Kropotkin, Words of a Rebel, p. 75]. 아나키스트가 그 사상을 넓혀 아나키즘을 옹호하는 주장을 논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와 국가와의 불공정을 의문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의식적 아나키스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히에라르키형 사회의 성질,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발달시키는 히에라르키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이 프로세스를 도울 것이다. 아나키즘 사상은 투쟁을 통해 자발적으로 발달한다. 섹션I..2-3에서 논하듯이 아나키즘 조직은 모든 히에라르키 시스템을 특징짓는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의 일부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잠재적으로 신사회의 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버타리안 제도의 창조는 항상 어떠한 정황에서도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민중의 경험이 아나키즘의 결론, 즉 국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자를 보호하고 다수자로부터 힘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민중을 밀어줄지도 모른다. 국가는 계급과 히에라르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사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할 수도 없다. 국가 없이도 조직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의식적인 아나키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리버타리안 경향도, 대중에게 미치는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이나 종교 그룹에 의해서 이용되고 악용되어 최종적으로는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러시아 혁명은 이런 프로세스의 가장 유명한 실례이다). 이런 이유에서, 아나키스트는 투쟁에 영향을 주어 자신들의 사상을 넓히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섹션 J.3을 참조). 아나키즘 사상이 「우세한 영향력을 획득」하고, 「충분히 많은 민중에게 받아들여」져 비로소 우리는 「아나키를 달성하거나, 아나키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왜냐하면, 아나키를 「민중의 희망에 반해서 강요할 수 없기」때문이다[Malatesta, 전게서, p. 159 and p. 163].
결론을 말하자. 아나키즘 사회의 구축은 사람들이 완전한지 어떤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나키스트가 되어 사회를 리버타리안의 방식으로 재조직 하고 싶은지 어떤지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형성된 아나키즘적 인간성이 출현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변혁의 투쟁이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한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온갖 편견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서서히 줄여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
|
|
|
|
|
|
|
 |
A.2-15「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어떤가 |
|
|
 |
A.2-15「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어떤가
아나키스트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 개념을 깊이 생각하고 반영시키기 위한 유일한 정치이론을 갖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아나키즘에 반대하는 주장을 변호할 때의 마지막 대사로 던져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나키스트에게는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은 복잡하다.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모순투성이다. 사랑과 증오·동정과 무정無情·평화와 폭력 등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모두 「인간본성」의 산물이다. 물론 「인간의 본성」은 사회상황과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수천 년 동안 노예제도는 「인간의 본성」의 일부였으며 「보통」의 일로 여겨졌다. 동성애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완전히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기독교 교회가 비난한 이래 수천 년 동안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국가가 발전해서 비로소 전쟁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가 되었다.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확실히 사람은 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를 실현하는 수많은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많은 잠재적 능력과 선택지를 갖고 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는 대부분 제도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병적 살인자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살인자가 그 자리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의 이런 요소를 나타난 그대로 둬야 한다.
탐욕을 인간의 유일한 재산으로 삼고, 타인의 감정과 헌신을 희생해 순수한 탐욕을 촉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 계속될 모든 것을 포함해, 탐욕에 바탕을 둔 사회를 얻게 된다. 별종의 인간감정과 정서, 예를 들어 연대·원조·동정이 우세해지는 방식으로 조직되는 사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의 다른 측면이 나타나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인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Chronicles of Dissent, pp. 158]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 어떤 측면이 표현되는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아나키즘에 관한 최대의 신화 중 하나는 아나키스트의 생각에서 보면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 선이라는 것이다(오히려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우리들이 생활하고 만들어 내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달려 있다. 히에라르키 사회는 일종의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인간을 형성하고, 리버타리안 사회에서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본성」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아나키스트는 인간을 현실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만, 이런 난센스를 반복할 수 있는 등,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지성을 가지고 있을까하고 당황하게 된다. 사람을 탐욕스럽고 제멋대로 하지 않도록 하고, 권력욕을 줄이며 동시에 비굴하지도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중심주의와 탐욕의, 비굴함과 권력욕의 성장을 선호하고 있는 여러 조건을 줄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반복해서 말해 온 것이 아닐까?」[Peter Kropotkin, Act for Yourselves, p. 83].
이처럼 아나키즘에 대한 반대론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내세우는 것은 피상적일 뿐으로 결국은 트집에 불과하다. 사고정지의 변명을 하는 것이다.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바보가 왕으로부터 경찰, 지극히 평범한 목사로부터 과학적 비전이 없는 멍청이까지, 무섭게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 고압적으로 말하고 있다. 정신의 사기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약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영혼이 감옥에 갇히고, 모든 마음이 족쇄가 채워져 상처받고 불구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일까?」 사회를 변혁하고, 보다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어 내어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자신의 본성의 산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무엇이 권위주의 시스템의 산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나키즘은 「종교의 지배로부터 정신의 해방을, 재산의 지배로부터 육체의 석방을, 정부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확충·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와 안식은 그것만으로 인간의 본성과 그 멋진 가능성 모두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Red Ema Speaks, p. 73].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처음부터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개개인은 「사회」(실제로 이것은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것이다)가 만들어주기를 그저 기다릴 뿐인 타불라라사(tabula rasa: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석판)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엄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나는, (인간의 본성은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근본적 성질의 일부인 기본적 욕구 몇 가지에 더 잘 적합하도록 사회구조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사회변혁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와 같은 것을 형성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Language and Politics, p. 215]. 인간의 특징 중 어떤 것이 (타고난 천성)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논의를 여기서 할 생각은 없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사고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 이것은 충분히 명백한 것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다 - 것이며,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끼고 성공하기 위해 타자와의 교제를 필요로 하는 사교적인 생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불공정과 억압을 인식하고 그에 반항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바쿠닌은 올바르게도 「사고하는 힘과 반역의 욕구」를 「존귀한 능력」으로 보았다[God and the State, p 9]).
우리는 이들 세 가지 특징에서 아나키즘 사회의 실행 가능성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선천적 능력은 자동적으로 히에라르키의 모든 형태를 부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사회관계에 대한 욕구는 우리들이 국가 없이도 조직을 만들 수 있음을 나타낸다. 현대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불행과 소외는 자본주의와 국가의 중앙집권주의와 권위주의가 우리들 안에 있는 선천적 욕구의 일부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미 말한 것처럼 인류는 이 세상에 나타난 이래 대부분의 시대를 히에라르키가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아나키한 커뮤니티에서 생활해 왔다. 현대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든가 「원시인」이라든가 하고 부르지만 참으로 오만하다. 누가 아나키즘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나키스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스트가 너무나도 많은 「인간의 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말하자면 그 주장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나키스트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우리들의 적대자들은 어떤 종류의 이 땅의 소금 - 통치자·고용주·지도자 - 이 존재해 충분히 다행스럽게도 악인 - 지배받는 쪽·착취당하는 쪽·지도받는 쪽 - 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 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아나키스트는 「주장한다. 지배하는 쪽도, 받는 쪽도 양쪽이 권위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착취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양쪽이 착취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차이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지배자가 그 예외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적대자는 때때로 무의식적으로나마 예외를 인정했으며, 우리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몽상가라고 부르는 것이다」[Peter Kropotkin, Act for Yourselves, p. 83].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타자를 지배할 권리를 주고, 정의와 자유가 인도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야말로 절망적인 공상인 것이다.
나아가 이미 말한 것처럼 아나키스트의 주장에서는 히에라르키형 조직은 인간의 본성이 갖는 한층 더 나쁜 것을 끌어내고 있다. 억압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권위주의적 관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죽이는, 이것이 특권의 특징이며, 모든 특권이 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법칙이다. 평등과 인간성의 법칙이다」[God and the State, p. 31]. 그리고 특권자가 권력에 의해 타락하면,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는 (개략적으로) 마음 속에서나 정신 속에서도 비굴해진다(다행스럽게도 인간의 영혼은 어떠한 억압이든 억압이 있는 곳에는 반역자가 항상 있고, 저항이 있으며 그 결과로서 희망이 있다고 하는 식이다). 이처럼 (뒤틀린) 「인간의 본성」을 히에라르키가 만들어 내고 있는데도 아나키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그 히에라르키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은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는 기묘한 것이다.
슬프구나! 바로 이 일이 몇 번씩이나 계속해 행해져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사회생물학」의 발흥과 함께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의 산물이며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실제의 증거따위 거의 없지만) 패거리가 있다. 이런 주장은 단지 「인간의 본성」논란의 새로운 변형에 지나지 않으며, 권력자가 달려드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증거 부족을 따져 보면, 이 「새로운」 학설을 권력자가 지지하는 것은 권력자에게 있어서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 즉,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유효하다는 사실 -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 프로세스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스티븐 로즈Steven Rose, 리처드 찰스 르윈틴R. C. Lewontin, 레온 J. 카민Leon J. Kamin) 저, 『유전자에는 없었다: 생물학·이념·인간의 본성 Not in Our Genes: Biology, Ideology and Human Nature』을 참조).
다시 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단 한 조각의 진실도 없다. 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는 「우리의 잠재적인 행동범위는 우리의 생물학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생물학이 「유전자 제어라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론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생물학이 찬동하는 것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한 형태다. 특정의 인간특성에 대해 특정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폭력·성차별·전반적인 심술은 가능한 행동범위의 한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이상 생물학적인 것이다」. 그리고 「평화· 평등·친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것들이 널리 행해지는 사회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이 증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문화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생물학자 자신의 저작으로 부터도 알 수 있다. 단지 한편에서 이러한 학자는 「형편이 나쁜 『예외』를 일시적으로 취하기에 부족한 일탈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사람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고 대개는 대량학살을 동반하는 전쟁이 우리의 유전자적 운명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존재에는 당혹스럽게 되어」버린다[Ever Since Darwin, p. 252, p. 257 and p. 254].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회적 다윈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생물학은 우선 처음으로 현재 사회에서 지배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투영해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생각을 「보통」이며「자연」스럽다고 착각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자연에 관한 이론은 인간사회와 역사로 되돌려져 자본주의의 원리(히에라르키·권위·경쟁 등)가 영원한 법칙이라고 「증명하기」위해 사용되고, 그리고 현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놀랍게도, 총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하찮은 수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의 「히에라르키」가 인간사회의 히에라르키를 설명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유analogy는 인간 생활의 제도적 본질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머레이 북친은 사회생물학을 비판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힘없이 쇠약하고 신경이 곤두선 병든 원숭이가 『무리를 지배할』수컷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물며 이 상당히 헛된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인간의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매우 병적인 지배자는 역사 속에서 파멸적인 영향을 가지면서 권위를 행사해 왔다」. 이것은 「개인에게 미치는 히에라르키형의 모든 제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동물의 히에라르키』에서 이것은 완전히 무효다. 제도의 부재야말로 정말로 『무리를 지배하는 수컷alpha males』이라든가 『여왕벌queen bees』을 말할 때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인 것이다」[“Sociobiology or Social Ecology”, Which way for the Ecology Movement?, p. 58]. 결국 인간사회를 독특하게 하는 것은 기분 좋게 무시되고, 사회에서의 권력의 실제 원천은 유전자 화면 밑으로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더욱 나쁜 경우에는 사회생물학)에 대한 호소와 관련된 일종의 변증론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지배계급은 자신이 지배할 권리를 정당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 권력을 정당화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인간의 본성을 정의한 학설 ?사회생물학, 왕권신수설, 원죄 등 ?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학설이 언제나 틀렸던 것은 명백하다. 물론 그것도 오늘까지다. 현재의 사회가 정말로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과학의 법복을 입은 성직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주장의 뻔뻔함이라면 정말 놀라운 것이다. 역사조차도 이를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천 년만 지나면 사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상상해 보면 그것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기구도 없을 것이고, 현재의 경제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회는 「유일한 진짜 시스템」으로, 과거의 시스템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는 완전히 인간의 본성을 따른 것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같은 사실에서 다른 결론을 끌어낼지도 모른다 - 그것은 더 타당한 결론일지도 모른다. - 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스치는 일 따위는 물론 없다. 자본주의 지지자들에게는 「객관적」과학자가 세운 이론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지배적 생각의 문맥 속에서 규정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에 있어서 그런 일은 놀랄만하지 않다. 황제에 의한 전제정치 하의 러시아에서 연구하던 과학자는 진화론을 종간種間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켰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의 영국에 있던 연구자와 전혀 달랐다. 영국의 연구자는 종간·종내種內의 경쟁적인 투쟁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후자의 이론이 영국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정치경제의 여러 이론(특히 경쟁적 개인주의)을 반영했다는 것은 물론 우연의 일치다.
예를 들면 크로포트킨의 고전 『상호부조론Mutual Aid』은 영국의 다윈주의Darwinism의 대표자가 자연과 인간생활에 투영하던 분명한 잘못에 대해 쓰여 있었다. 당시의 영국 다윈주의에 대한 러시아 주류파의 비판을 토대로 하면서, 크로포트킨은 집단이나 종내種內에서의 「상호부조」는 그 집단이나 종내에서의 개체 사이의 「상호투쟁」과 같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상당한 양의 실증적 증거와 함께) 제시했던 것이다(상세한 내용과 그 평가에 대해서는, 스테판-제이-굴두Stephan Jay Gould의 「Bully for Brontosaurus」에 수록되어있는 에세이「크로포트킨은 미치광이가 아니다Kropotkin was no Crackpot」를 참조).
크로포트킨은 강조했다. 상호부조는 경쟁과 함께 진화에 있어서의 한 요소였다. 대부분의 환경 속에서 생존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즉, 협력은 경쟁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것이며 종의 멤버 사이에서 협력이 개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는 이상, 「인간의 본성」은 아나키즘의 장애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 아나키스트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아나키가 「인간의 본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즉, 히에라르키 사회는 어떤 종류의 인격특성이 우세하도록 촉진하고 있으며 반대로 아나키스트는 별종의 인격특성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아나키스트는 「인간의 본성이 변화한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본성 속에는 서로 다른 환경 하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이론을 신뢰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화는 「근본적인 생존법칙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George Barrettt, Objections to Anarchism, pp. 360-1 and p. 360].
인간의 본성에 관한 아나키즘의 생각에 대해서는 피터 마셜Peter Marshall의 「인간의 본성과 아나키즘Human nature and anarchism」[David Goodway(ed.), For Anarchism History, Theory and Practice, pp. 127-149]와 데이비드 하틀리David Hartley의 「Communitarian Anarchism and Human Nature」[Anarchist Studies, vol. 3, no. 2, Autumn 1995, pp. 145-164]에서 유용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것이나 아나키스트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이라고 본다는 생각을 반박하고 있다.
|
|
|
|
|
|
|
|
 |
A.2-14 왜 임의주의는 불충분한가 |
|
|
 |
A.2-14 왜 임의주의는 불충분한가
임의주의voluntarism란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협동조직은 임의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나키스트가 임의주의자라는 것은 분명하며, 자유합의로 만들어진 자유로운 협동조직에서만 개인은 발달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서는 분명히 임의주의만으로는 자유를 최대 존중하기에 불충분한 것이다.
임의주의란 약속(즉 계약하는 자유)을 의미한다. 약속이란 개개인이 자립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사리에 맞는 토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개개인이 자신의 행위와 타인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계약은 이런 임의주의가 보여주는 것과 반한다. 엄밀한 법률 해석상 「임의」라는 것에서(섹션 B.4에서 나타내듯이 그런 것들은 정말로 드문 것이지만) 자본주의 계약은 자유의 부정을 낳는다. 그것은 급여 - 노동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호관계가, 급여지급을 담보로 복종을 약속하게 하기 때문이다. 캐럴 페이트먼Carole Pateman은 이렇게 지적했다.
「복종을 약속한다는 것은 많든 적든 개인의 자유?평등?(자립판단과 이성적 토의의) 가능성을 행사할 능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한정하는 것이다. 복종을 약속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은 어떤 특정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자유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자유조차 갖지 못하고 평등하지도 않으며 오직 종속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p. 19].
그 결과 복종하는 사람들은 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된다. 임의주의의 이론적 근거(즉,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인정되어,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인정돼있는 것)가, 소수가 관리하고 다수가 복종한다는 히에라르키 관계 속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섹션 A.2.8 참조). 예속관계를 만들어내는 임의주의는, 그 정당한 성질로 인해 불완전하고 그 자체의 정당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는 살기 위해서 보스에게 자신의 자유를 팔아넘기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자유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일 뿐이다.! 그러나 자유란 주인을 바꿀 권리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예속은 임의라 해도 예속일 뿐이다. 루소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권이 「그것을 불가분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대표될 수 없다」고 한다면, 주권은 매도되거나 고용계약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무효가 될 수도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루소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영국의 민중은 자신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다. 민중은 의원을 선거할 때만 자유로운 것이다. 의원이 뽑히면 곧바로 노예상태가 되어 무가치해 지는 것이다」[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p. 266]. 아나키스트는 이 분석을 확대한다. 루소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바꿔 말해 보자.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다. 노동자는 보스와의 고용계약에 사인할 때만 자유로운 것이다. 일단 사인하면 곧바로 노예상태가 되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그 불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소를 인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부자이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곳에 정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권위를 받아들여 자신의 바라는 모든 것에 복종하겠다는 조건에 의해서만 정주를 허가할 것이다. 나아가 많은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폭군적 행위는 이중의 강탈을, 토지의 소유와 주민자유의 강탈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전게서, p. 316]
그러므로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람은 재산에 따라 노예로도, 그리고 다음에는 폭군으로도 될 수 있다」[What is Property?, p. 371]. 바쿠닌이 「최대한 평등으로 상호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닌 한 어떤 신분의 사람과의 계약도」 거절했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를 소외」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타자와의 임의의 노예관계」인 것이다. 자유사회(즉 아나키즘 사회)에서 이러한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도 개인존엄의 감각을 결여하게 될 것이다」[Michael Bakunin: Selected Writings, pp. 68-9].
그렇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는 임의의 협동조직에서는 직접민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라는 개념은 엉터리도 아니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자율관리형 협동조직만이 멤버 사이의 예속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아나키스트는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노동자에게 봉건주로의 퇴보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하는 조건으로, 모든 멤버에게 평등한 조건을 가진 민주적 사회를 향해 스스로를 조직하」도록 요청해 왔다[Proudhon, The 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 p. 277]. 같은 이유로 아나키스트는(프루동은 확실히 예외였지만)결혼에 반대해 왔다. 그 이유를 볼테린 드 클라이어Voltairine de Cleyr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성을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고, 남편의 빵을 먹고, 남편의 명령을 들으며, 남편의 정념을 섬기고, 남편의 동의 없이는 어떤 재산도 관리하지 못하며, 자신의 육체조차 관리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노예」로 되었기 때문이다[Paul Avrich, An American Anarchist: The Life of Voltairine de Cleyre, p. 160에서 인용]. 페미니스트의 선동에 의해 결혼은 평등자의 자유결합이라는 아나키즘의 이상을 향해 개선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골드만과 드 클리어와 같은 아나키스트가 특정해서 비난한 가부장제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페미니즘과 아나키즘에 관해서는 섹션A.3-5를 참조].
확실히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임의적 참여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동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혹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 있고, 또한 이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모든 관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자신의 노동력을 팔아넘겨야 하는 노동자가, 계속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Kropotkin, Selected Writings on Anarchism and Revolution, p. 305]). 추상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관계는 어떤 것이든 자유롭지 않고 무력과 권력·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되기 쉽다. 물론 이것이 상정하고 있는 자유의 정의는,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의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아나키스트가 임의의 협동조직은 협동조직 내부의 자주관리(직접민주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임의주의의 전제는 자주관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프루동의 말을 빌리면, 「개인주의는 인간의 원시적 사실이기 때문에, 협동조직은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말인 것이다」[System of Economical Contradictions, p. 430].
물론, 「아나키스트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다른 관계보다 중요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타인이 자기 나름의 사회적 관계를 선택하는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반론부터 우선 대답하기로 하자. 사유재산(국가주의도 그렇다)에 기초한 사회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권력을 쥐고 그것을 사용해 자신의 권위를 영속시킬 수 있게 된다. 엘버트 파슨즈Albert Parsons는 「부는 권력이며 빈곤은 약함이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아래서는 매우 칭찬받아야 할 「선택의 자유」등도 극도에 한정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파슨즈는 비꼬면서 말하고 있지만, 노예제 하에서 그 주인은 「자신의 노예를 고르고 있었다. 임금 노예제 하에서는 임금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고른다」). 파슨즈는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신의 자연권을 상속받지 못하는 무산자는 억압하는 계급에 고용돼, 섬기거나 복종하거나 아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선택지 따위는 없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고, 그 최고의 것이 생명과 자유다. 자유인은 팔리거나 고용되지 않는 것이다」[Anarchism, p. 99 and p.98].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속상태를 허용하고,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용인해야 하는 것일까? 명령할 「자유」는 노예가 되는 자유다. 따라서 실제로는 자유의 부정인 것이다.
첫 번째 반론에 관해 아나키스트는 그 죄를 인정한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편견을 갖고 인간이 로봇 상태로 타락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인간성과 개성을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섹션 A.2.11에서는 왜 직접민주주의가 임의주의(즉, 자유합의)와 함께 사회에 필요한가를 논하고 있다. B.4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재산 소유자와 무산자 사이의 평등한 협상력에 근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
|
|
|
|
|
|
|
 |
A.2-13 아나키스트는 개인주의인가, 아니면 집단주의 인가 |
|
|
 |
A.2-13 아나키스트는 개인주의인가, 아니면 집단주의 인가
간단히 말하면 어느 쪽도 아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바쿠닌과 같은 아나키스트를 「집단주의자」라고 비난하는 한편, 마르크스주의자가 바쿠닌과 아나키스트 전반을 「개인주의자」라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아나키스트는 어느 쪽 이데올로기라도 난센스라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나키스트가 아닌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는 같은 자본주의라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은 현대자본주의를 고찰하면 매우 잘 알 수 있다. 거기서는 「개인주의」 경향과 「집단주의」 경향은 끊임없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구조?경제구조는 이들 두 경향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자본주의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양쪽 모두 인간 존재의 일면밖에 보지 못하고, 온갖 불균형의 징후와 같이 완전히 결함투성이다.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집단」이나 「보다 큰 선」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집단은 개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만약 사람들이 집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만을 생각한다면 집단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가 되고 만다. 집단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집단 내에서의 인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집단」은 생각할 수 없다. 개인만이 생각할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사실에 따라 권위주의적인 「집단주의자」는 가장 특수한 「개인주의자」로, 즉 「개인숭배」와 지도자 신앙으로 이끌리게 된다. 당연한 말이다. 이런 「집단주의」는 개인을 몇 갠가의 추상적 집단으로 분류하고 개성을 부정하며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개성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도자 원리에 따라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스탈린주의와 나치즘이 이 현상의 좋은 예다.
아나키스트는, 사회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며 개인만이 흥미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아나키스트는 「집단주의」와 집단 찬미에 반대하는 것이다. 아나키즘 이론에서 집단은 집단에 참여하는 개개인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만 존재한다. 아나키스트가 리버타리안의 방식으로 구조화된 집단에 큰 무게를 두는 이유가 이것이다. 집단내부의 개인이 충분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성과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는 사회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리버타리안 조직뿐이다. 개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과 사회가 그 개인을 형성하는 한편, 그 개인은 사회의 진정한 기반인 것이다.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사회에서의 생활과 진보 속에서, 개인의 발의와 사회적 행동이 각각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것들이 이야기 되고 있다. 인간세계에서는 개인의 발의 덕분에 모든 것이 유지되고, 계속 행해져왔다. 진정한 존재는 인간, 개인인 것이다. 사회나 집단 - 그것을 대표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국가나 정부도 - 은, 그것이 공허한 추상이 아니라면, 개인과 개인이 만들고 있다. 모든 사고와 인간행동의 기원은 확실히 각각의 유기체에 있다. 그리고 그 사고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짐으로써 개인적 사고?행동에서 집단적 사고?행동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발의를 부정하는 것도, 보완하는 것도 아니라, 사회를 만드는 개개인 모두의 발의?사고?행동의 결과인 것이다. 문제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현실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일부의 개인이 타자를 억압하는 것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 만인에게 같은 권리와 같은 행동수단을 부여한다는 것, 만인의 억압을 반드시 불러오는 소수자의 발의(마타테스타는 소수자의 발의가 정부나 히에라르키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를 만인의 발의로 치환하는 것이다. [Anarchy, pp. 38-38]
이상의 고찰은 아나키스트가 「개인주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투박한 개인주의』는 개인과 그 개성을 억압하고 좌절시키려는 가면을 쓴 시도에 불과하다. 이른바 개인주의는 사회적?경제적 자유방임주의다. (지배)계급에 의한 대중의 착취이며, 이를 위해 법률로 속이고 영혼을 타락시키며 비굴한 영혼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타락하고 왜곡된 『개인주의』는 개성의 속박이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최대의 근대적인 노예제를, 수백만 명을 배급의 줄로 내 몬 가장 어리석은 계급분단을 초래한 것이었다. 『투박한 개인주의』란, 주인에게 있어서 모든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중은 한줌의 제멋대로인 『초인』을 섬기는 노예계급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Red Emama Speaks, p. 112].
집단은 생각할 수 없다. 개인은 혼자서는 살아나갈 수도, 논의할 수도 없다. 집단이나 조직은 개인생활의 본질적 측면이다. 실제로 집단은 바로 그 성질에서 사회관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개인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 방식으로 조직된 집단은, 소속된 개인의 자유와 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개인주의」가 갖는 추상적 성질 때문에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자는 권력주의 방식으로 조직된 집단과 리버타리안 방식으로 조직된 집단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쪽이나 「집단」이라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자」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가장 「집단주의적인」 기관 - 자본주의 기업- 의 몇 가지를 지지해 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빈번하게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은 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개인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즉 추상적인 개인주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아나키스트는 사회적 「개인주의」(이 개념에 대해서는 「코뮌적 개성」이라는 말이 더 나을 수 있다)를 강조한다. 아나키즘은 「사회의 중심은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충분히 살아야 한다. 자유롭고 충분히 성장한다면 인간은 타인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여기에는 『철저한 개인주의』와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약탈적 개인주의는 철저하기는 커녕 정말로 연약하다. 자신의 안전이 아주 조금이라도 위협받으면 국가의 비호로 숨어들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 『철저한 개인주의』는 무제한의 돈벌이와 정치적 강탈을 감추기 위해 지배계급이 뒤집어 쓰는 수많은 가면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Emma Goldman, 전게서, pp. 442-3].
아나키즘은 타자에 의해 제약받는 개인의 「절대」자유라는 사상으로 자본주의의 추상적 개인주의를 거부한다. 이 이론은 자유가 존재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문맥을 무시하고 있다.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유는 우리 자신에게도 타자에게도 있어서도 절대적인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자유가 아니다. 이는 실제로는 반드시 약자에 대한 억압으로 탈바꿈한다. 그렇지 않고, 현실의 자유, 가능한 자유인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인 이익공동체?자발적 연대인 것이다」[Anarchy, p. 43].
추상적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에서는 계약하는 개인 간의 권력의 불평등을 낳는다. 그 결과 권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권위는 개인에 우선하는 법에 근거해 개개인이 주고받은 계약의 이행을 조직적으로 강제한다. 이 결말은 자본주의를 보면 확실하며,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설파한 「사회계약」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운 것은 서로가 고립돼 있을 때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의 「자연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에 참여하면 개인은 「계약」을 만들고 이를 집행시키기 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환상은 차치하고(인류는 늘 사회적 동물이었다), 이 「이론」은 현실에서는 국가가 사회에 대해 광범위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당화한다. 동시에 이것은, 이 이론의 기반이 되고있는 자본주의 경제 관계의 결론과 똑같다.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은 서로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이 시행되고 있는 한, 소유자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섹션 A.2-14와 섹션 B.4를 참조].
아나키스트는 자본주의의 「개인주의」를 거부한다. 크로포트킨을 인용해보자. 그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개인주의」다. 그 이상으로 「개인들을 경시하는 멍청한 에고이즘」이며, 「개인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목표로 설정된 것에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즉, 개성이 전면적으로 폭넓게 가장 완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히에라르키는 개성의 발달이 아닌 「개성의 빈곤화」를 낳는다. 이에 대해 아나키스트는 「개인의 원시적 욕구·타자와의 관계 전반,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고도의 공산주의적 사교성을 통해 최대의 개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개성」을 대비시킨다[Selected Writings on Anarchism and Revolution, p. 295, p. 296 and p.297].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유는 주인과 노예로서가 아니라 평등자로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때, 그 사람들에 의해 풍부해지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도 개인 자유의 부정, 집단의 자율성과 역동성의 부정을 가져온다. 덧붙여 말하자면 한 쪽은 다른 쪽을 포함하는 것이다. 집단주의는 특정형태의 개인주의를 불러오고 개인주의는 특정형태의 집단주의를 불러오는 것이다.
집단주의는 은밀하게 개인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커뮤니티를 빈약하게 만든다. 집단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뿐이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커뮤니티(즉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을 빈약하게 만든다. 개인은 사회에서 떨어져 살 수 없으며 사회 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주의는 결국 「선택받은 소수자」에게 사회의 대부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통찰과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정의 원천인 것이다. 이것이 개인주의의 치명적 결함(그리고 모순)이다. 즉, 「『아름다운 상류층』에 의한 대중억압 상태에서는 개인이 진정으로 충분히 발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발달은 한쪽으로 치우쳤을 것이다」[Peter Kropotkin, Anarchism, p. 293].
진정한 자유와 커뮤니티는 거기에는 없다.
|
|
|
|
|
|
|
|
 |
A.2-12 합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
|
|
 |
A.2-12 합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자유로운 협동조직 내부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아나키스트는 일반적으로 합의Consensus방식의 의사결정을 지지한다. 합의는 결정을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전에 그룹 전원이 합의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합의는 다수파가 소수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보다 아나키즘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의견의 일치는 모두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선택지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머레이 북친은 합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합의는 권위주의를 포함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나의 결정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소수파의 반대의견은 번거로운 의제에 대해 투표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독촉되거나 심리적으로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이의가 단지 혼자만의 거부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실천은 미국 합의과정에서는 「standing aside」라고 불리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정말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소수파라 하더라도 자신의 관점에 따라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이의를 훌륭하게, 계속적으로 표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의사결정에서 철수함으로써, 이의자는 정치적 존재임을 포기한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결정」은 반대의견을 압박을 가해 잠재우는 것으로, 그러한 연쇄적인 협박을 통해서, 「합의consensus」는 궁극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멤버를 그 과정에의 참가자를 무효로 한 후에만 확립되었다.
좀 더 이론적인 단계에서 말하자면 합의는 모든 대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측면인, 이견의 상이(의견 불일치)를 침묵시켰다. 계속적인 이의는 소수파가 대다수의 의사결정에 일시적으로 응한 후에도 계속되는 열정적인 대화인데, 지루한 독백 - 그리고 논박이 없는 정제되진 못한 합의의 톤 - 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었다. 다수결 의사결정에서는 패배한 소수파는 자신이 패배한 결정을 뒤집으려고 결의한다. 소수파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잠재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의를 개방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합의의 경우에는 소수파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 집단의 형이상학적 「통일」의 이익이 되도록 소수파를 묵살시키는 것이다. [「Communalism: The Democratic Dimension of Anarchism」, Democracy and Nature, no. 8, p. 8]
북친은 「서로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소집단 내에서의 의사결정 형태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문제로서 그의 경험이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보다 큰 집단이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지적으로 최소한의 공통견해만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대규모 민중집회가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쟁밖에 일으키지 않는, 가장 범용한 결정이 채택된다 - 그것은 바로 누구나 그것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 의제에 투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중 어느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잠재적인 권위주의 성질로 인해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합의가 자유협동 조직의 정치적 측면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 특히 대규모 그룹에서는 - 것이다. 많은 경우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개성을 파괴하거나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의를 압살하기도 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나 조직을 비하하는 것이다. 공적비난과 압력에 의해 개성의 발달과 자기표현이 방해될 때에는 진정한 커뮤니티도 연대성도 자라지 않는다. 개인이 모두 유일무이한 이상, 개인은 독자적인 견해를 갖는다. 개개인의 행동과 사상에 의해 사회는 진화하고 풍요로워지므로, 이 견해를 표명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하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아나키스트는 「이의의 창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역할이 「합의에 필요한 지루한 획일성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전게서, p. 8]
아나키스트는 다수파가 소수파를 투표로 이겨, 소수파를 무시한다는 기계적 의사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전혀 다르다!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아나키스트는 다이내믹한 논의 과정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보고 있다. 즉, 다수파와 소수파가 가능한 한 서로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가능하다면) 모두가 감수할 수 있는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아나키스트는 직접민주주의 조직내부로의 참여 프로세스를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중요문제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을 촉진하고 개인과 소수파의 표현을 촉진하며 다수파가 소수파를 경시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을 줄이는 과정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A.2-11 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
|
|
 |
A.2-11 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에게 자유합의(이것은 「자주관리」로도 알려져 있다)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유로운 협동조직 속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투표다. 왜냐하면 「지배형태의 대부분은 자유롭고 비강제적이며 계약적인 방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통제에 대해 단지 반대하는 것만으로 억압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John P. Clark, Max Stirner’s Egoism, p. 93].
조직이 리버타리안 처럼 될지 어떨지는 조직이 임의의 것인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내부에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가에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섹션 A.2-14를 참조).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적 생활을 구가하려면 개인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개인은 세 가지 선택을 갖게 된다.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든지(노예가 된다), 자신의 의지에 타인을 따르게 하던지(권력자가 된다), 만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우애를 가지고 합의하는 가운데 타인과 더불어 사는(동료가 된다)가 하는 것이다. 누구도 이 필연으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Errico Malatesta, Life and Ideas, p. 85].
물론 아나키스트는 마지막 선택지, 협동조직을 선택한다. 이것이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서로의 유일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속에서 비로소 개인은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비판적 사고와 자기통제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지적?윤리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고 개개인의 지적?윤리적?사회적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항상 보스의 의지에 순종하기 보다는 때로는 소수파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다면 아나키즘의 직접민주주의의 배후에 있는 이론은 어떤 것일까?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이렇게 쓰고 있다. 아나키스트는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의미에서의 정부의 폐기를 원하지 않는다.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정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시스템이다」[Roads to Freedom, p. 85]. 아나키스트는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자주관리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지역사회나 직장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그 협동조직인 「시민」(적절한 말이 없어서 이를 사용하지만)이 된다. 협동조직은 멤버 전원의 집회를 중심으로 조직된다(큰 직장이나 마을의 경우, 부서나 마을 내라고 하는 기능적인 서브그룹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집회에서는 다른 집회와 협력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책무내용이 정의된다. 협동조직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비판적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 즉, 자신들의 활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다. 복종을 약속하는(국가나 자본주의 기업과 같은 히에라르키 조직에서는 그렇지만)것과는 달리 개개인은 자신이 관여하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동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표명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책무는 해당그룹이나 사회의 상부에 있는 국가나 기업과 같은 별개의 단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인 「시민」끼리 지는 것이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협동조직의 규칙을 집단적으로 제정해 개인으로서 그 규칙에 구속된다. 그러나 그 규칙은 언제라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은 규칙보다 상위이다. 집단으로서 제휴한 「시민」은 정치「권력」이 된다. 그러나 이 「권력」은 개인 간의 수평적 관계에 근거하는 것이며 개인과 엘리트 사이에서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력」은 비히에라르키인 것이다(그것은 「이성적인」 혹은 「자연적인」것이다. 상세한 것은 섹션 B.1 왜 아나키스트는 권위 및 히에라르키에 반대하는 것인가? 를 참조).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법률 대신 계약(즉 자유합의)을 둔다. 이제는 다수결에 따른 법률도, 만장일치에 따른 법률조차 없다. 시민마다, 마을마다, 산업별 노조마다, 각각 독자적인 법률을 갖는 것이다.[The 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 pp. 245-6]
물론 이런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필요한 결정사항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결정이든 집회에서 제기할 수는 있지만(집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그렇다는 것으로 아마도 멤버의 일부가 제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모종의 활동(그리고 순수하게 직무적인 결정도)은 협동조직의 선임운영진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활동가의 말을 인용하자. 「집단 그 자체는 편지를 쓰거나 데이터표의 숫자를 합계하거나 여러 가지 잡역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뿐이다」. 즉 「관리를 조직할」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느 협동조직이 「지도적인 위원회나 히에라르키형의 관직 없이 조직 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조직은 「한 주에 한 번 이상 총회를 열어 조직이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한다」. 더군다나 이 조직은 「엄밀한 관리직무를 가진 위원회를 임명한다」. 단, 총회가 「이 위원회에 명확한 운영방침을 지시하거나 강제적 위임을 하기도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이 조직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지 미리 지시된 적임자에게 그런 직무를 위임하는 것은, 집단성 그 자체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Max Nettlau, A Short History of Anarchism, p. 187에서 인용].
기록해 두어야겠지만 이것은 프루동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다. 노동자 협회에서는 「모든 지위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여러 규칙은 멤버의 승인이 전제가 된다」[Proudhon, 전게서, p. 222].
자본주의?국가주의?히에라르키 대신 자주관리(즉 직접민주주의)가 자유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자유결합 조직의 주도원리가 될 것이다. 이는 아나키즘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협동조직의 모든 연합에도 적용된다. 호세 류나스 프홀스Jose Llunas Pujols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아나키즘 사회에서 임명되는 위원회나 대표단은 모두 교체의 대상이며, 자신을 선출한 섹션이나 섹션무리의 상시투표에 의해 언제라도 경질된다」. 이것은 「강제적 위임」과 「엄밀한 관리업무」를 조합하는 것으로 「그 결과, 누구라도 사소한 권위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이다」[Max Nettlau, 전게서, pp 188-9]. 여기서도 다시 프홀스는 프루동에 따르는 것이다. 프홀스보다 20년 전에 프루동은 민중이 「그 주권을 간청」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속력이 있는 임무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No Gods, No Masters, vol. 1, p. 63].
위임과 선거에 기초한 연합주의를 이용해 아나키스트는 의사결정이 확실히 아래에서 위로 흐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공통의 이익을 자신들이 살펴봄으로써, 타자가 자신들을 지배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아나키스트에게 자주관리는 조직내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조직 내에서의 자유는 건실한 인간적 존재에 필요한 것이다. 물론 소수파는 타자에게 지배당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민주주의의 룰은 여전히 룰인 것이다」「L. Susan Brown, The Politics of Individualism, p. 53」]
지금까지 서술해 온 직접민주주의의 개념은 다수결 원리의 개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특정한 투표에서 소수파가 된 경우, 소수파는 투표결과에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든지 거부하든지의 선택에 직면한다. 소수파에게 판단이나 선택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유합의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다수파의 의지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은 인책의무引責義務라는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와 자유제휴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자유제휴와 인책의무라는 맥락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자유의 부정이 아니라 자유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개인의 자율은 특정한 약속의 의무를 지킨다는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Max Nettlau, Errico Malatesta: The Biography of an Anarchist에서 인용되는 마라테스타의 말]).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소수파가 그 조직에 머물 경우에는 소수파는 자기주장을 하고 다수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설득하려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해 둬야겠지만, 아나키스트가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수자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가당치 않다. 민주적 참여의 주장은 다수파가 항상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복지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소수파는 없다는 것이다. 역사는 상식이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독재적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국가 원수든, 보스든, 남편이든, 누구라도)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결정에 따르는 사람들을 희생해서 사복을 채우고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다수파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제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나키즘의 조직론이 소수파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인책의무의 이론에서 볼 수 있다. 인책의무는 다수파의 결정에 항의하는 소수파의 권리기반이며, 반대의견을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캐럴 페이트먼Carole Pate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수파가 잘못된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면 소수파는 정치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적절하다면 자신들의 시민권과 주체성을 지키고, 정치결사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불복종 행동도 거기에 포함되게 된다. 정치적 불복종은 자주관리형 민주주의가 기반으로 하는 능동적 시민권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약속이라는 사회실천에는 거부할 권리와 언질을 바꿀 권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인 인책의무의 실천은 소수파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하거나, 필요하다면 위반할 권리를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p.162]
협동조직 내의 관계에서 외부로 눈을 돌린다면, 다른 조직끼리 어떻게 협조해 나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상할 수 있겠지만 조직 간의 관계도 조직 그 자체와 골자는 같다. 개인이 조직에 참가하는 것처럼 조직이 연합에 참가한다. 연합 내에서의 조직 간의 관계는 조직 내와 같이 수평적이며 임의의 성격을 갖는다. 멤버가 같은 「발언권과 퇴장권」을 가지며 소수파도 같은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해서, 사회는 협동 조직군으로 이루어진 협동조직?지역 사회군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코뮌군으로 이루어지는 코뮌이 된다. 참가와 자주관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한다, 이것이 사회의 기반이다.
이러한 연합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는 섹션 A.2-9「아나키스트는 어떤 사회를 원하고 있는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섹션.I 「아나키스트 사회는 어떤 것이 될까」에서 더 자세히 논하고 있다.
이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은 아나키즘 사상과 잘 조화를 이룬다. 마라테스타는 모든 아나키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아나키스트는 사회전체를 통치할 권리를 다수파가 갖는 것을 부정한다」. 잘 알겠지만 다수파가 소수파에 강제할 권리는 없다. 소수파는 언제라도 조직을 떠날 권리를 가지며, 마라테스타의 말을 빌리면 「다수파의 결정이 어떤 것이 될지 듣기 전 조차도 그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The Anarchist Revolution, p. 100 and p.101]. 따라서 임의적 협동조직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다수파 지배」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소수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수파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아나키스트의 의견은 다음의 마라테스타의 주장과 같다.
생물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는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아나키스트는 확실히 인정한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거나 혹은 유용할 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소수파는 다수파의 희망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그룹이 그런 식으로 순응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관계 속에서 임의적이어야 하며, 고집을 부려 사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선의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원칙·법적규범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전게서, p. 100]
소수파에게는 행동?항의?어필을 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탈퇴할 권리도 있으므로 다수결이 원리로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수결은 순수하게 의사결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파가 자신의 의사를 다수파에 강요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소수파가 반대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한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수결은 소수파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다수자의 결정은 파멸을 초래한다. 고 단호하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희생해 수동적으로 방관해야 한다든지, 더 나아가 잘못된 것이 틀렸다고 자신이 판단한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으며 바랄 수도 없는 것이다.[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 p. 132]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와 같은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조차 직접민주주의는 유용하다고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의의 결사단체 전부 혹은 거의 모든 것이 다수파이거나 혹은 멤버 전원이 아니지만, 그 일부에 대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에 관한 한, 한정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배심원의 만장일치 결정뿐이다(배심원은 「법을 재판하고, 법의 정의를 재정할」것이다). 왜냐하면 이 「재판기관은 모든 민중을 평등하게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라는 입장에서의 결사가 개인의 재산?권리?인격에 반해서 어떠한 법률도 정당하게 실시할 수는 없다. 그 조직의 모든 멤버가 그 시행에 동의했을 경우는 예외이다」(스푸너가 배심원 제도를 지지하는 것은, 조직의 모든 멤버가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Trial by Jury, p. 130-1f, p. 134, p. 214, p. 152 and p. 132]
직접민주주의와 개인과 소수파의 권리가 조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배심원 제도와 소수자의 항의행동이나 직접행동을 조합하면서 아나키즘 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대부분의 조직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하는 데 사용되고(아마도 기본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겠지만) 소수파의 건의나 권리를 보호하고 평가할 것이다. 자유의 실제적인 형태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실제경험을 통해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하지만 아나키스트가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 해결책이 모든 장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소규모 조직에서는 합의일치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도 모른다(합의에 대해, 그리고 아나키스트가 합의일치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대체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을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의 생각에서는 자유로운 조직 내부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존엄?평등이라는 아나키즘 원리와 일치하고 있는 최량의(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조직 형태인 것이다. |
|
|
|
|
|
|
|
 |
A.2-10 히에라르키의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이룰 것인가 |
|
|
 |
A.2-10 히에라르키의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이룰 것인가
리버타리안 조직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것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다. 수많은 민중이 권능을 갖게 됨으로써 지금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사회가 바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조직형태는 비현실적으로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합적이고 비권위주의 조직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가주의이자 중앙집권형 히에라르키 조직형태는 참여가 아닌 무관심, 연대가 아닌 무정함, 단결이 아니라 획일화, 평등이 아닌 특권적 엘리트를 낳는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조직은 개인의 발의를 파괴하고, 독립된 행동이나 비판적 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다(히에라르키에 대해서는 섹션 B.1「왜 아나키스트는 권위 및 히에라르키에 반대하는가」를 참조).
리버타리안 조직이 잘 기능한다는 것, 그것이 자유를 바탕으로 자유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스페인의 아나키즘 운동이 증명했다. 영국 독립노동당의 서기장 페너 브록웨이Fenner Brockway는 1936년 혁명 중에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아나키스트들 사이에는 큰 연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지도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직이 성공하려면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이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Rudolf Rocker, Anarcho-syndicalism, p.67에서 인용].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써왔던 것처럼, 히에라르키형 중앙집권 구조는 자유를 제한한다.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크기?단순함?구조라는 점에서 중앙집권 제도는 매우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 제도에서 개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실감할 수 없고, 자신의 삶을 실감하지 못하며,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도 전혀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이다」[Paths in Utopia, Martin Buber, p. 33에서 인용].
히에라르키의 영향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게다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히에라르키와 권위는 직장에도, 가정에도, 거리에도, 어디에나 존재한다. 밥 블랙Bob Black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명령에 복종하거나, 아첨하며 살고 있거나, 히에라르키에 흠뻑 빠져 있다면, 머지않아 수동공격성 인격인물인 사디스트, 마조히스트의 노예근성 불감증이 된다. 그리고 남은 인생 모두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The Libertarian as Conservative」 The Abolition of Work and otheressays, pp. 147-8].
즉, 히에라르키가 끝나면 일상생활은 엄청나게 변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자신의 직장?자신의 지역사회?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참가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킬 것이 확실해질 것이다.
사회생활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되면 곧바로 불평등과 불공정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히에라르키의 종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크로포트킨을 인용하면) 「만인의 행복」일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처럼 수입의 범위 안에서 꾸려나가기 위해 존재하고 소수자의 부와 권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야흐로 「공통의 계승물에 대해 노동자가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자의 소유로 귀착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The Conquest of Bread, p. 35 and p]. 생활수단(직장?주택?토지 등)을 손에 넣는 것만이 「자유와 공정」을 보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와 공정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주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며, 자신의 노고의 산물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자유와 공정은 발생하는 것이다」[Ricardo Flores Magon, Land and Liberty, p. 62]. 따라서 자유는「사용권」을 지지하고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상세한 것은 섹션 B.3을 참조). 아이러니컬하게도 「재산의 폐지는 노숙자 상태와 무소유 상태로부터 민중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Max Baginski, 'Without Government', 'Anarchy! Anthology of Emmmma Goldman's Mother Earth, p. 11]. 아나키즘은 「행복의 두 가지의 필요조건 - 자유와 부」를 약속한다. 이 아나키에서는 「인류는 자유와 쾌락함 속에서 생활할 것이다」[Benjamin Tucker, Why I am an Anarchist, p. 135 and p. 136].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자기결정과 자유합의만이 개인과 사회전체의 책임감?발의?지성?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인간성 안에 숨어있는 광범위한 재능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나키스트 조직뿐이다. 개인을 풍요롭게 하여 발전시키는 그 과정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며, 조정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과정에 모두가 참가함으로서 비로소 자유가 개화할 수 있고, 개성이 충분히 육성되고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아나키는 히에라르키에 의해 노예화 된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또한 아나키는 자본주의와 그 권력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주장한다. 지배자도 지배받는 측도 양쪽 모두 권위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착취하는 측도 착취당하는 측도 양쪽 어느 쪽이나 착취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Peter Kropotkin, Act for Yourselves, p. 83]. 왜냐하면 「어떤 히에라르키 관계에 있어서도 지배자는 종속자와 마찬가지로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통제의 명예」를 위한 대가는 실제로 심각한 것이다. 모든 폭군은 자신의 대가에 분개했다. 폭군은 히에라르키 여행의 여정내내 복종자의 속에 잠들어 있는 창조적 잠재능력이라는 죽음의 무게를 끌고 가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For Ourselves, The Right to Be Greedy, Thesis 95].
|
|
|
|
|
|
|
|
 |
A.2-9 아나키스트는 어떤 사회를 원하고 있는가 |
|
|
 |
A.2-9 아나키스트는 어떤 사회를 원하고 있는가
아나키스트는 자유제휴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분산형 사회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해 온 가치관 - 자유?평등?연대 - 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형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비로서 개인의 자유는 육성?촉진된다. 소수자의 손에 권력을 맡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의 분명한 부정인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자신의 일을 관리하는 것을 민중으로부터 빼앗아 타자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작게 하고 저변의, 결정된 사항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손에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조직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제휴는 아나키즘 사회의 근간이다. 개인은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단결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기본이다. 이러한 자유합의는 권력분산에 근거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다(자본주의에서처럼). 자유가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문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평등뿐이다. 그러므로 아나키스트는 「1인 1표」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이다(자유 합의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섹션 A.2-11「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를 참조).
여기서 말해 두겠지만 아나키즘 사회는 모두가 찬동하는 목가적 조화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혀 다르다! 루이지 갈레아니Luigi Galleani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견의 불일치나 마찰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사실 그것은 진보를 지속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모든 동물적 생존경쟁 - 음식을 서로 빼앗는 것과 같은 - 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상태에서 일단 탈출하면, 의견의 불일치의 문제는 사회질서나 개인의 자유에 전혀 위협을 주는 일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The End of Anarchism?, p.28].
아나키즘의 목적은 「개인과 여러 집단이 갖는 발의發意의 정신을 일깨우는」것이다. 개인과 집단은 「자신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운동을 창출하고 자유 이해와 관련된 여러 원칙에 입각한 삶을 창조할」것이다. 그리고 「다양성 - 대립이라 하더라도 -이야말로 생이며, 통일은 죽음이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다[Peter Kropotkin, Anarchism, p. 143].
아나키스트 사회는 협력적 대립에 근거하게 된다. 「대립 그 자체에 해는 없다. 의견의 불일치는 항상 존재한다(그것을 숨기면 안 된다). 의견의 불일치를 파멸적으로 하는 것은 대립 그 자체의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경쟁을 동반하는 것이다」. 확실히 「합의에 너무 매달리면 사람들이 지혜를 내어 그룹의 노력에 공헌하는 것이 사실상 방해된다」[Alfie Kohn, 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 p. 156].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큰 그룹에서의 합의에 의한 의지결정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섹션 A2-12를 참조]
아나키즘 사회에서 협동조직은 전원이 참가하는 대중집회가 운영하게 될 것이다. 민중집회는 평등자 사이에서의 포괄적인 논의?토의?협력적 대립에 근거한다. 다양한 위원회도 선출되지만 이는 순수하게 관리상의 직무만을 수행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그 직무를 명받고, 소환이 가능하며, 잠정적이고, 그 직무수행은 자신을 선출한 집회에 의해 감시받는다. 즉 아나키즘 사회에서는 「자신은 일은 스스로 처리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계획을 관리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여차여차한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고, 그 외의 방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결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즉 우리의 대리인은 명령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권위를 전혀 갖지 않고, 참가한 누구나가 하길 바라는 것을 실시할 의무만을 가진 사람들이다」[Erico Malatesta, Fra Contadini, p. 34]. 만약에 대리인이 명령받은 직무에 반해 행동하거나, 집회의 결정 이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거나, 집회가 결정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했을 경우(즉, 대리인이 정치적 결정을 하기 시작한 경우)는, 즉시 소환되며, 대리인이 행한 결정은 백지화된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그것을 만든 개인의 합동조직의 수중에 보전되는 것이다.
그룹 저변에 있는 멤버가 실시하는 자주관리와 구성원이 가진 소환권이란 아나키스트 조직의 본질적 신조다. 국가주의 시스템이나 히에라르키 시스템과 아나키스트 커뮤니티의 중요한 차이는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있다. 예를 들어 의회시스템에서는 민중은 일정기간, 의원단에 의사결정을 할 권력을 부여한다. 의원들이 공약을 실행하는지 어떤지에 상관없이, 다음 선거까지 민중은 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
권력은 위에 있어 저변의 사람들은 그저 따르기만 할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직장에서는 톱에 있는 보스와 관리직이라는 선거에 의해 뽑힌 것도 아닌 소수자가 권력을 잡고, 노동자들은 복종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나키즘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역전된다. 아나키스트의 지역사회에서, 단 한 명의 개인이나 단 하나의 그룹만이 (선거에 의해 뽑힌 것이든 그렇지 않든) 권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 대신 의사결정은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지역사회가 선거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결정에 영향을 받는 개개인의 의무다)과, 채용된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대리인의 일이다)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주의의 지역사회는 자유합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연합이라는 형태로 자유롭게 제휴한다. 이러한 자유연방은 아래에서 위로 운영되며, 의사결정은 기반이 되는 집단에서 위로 진행된다. 연합도 컬렉티브collectives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지방차원?「국가」차원?국제차원에서 정기적 회의가 있으며, 참가하는 컬렉티브에 영향을 주는 중요문제를 논의한다. 나아가 이 회의는 사회의 근본적 지침이나 사상을 토의하고, 정책을 결정해 실행에 옮기고 재검토하며 조정한다. 대리인이 행하는 것은 단지 「지지된 임무를 가지고 관련된 회의에 참석해 각각의 다양한 요구와 염원을 조화시키려하는 것뿐이다. 토의는 항상 자신들을 대리인으로 파견한 사람들의 관리?승인에 제약받는다」. 거기서 「민중의 이익이 잊혀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다」[Malatesta, 전게서, p. 36].
필요하다면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어 상술한 바와 같이 엄밀한 아래로부터의 컨트롤에 의해 집회와 회의의 결정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위원회에 파견되는 대리인의 재직기간은 한정되며, 회의에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임무는 고정되어 있다. 자신을 대리인으로 지명한 민중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또한 회의나 대회에 보내는 대리인처럼 자신을 처음 선출한 집회와 대회에 의해 즉각적인 소환의 대상이 된다. 마라테스타의 말을 인용하면 이와 같이 해서, 공동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는 모두 「항상 민중의 직접관리 하에 놓인다.」 그리고, 「민중집회에서 채택된 결정을」표명하는 것이다[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 p. 175 and p.129].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지역집회는 연합이 도달한 어떤 결정도 뒤집을 수 있으며, 연합을 탈퇴할 수도 있다. 한창 협의 중에 대리인이 한 타협은 어떤 것이든 간에 전체회의로 회부해 승인을 구해야 한다. 그 승인 없이는 대리인이 행한 어떤 타협도, 특정사항을 특정개인이나 위원회에 위임한 지역사회를 구속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사회는 연합회의를 소집해 사태의 새로운 진전을 논의하고 실행위원회에 요망이 바뀌었음을 전달하여 사태의 진전이나 제안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실행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나키스트 조직이나 아나키즘 사회에서 필요한 대리인은 모두, (민주주의 정부에서와 같은) 대의사가 아닌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진정한 대리인 vs 대의사라는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상상해보면 된다. 100명 혹은 200명의 사람이, 매일 업무로 만나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의 모든 면을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뽑아 같은 대리인과 합의에 도달하도록 그 사람을 보낸다. 이 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은 자신의 동료가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른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것뿐이다. 대리인은 어떤 일도 강요할 수 없으며 이해를 구하는 것뿐으로, 자신이 위임받은 사항이 받아들여지는지 거부되었는지 하는 단순한 제의를 가지고 돌아갈 뿐이다. 진정한 대리위임이 출현하면,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다.[Words of a Rebel, p. 132]
대의제와 달리 권력은 소수자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대리인이라도 최초로 자신을 선거한(혹은 발탁한) 협동조합의 심부름꾼인 것이다. 대리인?행동위원회는 모두 자기 자신보다 출신 집회의 희망을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 임무를 명령받아 즉각적인 소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아나키로 바꿔지는 것이다. 즉, 임무를 명령받은 대리인?즉각적인 소환?자유합의?밑에서 위로의 자유연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근거한 평등자로서 협력하는 자유 협동조직과 자유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만이 「민중의 자유조직, 밑에서 위로의 조직」을 확실하게 한다. 이 「밑에서 위로의 자유연합」은 기본적인 「협동조직」으로 시작해 「우선 가장 먼저 코뮌에, 그리고 코문연합이 지방으로, 지방연합이 국가로, 국가의 연합이 국제동포동맹으로」으로 연합하는 것이다[Michael Bakun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Bakunin, p. 298]. 아나키스트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세 가지 단계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지역적 조직을 위해서는 독립코뮌, 각각의 직무에 따른 민중조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경제적·위생적·교육적인 모든 현실 가능하고 상상 가능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상호의 방위?사상의 선전?예술?오락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자유연합과 자유협회」가 있다[Peter Kropotkin, Evolution and Environment, p. 79]. 이 모든 것은 자주관리?자유제휴?자유연합?밑에서 부터의 자주조직화에 근거할 것이다.
이렇게 조직을 만듦으로써 생의 모든 면에서 히에라르키를 폐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의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리인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조직 형태만이 정부(소수자의 발의와 권능)를 아나키(만인의 발의와 권능)로 바꿀 수 있다. 그룹에서의 작업과 많은 사람들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모든 활동에, 이 조직형태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바쿠닌이 말하듯이 그것은 「자신이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에 개개인을 포함시키는」수단인 것이다[Cornelious Castoriadis, Political and Social Writings, vol. 2, p. 97에서 인용]. 각각의 발의에 관해 참여하는 개인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나키스트가 만들고 싶어하는 사회는 어떤 개인이나 그룹도 타자에 대해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구조에 근거한다. 자유합의·연합과 소환권·고정된 임무와 한정된 임기, 이것들은 권력을 정부의 손에서 빼앗아, 결정에 직접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손으로 옮기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아나키즘 사회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섹션.I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아나키는 뭔가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에 대한 현재의 투쟁의 일면인 것이다. 수단과 목적은 연관되어 있다. 직접행동은 대중 참여조직을 만들어내고 민중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집단적 이익을 직접 관리할 각오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섹션 I.2.3에서 논하듯이 아나키스트의 생각에서는 자유사회의 틀은 학대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여기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조직에 근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집단적 투쟁은 아나키즘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세도 만들어낸다. 억압에 대한 투쟁이야말로 아나키의 학교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아나키스트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아나키즘 사회가 어떻게 될지, 그 당초의 조직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자신들이 관리해 보는 경험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아나키스트는 목전의 투쟁 속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세계를 다소나마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상이 「혁명 후」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아나키즘 원리를 현재로 적용하면 아나키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
|
|
|
|
|
|
|
 |
A.2-8 히에라르키에 반대하지 않아도 아나키스트가 될 수 있는가 |
|
|
 |
A.2-8 히에라르키에 반대하지 않아도 아나키스트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아나키스트는 권위주의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 왔다. 반권위주의라면 모든 히에라르키 기구에 반대해야 한다. 그것이 권위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개인의 진가와 특성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정부만이 아니다. 생활을 질식시키는 복합적 권위와 제도적 지배 전체 역시 그렇다. 권위와 제도적 지배를 지원하는 것이 미신superstition?신화myth?겉치레pretence?회피evasions?아첨subservience이다」[Red Ema Speaks, p. 435]. 즉 「히에라르키?권위?지배로 이루어지는 구조와 노예제?임금노예 (즉 자본주의)?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권위주의적 학교 등 자유에 대한 족쇄를 항상 영속적으로 찾아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Noam Chom Chomeom].
일관된 아나키스트라면 국가뿐만이 아니라 히에라르키에도 반대할 것이다.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것을 막론하고 아나키스트라는 것은 히에라르키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위해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히에라르키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이며 권력?명성(통상적으로), 보수를 크게 하기위한 등급?지위?역할로 이루어진다. 히에라르키 형태를 조사하던 학자들은 히에라르키는 지배와 착취라는 두 개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예를 들면 「보스는 무엇을 하는가?What Do Bosses Do?」라는 현대공장을 연구한 저명한 논문(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Vol.6,No.2)에서 스티븐 머글린Steven Marglin이 발견한 것은 기업 히에라르키는 주로 (자본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생산효율의 향상이 아니라 착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히에라르키의 통제는 강제적으로 유지된다. 육체적?경제적?심리적?사회적 등등 다양한 부정적 제재조치에 의한 협박을 사용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나 반항에 대한 탄압을 포함한 이러한 통제에는 권력집중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정점에 있는 소수자(특히 조직의 리더)가 최대의 통제를 행사하고, 중간층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많은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밑바닥에 있는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전혀 통제력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배?강제?중앙집권이 권위주의의 본질적 특징으로 이 특징이 히에라르키로 구현되고 있는 이상, 모든 히에라르키 기구는 권위주의이다. 더구나 아나키스트에게 히에라르키?중앙집권제?권위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은 어떤 것이든 국가를 꼭 닮은 것이며 「국가주의적」이다. 아나키스트는 국가에도 권위주의적 관계에도 반대하기 때문에 모든 히에라르키 형태를 해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아나키스트」라고 부를 수 없다. 자본주의 기업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노엄 촘스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기업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극도로 히에라르키 형이며 실제로 파시스트이다.
파시즘기구는 절대주의다. 권력이 위로부터 아래로 파급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국가는 본질적으로 명령에 따를 뿐인 대중을 톱다운으로 통제한다.
기업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자. 실제로 기업이 어떤지를 보면 권력이 엄밀히 위에서 아래로, 이사회에서 경영자로, 그리고 하급관리직으로, 최종적으로는 생산현장의 사람들과 사무원 등으로 미치게 되어 있다. 아래에서 위로의 권력흐름 따위는 없고 밑으로 위로 보내려는 시도조차 없다.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방해하고 비판할 수도 있다. 바로 똑같은 일이 노예사회에도 해당된다. 권력구조는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선상으로 뻗어있는 것이다.[Keeping the Rabble in Line, p. 237]
데이비드 델런David Deleon은 다음과 같이 기업과 국가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공장은 군사독재와 같은 것이다.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병졸, 현장의 통괄은 하사관이라는 방식의 히에라르키다. 일하는 동안 자신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에서부터 자신이 생활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 조직에게 명령받는다. 잔업을 명령받는다. 병에 걸리면 고용 중인 산업의에게 진찰받도록 지시받는다. 한가할 때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탄압받는다. CCTV에 더해 ID카드와 무장한 공안경찰을 통해 감시받는다. 반대의견을 말하면 징계정직(GM에서 부르는 방법)으로 처벌받고 해고되는 일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백만이라는 실업자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 거의 모든 작업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직할 「권리」정도일 것이다. 상아탑에서 일을 하던, 갱도에서 일을 하던,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정하는 것은 톱으로,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 있다.[For Democracy Where We We Work: Artionale for social self-management, Reinventing Anarchy, Again, Howard J. Ehrliched., 193-4]
일관된 아나키스트라면 모든 형태의 히에라르키에 적대해야 한다. 자본주의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키 archy」를 지지하는 것이다. - 정의상 아나키스트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나키스트에게 있어 「복종하는 약속, (임금)노예의 계약, 예속상태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합의, 이것들은 모두 부당하다. 개인의 자율을 제한하고 억제하기 때문이다」[Robert Graham, 'The Anarchist Contract', Reinventing Anarchy, Again, Howard J. Ehrlich(ed.), p. 77]. 따라서 히에라르키는 아나키즘의 원동력이 되는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히에라르키는 우리를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며 「인간의 가장 근본적 특징인 인격을 박탈한다. 개인은 자신의 사적생활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문맥 - 사회상황 - 에 대응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Murray Bookchin, The Ecology of Freedom, p. 129].
협동조직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히에라르키 구조 여부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아나키스트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우선 첫 번째로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생활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그리고 자유도)판다. 이런 과정은 「부의 막대한 격차」를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조건들을 더욱 강화한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가격으로 팔아 치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용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묘사하는 것은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의 협상력에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예속과 착취의 관계는 자유의 축도縮圖로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묘사하려는 것 등, 개인의 자유와 사회공정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Robert Graham, 전게서, p.70]
이런 이유로 아나키스트는 집단적 행동과 조직을 지지한다.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자율을 단호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섹션J를 참조).
두 번째로, 만약 협동조직이 임의적인지 어떤지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국가시스템도 「아나키」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특정국가에 강제적으로 살도록 강요받는 개인은 없다. 그곳을 떠나 어딘가 특별한 장소로 가는 것은 자유다. 협동조직이 갖는 히에라르키형의 성질을 간과하면 결국 자유의 부정에 바탕을 둔 조직(자본주의 기업?군대?국가조차도)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임의」이기 때문이다. 밥 블랙Bob Black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복종협정을 무시하면서도 국가의 권위주의를 악마화하는 것은 최악의 페티시즘fetishism이다」[The Libertarian as Conservative, The Abolition of Work and otheressays, p. 142]. 아나키는 주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이상을 말한다.
히에라르키에 반대하는 것이 아나키즘의 중요한 자세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임의주의Voluntarism 아나키스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A.2-14 「왜, 임의주의는 불충분한가」에서 자세하게 논하겠다.
아나키즘의 생각으로 보면 조직이 히에라르키형이 될 필요는 없다. 자신들의 일은 직접 자신들이 관리하는 평등자 사이의 협력에 기초한 조직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히에라르키 구조(즉 소수자의 손에 권력을 맡기는 것이) 없이도 해 나갈 수 있다. 협동조직은 그 멤버에 의해 자주관리되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아나키즘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황하게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자본주의 옹호자 가운데 자유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이유로 분명히 「아나키스트」라는 말을 훔쳐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최근에는 자본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아나키스트인 것은 가능하다(이른바 「아나르코」캐피털리즘anarcho capitalism)는 따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의 기반은 히에라르키(국가주의와 착취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이기 때문에, 「아나르코」캐피탈리즘은 분명히 모순되어 있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섹션 F를 참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