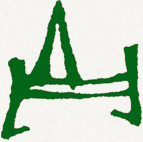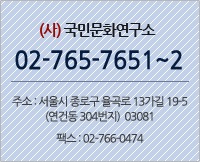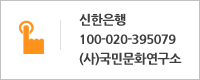|
|
 |
A.2-7 왜 아나키스트는 자기해방을 주장하는가 |
|
|
 |
A.2-7 왜 아나키스트는 자기해방을 주장하는가
본질적으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사슬은 자신의 노력으로 끊어야 한다. 물론 개인의 노력은 집단행동의 일부가 될지도 모르며, 대부분의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역사는 가르쳐준다. 온갖 학대받은 계급(혹은 집단이나 개인)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지배자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획득해 왔던 것이다.[Red Ema Speaks, p. 167]
민중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뿐이다. 아나키스트는 줄곧 이렇게 주장해 왔다.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아나키스트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섹션J「아나키스트는 무엇을 행하는가」에서 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모든 방식에 공통적인 것은 민중이 자신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검토과제를 설정하며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신들을 위해 모든 일을 해 주는 리더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나키즘의 기본은 「스스로 행동하는」사람이다(아나키스트는 그것을 「직접행동」이라고 부른다 - 상세한 것은 섹션 J.2를 참조).
직접행동은 참여하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고, 해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자주행동은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창조성?주체성?상상력?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수단이다. 이 수단에 의해서만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 엔리코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과 사회환경은 상호작용이다. 현재의 사회는 인간이 만들고, 현재의 인간은 사회가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종의 악순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를 변혁하려면 인간이 변해야 하고 인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변해야 한다. 지배계급은 민중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 소극적이고 무의식적인 도구로 폄훼하는 데 성공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이런 지배계급의 직감적 의지가 아니다. 무수한 내부투쟁의 결과이며 다양한 인간적?자연적 요인의 결과인 것이다.
진보의 가능성은 여기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현재의 환경이 허락하는 한, 민중의 의식을 깨워 민중의 의식과 요구를 발달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가능성,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장래의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여는데 조력할 수 있게 하고 진보의 길을 효과적으로 개척하는 대규모 사회변용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만인으로 하여금 모든 개선과 자유를,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힘을, 그것들이 부족하다면 원하는 만큼 요구하고 강요하며 자력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전해방을 달성할 때까지 민중이 항상 더 요구하도록 (지배 엘리트에 대해)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 pp. 188-9]
사회는 개인을 형성하는 한편 동시에 개인의 행동?사고?이념을 통해 개인이 만들어 낸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전적인 모든 제도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관계 전반을 의문시하는 과정을 시작함에 따라 정신적으로 해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통찰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이념을 창조한다. 다시 한 번 엠마 골드만을 인용하자. 「진정한 해방은 여성의 영혼에서 시작된다」. 덧붙이지만, 물론 남성의 영혼에서도 시작된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선입관?전통?습관의 중압에서 해방되어 정신적인 재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전게서, p. 167]. 단, 이 과정은 막스 스티르너도 말하고 있듯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타자로 부터 자유를 부여받은 받은 인간은 보석으로 풀려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뒤에 사슬을 달고 걷는 개와 같다」[Max STirner, The Ego and Its Own, p. 168].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을 바꿈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스페인 혁명 중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투사 두루티Durutti는 「새로운 세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 그런 비전을 마음에 그릴 수 있게 하고 현실세계에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은 자주활동과 자기해방뿐이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장엄한 혁명」후의 미래까지 자기해방을 기다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사회의 성질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사회와 생활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바쿠닌인 말하듯이 아나키즘 사회의 성립 이전이라도 아나키스트는 「미래에 관한 사상뿐만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의 모든 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사회관계나 다른 종류의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다. 부자유스러운 사회에서 자유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지금 여기서의 행동뿐이다. 그 이상으로 이 자기해방의 과정은 항상 계속하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노예는 매일 비판적 자기반성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이 주인이 방해가 되고 실망하게 되며 때로는 전복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주인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노예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한, 비판적 반성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복종을 끝내고 자유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다.[Carole Pateman, The Sexual Contract, p.205]
아나키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향들이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에 저항하며, 좌절시키며 그것들을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판적인 자기반성?저항?자기해방의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자유스러운 사회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아나키즘은 학대받는 사람들이 히에라르키 세계 내부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행하는 자연스러운 저항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 저항의 과정을 많은 아나키스트는 「계급투쟁」(사회 속에서 가장 학대받은 그룹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이다) 혹은 더 일반적으로 「사회투쟁」이라고 부른다. 모든 형태의 권위에 대한 일상적 저항과 자유의 희구야말로 아나키즘 혁명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이런 이유로 「아나키스트는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계급투쟁이 노동자(등의 학대받은 집단)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Marie-Louise Berneri, Neither East Nor West, p. 32].
혁명은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다. 「자발적 혁명행동」은 「유토피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온 조직 만들기와 교육이라는 인내심 강한 활동의 결과이며, 이 활동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종류의 기관과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낡은 껍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I.W.W의 말을 사용하자면) 과정은 혁명적 헌신과 혁명적 전투라는 장기간에 걸친 전통이 되어야 할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명언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민중조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사상의 논리 귀결이다. 따라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아나키스트는 민중을 해방시키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중이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을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민중조직으로부터 새로운 생활양식이 출현하는 것이며, 민중의 발전상태에 입각하는 것이고, 민중이 전진 하는 것에 따라 전진하는 것이다」[전게서, p.90].
자기해방의 프로세스가 생기지 않는 한 자유사회는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도(국가와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지적으로도(권위에 대한 복종적 태도로 부터 자신을 해방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비로소 자유사회는 가능해 진다. 잊어서는 안 되지만 자본주의와 국가의 권력은 전적으로 그것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라는 것이다(물론 정신적 지배에 실패하여 민중이 반란과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수의 무력이 후원자로 나타나겠지만). 그 결과, 지배계급의 사상으로서의 정신적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학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에 침투한다. 이것이 지속하는 한 노동자 계급은 권위?억압?착취를 통상의 생활조건이라고 묵인하게 된다. 주인의 학설이나 입장에 복종하는 정신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도, 반항하는 것도, 투쟁 역시 바랄 수 없다.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그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기 되기 전에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신적 지배를 극복해야 한다(직접행동이야말로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아나키스트는 주장한다. - 섹션 J.2와 J.4를 참조). 자본주의와 국가주의는 물리적으로 패배되기 전에 정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패배되어야 한다. (많은 아나키스트는 이 정신적 해방을 「계급의식」이라고 부른다. - 섹션 B.7-3을 참조). 그리고 억압에 대한 투쟁을 통한 자기해방이야말로 그것을 이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는 「반역의 혼」(크로포트킨 말을 빌리면)을 고무하는 것이다.
자기해방은 투쟁?자주조직?연대?직접행동의 산물이다. 직접행동은 아나키스트를, 그리고 자유인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아나키스트는 항상 자본과 그 옹호자인 국가에 반항하는 노동자의 직접투쟁을 행하는 노동자 조직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것은 「그런 투쟁은 간접적 수단보다 뛰어나며,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개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주의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가 행하는 악에 대해 노동자의 눈을 뜨게 해 준다. 그리고 자본가와 국가의 개입 없이 소비?생산?교환을 조직할 가능성에 대해 노동자의 사고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다」. 즉 자유사회의 가능성을 보게끔 되는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많은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생디칼리즘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을 기존의 사회 속에서 리버타리안 사상을 발달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도 아나키스트 활동을 그런 운동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그 연대를 실현하고 자신들이 가진 한 무리의 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운동은 어떠한 것이든 무정부 공산주의communist-anarchism가 갖는 「이러한 개념의 토대를 만든다」[Evolution and Environment, p. 83 and p.85]. 즉 학대받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는 기존사회의 정신적 지배를 극복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아나키스트 투사가 말했듯이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인류 진보의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에 종속함으로써 타락한 개인에 의한 반역과 불복종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반역과 불복종을 통해서 뿐이다」[Robert Lynn, Not a Life Story, Just a Leaf from It, p. 77]. 아나키스트가 자기해방(그리고 자주 조직?자주 관리?자주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바쿠닌이 「반역」을 「역사에 있어서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모든 인간적 발전이 갖는 본질적 조건으로 되어있는 3가지 근본원리」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God and the State, p. 12].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역(자기해방)은 기존사회가 더욱더 리버타리안이 되고, 아나키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
|
|
|
|
|
|
|
 |
A.2-6 왜 아나키스트에게 연대가 중요한가 |
|
|
 |
A.2-6 왜 아나키스트에게 연대가 중요한가
연대, 즉 상호부조는 아나키즘의 핵심이 되는 생각이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이며 자유와 평등을 부양해 기르는 환경 속에서 공통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게 개개인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상호부조는 인간생활의 근본적 특징?힘과 행복의 원천?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로서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사회주의 휴머니스트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타자와의 단결을 경험하고 싶은 인간의 소망은, 인류라는 종을 특징짓는 고유한 존재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행동의 동기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것 중 하나이다」 [To Be or To Have, p.107].
따라서 사람들과 「조합」을 만들고 싶다(막스 슈티르너의 말을 빌리면)는 소망은 자연스런 욕구라고 아나키스트는 생각한다. 참가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합, 즉 협동조직은 평등과 개성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즉 아나키즘의 방법, 즉 자발적?분권적?비히에라르키의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대 - 개인 간의 협력 - 은 살기 위해 필요하며, 자유의 부정이 아니다. 엔리코 마라테스타Errico Malatest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대는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고, 최적의 자기발달을 달성하며, 가능한 한 자신의 최대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다」. 이것은 「만인의 행복을 위해 개개인이 단결하고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만인이 단결하는 것으로」「개인인의 자유가 타자의 자유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자유에 의해 보완되는 - 실제로 타자의 자유 속에 필요한 존재 이유를 이끌어」내는 것이다[Anarchy, p. 29]. 즉, 연대와 협력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를 평등자로 대접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자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자유를 지원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엠마 골드만은 이 주제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사람의 개성이 갖는 유일무이한 힘이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타인의 개성과 협력함으로써 그것이 강해질 때이다. 협력 - 서로 죽일 정도의 싸움이나 투쟁에 반대하면서 - 은 종의 생존과 진화에 공헌해 왔다. 상호부조와 자발적 협력만이 자유로운 개인과 연합적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Red Ema Speaks, p. 118].
연대란 공통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등자로서 연합하는 것이다. 연대에 근거하지 않는 조직(즉, 불평등에 근거한 조직)은, 조직을 따르는 사람들의 개인성을 파괴한다. 레트 마르트Ret Marut는 자유에는 연대가 공통의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진실한 사랑은 자기애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세계의 모든 미를 감상하고 싶다. 하지만 나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자유로울 때뿐이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때뿐이다. 마주치는 사람, 보이는 사람 모두가 기쁨에 찬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을 때에만 나는 기쁘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배불리 마음껏 먹고 있다고 확신해야 비로소 나도 순수하게 기꺼이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 저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만족의 문제이며, 자기 자신의 문제일 뿐이다.[Ret Marut (a.k. a. B. Traven), The Brick Bururur Burururur 133-4에서 인용]
연대의 실천은 세계 산업노동자의 구호에 있듯이 「한 사람의 아픔은 모두의 아픔이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대는 개성과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며 자기 이익의 표현인 것이다. 알피 콘Alfie Koh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협력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개념을 막연한 이상주의로 연결시키려 한다. 이는 협력을 이타주의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직적인 협력은 흔한 이기주의 - 이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에 도전한다. 모든 일은 남을 돕는 것이 동시에 자기 자신도 돕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설령 처음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우리의 운명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가라앉는 것도 헤엄치는 것도 함께인 것이다. 협력은 지혜롭고 성공률이 높은 전략이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뭔가를 할 때 경쟁하기 보다는 효율 좋은 실용적인 선택인 것이다. 동시에 협력하면 서로 친해지고, 정신 위생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충분한 증거도 있는 것이다.[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 p. 7]
히에라르키 사회에서 연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만족을 가져다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저항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여기서 마라테스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한 번도 완전하게 억압과 빈곤에 굴하지 않고 정의?자유?행복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학대받는 사람들은, 전세계 모든 곳에서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결?연대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Anarchy, p. 33]
단결함으로서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그룹을 조직함으로써 자신들의 집단적인 문제를 자신들이 관리하고, 확실하게 보스와 결별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은 개인의 수단을 증대시키고, 공격받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Max Stirner, The Ego and Its Own, p. 258]. 연대해 행동한다면 현행시스템을 더욱 우리의 기호에 맞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단결은 힘이다」[Alexander Berkman, What is Anarchism?, p. 74].
연대는 자유를 획득하고 보장해 주는 수단이다. 우리는 협력하는 것에 합의한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필요는 없다.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한다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고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이다. 상호부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이다. 즉 상호존중과 사회적 평등에 기초하여 타자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지배를 용서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십중팔구 다음에는 자신이 지배당할 것이다.
막스 스티르너는 연대를, 자유를 강화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권력자로부터 자기 몸을 확실히 지키는 수단이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자네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그는 묻는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멋대로 이용당할 운명이라도?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게 된다. 만약 자신의 뒤에는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자신을 지지해 준다면 너는 압도적인 힘이며, 너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것이다」[Luigi Galleani's The End of Anarchism?, p. 79에서 인용].
아나키스트에게 연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유를 창조하고 권력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연대는 힘이며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연대를 지도자에 대한 수동적 추종을 뜻하는 「군집주의herdism」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유인이 평등자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연대는 효과적이지 않다. 「군집주의」에 대한 소망이 연대와 단합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라고 해도 「대문자로 쓰는 우리들The big WE」는 연대가 아니다. 그것은 히에라르키 사회에 의해 더럽혀진 「연대」이며,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길들여진 것이다.
|
|
|
|
|
|
|
|
 |
A.2-5 왜 아나키스트는 평등을 지지하는가 |
|
|
 |
A.2-5 왜 아나키스트는 평등을 지지하는가
전술했듯이 아나키스트는 사회적 평등에 전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의 자유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등」에 대해서는 난센스가 많이 기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대부분도 정말 이상한 경우가 많다. 아나키스트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논하기 전에 무엇을 의미 「하지 않는가」를 먼저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재능의 평등」 같은 건 믿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라도 유일한 존재이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인간의 상위相違는 단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원인이 아니라, 기쁨의 원인인 것이다」. 왜일까?「클론에 둘러싸인 인생 따위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이 가지지 않는 능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Noam Chomsky, Marxism, Anarchism, and Alternative Futures, p. 782].
아나키스트가 「평등」이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것은, 누구라도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은 현대의 한심스러운 지적문화intellectual culture를 반영하고 있으며, 언어의 부패corruption of words 인 것이다. 이 부패를 이용해 불공정한 권위주의 시스템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고 생물학의 논의로 말을 얼버무리고 있다. 「자기의 유일성은, 평등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말하고 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명제는, 인간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근본적 성질을 공유하고 인류의 기본적 숙명을 공유해 자유와 행복을 요구한다는, 뺏을 수 없는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는 연대관계이지, 지배 - 복종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이 같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The Fear of Freedom, p. 228].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유일성의 완전한 주장과 발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는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편견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아나키스트는 이른바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누구든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집에 살며, 같은 제복을 입는다고 하는 사회에 사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아나키스트가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에 반항하는 이유의 일부분은 그것들이 생의 대부분을 규격화해 버리기 때문이다(자본주의가 규격화와 획일화로 향해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지 리처George Reitzer의 저서 『사회의 맥도날드화The McDonaldisation of Society』를 참조).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을 인용하자.
권위?법률(명문화되었든 되어있지 않았든)?전통?관습, 이것들이 갖는 정신은 우리를 무리하게 끼워 맞춰 인간을 주체성이나 개성이 없고 의사도 없는 자동기계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모두 이 희생자인 것으로, 예외적으로 강한 자만이 그 쇠사슬을 깨부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일부에 불과하다.[What is Anarchism?, p. 165]
아나키스트는 더욱 깊이 「틀에 끼워 맞추」려고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우선 가장 먼저 이 정신을 파괴해, 그것이 만들어 내는 모든 사회관계와 사회제도를 파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받아들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타자보다 큰 힘을 가지게 되어, 어쨌든 평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특히 「결과의 평등」을 싫어한다. 개인은 각자 다른 욕구?능력?욕망?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하는 것을 모두 같게 한다는 것은 전제정치다. 의료처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평등한」양의 의료적 케어를 받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것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알렉산더 버크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등이란 평등한 양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자유에 있어서의 평등을, 형무소에서의 강제적 평등과 헛갈려서는 안 된다. 누구나 같은 것을 먹고, 마시며, 입어야 하며, 같은 방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전혀 다르다. 실제로 전혀 반대인 것이다.
개인의 욕구와 기호는 서로 다르다. 식욕이 다르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정한 평등이란, 그것들을 만족시킬 평등한 기회를 뜻하는 것이다.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며, 이러한 평등은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활동과 발전의 기회를 부여해 준다. 인간의 특징은 다양하므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기회는 자연스러운 다양성과 다양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게서, pp. 164-5]
아나키스트에게 「결과의 평등」이나 「재능의 평등」으로서의 「평등개념」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히에라르키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각각의 세대가 갖는 기회는 이전 세대의 결과에 의존한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략적인 「결과의 평등」(수입과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없이 「기회의 평등」역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억만장자의 자녀와 도로 청소부 자녀와의 사이에는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의 결과가 만들어낸 장애물을 무시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주창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히에라르키 사회에서의 기회는 진로가 개방되는지 어떤지 뿐만 아니라 스타트 지점이 평등한지 어떤지 에도 의존하는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에서 아나키스트가 「결과의 평등」을 원한다는 오해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히에라르키형의 시스템에는 해당되지만 아래와 같은 자유사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나키즘 사상에서는 평등은 개인의 다양성과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바쿠닌의 견해를 살펴보자.
일단 평등이 쟁취되어 그것이 충분히 확립되면, 개인능력의 다양성이나 개개인의 활력의 수준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일까?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많지는 않더라도 차이는 반드시 남을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에 완전히 똑같은 잎이 두 장 생겨날 수 없다는 속담에도 있듯이,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인간은 나뭇잎보다 훨씬 복잡한 생물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인간에게 더 해당된다. 하지만 이 다양성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재산이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인간성은 집단적 전체가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모두를 보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무한한 다양성이 연대의 근본 요인이며 바로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을 요구하는 매우 강력한 논거인 것이다.[All-Round Education, The Basic Bakunin, pp. 117-8]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평등은 사회적 평등을 의미한다. 머레이 북친의 말을 빌리자면 「불평등자의 평등」이다(마라테스타는 같은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조건의 평등」이라고 했다). 이 말에서 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나키스트 사회는 개인의 능력?욕구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권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그것이 어떠한 법적 허구나 제도에 의존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집단성 속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Michael Bakunin, God and the State, p. 53].
참가를 촉구하고 「1인 1표」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관계를 지지함으로써 히에라르키형의 사회관계와 그것을 만들어 낸 여러 가지 힘을 폐기하면, 자연스러운 차이가 히에라르키 권력으로의 전환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 소유권이 없다면, 소수자가 생활수단(기계류와 토지)을 독점하고, 임금 시스템과 고리(이윤?임대료?이자)를 사용해 타자의 노동으로 사복을 채우는 것을 가능케 하던 수단이 없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관리하면 노동자의 노동으로 부를 이루는 자본가 계급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평등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그 기원은, 사회 속에서 자본?노동?재능이라는 세 가지 추상물이 구체화한 것에 있다.
사회가 이 공식의 세 가지 조건에 대응해 세 종류의 시민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상, 언제나 이 카스트 구별에 도달해 인류의 반수는 언제나 타자의 노예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는 자본 - 노동 - 재능이라는 귀족정치의 공식을 보다 단순한 노동의 공식으로 줄임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모든 시민을 일제히 차별 없이 어느 정도까지의 자본가?노동자?전문가?예술가로 만드는 것이다.[No Gods, No Masters, vol. 1, pp. 57-8]
모든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프루동은 이러한 직무의 통합을 평등과 자유에 대한 열쇠라고 보고 그것을 달성할 수단으로서 자주관리를 기도했다. 즉 자주관리가 사회적 평등의 열쇠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사회적 평등은 직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킬까에 대한 방침의 결정에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아나키스트는 「만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만인이 결정한다」는 격언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전문가를 무시한다거나 누구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문가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 관심도, 재능도, 능력도, 다른 것이므로 다른 공부를 해서 다른 일을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병이 생겼을 때는 의사 - 즉 전문가 - 에게 진찰받는 것으로, 그 의사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굳이 말해야 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사회적 평등이나 노동자 자율관리의 화제가 되면 반드시 난센스적인 참견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회적으로 평등한 방식으로 관리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초보자가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당연하지 않은가!
사실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떼어 놓을 수는 없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개인이 자주관리하는 것(자유)을, 그룹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자주관리하는 것(평등)으로 보완함으로써 비로소 자유사회가 가능해진다. 그 양쪽이 없으면 타자에 대해 권력을 갖고 타자를 위해 결정을 내리는(즉 타자를 통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결과 타자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즉 당연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아나키스트는 부의 측면뿐만 아니라 생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만인에 대한 사회적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분배도 요구한다」[Malatesta and Hamon, No Gods, No Masters, vol. 2, p. 20]. 즉, 자유와 평등 모두를 보증하기 위해 자주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평등은 개인이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평등이 시사하는 자주관리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에 자기 독자적인 관점을 가져오기 위해 동료들과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사람들이 일에 착수하는 것」[George Benello, From the Ground Up, p. 160]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등은 개성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으로 개인의 자유에 필수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평등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생각은 섹션 F.3「왜 아나르코 캐피탈리스트는 평등을 경시?무시하는가」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다. 노엄 촘스키의 에세이 『평등Equality』(『촘스키 독본The Chomsky Reader』에 수록)은 이 주제에 대한 리버타리안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다.
|
|
|
|
|
|
|
|
 |
A.2-4 아나키스트는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가 |
|
|
 |
A.2-4 아나키스트는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에는 항상 타자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나키스트는 강간?착취?강제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 권위를 허용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권위가 자유?평등?연대(인간의 존엄은 말할 필요도 없다)에 대해 위협인 이상, 아나키스트는 권위에 저항하고 그것을 타도할 필요를 인정한다.
권위의 행사는 자유가 아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마라테스타Malatesta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나키스트가 지지하는 것은 「만인의 자유다. 단 하나의 제한은 타자에도 동일한 자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착취?억압?명령의 「자유」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것은 억압이며 자유가 아니다」[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 p. 53].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적인 것(보스)이든, 공적인의 것(국가)이든 모든 히에라르키형의 권위의 형태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인간의 표시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가 그의 저서 『시민적 불복종Civil Disobedience』(1847년)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불복종은 진정한 자유의 기반이다. 복종은 노예와 다름없다.」
|
|
|
|
|
|
|
|
 |
A.2-3 아나키스트는 조직을 용인하는가 |
|
|
 |
A.2-3 아나키스트는 조직을 용인하는가
그렇다. 협동조직 없이 진정한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는 사회나 조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죠지 바렛George Barrett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인생의 충분한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동료와 합의해야한다. 그러한 합의를 자유의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거꾸로 그것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합의하는 것이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는 도그마를 꾸며내면 자유는 곧바로 폭군화 한다. 그 도그마는 일상의 사소한 즐거움조차 금지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친구와 산책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친구와 산책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친구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말고는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 이상의 것을 하려 한다면 누군가와 협력해야 하고 협력하는 것은 타인과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자유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이 어리석다는 것은 일목요연하다 할 것이다. 친구와 산책하러 가는 것에 동의 할 때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뛰어난 지식으로, 친구는 운동하는 게 좋겠다, 친구를 산책에 데려가야지, 라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 된다. 이것이 자유합의와 지배와의 차이인 것이다.[Objections to Anarchism, pp. 348-9]
조직에 관해서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권력을 만들어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권력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이다. 즉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단적 작업 속에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지도자의 수중에 있는 수동적 도구로서의 존재를 그만두는 유일한 수단이다」[Errico Malatesta, Life and Ideas, p. 86]. 아나키스트는 구조가 있는 오픈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케롤 에릭Carole Ehrlich이 지적하고 있듯이 아나키스트는 「조직기구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히에라르키 구조를 단절시키고 싶을」뿐이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그들은 「조직기구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고정관념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틀린 것이다. 「책임성· 최대다수의 사람들에게의 권력의 확산·직무의 로테이션·기능의 공유·정보와 자원의 보급·이것들을 짜 넣은 조직」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뛰어난 사회적 아나키스트 조직원리인 것이다!」[“Socialism, Anarchism and Feminism”, Quiet Rumours: An Anarcha-Feminist Reader, p. 47 and p. 46]
아나키스트가 조직을 용인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영국인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조직에 대한 경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직은 전체주의적인 것이거나 민주주의적인 것인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해 정부를 신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동시에 조직 전체를 신용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Stuart Christie and Albert Meltzer, The Floodgates of Anarchy, p. 122].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조직이 권위주의로 이루어진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외의 조직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종류의 조직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지배와 착취를 그 원동력으로 하는 특수한 사회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고고학자나 인류학자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사회는 노예의 노동이 잉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배계급을 부양하는 정복과 노예제에 근거한 최초의 원시적 국가와 함께 출현했다. 기껏해야 5천 년간 존재했던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전의 몇 십만 년 동안 인류와 이전 인류의 사회는 머레이 북친이 「유기적 사회」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었다. 즉, 상호부조?생산자원의 자유이용?공동노동·생산물의 필요에 의한 공유, 이런 것을 포함한 협조형의 경제활동에 근거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사회에도 연령에 의한 지위의 상하관계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적 제재에 의해 강요당하는 제도화된 지배 - 종속관계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히에라르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어느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착취를 포함한 계급분화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Murray Bookchin, The Ecology of Freedom 참조].
하지만 강조해 두지만, 아나키스트는 「석기시대에 돌아가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히에라르키 - 권위주의형의 조직은 인간의 사회진화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 그것이 어떤 이유에선지 영구히 「정해진 운명이다」고 생각할 이유 따위는 없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인간의 권위주의적?경쟁적?공격적인 행동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도 없다. 반대로 그것은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지고 학습된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Ashley Montagu, The Nature of Human Agression를 참조]. 우리는 운명론자도 유전학적 결정론자도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고 있다. 자유의지란, 사람은 자신이 일을 행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의미다. 사회를 조직 하는 방식 역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의심할 것 없이 사회는 더욱 좋은 방향으로 조직 되어야 한다. 현재는 대다수가 생산한 부와 권력의 대부분은 사회적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것이 빈곤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특히 피라미드의 저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다. 엘리트가 국가통제를 통한 강제적 수단을 장악하고 있기(섹션 B.2.3을 참조)때문에 다수자를 억압하고 그 고통을 무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규모는 더 작기는 하지만 이런 현상은 모든 히에라르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나 중앙집권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 부정이라고 해서 조직을 미워하게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조직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난센스를 말하는 것이다. 조직은 만사이며, 만사가 조직인 것이다. 의식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모든 것이 조직인 것이다. 하지만 조직도 천차만별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당히 나쁘게 조직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마치 몸의 어딘가가 아플 때 몸 전체가 아프고 병이 든 것과 마찬가지다. 조직이나 조합의 멤버는 한 사람이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차별받거나 억압되거나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빨이 아픈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몸 전체가 병들기 때문이다.[전게서, p. 198]
이것은 정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결과적으로 「몸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나키스트는 권위주의적 조직형태를 부정하고 자유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조직을 지지한다. 자유합의는 중요하다. 버크만의 말을 빌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스러운 독립주체이며, 상호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타자와 협력해 비로소 세상은 제대로 기능하고 강력해 진다」[전게서, p. 199]. 섹션 A.2-14에서 논하겠지만, 아나키스트에 의한 자유합의의 강조는 협동조직 그 자체 내부에서의 직접민주주의(아나키스트가 통상 쓰는 말로는 자주관리)로 보완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어떤 주인을 선택하는가 하는 정도의 것이 되어 버린다.
아나키스트 조직은 권력을 민중의 손에, 즉 내려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손에 되돌려 준다는 대규모적인 권력분산에 근거한다. 프루동을 인용해보자.
민주주의가 속임수가 아니고 인민주권이 농담이 아닌 것이라면, 자신이 종사하는 산업분야나 그 지방에 있는 개개의 자치체?지구?지방의회에서 개개인의 시민은 자신이 관여하는 이해관계를 관리하는데 직접적으로 각각 스스로 행동하고 그러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완전히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The 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 p. 276]
이것은 공통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연합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키즘에 있어서 연합주의는 자주관리의 자연스러운 보완물이다. 국가의 폐지와 함께 사회는 「다른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방식으로, 그 자체를 조직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직해야 한다. 장래의 사회조직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협동조직이나 연합에 의해 오로지 아래에서 위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처음에는 노동조합에서 시작해 코뮌으로, 지방으로, 국가로, 최종적으로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대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자유와 공익이라는 진정한 질서, 생명을 부여해주는 질서가 실현 할 것이다. 이 질서는 개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확약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다」[Bakunin, Michael Bakunin: Selected Writings, pp. 205-6]. 왜냐하면 「진정한 민중조직은 아래서부터 시작되고」따라서 「연합주의가 사회주의의 정치적 제도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민중생활 조직이 되기」 때문이다. 리버타리안 사회주의는 「특징으로서 연합주의적인 것이다」[Bakun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Bakunin, pp. 273-4 and p. 272].
아나키스트 조직은 직접민주주의(즉, 자주관리)와 연합주의(즉, 연방)에 근거한다. 이것들은 자유의 표현이며 자유의 환경이다. 자유와 평등에는 민중이 평등자로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이 필요한 이상 직접(참가형태의)민주주의는 필수적이다. 이 포럼은 머래이 북친이 「반대의견의 창조적 역할the creative role of dissent」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연합주의는 공통의 이익이 확실히 논의되어 영향을 받는 사람 전원의 희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동행동이 조직 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의사결정이 소수의 지배자에 의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리버타리안 조직에 관한 아나키스트의 생각과 직접민주제와 연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섹션 A.2-9와 A.2-11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
|
|
|
|
|
|
|
 |
A.2-2 왜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강조하는가 |
|
|
 |
A.2-2 왜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강조하는가
바쿠닌의 말에 의하면 아나키스트는 「자유의 열애자이며 자유야말로 인간의 지성?존엄?행복을 키우고 증대시키는 유일한 환경이라 생각하고 있다」[Michael Bakunin: Selected Writings, p. 196].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인 이상 이 동물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자유는 인간성의 산물이다.
사람은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 타인과는 다른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 진실이 바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다는 염원을 만들어 낸다. 자유와 자기표현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특징인 것이다. [Emma Goldman, Red Emma Speaks, p. 439]
이로 인해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권력에 의한 모든 속박이나 침해로부터 해방하려 한다. 인간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은 자유 안에서 뿐이다. 사람은 자유 속에서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스스로를 최고의 상태로 하는 것을 배운다. 자유 속에서 비로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회적 결속이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을 실감한다. 이 결속이야말로 당연한 사회생활의 진정한 기반인 것이다」[전게서, pp. 72-3].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자유란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개인의 활동과 힘이 발휘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단하기 때문이다. 자유만이 개인의 발전과 다양성을 보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고 자신들 스스로 의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각자의 정신을 작동시켜야 하며 바로 이것이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을 확충하고 자극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중이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중이 스스로 행동하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실수를 범하겠지만 범한 실수의 결과로부터 배우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것이다」[Fra Contadini, p. 26].
자유는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성장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자유는 사회적 산물이며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지역사회가 자유로운 개인을 만든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이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다양한 자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종잇조각에 법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뿌리 깊은 습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해치려는 시도에 대해 민중이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타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존경할 기분이 된다. 이것은 사생활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생활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많든 적든 받아 누리고 있는 정치적 권리와 특권 모든 것은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민중 자신의 힘 덕분이다」[Rudolf Rocker, Anarcho-syndicalism, p. 75].
이런 이유로 아나키스트는 직접행동 전술을 지지하는 것이다(섹션 J.2를 참조).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원하는 만큼의 자유다. 따라서 아나키즘은 직접행동을 경제적인가, 사회적인가, 도덕적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법률과 제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반역과 저항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실?자립?용기다. 즉 자유로운 독립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저항만이 최종적으로(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직장에서 권위자에 대한 직접행동, 법률의 권위에 대한 직접행동, 도덕규범이 갖고 있는 침해적이고 간섭적인 권위에 대한 직접행동, 이것들은 아나키즘의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법인 것이다」[Red Emma Speaks, pp. 76-7].
바꿔 말하면 직접행동은 자유의 활용이며, 지금 여기서의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유사회를 창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자유가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모든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느 쪽이나 지극히 중요하다. 자유가 발전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이지 사회에 적대해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머레이 북친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인간이 어떤 역사적 시기에 어떠한 자유?독립?자율을 갖는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전통인 「집산적」발전의 산물인 것이다. 그것은 개개인이 그 발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실제로 자유롭게 되고 싶다고 원한다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Social Anarchism or Lifestyle Anarchism, p. 15].
자유에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올바른 종류의 사회환경이 필요하다. 그러한 환경은 권력 분산형이며 노동자에 의한 직접적인 노동관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집권이 강제적 권력(히에라르키)을 의미하는데 반해 자주관리는 자유의 본질이다. 자주관리는 거기에 참가하는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 특히 그 정신적 능력을 - 확실히 행사(그리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히에라르키는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의 활동과 사고를, 소수의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바꿔놓는다. 개인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경시하고 그 발달을 확실히 무디어지게 하는 것이다(섹션 B.1도 참조).
아나키스트가 자본주의나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세바스찬 폴Sebastien Faure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권위는 「두 개의 주요한 형태를 몸에 걸치고 있다. 하나는 정치적 형태, 즉 국가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형태, 즉 사유재산이다」[Peter Marshall, Demanding the Impossible, p. 43에서 인용]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중앙집권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즉, 노동자에 대한 보스의 권위이다). 그 목적은 노동자의 손에서 노동의 관리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자의 본격적이며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상태뿐이다. 자본, 즉 원재료와 토지를 포함한 모든 노동수단을 노동자 전체가 점유 한다는 상태뿐이다」[Michael Bakunin, quoted by Rudolf Rocker, Op. Cit., p. 50].
노엄 촘스키는 말한다. 「정통한 아나키스트라면 생산수단의 사유와 임금노예에 반대할 것이다. 이것들이 현행 시스템의 구성요소이고 노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산자의 관리 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Notes on Anarchism”, For Reasons of State, p. 158].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자유란 개인이나 그룹이 자주관리를 실천하는 -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 비권위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아나키스트 사회는 강제적이 아니다, 즉 개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을 「납득시키는」데에 폭력이나 폭력을 드러내 보이는 위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아나키스트는 개인의 주권을 단호히 지지하며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강제적 권위에 근거하는 제도(즉 히에라르키)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나키스트는 「정부」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앙집권형?히에라르키형?관료제도형의 조직이나 정부에 반대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하는 한 권력 분산형의 풀뿌리 조직으로 이루어진 연합을 통한 자치정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아나키스트의 조직에 대해서는 섹션 A.2-9를 참조). 권위는 자유의 적이며 권력의 위임에 근거하는 조직은 어떠한 것이든 그 권력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에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는 자유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회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국가주의 하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유는 없다. 사유재산과 히에라르키가 대다수 사람들의 의사와 판단을 확실하게 주인의 의지에 종속시켜 개인의 자유를 큰 폭으로 제한해 「우리들 개개인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적?지적?도덕적 능력 전부의 충분한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Michael Bakunin, Bakunin on Anarchism, p. 261].(자본주의와 국가주의의 히에라르키적, 권위주의적 성질에 관한 더욱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섹션 B를 참조)
|
|
|
|
|
|
|
|
 |
A.2-1 아나키즘의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
|
|
 |
A.2-1 아나키즘의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앞에서 본 것처럼 「an-archy」는 「지배자가 없는」혹은 「히에라르키hierarchy 권력이 없는」상태를 의미한다. 아나키스트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숙련되어 있거나, 박식한 전문가라는 의미의 「권위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런 권위자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으로 사람들을 억지로 복종시키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섹션 B.1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아나키즘은 반권위주의다.
아나키스트는 반권위주의자다. 그 누구도 타인을 지배하면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L 수잔 브라운L. Susan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스트는 「인간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존엄과 가치를 믿고 있다」[The Politics of Individualism, p. 107]. 지배는 본래 비열하고 천하다.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의지를 지배하는 사람의 판단과 의지 속에 잠재워 개인의 자율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존엄과 자존심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배는 착취를 가능케 하며 대부분 실제로 착취하도록 이끌어낸다. 이것이 불평등?빈곤?사회붕괴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아나키즘의 본질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와 개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 평등한 입장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협력하는 것이다.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것이 반권위주의의 열쇠다. 협력에 의해 우리가 유일자로서 본래 가지고 있어야할 가치를 발달시키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들의 생활과 자유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인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 나의 자유는 만인의 자유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나의 평등자인 만인의 자유와 권리 속에서 확인되고 승인되지 않는 한 나는 사고에 있어서도 현실에 있어서도 진정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Michael Bakunin, quoted by Errico Malatesta, Anarchy, p. 30].
아나키스트는 반권위주의면서 인간에게는 사회성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은 이 상호영향이 갖고 있는 「권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상호영향의 단절은 죽음과 같다. 우리는 대중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을 때라도, 개인이나 개인의 그룹이 미치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단절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인공적?특권적?법적?공식적인 영향력을 단절하는 것이다[quoted by Malatesta, Anarchy, p. 51].
바꿔 말하면 이런 영향력은 히에라르키형 권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
|
|
|
|
|
|
|
 |
A.2 아나키즘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
|
|
 |
A.2 아나키즘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다음에 소개하는 퍼시 비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시는 아나키즘이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사상과 아나키즘을 움직이게 하는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고결한 영혼을 가진 인간은
명령하지 않고, 복종도 하지 않는다
권력은, 비참한 페스트처럼
손 댄 모든 것을 더럽힌다
그리고 복종은
재능?미덕?자유?진실 모든 것을 파멸시켜
인간을 노예로, 인간의 육체를 기계인형으로 만들어 버린다.
셸리의 시가 나타내는 것처럼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자신과 타자 서로의 자유를 희구하고 있다. 또한 개성 - 그것은 인간을 유일자로 한다 ? 을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는 개성은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없이는 개성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발달하고 확충하고 성장하는 데는 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발달과 사회발전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형성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고나 행동이(자기와 타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측면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유스러운 개인?그 희망?꿈?사상에 근거하지 않는 사회는 공허하며 죽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형성은 집단적 과정이다. 지역사회와 개인 쌍방이 참가하는 과정인 것이다」[Murray Bookchin, The Modern Crisis, p. 79]. 즉 순수하게 사회에만 또는 개인에만 기반을 둔 정치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개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나키스트는 생각한다. 그것은 자유?평등?연대의 사회다. 아나키스트는 모두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무정부 공산주의자communist-anarchist 표도르 크로포트킨은, 「자유?평등?연대라는 아름다운 용어」에 자극된 혁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The Conquest of Bread, p. 128]. 개인주의 아나키스트 벤자민 터커Benjamin Tucker 역시 같은 비전에 대해 쓰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진정한 사회주의, 아나키스틱 사회주의Anarchistic Socialism를 주장한다. 이것은 자유?평등?연대를 지구상에 보급시키는 것이다」[Instead of a Book, p. 363]. 이들 세 가지 원리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자유는 개인의 지성?창조성?존엄을 충분히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다. 타자에게 지배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행동할 기회가 부정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개성을 성장?발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배는 동시에 혁신과 개인의 책임감을 말살하고 획일성과 평범함mediocrity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개성을 크게 신장하는 사회는 반드시 권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제휴에 근거하게 된다. 프루동의 말을 인용하면 「누구나가 연합하면, 누구나가 자유롭게 된다」. 또한 루이지 가리아니Luigi Galleani는 이렇게 말한다. 아나키즘은 「연합하는 자유 안에서의 개인의 자율인 것이다」[The End of Anarchism?, p. 35]. (섹션 A.2.2 「왜,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강조하는가?」를 참조)
자유가 개성의 충분한 발달에 필수라고 한다면, 평등은 참된 자유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다. 권력?부?특권 등의 막대한 불평등으로 채워지고 계급으로 분단 된 히에라르키 사회에 참된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자 - 히에라르키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 - 만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 나머지는 반 노예이기 때문이다. 평등이 없으면 자유는 외관뿐인 속임수다. 자본주의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주인(보스)을 선택하는 「자유」정도의 것이다. 그 이상으로 그러한 정황에서는 엘리트마저도 정말로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엘리트 역시 다수자의 소외와 압정에 의해 왜곡되어 불모로 변한「발육을 방해하는 사회」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은 다른 자유로운 개인과의 폭넓은 접촉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엘리트 계급에 속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개인이 적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발달 가능성도 제한되어 버리는 것이다. [A.2.5 「왜 아나키스트는 평등을 지지하는가?」 를 참조]
마지막으로 연대는 상호부조를 의미한다. 그것은 같은 목적과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타자와 협력해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 없이는 사회는 상층계급이 하층계급을 지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하는 모든 계급의 피라미드가 되어 버린다. 자신들이 지금 있는 사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사회는 「지배 하던가 지배 받던가」 「먹느냐 먹히느냐」「자기 것만 생각하는」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감각을 잃어버린 「일그러진 개인주의」가 조장 된다.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무리를 원망하고 위에 있는 무리는 아래의 인간들을 두려워한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회전체의 연대는 불가능하다. 이해가 대립하는 계급사이에서의 부분적 연대만이 가능하고, 이것이 사회전체를 취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A.2.6 「왜, 아나키스트에게 연대가 중요한가?」를 참조]
여기서 연대는 자기희생이나 자기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마라테스타Errico Malatesta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에고이스트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단지, 아나키스트는 모두를 위해 고투하고, 자신이 형제들 중의 한 명이 될 수 있는 사회, 건강하며 지적이고 교육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투하는 것에 큰 만족을 찾고 있다. 하지만 생각을 곧바로 바꾸는 사람이나, 노예생활에 만족하는 사람, 노예노동에서 이윤을 얻고 있는 사람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며, 아나키스트가 될 수도 없다. [Life and Ideas, p. 23]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wealth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다. 엠마 골드만의 말에 그것은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성립하고 있다. 강하고 아름다운 육체와 거기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주는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이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이다. 인간의 에너지가 이처럼 자유롭게 발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완전한 개인적, 사회적 자유 아래서만 가능하다」. 즉, 「사회적 평등」하에서다[Red Emma Speaks, pp. 67-8].
또한 개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아나키스트는 사람들이나 사상이 사회와는 별개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관념론자는 아니다. 개성과 사상은 사회 속에서 물질적?정신적 교류나 경험에 따라 성장?발전하는 것이다. 이 교류나 경험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아나키즘은 유물론인 것이다. 사상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의 정신적 활동에 의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미하일 바쿠닌에 의한 유물론 대 관념론의 고전적 논의인 『신과 국가God and the State』를 참고).
이것은 아나키즘 사회란 인간이 창조하는 것으로 신과 같은 초월적 원리가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멋대로 준비 되지는 않는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렇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사물에 대한 자신의 자세와 이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Alexander Berkman, What is Anarchism?, p. 185].
아나키즘의 기반은 사상의 힘, 그리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인간의 능력이다. 그것이 자유인 것이다. |
|
|
|
|
|
|
|
 |
A.1-5 아나키즘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
|
|
 |
A.1-5 아나키즘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아나키즘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혁명(섹션 A.5-4참조)에서 마프노주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든 『리버타리안 공산주의자의 조직강령』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노동자의 노예화가 낳은 계급투쟁, 그리고 노동자의 자유에 대한 열망, 이것들이 억압 속에서 아나키즘 사상을 낳았다. 아나키즘은 계급원리와 국가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시스템을 노동자가 자주관리하는 자유로운 비국가주의 사회로 대체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아나키즘은 지식인이나 철학자의 추상적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노동자에 의한 자본주의와의 직접투쟁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물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삶과 투쟁이 영웅적인 시대에 이런 열망은 특히 생기가 넘치는 것이다.
걸출한 아나키즘 사상가 바쿠닌이나 크로포트킨 같은 사람들이 아나키즘 사상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대중 속에서 아나키즘 사상을 찾아내어, 자신의 장점인 사고와 지식을 사용해 그 사상을 기록하고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pp.15-16]
아나키스트 운동 대부분이 그랬지만 마프노주의자도 노동자 계급의 대중운동이며 1917년부터 1921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적군(공산당Communist)과 백군(차리즘Tsarist/자본주의) 양쪽의 권위주의 세력에 저항했다. 「전통적으로 아나키즘의 주된 지지자는 노동자?농민이었다」고 피터 마셜Peter Marshall은 기록했다.
아나키즘은 억압받는 쪽이 자유를 찾아 투쟁하는 속에서, 그리고 그 투쟁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크로포트킨에게 있어서 「아나키즘은 일상투쟁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 큰 실천적 교훈에 영향을 받을 때마다 아나키즘 운동은 새롭게 되었다. 아나키즘의 기원은 생활 그 자체의 가르침에 있었던 것이다」[Evolution and Environment, p. 58, p.59]. 프루동에 있어서 그 상호주의 사상의 「증거」는 「다양한 노동자 조직」의 「현재의 실천, 혁명적 실천」에 있으며, 「이러한 조직은 파리와 리용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신용조직과 노동조직은 완전히 같은 의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No Gods, No Masters, vol. 1, pp.59-60]. 실제로 어떤 역사가가 제시하고 있듯이 「프루동의 연합적 이상과 리용의 상호주의자의 프로그램은 매우 비슷하」며, 「(사상에서) 현저한 일치」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프루동이 자신의 건설적 프로그램을 정합성으로 확실히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리용의 실크 노동자의 실례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가 지지한 사회주의의 이상은 이미 이러한 노동자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된 것이다」[K. Steven Vincent, Pierre-Joseph Proudhon and the Rise of French Republican Socialism, p. 164].
즉, 아나키즘은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과, 완전한 인간적 생활, 삶?사랑?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에서 생기는 것이다. 생활에서 동떨어져 사회를 내려다보는 상아탑에서 자신의 선악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소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위?억압?착취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저항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앨버트 멜쳐Albert Meltze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 그 자체의 이론가 따위는 없었다. 아나키즘이 아나키즘 철학의 여러 측면을 논하는 많은 이론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아나키즘은 행동 속에서 성립하는 신조를 계속 이어왔다. 지적사상을 실천한다는 것은 아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부르주아 작가는 노동자와 농민이 이미 실천으로 성공한 것에 참가하고 기록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역사가는 이 작가를 지도자로 여긴다. 나아가 그 후의 부르주아 저술가들이, (이들 부르주아 역사가를 인용해)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지도자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실례라고 하는 것이다. [Anarchism: Arguments for and against, p.18]
크로포트킨의 눈에는 「아나키즘은 그 기원을 대중의 창조적?건설적 활동에 두고 있다. 그것은 과거 인간의 모든 사회기관 속에 실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관의 외부에서 세력의 대표자들에 대한 반역 속에 실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외부세력의 대표자들은 이들 기관에 손을 대어 자신들에게 편하게 이용해 왔던 것」으로 비쳤다. 더욱더 최근에는 「사회주의 일반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비판적?혁명적 항의행동이 아나키를 낳았다」. 아나키즘은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그 모독의 팔을 자본주의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주인 법률?권위?국가에 대해서도 드는 것이다」. 아나키스트 저작자가 행한 것은 사회 일반이 가진 여러 가지 진화경향의 분석뿐 아니라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경험에서 도출된「(아나키즘) 원리의 일반적 표현과 그 교리의 이론적?과학적 기반을 성립 시킨」것이었다[전게서, p. 19 p. 57].
하지만,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아나키즘적 경향과 조직이란 프루동이 1840년에 펜을 잡고 자신이 아나키스트라고 선언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특정 정치이론으로서의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의 발흥과 함께 태어났다(아나키즘은 「18세기말에 출현해, 자본과 국가를 전복한다는 이중적 도전에 착수했다」[Peter Marshall, 전게서, p.4]. 그러나 아나키스트 저작자는 여러 가지 리버타리안 경향에 관해 역사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로포트킨은 「어느 시대라도 아나키스트와 국가주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게서, p.16]. 『상호부조론Mutual Aid』 (과 그 외의 저작)에서 크로포트킨은 지금까지의 여러 사회가 갖고 있던 리버타리안적 측면을 분석하고, 아나키즘 조직이나 아나키즘의 측면을 (어느 정도까지) 잘 실천하던 사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아나키즘 운동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여러 실례가 아나키즘적 사상경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석기시대라는 가장 오래된 시대부터, 인간들은 동료 중 몇 명이 사적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원시적 씨족·촌락 커뮤니티·중세 길드·최종적으로는 중세의 자유도시 안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정복하러 온 이방인과, 같은 일족 중에서 사적 권력을 확립하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에 저항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Anarchism, pp. 158-9]
크로포트킨은 노동자 계급 민중의 투쟁을 이런 옛 민중조직 형태와 같다고 보았다. 「노동자의 단결은 소수자의 권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같은 민중저항의 결과였다. 이 경우에는 자본가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씨족?촌락 커뮤니티 등도 그랬고 1793년의 「프랑스혁명 중의 파리 『지구』·모든 대도시·많은 소규모 『코뮌』의 현저하게 독립해 자유롭게 연합한 활동」도 그랬다[전게서, p. 159].
정치이론으로서의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와 근대국가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자주활동의 표현이지만, 아나키즘 사상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행동 속에 몇 번씩이나 표현되어 왔다. 예를 들면 북미 등에 있는 많은 원주민족은 특정 정치이론으로서의 아나키즘이 존재하기 수천 년 전부터 아나키즘을 실천해 왔다. 마찬가지로 아나키즘적인 여러 경향과 조직은 모든 대혁명에 존재하고 있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미국 혁명 중의 뉴잉글랜드 지방의 타운미팅Town Meetings, 프랑스 혁명의 파리 「지구Sections」, 러시아 혁명의 노동자 평의회the workers councils와 공장위원회factory committees가 그것이다[자세한 것은 머레이 북친 저, The Third Revolution을 참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아나키즘이 권위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권위를 가진 사회는 어떠한 것이든 권위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켜, 여러 가지 아나키즘적 경향을 만들어 내는(그리고 물론, 권위가 없는 사회는 아나키즘적일 수밖에 없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나키즘은 억압과 착취에 대한 투쟁의 표현이며, 현행 시스템의 잘못에 관한 노동자의 경험과 분석의 일반화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의 표현인 것이다. 이 투쟁은 그것이 아나키즘이라고 불리게 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역사적인 아나키즘 운동(즉, 자신들의 사상을 아나키즘이라고 부르고 아나키즘 사회를 향하는 그룹)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와 국가에 반대하고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으로 구성된 자유사회를 추구하는 노동자 계급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
|
|
|
|
|
|
|
 |
A.1-4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인가? |
|
|
 |
A.1-4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인가?
그렇다. 어떤 종류의 아나키즘이라도 모든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자본주의가 「지배와 착취」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섹션 B, C참조] 「인간은 생산물의 이익을 가로채는 노예주가 없으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아나키스트는 반대한다. 아나키스트 사회에서는 「실제의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규율을 갖고, 사물은 언제?어디서?어떻게 되어야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서의 혹심한 노예상태」로 부터 해방되는 것이다[Voltairine de Cleyre, 「Anarchism」, pp.30-31, Man!, M.Graham(Ed), p.32, p.34].
(여기서 강조해야 하겠지만, 아나키스트는 봉건주의, 소비에트형 「사회주의」 -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러야 좋겠지만 - , 노예제도라는 지배와 착취에 기반을 둔 모든 경제형태에 반대한다. 여기서 자본주의에 집중해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루동, 바쿠닌 등과 같은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벤자민 터커Benjamin Tucker와 같은 개인주의자들도 자신들은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크로포트킨은 고전적 에세이 『현대과학과 아나키즘Modern Science and Anarchism』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폭넓고 포괄적인 그리고 진정한 의미 ?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폐기하는 시도로서 - 로 이해되었을 때 아나키스트는 그 시대의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맞잡고 행진했었다」 [Evolution and Environment, p. 81]. 터커의 말을 인용하면 「사회주의의 근저에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소유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두 가지 사회주의 학파, 국가사회주의도 아나키즘도」모두 이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The Anarchist Reader, p. 144].
즉,「사회주의자」라는 용어의 원래의 의미에는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의 것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Lance Klafta, 「Ayn Rand and the Perversion of Libertarianism」, in Anarchy: A Journal of Desire Armed, no. 34]. 착취(와 고리대금)에 대한 반대는 진정한 아나키스트라면 모두 공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노동의 과실을 확실히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노동의 수단을 소유하는 것이다」[Peter Kropotkin, The Conquest of Bread, p. 145]. 이런 이유에서 예를 들면 프루동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협동조합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업의 소유물을 전면적으로 공유한다」. 왜냐하면「경영에 참여함」으로서 「집단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즉, 잉여)이 소수 경영자의 이익의 원천이 되지 않게 된다. 모든 노동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The 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 p. 222 and p. 223].
즉, 참된 사회주의자는 자본에 의한 노동착취의 종결을 희망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관리하는(강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와 다른 사회주의 집단 사이에는 생산자가 이것을 행하는 수단에 대해 견해가 다르지만 이것은 공통의 바램인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관리는 노동자가 직접 실시하고, 소유는 노동자 협회나 코뮌 어느 쪽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아나키즘 종류에 대해서는 섹션 A.3을 참조).
그 이상으로 아나키스트는 자본주의를 착취적임과 동시에 권위주의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는 생산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통치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들의 노동의 산물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만인에게 평등한 자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비착취적이 될 가능성도 없다. 그러므로 아나키스트는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프루동(터커와 바쿠닌을 자극했다)의 저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저작에서 그는 아나키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나키즘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자본주의와 소유Proprietary에 의한 착취가 끝나고, 임금 시스템이 폐지된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소유자 ? 자본가 ? 흥행주에게 단순하게 고용되던가, 참가하던가 그 어느 쪽일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노동자는 예속되고 착취된다. 복종적인 사회지위가 변하는 일은 없다. 두 번째 경우 노동자는 인간?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존엄을 회복하고 생산조직을 결성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이전에는 노예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었다. 주저하면 안 된다. 우리들에게 선택지 따위는 없다. 노동자끼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노동자는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관계가 계속되며, 주인과 임금노동자라는 두 가지 카스트를 보증하게 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런 카스트는 불쾌한 것이다」[전게서 p. 233, pp. 215-216].
따라서 아나키스트는 모두 반자본주의자들이다. (「노동이 만들어 내는 부를 노동이 소유한다면 자본주의는 없어질 것이다」 [Alexander Berkman, What is Communist Anarchism?, p. 37]). 예를 들면 가장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나키스트 벤자민 터커는 자기의 사상을 「아나키스틱 사회주의Anarchistic Socialism」라 부르며, 자본주의를 「고리대금업자?이자?임대수익?이윤의 수령인」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아닌 자유시장 아나키즘 사회에서는「노동이 자연스런 임금과 모든 생산물을 획득하기 때문에」자본가는 불필요한 잉여자가 된다고 터커는 생각했다[The Individualist Anarchists, p. 82 and p. 85]. 그 경제는 소비조합?기능공?농민들 사이의 생산물의 자유교환과 인간 상호은행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에고이스트의 일인자인 막스 스티르너Max Stirner조차 자본주의와 그 「유령Spooks」을 경멸하고 있다. 스티르너는 말하기를 사유재산?
경쟁?노동의 분업 등의 관념은 신성한 것이라 숭배 받는 유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아나키스트는 자신들을 어느 특정한 사회주의자,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인 조셉 A 라바디Joseph A. Labadi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터커와 바쿠닌도 거듭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나키즘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Voluntary Socialism인 것이다. 사회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다. 강권적archistic사회주의와 무강권적anarchistic사회주의, 권력주의적 사회주의와 리버타리안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와 자유스러운 사회주의다. 어떤 사회개량의 제안도 개인에 대한 압력과 외부의지의 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한다. 증가시키는 것이 강권적archistic, 감소시키는 것이 무강권적anarchistic인 것이다. [Anarchism: What It Is and What It Is Not]
라바디는 몇 번씩이나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모든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이지만 모든 사회주의자가 아나키스트는 아니다」. 따라서 다니엘 게렝Daniel Gueri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실제로 사회주의와 동의어다. 아나키스트는 우선 첫 번째로 사회주의자이며 그 목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기하는 것이다」[Anarchism, p. 12]. 이런 코멘트는 사회파나 개인주의파나 아나키즘 운동사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어왔다. 실제로 헤이마켓Haymarket의 희생자인 아돌프 피셔Adolph Fischer 역시 라바디와 거의 같은 용어를 사용해 같은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모든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이지만, 모든 사회주의자는 반드시 아나키스트는 아니다」. 동시에 아나키즘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운동은 「두 개의 파벌로 나누어져있다. 공산주의 아나키스트communistic anarchists와 프루동이나 중산계급의 아나키스트middle-class anarchists다」[The Autobiographies of the Haymarket Martyrs, p. 81].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사이에는 많은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유시장free market이 자유lieberty를 최대로 하는 최고의 수단인가 아닌가, 등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 아나키스트의 사회는 임금노동이 아닌 협동노동에 기초해야 한다는 등의 두 가지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협동노동만이 노동시간 중에서 개인에 대한 압력이나 외부의지의 힘을 줄일 수 있다. 그 같은 노동의 자주관리야 말로 참된 사회주의의 이상의 모습인 것이다. 이런 관점은 조셉 라바디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조직을 구성함으로서 자유를 획득하는 좋은 예다」. 그리고 「조합이 없이는 노동자는 조합이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고용주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이다」[Different Phases of the Labour Question].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용어는 변화해 버렸다. 오늘날에는 「사회주의」라고 하면, 자유와 「본래의 사회주의의 이상」을 부정하는 국가의 사회주의state socialism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말은, 아나키스트라면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만약, 좌익이 볼셰비키Bolsheviki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나는 좌익과는 단호하게 결별할 것이다. 레닌Lenin은 사회주의 최대의 적의 한 명인 것이다. [Marxism, Anarchism, and Alternative Futures, p. 779]
아나키즘은 마르크스주의?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레닌주의에 줄곳 반대해 왔다. 레닌이 권력을 잡기 훨씬 이전에 바쿠닌은 「붉은 관료정치」의 위험에 대해 마르크스의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만약 마르크스의 국가적 사회주의 사상이 실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전제 정부 가운데 최악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아나키스트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자이므로, 마르크스주의와 몇 가지 공통의 생각을 갖고 있다. (레닌주의와 공통된 점은 전혀 없다). 바쿠닌과 터커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비판과?노동가치설을 인정하고 있다. (섹션C 참조) 마르크스 자신은 막스 스티르너의 저작 『유일자와 그 소유The Ego and Its Own』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마르크스가 「조잡」한 공산주의라고 불렀던 것과, 국가의 사회주의에 대한 훌륭한 비판이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운동 속에도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견해(그 중에서도 특히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한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안톤 안톤 판네쾨크Anton Pannekoek, 로자 룩셈부르그Rosa Luxembourg, 폴 매틱Paul Mattick 등과 같은 사람들은 레닌과는 완전히 이질적이다. 칼 코르슈Karl Korsch 등은 공감을 갖고 스페인의 아나키즘 혁명에 관해 쓰고 있다. 마르크스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속된 연관성이 있지만 또한 마르크스 보다 더 리버타리안적인 마르크스주의자에 대한 연속적인 연관성 역시 있다. 이러한 리버타리안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레닌과 볼셰비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그 사상은 평등자의 자유연합을 추구한 아나키즘의 목표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아 온 것처럼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주의」(즉 국가통제의 사회주의)와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회주의인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용어와 관련시키고 있는 「계획경제」대신에 개인?노동현장?공동체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제창하고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인 「국가」사회주의에 반대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임금 수급자가 되며, 국가만이 임금 지불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Benjamin Tucker, The Individualist Anarchists, p. 81].
따라서 아나키스트는 「거대한 사회당 내의 사회민주주의 당파가 현재 사회주의를 자본가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환원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Peter Kropotkin, The Great French Revolution, p. 31]. 마르크즈주의가 「중앙지령형 경제」?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반론은 섹터 H에서 자세히 논한다.
국가사회주의와의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자신을 단순히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나키스트가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위 「리버타리안」우익의 출현과 함께, 자본주의 찬동가 중에 자기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이 점을 자세하게 논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아나키즘은 반자본주의 즉 사회주의인 것으로, 이것은 모든 아나키스트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두고 싶다. (어째서 「아나르코」캐피털리즘anarcho-capitalism이 아나키즘이 아닌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섹션 F에서 다룬다.)
|
|
|
|
|
|
|
|
 |
A.1-3 아나키즘은 왜 리버타리안 사회주의 라고도 하는가? |
|
|
 |
A.1-3 아나키즘은 왜 리버타리안 사회주의 라고도 하는가
「아나키즘」이라는 용어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아나키스트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 왔다. 가장 자주 쓰인 것이 「자유 사회주의free socialism」 「자유 공산주의free communism」 「리버타리안 사회주의libertarian socialism」 「리버타리안 공산주의libertarian communism」였다. 아나키즘과 「리버타리안 사회주의」, 「리버타리안 공산주의」는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사실상 같은 의미다.
『아메리카 헤리테지 사전American Heritage Dictionary』을 인용해 보자.
리버타리안LIBERTARIAN :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믿는 사람,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사회주의SOCIALISM : 생산자가 정치권력과 생산·유통수단 양쪽 모두를 소유하는 사회 시스템.
위의 두 가지 정의를 하나로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리버타리안 사회주의LIBERTARIAN SOCIALISM : 사고와 행동의 자유?자유의지를 믿으며 생산자가 정치권력과 생산?유통수단의 양쪽 모두를 소유하는 사회 시스템
(사전은 정치사상에는 무지하다는 평소의 코멘트를 덧붙여야겠지만, 여기서는 「리버타리안」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주의」는 국가소유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다른 사전에서는 다른 정의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특히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한 정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익한 논의를 벌리고 싶지 않다.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하라)
그런데 미국에서 「리버타리안당」이 만들어진 이래 「리버타리안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모순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많은 리버타리안 당원은 아나키스트는 「리버타리안 사상」에 「사회주의」라는 「반리버타리안」사상을 연결시켜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아나키스트가 「정당한 소유자」에서 「리버타리안」의 간판을 훔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것만큼 사실에서 동떨어진 트집은 없다. 아나키스트는 스스로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1850년대부터 「리버타리안」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858년부터 1861년까지 혁명적 아나키스트인 조셉 데자크Joseph Dejacque는 뉴욕에서 「르 리베텔, 사회운동 저널Le Libertaire Journal du Mouvement social」을 발행했으며, 다른 한편 「리버타리안 공산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1880년 11월에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회의가 이 용어를 채택했을 때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Max Nettlau, A Short History of Anarchism, p.75, p.145].
「리버타리안」이라는 용어가 더욱 자주 사용하게 된 것은, 반아나키스트 법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고 「아나키」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1890년대의 프랑스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895년에 세바스찬 포레Sebastien Faure와 루이즈 미셀Louise Michel은 프랑스에서 『르 리베텔Le Libertaire-The Libertarian』지를 발간했다). 그 이후 특히 미국 이외에서는 리버타리안은 아나키스트의 사상이나 행동과 항상 연계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최근의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1954년 7월에 아나르코 생디칼리즘(급진적 노동조합주의)을 견지하는 리버타리안 연맹이 결성되어 1965년까지 존속되었다. 그것에 대해 「리버타리안」당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였으며 그것은 아나키스트가 자신의 정치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나서 100년 이상 지난(「리버타리안 공산주의」가 채용되고 나서 90년 후) 후 이다. 용어를 「훔친」 것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그쪽의 당이다. 다음 섹션B에서 (리버타리안 당이 희구하고 있는) 「리버타리안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섹션 I에서는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의 소유 시스템만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겠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사회주의」라고 불리고 있는 국가소유는 아나키스트로서 말하자면 사회주의도 아무것도 아니다. 섹션 H에서는 국가의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한 변종으로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조금도 품고 있지 않은 대용품이라는 점을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리버타리안」이라는 말이 아나키즘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사상과 공유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이데올로기에 이 용어를 도둑맞고 기뻐하는 아나키스트는 거의 없다. 미국에서는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이 말하고 있듯이, 「『리버타리안』이라고 하는 용어 그 자체는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순전한 자본주의』나 『자유무역』과, 전투적 운동을 수반하는 반권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외관상으로는 함께 보고 있는 것이다. 리버타리안 운동이 이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19세기의 아나키즘 운동에서 훔친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반권력주의자에 의해 재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반권력주의자는, 돈벌이주의와 자유를 동일시하고 있는 개인적 이기주의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들 전체를 대변하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아나키스트는 자유시장 우익 「으로 변질당한 전통을 실제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The Modern Crisis, pp. 154-5]. 그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사상을 리버타리안 사회주의라고 계속 부르는 것이다.
|
|
|
|
|
|
|
|
 |
A.1-2 「아나키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
 |
A.1-2 「아나키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로포트킨을 인용하면 아나키즘이란 「정부가 없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다[Kropotokin's Revolutionary Pamphlets, p.46]. 바꿔 말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의 폐지, 즉, 사유재산(즉 자본주의)과 정부의 폐지다」[Errico Malatesta, 「Towards Anarchism」, p.75].
따라서 아나키즘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히에라르키가 없는 사회의 창조를 지향하는 정치사상이다. 지배자가 없는 「아나키」는 실현 가능하며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사회의 평등」을 최대로 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목적은 「서로 자립하는 것」이라고 아나키스트는 생각하고 있다. 또한 바쿠닌의 유명한 금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회주의가 없는 자유는 특권과 불공정이다. 또,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는 노예제도와 폭정이다. [The Political Philosophy of Bakunin, p.269]
인류 사회의 역사가 이 점에 대해 증명하고 있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강한 자만의 자유이며 자유가 없는 평등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구실 이외 그 무엇도 아니다.
한마디로 아나키즘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개인주의적 아나키즘에서 공산주의적 아나키즘까지, 섹션 A.3에 상술), 그 핵심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부에 대한 반대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그것이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벤저민 터커는 말한다. 아나키스트는 「국가의 폐지와 부당한 이득의 폐지를 주장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중지되어야 한다」[Eunice Schuster, Native American Anarchism, p.140에서 인용]. 모든 아나키스트는 이윤?이자?지대와 집세를 부당한 이득(즉 착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부나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 반대하고 있다.
L 수잔 브라운L. Susan Brown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 안에 있는 연대의 정신은 히에라르키와 지배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며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The Politics of Individualism, p.108]. 국가나 자본가의 권력에 복종 당하는 상황에서는 인간은 결코 자유로워 질 수 없다고 아나키스트는 생각하는 것이다.
볼테린 드 클라이어Voltairine de Cleyre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다음과 같은 사회의 가능성을 가르쳐 준다. 생활필수품이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정신과 육체의 완전한 발달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다. 현재는 부의 생산과 분배의 조직이 불평등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파괴되어야 하며 개개인에게 노동의 자유가 보증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노동의 자유란, 노동산물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주인을 가장 먼저 찾는 자유 따위가 아니다. 노동의 자유란 생산자원과 생산수단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맹목적 복종을 중지하고 불만을 말하자. 무의식적인 불만을 중지하고 의식적으로 불만을 갖자. 아나키즘은 억압의 의식을 일깨워 보다 좋은 사회를 향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해서 끝없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감각을 분기시키려 하는 것이다.[Anarchy! An Anthology of Emma Goldman's Mother Earth, pp. 23-4]
따라서 아나키즘은 아나키, 즉 「지배자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 사회의 건설을 제창하는 정치사상이다. 그 때문에 「사회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토지?자본?기계의 사적소유 시대는 끝났다. 사적소유는 사라져야 할 운명에 있다. 생산에 필요한 수단은 사회의 공유재산이며 생산자의 손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사회의 정치조직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다. 사회의 최종목적은 정부의 기능을 제로로 까지 가는 것, 즉 정부가 없는 사회, 아나키로 까지 가는 것이다」 [Peter Kropotokin, 전게서, p. 46].
따라서 아나키즘은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사회제도를 분석?비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의 비전, 현재의 사회가 부정하고 있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증하는 사회비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욕구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liberty?평등equality?연대solidarity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섹션2에서 논하기로 한다.
아나키즘은 비판적인 분석을 희망으로 이어준다. 바쿠닌은 「파괴로의 정열은 창조를 향한 정열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사회의 나쁜 점을 이해하지 않고는 보다 좋은 사회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
|
|
|
|
|
|
|
 |
A.1-1 「아나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
 |
A.1-1 「아나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나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not」이나 「without」을 의미하는 접두사 「a」와 「지배자」「지도자」「우두머리」「책임자」「지휘관」을 의미하는 「archos」를 합친 말이다. 표토르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는 「권력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Kropotkin's Revolutionary Pamphlets, p. 284]
그리스어로 anarchos 와 anarchia는 「정부를 갖지 않는 것」 또는 「정부가 없는 상태」로 알려져 왔다. 잘 알겠지만 아나키즘의 엄밀한 원래의 의미는 단순히 「정부가 없다」는 것만은 아니다. 「An-archy」는 「지배자의 부재」 좀 더 일반적으로는 「권력의 부재」라는 의미이며 이런 의미에서 아나키스트들은 이 말을 계속 사용해 왔다.
예를 들면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즘을 「자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권력의 기반인 법률·권력·국가를 공격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전게서 p.150]. 아나키스트들에게 있어서 아나키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같은 「질서의 부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다[Benjamin Tucker, Instead of a Book, p. 13]. 따라서 데이빗 위크David Weick는 다음과 같이 멋지게 요약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모든 권력·군주·지배 그리고 히에라르키를 부정하고 그것들을 소멸하고자 하는 사회·정치사상을 정리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나키스트의 비판은 분명히 정부(국가)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되지만 단순한 반국가주의는 아닌 것이다. [Reinventing Anarchy, p. 139]
따라서 아나키즘은 단순한 반정부나 반국가 운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주로 히에라르키에 반대하는 운동인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히에라르키가 권력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히에라르키의 최고형태이므로 아나키스트가 반국가인 것은 당연하지만 반국가만으로는 아나키즘의 정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진정한 아나키스트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히에라르키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브라이언 모리스Brian Morris의 말을 인용해보자.
아나키라는 용어는 그리스에서 유래하며 본질적으로는 「지배자가 없는」것을 의미한다. 아나키스트들은 모든 정부형태나 강제적인 권력, 모든 히에라르키와 지배형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멕시코의 아나키스트 프로레스 마곤Flores Magon이 말한 국가? 자본?교회의 「사악한 삼위일체」라 불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나키스트는 자본주의와 국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종교권력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는 동시에 다양한 수단을 통한 아나키의 상황을 확립하거나 유도하려 하고 있다. 아나키 상태란 억압적인 모든 제도가 없는 분권형 사회, 자발적 결합의 연합을 통해 조직된 사회인 것이다. [“Anthropology and Anarchism” Anarchy: A Journal of Desire Armed, no. 45, p. 38]
이런 맥락에서 「히에라르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최근의 경향이다.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등과 같은 고전적 아나키스트들은 이런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개 「권력Authority」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는 「권력주의·권위주의Authoritarian」를 단축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히에라르키에 반대하고 힘의 불평등이나 개인의 특권에 반대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쓴 것을 읽어보면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바쿠닌은 이에 대해, 「공公」권력을 공격하고, 「자연스러운 영향」을 옹호 했을 때에도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동료를 억압할 수 없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 누구도 권력power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Maximoff, G.P.,ed.,The Political Philosophy of Bakunin: Scientific Anarchism, p.271]
제프 드라한Jeff Draugh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반히에라르키라는 광범위한 개념은 지금까지 혁명운동에서는 겉으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 비로소 자세히 연구되어 쓰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어 「아나키」의 어원에서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Between Anarchism and Libertarianism: Defining a New Movement]
아나키스트는 히에라르키에 반대하는 것으로 국가나 정부만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은 강조하고 싶다. 히에라르키에는 정치적 관계만이 아니라 권력적인 경제관계나 사회관계, 특히 사유재산과 임금노동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프루동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자본은 정치분야에서의 정부와 비슷하다. 자본주의 경제사상, 정부와 권력의 정책, 교회의 신학사상은 완전히 동일한 사상이며 여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 중 하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 모두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자본이 노동에 대해 저지르는 것, 국가가 자유에 대해 저지르는 것, 종교가 영혼에 대해 저지르는 것, 이 절대주의의 삼위일체는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유해하다. 민중을 억압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민중의 육체?의사?이성을 동시에 노예화하는 것이다」[Max Nettlau에 의한 인용, A Short History of Anarchism, pp. 43-44]. 엠마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인간의 의사와 판단은 주인의 의사에 종속한다」는 의미인 것이다[Red Emma Speaks, p. 36]. 40년 전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임금과의 교환으로 자본가에게 「노동자는 자신의 인격과 자유를 일정시간 매각하고 있다」[전게서 p.187].
따라서 「아나키」는 단순한 「무정부」 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권력적 조직이나 히에라르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포트킨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에서 아나키즘의 기원은 히에라르키 조직과 권위주의적 사회개념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류의 진보운동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경향들에 대한 분석(에 있다)」[Kropotokin's Revolutionary Pamphlets, p.158]. 마라테스타Malatesta에게 있어서 아나키즘은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도덕적 반항 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사회적 병리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재산과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국가와 재산 모두를 전복하려 했을」때, 「아나키즘은 그 순간에 생겨난 것이다」[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 p. 19].
즉, 아나키가 단순하게 반국가라는 주장은 이 용어를, 그리고 아나키즘 운동이 이 용어를 사용해 온 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이언 모리스Brian Morri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전적 아나키스트의 저작을 음미하면 완전히 명백해 지는 것이지만, 이(단순히 국가에 반대한다는 것이라는)한정된 비전vision 등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아나키즘은 모든 형태의 권력?착취에 항상 도전하고 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이었던 것이다.[전게서 p.40]
아나키는 카오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나키스트는 카오스나 무질서를 희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해 말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권력으로부터 지워진 무질서가 아니라 보텀업bottom up에 의한 질서를 찾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A.1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
|
|
 |
A.1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아나키즘이란 아나키, 즉 「지배자나 군주가 없는 상태」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정치사상이다. [P-J Proudhon, What is Property, p.264]
바꿔 말하면, 「개인이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협력하는 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정치사상이다. 아나키즘은 국가에 의한 지배나 자본가에 의한 지배나 모든 형태의 히에라르키 지배에 반대한다. 그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개성에 있어서도 유해한 것이다. 아나키스트 수잔 브라운L. Susan Brown에 의하면
아나키즘은 일반적으로는 「폭력적인 반국가 운동」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아나키즘은 단순한 「정부권력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를 넘어선 미묘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아나키스트는 「사회에는 권력이나 지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반대인 것이다. 그 대신에 협동적이고 반히에라르키적인 사회·경제·정치의 조직 형태를 제창하는 것이다.[The Politics of Individualism, p106]
그러나 「아나키즘」이나 「아나키」가 가장 오해 받고 있는 정치사상인 점은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는 카오스chaos나 무질서without order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당연히 아나키스트 역시 카오스나 「약육강식의 법칙」으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의 과정은 역사적으로도 그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 의한 지배(전제 지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시대나 국가가 있었다. 거기에서는 「공화주의」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확실히 「아나키」와 마찬가지로 「무질서」나 「혼란」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기득권이 있어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현재의 시스템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나아질게 없다. 새로운 사회의 형태란 카오스로 되게 되어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거기에 대해 엔리코 마라테스타Errico Malatesta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정부의 지배는 필요하며 무정부상태는 무질서와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으므로 무정부를 의미하는 아나키가 무질서로 들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Anarchy, p12]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에 대한 이런 상식을 바꾸고 싶어 한다. 사람들에게, 정부나 또는 다른 히에라르키적인 사회관계가 유해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생각을 바꾸자. 정부의 통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유해하다는 것, 아나키라는 말은 무정부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치있는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자. 그것은 자연스러운 질서, 개인의 필요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의 일치, 완전한 단결 속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전게서, pp12-13]
이 FAQ는, 아나키의 의미와 아나키즘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프로세스의 일부인 것이다. |
|
|
|
|
|
|
|
 |
목 차 |
|
|
 |
|
A. |
1 |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
········· |
|
|
1 |
「아나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
|
|
2 |
「아나키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
|
|
3 |
아나키즘은 왜 리버타리안 사회주의라고도 하는가 |
····· |
|
|
4 |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인가 |
········· |
|
|
5 |
아나키즘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
········· |
|
A. |
2 |
아나키즘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
········· |
|
|
1 |
아나키즘의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
········· |
|
|
2 |
왜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강조하는가 |
········· |
|
|
3 |
아나키스트는 조직을 용인하는가 |
········· |
|
|
4 |
아나키스트는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 하는가 |
········· |
|
|
5 |
왜 아나키스트는 평등을 지지하는가 |
········· |
|
|
6 |
왜 아나키스트에게 연대가 중요한가 |
········· |
|
|
7 |
왜 아나키스트는 자기해방을 주장하는가 |
········· |
|
|
8 |
히에라르키에 반대하지 않아도 아나키스트가
될 수 있는가 |
········· |
|
|
9 |
아나키스트는 어떤 사회를 원하고 있는가 |
········· |
|
|
10 |
히에라르키의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이룰 것인가 |
········· |
|
|
11 |
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
········· |
|
|
12 |
합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
········· |
|
|
13 |
아나키스트는 개인주의인가, 아니면 집단주의인가 |
····· |
|
|
14 |
왜 임의주의는 불충분한가 |
········· |
|
|
15 |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어떤가 |
········· |
|
|
16 |
아나키즘에는 「완전한」인간이 필요한가. |
········· |
|
|
17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사회를 만드는데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
········ |
|
|
18 |
아나키스트는 테러리즘을 지지하는가 |
········· |
|
|
19 |
아나키스트의 윤리관은 어떠한 것인가 |
········· |
|
|
20 |
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무신론자인가 |
········· |
|
A. |
3 |
아나키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 |
|
|
1 |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와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
········· |
|
|
2 |
사회적 아나키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
········· |
|
|
3 |
녹색 아나키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 |
|
|
4 |
아나키즘은 평화주의인가 |
········· |
|
|
5 |
아나르카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
········· |
|
|
6 |
문화적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
········· |
|
|
7 |
종교적 아나키스트는 있는가 |
········· |
|
|
8 |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
········· |
|
|
9 |
아나르코 윈시주의란 무엇인가 |
········· |
|
A. |
4 |
아나키즘의 주요 사상가는 누구인가 |
········· |
|
|
1 |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상가가 있는가 |
········· |
|
|
2 |
아나키즘에 가까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있는가 |
········· |
|
|
3 |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회주의 사상가는 있는가 |
········· |
|
|
4 |
아나키즘에 가까운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이 있는가 |
···· |
|
A. |
5 |
「아나키 행동」의 실례는 무엇인가 |
········· |
|
|
1 |
파리 코뮌 |
········· |
|
|
2 |
헤이마켓의 희생자 |
········· |
|
|
3 |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구축 |
········· |
|
|
4 |
러시아 혁명의 아나키스트들 |
········· |
|
|
5 |
이탈리아 공장 점거운동에서의 아나키즘 |
········· |
|
|
6 |
아나키즘과 스페인 혁명 |
········· |
|
|
7 |
1968년 프랑스에서의 5월∼6월 반란 |
········· |
|
부록 |
아나키의 상징 |
········· |
|
|
1 |
흑기의 역사 |
········· |
|
|
2 |
왜 적흑기인가 |
········· |
|
|
3 |
서클 A의 기원 |
········· | |
|
|
|
|
|
|
|
 |
역자 해설 |
|
|
 |
역자 해설
번역: 김창덕
본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An Anarchist FAQ』(Version 15.4) 중 섹션 A: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What is Anarchism」와 부록 「아나키의 상징The Symbols of Anarchy」을 번역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 중이며 원문은 http://anarchism.pageabode.com/afaq/index.html에서 읽으 수 있다. 또한 번역의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일본의 번역 사이트 http://www.ne.jp/asahi/anarchy/anarchy/faq/에서 많은 부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전체 원문은 섹션A에서 섹션J까지이며 부록으로 「아나키의 상징」을 소개하고 있다. 전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섹션A :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섹션B : 왜 아나키스트는 오늘날의 사회 시스템에 반대하는가
섹션C : 자본주의 경제의 신화란 무엇인가
섹션D :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섹션E : 아나키스트는 모든 생태계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섹션F : 「아나르코」캐피탈리즘은 아나키즘의 유형인가
섹션G : 개인주의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적인가
섹션H : 왜 아나키스트는 국가사회주의에 반대 하는가
섹션I : 아나키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섹션J : 아나키스트는 무엇을 하는가
부록 : 아나키의 상징
이처럼 여기서는 아나키즘에 대해 전반적으로 폭 넓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 책에 번역 소개된 부분은 이중에서 일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번역을 끝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소개된 것들이 아나키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주지하다시피 아나키즘은 너무나 광범위하며 때로는 애매한 사상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일정한 틀, 즉 도그마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인간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말살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르크시즘과 같이 권위적인 이데올로기 밑에서 리더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이론화하는 과정이야말로 여기서 소개하는 아나키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나키즘의 기본 전제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와 히에라르키에 대한 저항과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나키즘은 권위에 대한 부정을 통해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 개성들이 혼합된 다양성이야 말로 인류 최대의 가치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를 책으로 엮어 내는 것 자체가 아나키즘이 극도로 경계하는 도그마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따라서 이 책은 아나키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키즘에 대한 여러 생각과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려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아나키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