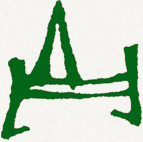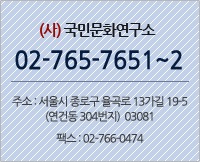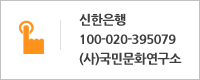|
|
 |
3 서클 A의 기원 |
|
|
 |
3 서클 A의 기원
서클 A는 아나키즘의 상징으로 흑기나 적흑기보다 더 유명하다(아마 그것은 낙서에 잘 쓰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터 마셜에 따르면 「서클 A」는 프루동의 격언 「아나키는 질서다Anarchy is Order」를 뜻한다고 한다[불가능한 요구Demanding the Impossible p. 558]. 피터 피터슨Peter Peterson은 「단결과 의사결정의 상징」이자 「국제 아나키스트 연대라고 하는 명언되어있지 않은 사상을 지원한다」고 덧붙이고 있다[Flag, Torch, and Fist: The Symbols of Anarchism", Freedom, vol. 48, No. 11, pp. 8].
그러나 아나키스트의 상징으로서의 「서클 A」의 기원은 분명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1970년대 펑크 운동punk movement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피터 마셜에 따르면 「1964년에 프랑스의 그룹 Jeunesse Libertaire는 서클 A를 상징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프루동의 슬로건 『Anarchy is Order』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했다. 이것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전게서, p. 445]. 이것은 이 상징을 볼 수 있던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다. 1956년 11월 25일 브뤼셀에서 Alliance Ouvriere Anarchiste(AOA)가 설립되었을 때 이 상징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더 오래된 것도 있다. 스페인 시민전쟁 관련 BBC방송의 다큐멘터리는 아나키스트 의용군 멤버가 분명히 『서클 A』가 뒤에 쓰인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이상은 『서클 A』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오늘날 서클 A는 정치적 상징 전체에서도 가장 성공한 이미지 중 하나다. 그 「훌륭할 정도의 단순함과 솔직함이 1968년 혁명 이후 다시 부활하는 아나키스트 운동의 일반에 받아들여진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다」 [Peter Peterson, 전게서, p. 8]. 그것은 특히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전세계 언어의 대부분에서 아나키라는 단어는 A의 문자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
|
|
|
|
|
|
|
 |
2 왜 적흑기인가 |
|
|
 |
2 왜 적흑기인가
적흑기는 아나키즘과 관련이 있다. 머레이 북친은 이 깃발의 기원을 스페인이라고 한다.
「적기와 함께 흑기가 존재했던 것이 유럽과 북미 아나키스트 시위의 특징이었다. (1910년의) CNT 설립과 함께 검은색과 붉은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돼 하나로 되어있는 깃발이 스페인에서 채용돼 주로 사용됐다」. [The Spanish Anarchists, p. 57]
그러나 적흑기가 다른 나라들, 특히 스페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들(예를 들어 다른 라틴계 국가들)로 퍼져 나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 예를 들어 1920년 공장점거로 정점에 달했던 이탈리아의 「붉은 2년간Two Red Years」[섹션 A.5.5 참조]에서 반란을 일으킨 노동자는 적흑기를 들었다[귄 윌리엄즈Gwyn A.Williams, 프로레타리아 질서Proletarian Order, p. 241]. 마찬가지로 니카라과의 급진적 전국 해방투사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Augusto Cesar Sandino는 멕시코 혁명 중 멕시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의 실례에 자극받아 자신의 운동 깃발을 검붉은 것으로 했다(단, 산디노의 깃발은 대각선이 아니라 가로로 붉은색과 검은색이 구분되어 있었다). 역사가 도널드 C. 호지스Donald Clark Hodges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산디노의 「적흑기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에서 기원했으며 스페인 이민에 의해 멕시코에 도입됐다」. 그의 깃발이 「해방을 요구한 투쟁을 상징하는 노동자의 깃발」이라고 여겨진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호지스는 산디노의 「무정부 공산주의anarcho-communism라는 독특한 브랜드」를 언급하며 이 깃발의 충당은 그의 정책에 강력한 해방적 테마를 제시했다, 고 시사한다)[니카라과 혁명의 지적 기반Intellectual Foundations of the Nicaraguan Revolution, p. 49, p. 137, p. 19].
영어권 세계에서 아나키스트에 의한 적흑기의 사용은 1936년의 스페인혁명과 시민전쟁에서 생겨난 세계적 평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에 퍼진 CNT-FAI 관련 정보와 함께 CNT에 자극받은 적흑기의 숙지도는 전세계에서 공통된 아나키스트,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의 상징이 될 때까지 확산되었다.
적흑기는 아나키즘보다 아나르코 생디칼리즘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앨버트 멜쳐가 말한 것처럼 「노동운동(사회주의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의 깃발은 붉은색이다. 스페인의 CNT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아나키즘+노동운동)의 적흑기를 창조한 것이다」[Anarcho-Quiz Book, p. 50]. 도널드 C. 호지스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멕시코의 세계노동자의 집(멕시코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조합)이 가진 띠에 붉은색 줄무늬는 소유계급에 대한 노동자의 경제투쟁을 의미하며 검은색은 폭동적 투쟁을 의미한다.[Sandino's Communism, p. 22]
조지 우드콕도 적흑기의 스페인 기원설을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깃발은 대각선으로 나눠진 검은색과 붉은색이었다. (제1)인터내셔널 시기에 아나키스트는 다른 사회주의 섹트와 마찬가지로 적기를 들고 있었으나 이후 아나키스트는 흑기를 대신 들게 되었다. 적흑기는 후년의 아나키즘 정신과 인터내셔널의 대중호소를 단결시키려는 시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Anarchism, p. 325f]
그러나 적흑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훨씬 이전의 기록도 있다. 즉 스페인의 아나키스트는 깃발을 발명했다기보다는 재발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77년 4월, 26명의 아나키스트들이 혁명을 기도하기(실패로 끝났지만) 위해 「적흑의 아나키즘 깃발을 돋보이게 보이면서 레티노Letino(이탈리아)의 작은 코뮌에 들어갔다」[T.R. Ravindranathan, Bakunin and the Italians, p. 228]. 조지 우드콕도 같은 사건을 기록해 같은 깃발이 사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Anarchism, p. 285]. 몇 년 뒤 멕시코에서 아나키스트에 의해 적흑기가 사용됐다는 보고도 있다. 1879년 12월 14일 멕시코시티의 콜럼버스 파크의 아나키스트 항의집회에서 「거기에 모인 5천여 명의 사람들은 엄청난 적흑기로 가득 찼다. 그중에는 『La Social, Liga International del Jura』라고 쓰인 것도 있었다. 연사의 무대 앞을 『La Social, Gran Liga International』이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흑기가 뒤덮고 있었다」[참조:John M. Hart, Anarchism and the Mexican Working Class, 1860-1931, p. 58 and p.17].
멕시코와 유럽의 아나키스트 운동의 연결고리는 강했다. 역사가 존 M. 하트John M. Hart가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19세기의 멕시코 도시부 노동운동은, 유럽의 제1 인터내셔널의 노동자 연합의 쥐라 지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고, 어느 단계에서는 공공연하게 그것과 제휴하고 있던 것이었다」[John M. Hart, Anarchism and the Mexican Working Class, 1860-1931, p. 58 and p.17]. 따라서 멕시코와 이탈리아의 운동에서 같은 깃발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닌 것이다. 양쪽 모두 쥐라연합이라는 같은 반권위주의 인터내셔널에 속해 있었고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탈리아, 멕시코 양쪽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제1 인터내셔널과 그 반권위주의적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모두 스위스에서의 쥐라연합과 마찬가지로 노조조직과 파업에 크게 참여하고 있었다. 제1 인터내셔널의 집산주의적 아나키즘(그 가장 유명한 옹호자는 바쿠닌이었다)과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의 분명한 연결과 유사성을 생각하면 이들이 같은 상징을 사용했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생디칼리즘은 인터내셔널의 재생이나 다름없다 - 연합주의, 노동자, 라틴계인 것이다」[마틴 A밀러, Kropotkin, p. 176 인용]. 따라서 상징의 재생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을 것이다.
두 가지 요인이 적기와 흑기의 조합은 논리적 발전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흑기와 적기가 1831년 리옹 봉기와 관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흑기의 발전은 그리 기이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흑기는 「파업의 깃발」이었다(루이즈 미셸에 따르면) - 앞의 섹션 참조 - 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운동의 적기와 함께 흑기가 사용된 것은 아나키즘과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의 경향을 갖고 직접행동을 기반으로 하며 계급투쟁에서의 파업을 중요하다고 여겼던 운동의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보인다.
그러나 1870년대 후기에 적흑기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점차 사용되지 않고 30년 뒤 스페인에서 CNT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다시 넓은 규모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점차로 아나르코 생디칼리즘과의 관계가 적어지면서 많은 비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계 아나키스트들이 적흑기를 기꺼이 사용하게 되었다(예를 들어 많은 무정부 공산주의자들은 적흑기를 사용했다).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보다 더 적흑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보다 자신을 더 넓은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과 동조시키고 싶어했다(적어도 현대에서는)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적흑기는 노동운동에서의 아나키스트의 경험에서 생겨나, 아나르코 생디칼리즘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검은색은 리버타리언 사상과 파업(즉 직접행동)을 의미하고 적색은 노동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적흑기는 표준 아나키스트의 상징이 됐다. 거기서는 검은색은 아나키를 의미하고, 적색은 사회적 협동이나 연대를 의미한다.
즉 적흑기는 다른 단일 상징물 이상으로 아나키즘의 목적(『개인의 해방과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협동』[Peter Kropotkin, Act for Yourselves, p. 102]) 과 수단(『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다수의 노동자는 자신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저항과 파업은 조직이 그것을 행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인 것이다』그리고 『파업은 연대의 감정을 발달시킨다』[캐롤라인 캠Caroline Cahm, 크로포트킨과 혁명적 아나키즘의 발흥Kropotkin and the Rise of Revolutionary Anarchism, 1872-1886, p. 255 and p. 256]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1 흑기의 역사 |
|
|
 |
1 흑기의 역사
아나키스트에 의한 흑기 사용에 관한 설명은 수없이 많다.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러시아 혁명시대의 네스톨 마흐노의 빨치산일 것이다. 흑기 아래, 12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그의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드넓은 지역을 해방시켰고 2년 동안 중앙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유지했다(이 중요한 운동의 자세한 것은, 피터 아시노프Peter Arshinov 저, 『마흐노 비치나 운동사History of the Makhnovist Movement』를 참조). 흑기에는 「죽음의 자유」와 「토지를 농민에게, 공장을 노동자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피터 마셜Peter Marshall 저 『불가능 요구』p.475). 1910년에 멕시코의 혁명가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는 해골·뼈십자가·처녀 마리아가 그려진 흑기를 사용했다 - 거기에는 「땅과 자유Tierray Libertad」라는 슬로건도 쓰여져 있었다. 1925년 일본의 아나키스트는 흑색청년연맹을 만들고, 1945년에 아나키스트연맹이 재편되었을 때 그 잡지의 이름이 흑기黑旗였다[전게서, p.525,526]. 최근에는 파리 학생들이 1968년 대규모 총파업 와중에 흑기(적흑기)를 들었고, 미국의 민주사회를 요구하는 학생조직도 같은 해의 전국대회에서 내걸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잡지 『Black Flag』가 공간公刊을 시작했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 대규모 시위에 가면 거기 있는 아나키스트가 흑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나키스트의 흑기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기원을 갖고 있다. 최초의 기록은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명예는 1871년 파리 코뮌의 유명한 참가자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 아나키스트 역사가 조지 우드콕George Woodcock에 따르면 미셸은 1883년 3월 9일 파리에서 실업자 시위 도중 흑기를 휘날렸다. 총 500여 명과 함께 미셸은 앞장서서 「빵이나 직업을, 그렇지 않으면 탄환을」이라고 외치면서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세 곳의 빵집을 약탈했다[조지 우드콕, 『Anarchism』, p. 251].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적흑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셸에 의한 흑색 사용은 완전히 앞섰던 것이 아니다.
곧이어 흑색 상징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폴 애브리치Paul Avrich는 1884년 11월 27일 흑기는 시카고에서의 아나키스트의 시위에서 볼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애브리치에 의하면 유명한 헤이마켓 희생자 중의 한 사람인 오거스트 스파이즈August Spies는 「(흑기가) 미국 땅에 펼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다음해 1월의 미국의 혁명적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연출 되었다. 「적색과 흑색의 깃발을 사용하는 가두행진과 대규모 야외시위는 선전의 가장 드라마틱한 모습이였다」. 1885년 4월 시카고 시위 행렬에서는 루시 파슨스Lucy Parsons와 리지 홈즈Lizzie Holmes가 시위대를 이끌었는데 각각 적기와 흑기를 들고 있었다[폴 애브리치 저, 헤이마켓의 비극The Haymarket Tragedy, pp.144-145].
더 서글픈 기록이지만 1921년 2월 13일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흑기의 종언으로 특징지어진 날이었다. 이날 표토르 크로포트킨의 장례식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대규모 민중들의 행진이 수 마일에 걸쳐 이어져 「권위가 있는 곳, 자유는 없다」고 쓰인 흑기를 들고 있었다[Paul Avrich, The Russian Anarchists, p. 26]. 흑기가 러시아에 등장한 것은 1905년 체르노에 즈나미아Chernoe Znamia(흑기) 운동의 창립 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크로포트킨의 장례 행진 2주 후에 크론슈타트 수병의 반란이 일어나고, 아나키즘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건은 무척 유명하지만 그것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도 흑기의 진짜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880년대 초기 대부분의 아나키스트 그룹이 흑색과 관계된 명칭을 채용하고 있었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다. 1881년 7월 흑색 인터내셔널이 런던에서 설립됐다. 그 목적은 당시 해산한 제1 인터내셔널의 아나키스트파를 재편성하는 것이었다.[Woodcock, Op. Cit., p. 212.214]
1881년 10월 시카고에서의 회의에서 국제 노동자협회가 북미에 만들어졌다. 이 조직이 흑색 인터내셔널로도 알려져 런던의 조직과 제휴했다[Woodcock, Op. Cit., pp. 212-4 and p. 393]. 이들 두 개의 회의 직후에 미셸의 시위(1883년)와 시카고에서의 흑기(1884년)가 이어진 것이다.
이 상징의 탄생으로 이 시기(1880년대 초)를 더욱 신뢰할 만한 것으로는 단명으로 끝난 프랑스 아나키스트 출판물의 이름 「Le Drapeau Noir=The Black Flag」이다. 로드릭 케드워드Roderick Kedward에 따르면 이 아나키스트 신문은 리옹의 카페에 폭탄이 투척된 1882년 10월 이전의 몇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The Anarchists: the men who shocked an era p. 35]. 머레이 북친은 1884년에 흑기는 「새로운 아나키스트의 상징이었다」[The Haymarket Tragedy, p. 144]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머레이 북친은 1870년 6월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운동을 언급하던 중 「훗날 아나키스트는 흑기를 채용하게 됐다」[Murray Bookchin, The Spanish Anarchists, p. 57] 고 보고했다.
당시 아나키스트는 적기를 즐겨 쓰고 있었다. 흑기가 아나키즘과 연결된 것은 이 시기였다, 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기의 사용이 쉽게 사멸한 것은 아니었다. 크로포트킨의 『반역자의 말Words of a Rebel』(1885년에 출판되었지만 쓰인 것은 1880-1882년이다)에는 「아나키스트 집단은 (중략) 혁명의 적기를 내걸었다」고 적혀 있다. 우드콕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아나키스트는 흑기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 크로포트킨처럼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적기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다」[Words of a Rebel, p. 75 and p. 225]. 나아가 시카고의 아나키스트도 1880년대를 거치면서 흑기와 적기를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루이즈 미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과 흑의 깃발이 성난 바람에 흩날릴 때 우리와 함께 있는 분노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적과 흑의 깃발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케케묵은 잔해 주위에 내걸릴 때 그것은 쓰나미가 되는 것이다!
자유를 의미하는 적기, 그것은 우리의 피로 진홍빛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인들을 떨게 한다. 노동으로 먹고살고 투쟁 속에서 죽고 싶어 하는 이들의 피를 쌓아놓은 흑기는 타인의 노동으로 먹고살려는 녀석들을 떨게 한다. 적과 흑의 깃발이 죽은자를 애도하면서 우리 위로 휘날리고, 새벽이 찾아오는 희망 위에 나부끼는 것이다」[The Red Virgin: Memoirs of Louise Michel, pp. 193-4].
프랑스의 아나키스트는 1885년 루이즈 미셸의 어머니가 죽자 3개의 적기를 들었다. 물론 1905년에 루이즈 자신이 죽었을 때도 그랬었다. [전게서, p.183,201] 즉,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나키스트는 흑기와 적기도 그 상징물로 사용했던 것이다.
적기에서 흑기로의 전반적인 이행은 역사의 맥락에 두어야 한다. 1870년대 후반과 1880년대에는 사회주의 운동은 변화하고 있었다. 각지에서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우월경향이 되면서 리버타리안 사회주의는 감소해 갔다. 거기서 적기는 권위주의, 국권주의적(그리고 점차 개량주의적으로 되었다) 사회주의 운동과 점차 관련하게 된 것이다. 자신을 다른 사회주의자와 구별하기 위해 흑기를 사용한 것은 사리에 맞다. 그것은 노동자계급 반란으로 인정받은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1831년 리옹반란에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북친, 제3혁명, 제2권, p.65]. 러시아 혁명과 그 독재로의 이행(처음에는 레닌 하에서, 다음으로는 스탈린 하로) 후, 적기는 이미 「자유를 의미하고 있지」않고, 공산당이나 기껏해야 관료제도적이고 개량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와 관계하고 있다, 고 해서 아나키스트가 적기를 사용하는 일은 적어졌다. 아나키스트가 그 깃발에서 붉은색을 사용하는 일은 있어도 그것은 검은색과 조합했을 때뿐이다(다음 섹션). 이렇게 해서 아나키스트는 자신을 USSR의 전제정치와 관련짓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이런 관계가 생겼는지 밝혀내는 것은, 왜 정확히 검은색이 선택됐는지를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인다. 확실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 시카고의 「경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흑기는 「굶주림·고뇌·죽음의 공포의 상징이다」[The Haymarket Tragedy, p. 144]. 북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흑기는 「노동자의 분노·고통의 표현으로서 고뇌의 상징이다」. 역사가 브루스 C 넬슨Bruce C. Nelson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흑기는 1884년 시카고에서 펼쳐질 때만 해도 「굶주림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Beyond the Martyrs, p. 141 and p. 150]. 루이즈 미셸은 「흑기는 파업의 깃발이며 굶주린 사람들의 깃발이다」고 했다.
이런 방향에 따라 앨버트 멜쳐Albert Meltzer는 흑기와 노동자의 계급반란과의 관계는 「1831년의 프랑스에서의 실업자 시위(노동이냐 죽음이냐Work or Death)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The Anarcho-Quiz Book, p. 49]. 그리고 실제로 1883년 미셸의 행동이야말로 그 관계를 확고히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프랑스에서의 반란에서 아나키즘으로의 연결은 더욱 강력한 것이다. 머레이 북친이 보고하고 있듯이, 「1831년에 비단직공은 (중략)보다 좋은 관세tarif, 즉 계약을 상인들로부터 얻기 위해 무장투쟁을 개시했다. 단기간에 이들은 적흑기 아래로 도시의 관리를 실제로 빼앗았다. 이 일이 그 폭동을 혁명심볼의 역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사건으로 만든 것이었다.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연합적 사회경향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말 mutuelisme, 역시 그 폭동을 아나키스트 사상사에서 잊지 못할 사건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프루동이 1843년~1844년까지 그 도시에 잠시 머무는 동안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The Third Revolution, vol. 2, p. 157].
크로포트킨 자신도, 이 말은 봉기 후에도 프랑스 노동운동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파리 노동자는 「(1848년) 6월에 「빵이나 노동을」이라는 흑기를 들고 있었다」고 했다[Act for Yourselves, p. 100].
따라서 아나키스트에 의한 흑기의 사용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의 노동운동에서 자신들의 뿌리와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1880년대 아나키스트 운동에 의해 흑기를 아나키스트가 채용한 것은 『기아·빈곤·절망의 전통적 상징』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복종도 하지 않는다·구걸도 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유럽에서의 민중봉기에서 내세워』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Walter and Becker, Act for Yourselves, p. 128].
이는 아나키스트 정책의 성질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나키스트는 그 사상이 현실의 노동자계급 실천을 기반으로 하듯 그 상징도 실천을 통해 창조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면, 프루동은 『상호주의』라는 말을 급진적 노동자로부터 따왔듯이 협동조합적 『노동연합』은 「자발적으로, 타자로부터의 격려나 자본도 없이 파리와 리옹에서 형성되었다. (중략) 그 (상호주의, 신용과 노동조직의) 증명은 (중략) 현재의 실천에, 혁명적 실천에 존재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의 사상을 노동자 계급의 자주활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No Gods, No Masters, vol. 1, pp. 59-60]. 실제로, 스티븐 빈센트K. Steven Vincent에 의하면, 『프루동의 연합적 이상(중략)과 리옹의 상호주의자의 프로그램에는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상 간에) 현저한 수렴성』이 있고, 『프루동이 자신의 건설적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리옹 실크 노동자의 실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높다. 프루동이 옹호하고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은 이러한 노동자에 의해 어느 정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던 것이다』[Pierre-Joseph Proudhon and the Rise of French Republican Socialism, p. 164]. 사회내부의 여러 경향과 노동자 계급투쟁의 표현인 아나키즘에 관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아나키스트도 있고 (크로포트킨에 대해서는 섹션 J.5를 참조),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자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아나키즘의 측면에 관한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마 흑기가 「파업의 깃발」이었다는 것은 루이즈 미셸의 코멘트일 것이다. 이것이 1881년에 설립된 흑색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그리고 1880년대 초반에 아나키스트 서클에서 흑기의 사용이 증가한 것도) 설명해 줄 것이다. 그 설립회의 때에 크로포트킨은 이 조직은 「파업 참가자의 인터내셔널」(Internationale Greviste)이 된다 - 「저항의, 파업의 조직」이 된다 - 는 생각을 형성하고 있었다[Martin A. Miller, Kropotkin, p. 147에서 인용].
1881년 12월 크로포트킨은 국제노동자연맹을 「파업 참가자의 인터내셔널」로 부활시킬 것을 논의했다. 왜냐하면 「혁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노동자의 대다수는 자신들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저항과 파업은 이를 행하기 위한 탁월한 조직방법이기」 때문이다. 크로포트킨은 「파업은 연대성의 감정을 발달시킨다」그리고 제1 인터내셔널은 「파업에서 태어났다. 본질적으로 파업 참가자의 조직이었던 것이다」고 강조했었다[Caroline Cahm, Kropotkin and the Rise of Revolutionary Anarchism, 1872-1886, p. 255 and p. 256 인용]. 파업 참가자의 인터내셔널은 파업 참가자의 깃발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흑색 인터내셔널이 그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파업 참가자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생각은 흑색 인터내셔널 그 자체처럼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아나키스트는 이 시기에 파업을 장려하고 지원했던 것이었다.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흑색 인터내셔널과 흑기의 사용이 생긴 이유의 일부는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그 논문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이것은 물론, 아나키즘에 의해서 노동자 저항의 상징으로서, 그 저항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흑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완전히 합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검은색은 매우 강력한 칼라, 말하자면 안티칼라이다. 1880년대는 극단적인 아나키스트 활동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흑색 인터내셔널은 아나키스트 강령으로 「행동에 의한 선전」의 도입을 보았다.
역사적으로 검은색은 적기와 마찬가지로 피 - 특히 마른 피 - 와 연관지어졌다(루이즈 미셸이 지적했듯이 1871년에 「리옹Lyon 마르세유Marseille 나르본Narbonne, 모두가 독자적인 코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파리에 있는)만큼 그들 역시 혁명가의 피에 젖어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의 깃발은 붉은 것이다. 깃발을 그 색깔로 더럽힌 사람들이 우리의 적기를 몹시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Louise Michel,p.65] 흑기는 노동자 계급반란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지만, 당시 니힐리즘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1871년의 파리 코뮌 함락 후에, 프랑스 지배계급에 의한 파리 코뮌 지지자의 대규모 살육에 의해 생겨난 니힐리즘이다).
파리 코뮌 지지자를 살육한 것도, 아나키스트의 흑기사용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검은색은 「상복색(적어도 서양문화에서는)으로 죽은 동지를 전쟁터(국가 간의)에서, 길거리 투쟁이나 피켓 라인(계급 간의)에서, 전쟁으로 생명을 빼앗긴 동지의 애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Chico, 「letters」, Freedom, vol. 48, No. 12, p. 10]. 코뮌에서 25,000명이 죽고 그 대부분이 아나키스트나 리버타리언 사회주의자였음을 생각하면, 이 사건 후에 아나키스트가 흑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납득이 간다. 니카라과의 리버타리언 사회주의자 산디노Sandino(그가 적흑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논하겠다)도 검은색은 애도를 의미한다고 했다(「자유의 붉은색, 애도의 검은색, 죽음을 건 투쟁의 해골[Donald C. Hodges, Sandino's Communism, p. 24]).
검은색 사용의 이면에는 철학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아나키스트가 흑기로 기운 또 다른 이유는 「부정」의 상징이라는 그 성질 때문일지도 모른다. 흑기에 관한 저작자의 대부분이 이 측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워드 J. 에를리히Howard J. Ehrlich 검은색은 「부정의 색조이다. 흑기는 모든 깃발의 부정이다」[「Why the Black Flag?」, Howard Ehrlich (ed.), Reinventing Anarchy, Again, pp. 31-2]. 부정의 상징으로서 흑기는 바쿠닌의 사상 중 몇 가지와 잘 일치한다. 특히 진보에 관한 그의 사상과 말이다. 헤겔의 영향을 받은 바쿠닌은, 헤겔의 변증법을 받아 들이기는 했지만, 언제나, 반(反)의 측면이 변증법 속에서의 동기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Robert M. Culter's introduction to The Basic Bakunin for details]. 즉, 바쿠닌은 초기 상태의 부정으로서 진보를 정의하고 있다(예를 들면, 신과 국가에 있어 그는 「모든 발전은, (중략) 출발점의 부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모든 깃발을 부정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고차적인 사회생활 형태로 운동을 의미하고 있는 이 부정 이상으로 아나키스트 운동을 나타내는 더 좋은 표시가 있을까? 즉 흑기는 기존사회의, 기존국가의 모든 부정을 상징하고 있으며, 신사회, 자유사회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흑기 채택의 한 요인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는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흑기와 해적과의 흥미로운 연관성도 있다. 불확실한 보고지만 루이즈 미셸은 1871년 파리 코뮌에서 여성 대군을 이끌면서 해골과 뼈십자를 휘날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연관성에는 더 깊은 가능성이 있다.
해적은 반역자·자유로운 영혼으로 간주되고, 무자비한 살인자로 간주되기도 했다. 각각의 해적은 매우 다른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해적선의 선장을 선출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선장이 남성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선장은 「쉽게 소환되도록」되어 있고 영국, 미국, 프랑스 해군의 선상에서의 생활 - 상업선은 어째든 간에도, - 보다도 해적선에서의 선상생활은 분명히 민주적이었던 것이다.
해적에게 흑기는 죽음의 상징이었다. 흑기 위에 해골과 뼈십자가 있는 필사적인(give-away)존재였다. 「항복이냐, 죽음이냐!」와 같은 의미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 피해자를 싸우지 않고 복종시키기 위해 겁을 주려고 의도했던 것이다. 칭기스칸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도 흑기는 「항복이냐, 죽음이냐!」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남북전쟁 중 콴트릴Quantrill이라는 연합군 사령관은 흑기 아래 싸웠다. 그는 적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고, 반대로 그 역시 어떤 자비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 멕시코의 산타 애너Santa Anna장군은 흑기를 휘날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알라모Alamo에서 그것들을 휘날리기까지 했다. 흑기를 따라 그는 자신의 나팔수에게 「The Deguello」라는 이름의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뜻의 음악이었다. 흑기의 이러한 사용은, 흑색 인터내셔널의 북미 아나키스트가 모방했다. 흑기는 『아나키즘의 서클에서는 죽음·기아·비참의 상징으로 해석되어있었지」만 동시에「보답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어, 1885년 1월 신시내티Cincinnati에서의 노동자 행진에서는 「흑기에 적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말로 나타나 있듯이 노동자 계급의 비타협의 깃발로 더 인정받은 것이다」[Donald C. Hodges, Sandino's Communism, p. 21].
칭기스칸genghis khan, 콴트릴Quantrill, 산타 애너Santa Anna 장군은 아나키즘과의 관계는 조금도 없지만, 한편으로 해적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해적은 반역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국가 없는 반역자, 자신들 가운데서 즉흥적으로 만든 임시변통의 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률 규정에 대한 충성도 지니지 않았던 것이다. 분명히 해적들은 의식적인 아나키스트가 아니었고 야만인과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적이 어떻게 생각되었는가 인 것이다. 해적들의 상징은 반역의 구현이자 무법과 반역의 영혼이었던 것이다. 해적들은 지배층으로부터 혐오되었던 것이다.
굶주림에 실업자가 반란에서 흑기를 들기는 쉬웠을지 모른다. 사실 폭동에서 붉은색과 검은색 옷조각을 구하기는 금방 가능했을 것이다. 이 소재를 얻기는 쉽다. 천 위에 복잡한 상징을 그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폭동에서 내걸린 즉흥적인 반역의 깃발은 단일색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아닌가. 그 결과, 폭동에서의 필연적 임시변통으로 해골과 뼈십자가 없는 흑기가 휘날렸던 것이다.
흑기에 관한 이 의문에 대해 하워드 J. 에를리히는 저서 아나키의 재발견Reinventing Anarchy에서 아나키를 재구축하는 데 뛰어난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상세하게 인용할 만한 것이다.
「왜, 우리의 깃발은 검은색인가? 검은색은 부정의 색조다. 흑기는 모든 깃발의 부정이다. 인간을 인간에게 적대시키고, 전 인류의 단결을 무시하는 국가의 부정이다. 검은색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인간성에 대한 혐오스러운 범죄 전부에 대한 분노와 격노의 감정이다. 정부의 허위·위선·싸구려 속임수에 암시되어있는 인간지성을 향한 공격에 대한 분노와 격노인 것이다. (중략) 검은색은 애도의 색이기도 하다. 국가를 상쇄하는 흑기는 피비린내 나는 국가에 위대한 승리와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의 전쟁으로 숨진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애도하기도 한다. 다른 이들을 살해하고 억압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에서 임금을 강탈(세금을 물리게 되는)당하는 사람들을 애도한다.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권위주의와 히에라르키 시스템 하에서 불구가 된 영혼도 애도한다. 세계를 비춰볼 기회도 없이 빛을 잃어버린 수백만의 뇌세포를 애도한다. 검은색은 위로할 수 없는 비탄의 색인 것이다.
「그렇지만 검은색은 동시에 아름답다. 검은색은 의사결정의, 해결의, 힘의 색이다. 이 색깔 덕분에 다른 색깔은 명료해지고 정의되는 것이다. 검은색은 발전의, 비옥하고 신비로운 환경인 것이며, 어둠 속에서 진화하고 재생하며 회복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땅속에 숨어있는 종자, 정자의 기묘한 여행, 자궁에서 태아의 숨은 성장, 이 모든 것을 흑색성이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검은색은 부정이며 분노이며, 격정이며, 애도이며, 미美이며, 희망이며, 이 지구상의, 그리고 이 지구와 함께 있는 인간생활과 인간관계의 새로운 형태를 길러내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흑기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흑기를 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내걸어야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런 상징이 불필요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Why the Black Flag?』, Howard Ehrlich (ed.), Reinventing Anarchy, Again, pp. 31-2].
|
|
|
|
|
|
|
|
 |
부록: 아나키의 상징 The Symbols of Anarchy |
|
|
 |
부록: 아나키의 상징
The Symbols of Anarchy
1 흑기의 역사
2 왜 적흑기인가
3 서클 A의 기원
아나키즘은 광범위하고 때로는 애매한 정치정강에 대해 항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논증은 깊다. 청사진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엄격한 도그마를 만들게 되며 창조적인 반역혼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같은 방향에 따라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는 다른 여러 좌익정치집단에서 볼 수 있는 「규율 바른」 리더십도 거부해 왔다. 이 논리도 중요하다. 권위에 바탕을 둔 리더십은 내재적으로 히에라르키적이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는 고정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꺼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상징과 우상의 중요성도 꺼리고 싫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아나키스트 상징의 기원이 종잡을 수 없고,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한편, 실제로는 아나키스트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반역에 있어 기호상징을 사용해 오고 있다. 상징에는 흑기뿐 아니라 서클 A와 적흑기도 있다. 서클 A는 전세계에서 벽이나 교각에 낙서돼 있다. 펑크스는 재킷에 서클 A를 쓰거나, 반건조된 시멘트에 서클 A를 휘갈겨 쓰기도하고 있다. 흑기와 적흑기는 국가사회주의 붕괴 후의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부활해 전세계 대부분에서 난무하고 있다.
즉, 아나키스트 운동은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서클 A·흑기·적흑기이다. 여기서는 이런 상징의 역사를 제시하려고 한다. 무척 아이러니컬하지만 원래의 아나키스트 상징의 하나는 적기였다(실제로 아나키스트 역사가 니콜라스 월터Nicolas Walter와 헤이너 베커Heiner Becker가 나타내고 있듯이 「크로포트킨은 항상 적기를 좋아했다」[Peter Kropotkin, Act for Yourselves, p. 128]. 이는 아나키즘이 사회주의 일종이며 일반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생긴 것으로 놀라만한 일은 아니다. 공통의 뿌리가 있다면 공통의 상상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사회주의는 19세기에 개혁주의적 사회민주주의 또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인 국가사회주의 중 어느 하나로 발전했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는 반역에 관한 자신들의 이미지를 흑기를 사용해 발달시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부록에서는 유명한 상징인 흑기·적흑기·서클 A의 소사小史를 표시한다. 이 부록은 제이슨 웨일링Jason Wehling의 1995년 에세이, 『흑기의 역사와 아나키즘the History of the Black Flag』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두고 싶다. 이 부록이 아나키스트 = 상징 전체를 망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최근 적흑기는, 에코 = 아나키즘의 녹흑기green-and-black flag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IWW계의 「Wildcat」·흑장미Black Rose·웃기는 듯한 「소형 흑폭탄little black bomb」도 유명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 가지 가장 유명한 상징물에 집중하기로 한다.
|
|
|
|
|
|
|
|
 |
A.5-7 1968년 프랑스에서의 5월∼6월 반란 |
|
|
 |
A.5-7 1968년 프랑스에서의 5월∼6월 반란
아나키즘 운동은 죽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프랑스에서 일어난 5월에서 6월의 사건이 급진주의의 지평선에 아나키즘을 부활시켰다. 이 반란은 천만 명 규모에 달했지만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다. 아나키스트 학생그룹(다니엘 콘벤디트Daniel Cohn-Bendit를 포함해)은 베트남 반전활동으로 인해 파리의 낭테르Nanterre 대학 당국으로 부터 추방당하자 즉각 항의시위를 호소했다. 80명의 경찰이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분노해, 수업을 중단하고 난동에 가세하면서 경찰을 학외로 쫓아낸 것이다.
학생들의 지지에 힘입어 아나키스트들은 대학 관리동을 점거하고 대중 토론회를 열었다. 점거는 확산돼 경찰대가 낭테르를 포위하고 당국은 대학을 폐쇄했다. 다음 날 낭테르의 학생들은 파리 중심에 있는 소르본대학에 집결했다. 경찰의 압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500명 이상이 체포되었기에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5시간에 걸친 시가전이 시작됐다. 경찰은 경찰봉과 최루탄을 사용해 행인까지 폭행했다.
시위가 완전히 금지되고 소르본대학도 폐쇄되자 수천 명의 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의 폭력은 점차 고조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바리케이드가 구축되었다. 리포터 장 자크 르벨Jean Jacques Lebel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전 1시까지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리케이드 만드는 것을 도왔다. 여성도 근로자도 구경꾼도 잠옷을 입은 사람도 모두 돌과 목재 및 철재를 운반하는 대열에 가세했다」. 싸움은 아침까지 이어지고 하룻밤에 350명의 경찰이 부상했다. 5월 7일에는 경찰에 항의하는 총 5만 명의 시위가 벌어지고, 카르티에라탱Latin Quarter의 좁은 거리는 모두 하루 종일에 걸친 투쟁의 장으로 변했다. 경찰의 최루탄 가스에 대해서는 화염병과 「파리 코뮌 만세!」라는 외침으로 화답했다.
5월 10일까지, 계속해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면서 교육부 장관은 협상을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거리에는 60개의 바리케이드가 등장하고 젊은 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가담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경찰의 폭력을 비난했다. 5월 13일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파리의 거리는 100만 명이 넘쳐났다.
격렬한 항의행동에 직면해 경찰은 카르티에라탱에서 철수했다. 학생들은 소르본대학을 점거하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집회를 열었다. 점거는 삽시간에 프랑스의 전 대학으로 번졌다. 소르본으로부터 프로파간다·리플렛·성명·전보·포스터 등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자」「헛된 시간Dead Times이 없는 삶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등의 구호가 벽이라는 벽을 가득 메웠다. 「모든 권력을 상상력으로」가 모두의 구호였다. 머레이 북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오늘날의 혁명을 움직이는 힘은 단순히 식량난과 물자적 필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 자신의 운명의 지배권을 손에 넣고자하는 시도이다」[Post-Scarcity Anarchism, pp. 249-250].
당시의 가장 유명한 슬로건의 대다수는 상황주의자Situationists가 고안한 것이었다.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은 반체제 인사 급진주의자와 아티스트로 구성된 작은 그룹에 의해 1957년에 조직됐다. 그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도로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과 그것을 새롭고 더 자유로운 사회로 대체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오늘날의 삶은 만인이, 만물이, 온갖 감정이, 모든 관계가 상품으로 소비되는 경제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아니라 생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외된 생산자가 아니라 소외된 소비자이기도 하다. 상황주의자들은 이런 종류의 사회를 「스펙터클Spectacle」이라고 정의했다. 삶 그 자체는 도둑맞았으며, 따라서 혁명이란 삶을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적 변혁의 영역은 더 이상 단순한 작업장이 아닌 일상적 존재의 터전에 있었다.
일상생활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 무엇이 파괴적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제약을 거부하는 것에 무엇이 긍정적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혁명과 계급투쟁에 대해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입에 시체를 물고 있는 것이다.[Clifford Harper, Anarchy: A Graphic Guide, p. 153에서 인용]
파리에서의 사건에 영향을 준 다른 많은 정치그룹과 마찬가지로, 상황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었다. 「노동자 평의회가 유일한 답이다. 다른 혁명적 투쟁형태는 모두 그것이 원래 추구하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끝났다」[Clifford Harper, 전게서, p. 149]. 이러한 평의회는 자주관리형이 될 것이다. 「혁명」당에 의한 권력장악이라는 수단은 쓰지 않을 것이다. 「흑과 적」의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인지 야만인지」의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상황주의자는 아래로부터의 자주관리형 혁명을 지지하고, 5월의 사건과 그것을 자극한 사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다크 스타Dark Star가 편집한 『포장석 아래서Beneath the Paving Stones』는 68년에 관련된 상황주의자 저작의 뛰어난 시집이며 이 사건을 실제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포함하고 있다.
5월 14일 수드 아비아시옹Sud Aviation 회사의 노동자들이 경영자를 사무실에 가두고 공장을 점거했다. 다음날 끌레옹 르노Cleon-Renault 공장, 록히드 보베Lockhead-Beauvais, 머슬 오를레앙Mucel-Orleans 공장이 가세했다. 그날 밤 파리 국립극장은 대중토론의 상설집회를 열기 위해 접수됐다. 다음날 프랑스 최대의 르노 빌랑꾸르Renault-Billancourt 공장도 점거됐다. 무기한 파업 돌입 결정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노조간부와 상의하지 않고 이뤄졌다. 5월 17일까지 파리에 있는 100개의 공장이 노동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주말인 5월 19일에는 122개의 공장이 점거되었다. 5월 20일까지 파업과 점거는 일반적이 되었으며, 600만 인파가 참여했다. 인쇄 노동자들은 언론이 TV·라디오 방송에 독점되는 것을 꺼려 신문이 「신문의 의무인 정보제공이라는 역할을 객관성을 갖고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신문의 인쇄를 계속하는 데 동의했다. 신문을 인쇄하기도 전에 인쇄 노동자가 제목이나 기사변경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피가로Le Figaro」나 「네이션La Nation」과 같은 우익 신문에서 행해졌다.
르노공장이 점거되자 소르본을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이 곧바로 르노의 파업노동자와 합류하려 했다. 아나키스트의 적흑기를 선두로 4,000명의 학생이 점거된 공장으로 향했다. 국가·보스·노동조합·공산당은 지금이야말로 최대의 악몽 - 노동자와 학생의 동맹 - 에 직면하고 있었다. 1만 명의 예비경찰이 소집됐고 반광란의 노조간부는 공장 문을 봉쇄했다. 공산당은 당원들에게 반란의 분쇄를 강요했다. 정부나 보스들과 결탁해 일련의 변혁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공장으로 향하자 노동자가 공장에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투쟁 자체와 투쟁을 확대하는 활동은 자율관리 대중집회가 조직하고 행동위원회가 조정했다. 파업도 마찬가지로 역시 집회가 실행했다. 머레이 북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반란의) 희망은, 모든 형태의 자주관리 - 전체 집회와 그 운영기관·행동위원회·공장파업 위원회 - 를, 경제의 전 영역, 실제, 생활 그 자체의 전면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전게서, pp. 251-252]. 집회에서는 「삶의 열정이 수백 만 사람들을 사로잡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감각이 다시금 환기되었다」[전게서, pp. 251]. 그것은 노동자와 학생의 파업은 아니었다. 이것은 전 계급을 횡단하는 민중의 파업이었던 것이다.
5월 24일 아나키스트는 시위를 조직했다. 3만 명이 바스티유 궁전으로 시위행진했다. 경찰은 부서를 방어하기 위해 최루탄과 경찰봉이라는 정해진 도구를 사용했다. 단지 브러스(파리의 증권거래소)는 무방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데모 참가자는 거기에 불을 질렀다.
일부 좌익단체들이 겁을 먹은 것은 이 단계에서였다. 트로츠키주의자인 JCR은 사람들을 카르티에라탱(Latin Quarter)으로 돌려보냈다. UNEF(프랑스 학생 연합)와 PSU(통일사회당) 같은 단체는 재무부와 법무부의 점거를 방해했다. 다니엘 콘벤디트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린 어떤가 하면 그런 모든 무뢰한들을 얼마나 쉽게 쓸어버렸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지금은 확실히 하고 있지만 5월 25일에 파리가 깨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부처가 점거되었다고 한다면 드골주의(Gaullism) 따위는 단번에 무너졌을 것이다」. 바로 그날 밤 다니엘 콘벤디트는 국외 추방됐다.
가두시위가 확산되고 점거가 계속되자 국가는 반란 진압을 위해 가공할 수단을 쓰려고 했다. 극비리에 군 최고사령관은 2만 명의 충실한 군대를 파리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텔레비전국이나 우체국이라는 정보중추를 점거했다. 월요일(5월 27일)까지 정부는 공업의 최저임금을 35%인상, 전체적으로 급여를 10% 올릴 것을 보증했다. 이틀 후, CGT(노동총동맹)의 지도자는 파리의 거리에서 50만 명의 시위를 조직했다. 파리 안에 민중의 정부를 요구하는 포스터가 붙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스스로 주도권을 쥐는 것보다 지배자를 교체하는 것을 생각했을 뿐이었다.
6월 5일까지 대부분의 파업은 끝나고 자본주의에서의 정상화를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로 프랑스 전역이 되돌아왔다. 이날 이후에도 계속된 파업은 장갑차와 총을 이용한 군사행동에 의해 분쇄됐다. 6월 7일 군이 플린스Flins 제철공장을 습격해 나흘간의 전투가 되고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사흘 뒤 경찰이 파업 중인 르노 노동자에게 발포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고립되어서는, 이러한 전투적인 지역에는 승산이 없었다. 6월 12일 시위는 금지되고 급진단체는 비합법화되고, 그 멤버는 체포됐다. 점점 커지는 국가폭력·노동조합의 배신, 모든 방면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총파업과 공장점거는 분쇄됐다.
왜 이 반란은 실패했을까? 분명히 볼셰비키 「전위」당이 없어서가 아니다. 패거리들은 떼 지어 있었다. 다행히 전통적 권위주의 좌익 섹트는 고립됐고 사람들은 섹트에 분개했다. 반란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줄 전위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 전위」들은 운동을 따라잡고 운동을 통제하려고 죽기 살기로 이 운동을 쫓아간 것이었다.
실패의 원인은 투쟁을 조정하는 독립된 자주관리형 연방조직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개개의 점거는 서로 고립되고 말았다. 고립되면 파탄이 난다. 게다가 머레이 북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순히 점거하거나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노동자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게서, p. 269].
반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강력한 아나키스트 운동이 존재했다면 이런 의식은 더 자랐을지도 모른다. 반권위주의 좌익은 매우 활동적이긴 했지만 파업 노동자 가운데서는 매우 약했다. 그 때문에 자율관리형 조직과 노동자 자율관리라는 사상은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5월 ∼ 6월 반란은 사태가 급속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에너지와 무모함에 자극받은 노동자 계급은 기존 시스템의 제약 안에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웠다. 총파업은 노동자 계급이 가진 잠재적인 힘을 훌륭하게 보여 주고 있다. 대중집회와 공장점거는 단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아나키 행동의 뛰어난 실례이자 아나키즘 사상의 급속한 확산과 현실 응용을 보여준 실례인 것이다.
|
|
|
|
|
|
|
|
 |
A.5-6 아나키즘과 스페인 혁명 |
|
|
 |
A.5-6 아나키즘과 스페인 혁명
노엄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말 대규모 아나키즘 혁명의 좋은 예 - 실제로 내가 아는 한 최선의 실례다 - 는 1936년의 스페인 혁명이다. 거기서는 공화주의 스페인의 대부분에 걸쳐, 상당한 지역에서 공업과 농업 모두를 끌어들인 매우 자극적인 아나키즘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적 지표와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의 경제적 지표 모두 꽤 성공적이다. 즉, 생산은 효과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이다. 농장과 공장에 있는 노동자는 많은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자유주의자 등이 믿으려 하는 것과는 반대로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1936년의 혁명은 「3세대에 걸친 실험·사상·활동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아나키즘 사상을 다수 민중에게 전달한 것이다」[Radical Priorities, p. 212].
이러한 아나키스트의 조직구성과 선동에 힘입어 1930년대의 스페인은 세계 최대의 아나키즘 운동을 하고 있었다. 스페인 「시민」전쟁 초에서 150만 이상의 노동자와 농민이 아나르코 생디칼리즘 조합연합 CNT(전국노동연합)의 멤버이면서 3만 명이 FAI(이베리아 아나키스트 연합)멤버였다. 당시 스페인의 총인구는 2,400만 명이었다.
1936년 7월 18일의 파시스트 쿠데타에 응해 열린 사회혁명은 오늘날까지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실험이었다. 대중 생디칼리스트 조합인 CNT는 파시스트의 반란을 저지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토지와 공장의 탈취를 촉구했다. 약 200만의 CNT노조원을 포함해서 7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관리를 수행하고, 근로조건과 생산액 모두를 현실에서 향상시켰던 것이다.
7월 19일 이후의 어지러운 나날 속에서 주도권과 권력을 진정으로 장악한 것은 CNT나 FAI의 일반멤버였다. 파시스트 반란을 격퇴하고 생산·분배·소비를 재개(물론 평등주의적인 방식으로)한 것은 분명히, 파이스타(FAI멤버)와 CNT투사에게 영향을 받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의용군을 조직하고, 의용군에 참가하기를 자원하여(수만 명 규모로), 프랑코가 지배하고 있는 지방을 해방하기 위해 스페인 각지로 향했던 것이다. 스페인의 노동자 계급은 모든 가능성을 통해 사회정의와 자유라는 자신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를 자신의 행위에 의해 창조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사상은 아나키즘과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1936년 12월 후반에 혁명의 바르셀로나를 목격한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사회개혁의 출발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사실상 카탈루냐Cataluna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아나키스트였으며, 혁명은 여전히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부터 거기에 있던 사람에게는 혁명적 기간은 12월이나 1월에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국으로부터 곧장 들어 온 사람에게는 바르셀로나의 광경은 무엇인가 충격적이고 압도적으로 생각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노동자 계급이 실제로 권력을 잡은 동네에 온 것은 완전 처음이었다. 실질적으로 크고 작건 관계없이 모든 건물은 노동자가 장악하고, 적기와 아나키스트의 적흑기가 내걸렸다. 모든 벽에도 온통 망치와 낫과 혁명당의 머리글자가 낙서돼 있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약탈당하고 성상은 불에 타 있었다. 교회는 곳곳에서 노동자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괴됐다. 어느 상점과 카페도 집산화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내걸려 있었다. 구두닦이마저 집산화되어 그 상자는 적흑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웨이터와 직원들은 손님을 정시하며 대등한 인간으로 대했다. 비굴한 말투는 물론 의례적인 말투조차 한때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씨Se?or, 님Don이라고 하지 않고 우스테(Usted:당신)조차도 말하지 않게 되었다. 서로가 카마라다(Comrade:동지)나 투(Thou군)라고 부르고, 부에노스 디아즈(Buenos dias:안녕)가 아닌, 살루(Salud:안녕)라고 인사했다. 무엇보다도 혁명과 미래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갑자기 출현한 자유와 평등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간은 자본주의 기구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다.[Homage to Catalonia, pp. 2-3]
이 역사적 혁명의 전모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다 말할 수 없다. 이 FAQ의 섹션 I.8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할 것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지만, 이러한 포인트들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얼마든지 보여주고 독자들이 더 많은 것을 조사하도록 촉구해 주기를 기대한다.
카탈루냐의 전체산업은 노동자 자주관리 하에 있거나, 노동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즉, 전자처럼 노동자가 경영의 전부를 완전히 장악했거나, 후자와 같이 노동자가 구 경영진을 관리했거나 둘 중 하나였다). 마을 전체와 지역경제가 집산체 연합으로 변환된 곳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철도연합(이는 카탈로니아, 아라곤, 발렌시아의 철도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었다. 이 연합의 기반은 지역집회였다.
각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주 2회 모여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검토했다. 지역 전체 집회가 각각의 역과 그 부대설비에 관한 전반적 활동을 관리할 위원회를 임명했다. 위원회의 멤버는 (이전 직장에서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위원회의 결정(방향성)은 지역 전체집회에서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후에 노동자에 의한 승인이나 부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집회는 위원회의 대표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었다. 철도연합의 최고 조정기관은 혁명위원회이며, 그 멤버는 각 부문의 조합집회가 선출했다. 가스톤 레벌Gaston Leval에 따르면 철도 관리는 「국가주의 중앙집권형 시스템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혁명위원회에는 그런 권한은 없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고 철도망을 구성하는 각 노선 간의 활동을 조율할 뿐이었다」[Gaston Leval, Collectives in the Spanish Revolution, p. 255].
농촌에서는 수만 명이나 하는 농민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임의의 자율관리형 집산체를 만들었다. 제휴체제를 만듦으로써 사회 인프라에 의료·교육·기계·투자의 도입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은 개선되었다. 생산이 증대하는 것과 동시에 집산체의 자유도 커졌다. 어떤 멤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산체에서의 생활은 훌륭했다. 그곳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발언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였고, 마을의 위원회에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말할 수 있었다. 마을의 전원이 모인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서는 위원회가 큰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훌륭했다」[Ronald Fraser, Blood of Spain, p. 360].
이 혁명에 대해서는 섹션 I.8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하겠다. 예를 들면, 섹션 I.8-3과 I.8-4에서는 산업 집산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욱 깊게 논하고 있다. 지방의 집산체에 대해서는 섹션 I.8-5와 I.8-6에서 논하고 있다. 이런 섹션은 이 엄청난 사회운동을 요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가스톤 레벌이 쓴 『스페인 혁명에서의 집산체Collectives in the Spanish Revolution』, 샘 도르고프Sam Dolgoff 저 『아나키스트의 집산체The Anarchist Collectives』, 호세 페이라츠Jose Peirats 저 『스페인 혁명에 있어서의 CNT The CNT in the Spanish Revolution』, 그 외 많은 아나키스트에 의한 스페인 혁명 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사회적 분야에서는 아나키스트 조직은 합리적 학교, 리버타리안 의료제도, 사회센터 등을 만들었다. 무헤레스 리브레(Mujeres Libres:자유로운 여성들)는 스페인 사회에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싸워 아나키스트 운동 내외에 있는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힘이 되었다(이 매우 중요한 조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마사 A. 아켈스 버그Martha A. Ackelsberg 저 『스페인의 자유로운 여성들The Free Woman of Spain』을 참조). 사회적 분야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내전이 발발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 학교나 노동자 센터 등에 자금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페인의 다른 지역을 프랑코로 부터 해방하기 위해 각지로 향했던 유지 의용군은 아나키즘의 원칙에 따라 조직됐으며 남자도 여자도 참가했다. 거기서는 지위도, 경례도, 장교계급도 없었다. 누구나 평등했다. POUM의용군의 멤버였던 조지 오웰은 이 일을 확실히 알리고 있다(POUM은 반체제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레닌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나 공산당이 주장하는 트로츠키스트는 아니었다).
(의용군) 조직의 요점은 장교와 부하 사이의 사회적 평등이었다. 장군에서부터 병졸까지 누구나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완전히 평등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단장의 등을 치며 담배 한 대 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었고 아무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여하튼 어느 의용군도 히에라르키가 아니라 데모크라시였다. 명령에는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명령할 때에는 동지로서 동지에게 주는 것이지 상관으로부터 부하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었다. 장교와 하사관도 있었지만 보통의 의미에서의 군인의 신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직함도 계급장도 없고 「부동자세」나 「경례」도 없었다. 이들은 의용군 가운데 일시적이나마 일종의 무계급 사회의 작업모델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본 무엇보다도 전시라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 평등에 가까웠던 것이다.[전게서, p. 26]
하지만,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 운동은 한편으로는 스탈린주의(공산당)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프랑코) 사이에서 분쇄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아나키스트는 혁명보다 반파시스트의 단결을 중시했다. 그 결과 적에게 손을 빌려, 자신 자신도 혁명도 패배시키고 만 것이다. 정황에 의해서 이런 처지에 몰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논의되고 있다(CNT-FAI가 왜 협조 노선을 취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섹션 I.8-10을, 이 결정이 왜 아나키즘 이론의 산물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는 섹션 I.8-11을 참조).
오웰의 의용군 경험에는 아나키스트에게 스페인 혁명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사실상 우연히 서구의 모든 지역사회 중에서도 유일한 장소에 뛰어든 것이었다. 거기서는 정치적 의식과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감 쪽이 그 정반대보다 보통이었다. 이곳 아라곤 지방에서는 수십만 명의 민중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같은 수준으로 살며 평등하게 어울렸다.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평등했고, 실질적으로도 완전평등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사회주의 전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즉 사회주의의 정신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문명생활을 움직이고 있는 통상의 원동력의 상당수 - 속물근성·돈벌이·보스에 대한 두려움 등 - 은 완전히 사라졌다. 통상적 사회계급 격차가 사라지고 있었다. 돈으로 더러워진 영국의 공기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서는 농민과 우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주인이라는 것은 없었다. 무관심이나 비아냥거림보다도 희망이 보통인 지역에 「동지」라는 말이 대개의 나라에서 그런 것 같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동료를 뜻하는 지역에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는 평등의 공기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가 평등과 관련돼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요즘의 유행임은 잘 알고 있다. 전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정당의 삼류 작가나 입만 번지르르한 교수들이 대군을 이루고 사회주의란 이윤추구에 손을 대지 않는 계획형 국가자본주의일 뿐이라고 「증명」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러한 사회주의관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 비전도 존재한다. 보통 사람들을 사회주의에 매료시키고 사회주의를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 이 사회주의 「신비」는 평등이라는 이념이다. 대부분의 민중에게 사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비위를 맞추지도 않았다. 사회주의의 첫 단계가 어떤 것인지 이 지역에 있었다면 대략이긴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결국 거기에 환멸이 아니라 깊이 매료된 것이다. [전게서, pp. 83-84]
스페인혁명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책을 추천한다. 버논 리처드Vernon Richards 저 『스페인 혁명의 교훈 Lessons of the Spanish Revolution』호세 페이라츠 저 『스페인 혁명에서의 아나키스트들Anarchists in the Spanish Revolution』과 『스페인 혁명에서의 CNT The CNT in the Spanish Revolution』, 마사 애크스 버그 저 『스페인의 자유로운 여성들Free Women of Spain』, 샘 달고프 편 『아나키스트의 집산체The Anarchist Collectives』, 노엄 촘스키 저 「객관성과 자유주의적 학문 Objectivity and Liberal Scholarship」(『촘스키 독본The Chomsky Reader』에 수록), 제롬 민츠Jerome R. Mintz 저 『까사스 비에하스의 아나키스트들The Anarchists of Casas Viejas』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Homage to Catalonia』
|
|
|
|
|
|
|
|
 |
A.5-5 이탈리아 공장 점거 운동에서의 아나키즘 |
|
|
 |
A.5-5 이탈리아 공장 점거 운동에서의 아나키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 그리고 세계가 크게 급진화했다. 노동조합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파업·시위·선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쟁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인 것도 그 한 요인이었다. 조셉 라바디와 같은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 조차 러시아 혁명에 열광하고, 다른 많은 반자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빛나는 시대의 희망을 부여해 주는 동방의 붉은색」을 보고, 볼셰비키는 「적어도 산업노예의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Carlotta R. Anderson, All-American Anarchist p. 225, p. 241에서 인용].
아나키즘 사상은 유럽 전역에서 더욱 유행하여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은 대규모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이 소란상태로 인해 직장대표(샵 스튜어드:shop stewards’ movement) 운동이나 크라이드 사이드의 파업이 생겨났다. 독일에서는 IWW에 자극받은 산별 노동조합주의가 대두됐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CNT가 크게 성장했다. 더욱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의 양 세력도 대두해 성장하고 있었다. 이탈리아도 이 예외는 아니었다.
토리노Turin에서는 새로운 일반 대중운동이 발전하고 있었다. 이 운동은 「내무위원회」(선거에서 뽑힌 임시 민원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조직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직접 근거해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노동자 집단에 대한 임무를 위탁되거나 주민소환이 가능한 직장대표 한 명이 뽑혔다. 그리고 공장 내의 직장대표 전체집회에서 그 공장시설에서의 「내무위원회」가 선발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직장 대표기구에 대해 직접적이고 일관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것이 「공장평의회」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1918년 11월부터 1919년 3월까지 내무위원회는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의 전국적 의제가 되었다. 1919년 2월 20일 이탈리아 금속공업노동자연합(FIOM)은 공장에서 「내무위원회」의 선거를 규정하는 협정을 획득했다. 그 후 노동자는 이 노동자 대표기관을 경영기능을 가진 공장평의회로 전환하려 했다. 1919년 메이데이까지 내무위원회는 「금속공업에서의 주요 세력이 되었으며, 노동조합은 대수롭지 않은 관리부서가 될 위험이 있었다. 개혁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우려스러운 발전의 비밀에는 리버타리안이 숨어있는 것이었다」[Carl Levy, Gramsci and the Anarchists, p. 135]. 1919년 11월까지 토리노의 내무위원회는 공장평의회로 변화했다.
토리노의 운동은 1919년 5월 1일 발간한 『신질서L'Ordine Nuovo』라는 주간지와 관련되어 있다. 다니엘 게랑Daniel Guerin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것을 「편집하고 있던 것은 좌익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였지만, 그는 아나키즘 사상을 가진 카를로 페트리Carlo Petri라는 필명의 토리노 대학 철학교수와 토리노의 리버타리안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공장에서, 『신질서』그룹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금속공업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투사, 피에트로 페레로Pietro Ferrero와 마우리지오 가리노Garino, Maurizio는 특히 지지하고 있었다. 『신질서』의 성명에는 사회당원과 리버타리안이 함께 서명하고, 공장평의회를 「장래에 개개의 공장과 사회전체를 공산주의적으로 관리하느느데 적합한 기관」[Anarchism, p. 109]이라 하기로 합의했었다.
토리노에서의 발전이 고립되어 행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탈리아 전 국토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행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1920년 2월 후반 리그리아Liguria주, 피에몬테Piedmont주, 나폴리Naples에서 공장점거가 빈발했다. 리그리아주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협상이 파탄 난 뒤 세스토리Sestri, 포넨테Ponente, 코르닐리아노Cornigliano, 캄피 Campi에 있는 금속공장과 조선공장을 점거했다. 생디칼리스트 지도부 아래 4일 간에 걸쳐 노동자는 공장평의회를 통해서 공장을 운영했다.
이 시기 이탈리아 노동조합동맹(USI)은 거의 80만 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탈리아 아나키스트 연맹(UAI)도 2만 명의 세력이 되어, 일간지(『새로운 인간성Umanita Nova』)도 그에 따라 부수를 늘렸다. 웨일스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그윈 A 윌리엄스Gwyn A.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나키스트와 혁명적 생디칼리스트가 좌익 중 가장 시종일관된 완전한 혁명그룹이었다. 급속하게 끊임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성장, 이것이 1919년부터 1920년까지의 생디칼리즘과 아나키즘의 역사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결국 생디칼리스트들은 사회주의 운동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전투적 노동자 계급의 의견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Proletarian Order, pp. 194-195]. 토리노에서 리버타리안은 「FIOM 내부에서 활동하고」, 「『신질서』 캠페인에 처음부터 크게 참여했다」[전게서 p. 195]. 놀라지 마라, 『신질서』는 다른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생디칼리즘」이라고 비난받았던 것이다.
작업장을 점거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아나키스트와 생디칼리스트였다. 마라테스타는 이 생각을 1920년 3월에 『새로운 인간성』에서 논하고 있다. 마라라테스타의 말로는 「총파업이라는 항의행동으로는 이제 누구도 당황하지 않게 됐다. 다른 것을 해야 한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자. 공장 탈취다. 이 방법에는 분명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하며 수용이라는 궁극적인 행위를 할 각오를 다지게 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 p. 134]. 같은 달 「미라Mila에서 평의회를 성립시킬 강력한 생디칼리스트 정치운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아르만도 보르기Armando Borghi(USI의 아나키스트 서기)는 대규모 공장점거를 호소했다. 토리노에서는 직장 커미사르commissars의 재선거가 이제 막 막을 내렸을 때였다. 이 광란의 2주간, 정열적인 논쟁이 행해져 노동자는 계속 이 열병에 걸려 있었다. (공장평의회)커미사르는 점거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토리노 이외의 평의회운동은 본질적으로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이었다.」 당연히 생디칼리스트 금속공업 노동자의 서기관은 「토리노 평의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토리노의 평의회는 공장관리를 목적으로 한 반관료주의의 직접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디칼리스트 산별노조의 제1 하부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디칼리스트 대회는 이 평의회를 지지하기로 투표로 결정했다. 마라테스타는 평의회는 직접행동의 한 형태이며, 분란의 생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평의회를 지지했다. 『새로운 인간성』과 『계급전쟁Guerradi Classe』(USI의 신문)은 『신질서』와 토리노판 『전진Avanti』(사회당 기관지)만큼이나 평의회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Williams, 전세서, p. 200, p. 193, p. 196].
노동자의 전투성이 급격히 높아지자 고용주는 곧바로 반격했다. 보스들의 조직은 공장평의회를 비난하고 평의회에 반대하는 동원을 호소했다. 노동자는 반발하며 보스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다. 「무질서」가 공장 안에 끓어올랐다. 보스는 국가의 원조를 얻어내 기존 산업규칙을 강화했다. 1919년에 FIOM이 쟁취한 전국협정은 생산현장에서의 내무위원회는 금지되고, 작업 이외의 시간으로 제한키로 정한 것이 되어 버렸다. 즉, 토리노에서의 직장대표 운동의 활동 - 예를 들면, 직장대표 선거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는 것 - 은 계약위반이 되어 버렸다. 운동을 유지한 것은 본질적으로 대중의 불복종이었다. 보스들은 토리노의 공장평의회와 싸우는 수단으로서 합의가 끝난 계약에 대한 이러한 침해행위를 사용했던 것이다.
고용주와의 결착은 4월에 찾아왔다. 피아트에서 열린 직장대표 총회는 몇 명의 직장대표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불러 일으켰다. 반면 고용주측은 전면적 공장폐쇄를 선언했다. 정부는 공장폐쇄를 지지하며 대량의 무력을 과시하고 군대로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에 기관총을 배치했다. 2주간의 파업 후 직장대표 운동이 계류 중인 당면문제에 대해서 항복하기로 결정을 내리자, 고용자 측은 FIOM 전국협정에 따라서 직장대표자 평의회를 작업 이외의 시간에 한정하고 경영자에 의한 관리를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공장평의회 시스템의 핵심으로 향해진 것으로 토리노 노동운동은 그것을 방위하기 위해 대규모 총파업으로 응수했다. 토리노는 전면파업에 돌입해 곧바로 피에몬테Piedmont 지방 전체로 퍼지고, 최고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토리노 파업 참가자들은 파업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업을 사회당원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CGL(노동총동맹)과 사회당 지도자를 의지했지만 그 요구는 거절당했던 것이다.
토리노의 총파업을 지지한 것은 예를 들면 독립철도노조나 해운노조와 같은 주로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의 영향을 받은 노동조합뿐이었다 (「생디칼리스트만이 움직여 준 것이다.」) 피사Pisa와 플로렌스Florence에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토리노로 보내질 군대의 수송을 거부했다. 제노바Genoa 곳곳에서 조선공과 USI가 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작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주의 운동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운동은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가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자극한 각종 행동」과 함께 「여전히 민중의 지지를 받았었다」. 토리노 자체에서는 아나키스트와 생디칼리스트는 그람시Gramsci와 『신질서』그룹으로 부터 평의회 운동을 당장이라도 떼어 내려했던 것이다」[Williams, 전게서, p. 207, p. 193, p. 194]. 결국 CGL 지도부는 직장대표 평의회를 업무 이외의 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고용측의 주된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파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평의회의 활동과 생산현장에서의 존재감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9월 공장점거 중에 그 입장은 부활하게 된다.
아나키스트는 「사회당은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사회당원을 얼치기 지도부로 구속하는 잘못된 규율감각이라고 아나키스트는 비판했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운동을 『지도자의 계산·공포·잘못·배신의 가능성』 아래에 두는 규율을, 다른 규율과 대비했던 것이다. 즉, 토리노에 연대해 파업을 한 세스토리 포넨테Sestri Ponente 노동자의 규율, 토리노에 치안부대를 수송하는 것을 거부한 철도 노동자의 규율, 당이나 섹트의 고려사항을 잊고 자신을 토리노 민중의 의향 속에 몸담았던 아나키스트나 USI멤버와 대비시킨 것이다」[Carl Levy, 전게서, p. 161]. 슬프도다! 사회당과 그 조합이 갖는 이러한 톱다운형 「규율」은 공장점거 중에도 반복되면서 극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
1920년 9월, 한 경영자가 임금삭감과 공장폐쇄한 것에 대항해 이탈리아 각지에서 대규모 농성 파업이 벌어졌다. 「위기 분위기의 중심에는 생디칼리스트의 대두가 있었다」. 8월 중순, USI의 금속노동자는 「공장점거를 하기 위해 양쪽의 조합에 호소하고」 동시에 공장 폐쇄에 대한 「예방적 점거」를 호소했다. USI는 이를 「금속 노동자에 의한 공장의 수용」으로 간주하고 (「모든 필요수단을 써서 방위되어야」한다), 「다른 산업 노동자도 싸우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Williams, 전게서, p. 236, pp. 238-9]. 실제로 「고용 측의 공장폐쇄에 대항해 공장을 점거한다는 생디칼리스트의 생각을 FIOM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USI야말로 토리노의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Carl Levy, 전게서, p. 129]. 파업은 기계공장에서 시작해 곧바로 철도와 도로 운송업 등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농민도 농지를 점거했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는 그저 단순하게 직장을 점거한 것만이 아니라 직장을 노동자 자율관리 하에 두었던 것이다. 곧 50만 명 이상의 「파업 참가자」가 일자리를 갖고 자신들 자신이 생산을 시작했다. 이 일에 참가한 엔리코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금속 노동자가 임금율을 둘러싸고 운동을 개시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운동이었다. 공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장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이 생각이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노동자의 혁명적 열광이 일어났고, 곧 이 요구가 노동자의 성격을 바꾸었다. 마침내 생산수단을 점유할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했다. 그들은 방위를 위해 무장하고 그들 스스로 생산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현실에서 소유권이 폐지된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회생활 형태의 선구였다. 정부는 이에 반대할 기력을 잃고 수수방관했다.[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 p. 134]
다니엘 게랑이 이 운동의 확산 양상을 잘 정리하고 있다.
공장을 관리한 것은 기술노동자 위원회와 관리노동자 위원회였다. 자주관리는 매우 긴 길을 걸었다. 당초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중단되자 자체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체화폐를 발행했다. 매우 엄격한 자제심이 요구되었으며, 알콜음료는 금지됐고, 자위를 위해 무장 패트롤이 조직됐다. 자주관리 하의 공장 사이에는 매우 친밀한 연대감이 확립되었다. 광석과 석탄은 공유로 축적되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Anarchism, p. 109]
이탈리아는 「혼란스러웠다. 50만 명의 근로자가 공장을 점거하고 그 위에 적흑기가 내걸렸다」. 이 운동은 이탈리아 안으로 퍼지고, 밀란, 토리노, 제노바 같은 공업 중심지뿐 아니라 로마, 플로렌스, 나폴리, 팔레르모에서도 이루어졌다. 「운동의 최전선에는 확실히 USI의 투사가 있었다」. 반면, 『새로운 인간성』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었다. 「이 운동은 매우 중대하다. 이 운동이 대규모로 확대하도록 우리들은 가능한 것을 해야한다」. USI는 「 『수용 총파업』을 개시하기 위해 모든 산업으로 운동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Williams, 전게서, p. 236, pp. 243-4]. 리버타리안에게 영향을 받은 철도 노동자들은 군대의 수송을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개혁주의 조합의 명령에 항거해 파업에 돌입했고 농민들은 땅을 점거했다. 아나키스트는 성심 성의껏 이 운동을 지지했다. 당연히 「공장과 땅의 점거는 우리의 행동 프로그램과 완전히 일치했기」때문이다[Malatesta, 전게서, p. 135]. 루이지 파브리Luigi Fabbri는 이 점거는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힘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Paolo Sprinao, The Occupation of the Factories, p. 134에서 인용].
하지만 4주간의 점거 후, 노동자들은 공장을 떠날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사회당이나 개혁주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조직은 점거운동에 반대하고 국가와 협상을 벌였다. 노사협조로 근로자 관리를 합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맞바꾸면서 「정상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혁명의 문제는 4월 10일~11일 밀란에서의 CGL전국대회의 투표로 결정했지만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당 지도부는 어쨌든 투표를 거부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근로자 관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독립된 공장 간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노동자가 얻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관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관료들은 그 힘을 이용해 개개의 공장이나 도시를 분단했다. 그 결과, 「공장안에서 분산되어 있던 개개의 아나키스트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작업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Malatesta, 전게서, p. 136]. 개혁주의 조합이 생디칼리스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기에, 현지의 생디칼리스트 조합연합은 충분히 조정된 공장점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틀을 만들 수 없었다. 아나키스트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수파였지만, 결국 소수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대회(아나키스트 연맹, 철도와 해운 노조가 참여했다)가 9월 12일에 열렸을 때 생디칼리스트 조합은 사회당과 CGL 없이 「자기들끼리만 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뒤 밀란에서의 「반혁명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투표는 소수파 주의로 자의적이며 무효라고 단정하고, 새롭고 모호하지만 열렬한 행동 요청에 착수하는 것으로 결말지었다.[Paolo Spriano, 전게서, p. 94]
마라테스타도 밀란의 공장 중 하나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논했다. 「로마에서 (CGL과 자본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을 너희의 승리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졸리티Giolitti, 정부, 부르주아 계급이 승리한 것이다. 놈들은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던 절벽에서 구출되었던 것이다」. 점거 내내 「부르주아 계급은 두려웠고, 정부는 이 상황에 직면해 무능했다」그래서
로마협정은 부르주아 착취 밑으로 너희를 내몰 것이다. 너희들이 착취를 없앨 수 있었음에도.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것 등은 거짓말이다. 공장을 포기한다고 하면 위대한 싸움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 최초의 동기로 투쟁을 되돌려 철저하게 해내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승리가 갖는 기만적 특징에 대해 아무런 환상도 갖지 못했다면 잃을 것이 없다. 공장 관리라는 유명한 포고는 가짜다. 너의 이익과 부르주아의 이익을 조화시키려한다는 것이므로. 그런 것은 늑대와 양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과 같다. 지도자 따위 믿어서는 안 된다. 놈들은 하루하루 혁명을 미루는 것으로 너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기회가 온다면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명령 따위는 기다리지 마라. 혁명의 명령 같은 것은 내려지지 않고, 내려진다고 해도 행동을 멈추라고 명령할 뿐이다. 자신에게 자신을 가져라. 자신의 미래를 신뢰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Max Nettlau, Errico Malatesta: The Biography of an Anarchist에서 인용]
마라테스타가 옳다는 것은 증명됐다. 점거가 끝나자 승리한 것은 부르주아 계급과 정부뿐이었다. 곧바로 노동자들은 파시즘에 직면하게 됐다. 당초 1920년 10월에 「공장을 내준 뒤」, 정부(누가 진짜 위협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는 「USI와 UAI의 지도자를 전원 체포했다. 사회당원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1921년 봄에 마라테스타 등의 옥중 아나키스트가 밀란의 독방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할 때까지 리버타리안에 대한 박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Carl Levy, 전게서, pp. 221-2]. 이러한 아나키스트는 나흘간의 공판 후에 석방되었다.
1920년의 사건은 네 가지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첫째, 노동자는 자신의 작업장을 보스 없이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나키스트는 노동운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USI의 지원이 없었다면 토리노의 운동은 실제보다 더 고립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 계급투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나키스트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향력과 규모 쌍방의 점에서 UAI와 USI는 성장했다. 이것이 아나키스트 조직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장점거라는 생각을 제기하고 그 운동을 지원하는 아나키스트와 생디칼리스트가 없었다면, 공장점거가 이 정도까지 성공하고 확대됐을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히에라르키형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주의 조직은 혁명적 멤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지도자에게 의지함으로써 운동은 불편해지고, 그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탈리아 역사의 이 시대가 이탈리아에서의 파시즘의 성장을 설명해 준다. 토비아스 아베세Tobias Abse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발흥은 그것에 앞서는 1919년과 1920년의 붉은 2년간 비엔니오 로소Biennio Rosso 사건과 뗄 수 없다. 파시즘은 예방적 반혁명이었다. 혁명이 실패한 결과, 일어났던 것이다[Rethinking Italian Fascism, David Forgacs (ed.) pp. 52-81수록의, 「The Rise of Fascism in an Industrial City」, p. 54]. 「예방적 반혁명」이라는 말을 원래 만든 것은 주도적 아나키스트인 루이지 파브리이다.
공장 점거 때 마라테스타는 이렇게 주장했다. 「끝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부르주아 계급에 심어져 있는 공포의 보복을 피눈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Tobias Abse, 전게서, p. 66에서 인용]. 나중에 벌어진 일이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다. 자본가와 부유한 지주는 노동자 계급에게 분수를 알게끔 파시스트를 지원한 것이다. 토비아스 아베세를 인용하자.
1921년부터 1922년 파시스트, 그리고 기업인과 농민 파시스트 지지자가 목적으로 했던 것은 단순했다. 조직적 노동자와 농민의 힘을 가능한 한 완전히 분쇄하는 것, 비엔니오 로소가 획득한 것뿐만 아니라 세기의 변환기와 제1차 세계대전 사이에 하층계급이 획득한 모든 것을 총탄과 곤봉을 사용해 일소하는 것이다.[전게서, p. 54]
파시스트 분대는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의 집회소, 사회센터, 급진주의 신문, 카메라 델 라볼로(지역의 노조협의회)를 공격해 파괴했다. 하지만 파시스트에 의한 테러의 암흑시대 조차, 아나키스트는 전체주의 세력에 저항했다. 「파시즘에 대해 가장 강력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이 있었던 것은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의 전통이 강한 마을이나 도시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Tobias Abse, 전게서, p. 56].
아나키스트는 노동자의 이익을 자위를 위한 노동자 계급조직 「민중돌격대Arditidel Popolo」에 참가해 그 지부를 조직하는 일도 많았다. 민중돌격대는 파시스트 부대에 대한 노동자 계급 레지스탕스를 조직하고 후원하며 대부분 규모가 큰 파시스트 부대를 무찌르고 있었다(예를 들면 1922년 8월에 파르마Parma의 아나키스트의 거점에서, 「노동자 계급 지역의 주민에 지원된 민중돌격대의 두 명이, 수 천 명의 이탈로 발보Italo Balbo의 파시스트 행동대에 완전한 굴욕을 가져다 주었다」[Tobias Abse, 전게서, p. 56]).
민중돌격대는 마라테스타와 UAI가 제창한 단결된 혁명적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반파시스트 전선 구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이 운동은 「반부르주아·반파시스트의 방향성을 따라 발전하였으며, 지방지부의 독립성을 특징으로 했다」[Red Years, Black Years: Anarchistance to Fascism in Italy, p. 2]. 단순한 「반파시즘」 조직이라기보다는 민중돌격대는 「『민주주의』를 추상적으로 방어하는 운동이 아니라, 산업 노동자, 항만 노동자, 수많은 농민과 장인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전념하는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조직이었다」[Tobias Abse, 전게서, p. 75]. 당연히 민중돌격대가 「가장 강력하게 되고 가장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정치문화가 그만큼 사회당에 독점되지 않고, 아나키즘과 생디칼리즘의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발리Bari, 리보루노Livorno, 팔마Parma 그리고 로마Rome였다」[Antonio Sonnessa,"Working Class Defence Organisation, Anri-Fascist Resistances and the Arditi del Popolo in Turin, 1919-22,"pp. 183-218, European History Quarterly, vol. 33, no. 2, p. 184].
하지만 사회당과 공산당은 이 조직에서 탈퇴하고, 사회당은 1921년 8월에 파시스트와 「평화협정」을 맺는다. 공산당은 「당원들을 아나키스트와 함께 활동시키지 않고, 민중돌격대에서 탈퇴시키려고 했다」[Red Years, Black Years, p. 17]. 사실 「이 협정이 체결된 바로 그 날, 『새 질서』는 민중돌격대에게 「관여하지 않도록 경고한 PCd'I(이탈리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taly)의 통보를 공개했다」. 4일 후 공산당 지도부는 「공식으로 운동을 포기하고」, 이 조직에게 「계속 참여하거나 제휴를 맺는 공산당원에게는 중대한 징계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즉 「1921년 8월 첫 째 주의 마지막까지 PSI, CGL, PCd'I는」 이 조직을 「공식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민중돌격대)의 프로그램에 항상 동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나키스트 지도자들만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새로운 인간성』지는 이 운동을 「반파시즘 저항의 민중표현이며, 조직을 만들 자유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지지하고 있었다」[Antonio Sonnessa, 전게서, p. 195, p. 194].
하지만 지도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반 사회당원과 공산당원은 이 운동에 동참했다. 공산당원에 이르러서는 이 운동을 「PCd‘I 지도부가 점차 포기한 데 대한 반항을」 공공연히 했다. 예를 들어 토리노에서 민중돌격대에 참가한 공산당원들은 「자신을 공산당원으로서가 아니라 더 넓은 노동자 계급의 일부로 간주해」 그렇게 했다. 거기에 「한 사람의 유력한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가 존재하고 있던 것이 이 힘을 강하게 하고 있었다」. 공산당 지도부가 이 운동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은, 민중운동의 요구에 둔감한 볼셰비키 조직 형태의 파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권위로부터의 자율·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리버타리안의 관습이, 특히 지도자가 풀뿌리 차원의 정황을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운동 지도자에게 대항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onnessa, 전게서, p. 200, p. 198, p. 193].
공산당은 파시즘에 대한 민중저항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산당의 지도자 안토니오 그램시Antonio Gramsci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 지도부 이외의 지도력에 당원들이 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중돌격대의 문제에 관한 당 지도부의 태도는 이 필요성에 부합한 것이다」. 그람시는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이 정책은 「이 대중운동을 부당하다고 보는 역할을 했다. 이 운동은 아래로 부터 시작했지만 거꾸로 자신들이 이 운동을 정치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Selections from Political Writings(1921-1926), p. 333]. 다른 공산당 지도자보다는 민중돌격대에 대해서 당파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공산당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람시도 PCd'I 주도의 군대를 만드는 것을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Sonnessa, 전게서, p. 196]. 말하자면 공산당 지도부는 파시즘에 대한 투쟁을 더 많은 당원을 얻는 수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막상 당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게 되자 그들은 공산당 신봉자들이 아나키즘에 영향을 받게 될 리스크가 아니라 패배와 파시즘을 택한 것이었다.
아베세Abse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민중돌격대를 「망친 것은 전국차원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이 지지를 취소한 것이었다」[전게서, p. 74]. 즉 「사회개혁주의의 패배주의와 공산당의 섹터주의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유효한 무장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민중저항의 개개의 실례를 전략의 성공으로 결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파시즘은 타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1921년 7월 사르자나Sarzana의 폭동, 1922년 8월의 파르마Parma의 폭동은 아나키스트가 행동과 심리전을 촉구한 정책이 옳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Red Years, Black Years, p. 3, p. 2]. 역사가인 토비아스 아베세Tobias Abse는 이 분석을 지지하고 있다. 「아나키스트 마라테스타가 행한 혁명적 반파시즘 공동전선의 호소를 사회당·공산당 지도부가 지지만 했더라면 1922년 8월에 파르마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전게서, p. 56].
결국 파시스트의 폭력은 성공했고 자본가의 권력은 유지됐다. 아나키스트의 의지와 용기만으로는 파시스트 갱에 대항하기에 부족했다. 파시스트는 물자와 무기 보조를 많이 받고, 여러 억압적 국가기관에 지원됐다. 아나키스트와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는 일부지역이나 일부산업에서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당과 노동총동맹(개혁주의 노조)도 역시 직접행동을 선택하기만 하면 파시즘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Red Years, Black Years, pp. 1-2].
마르크스주의자는 혁명 패배에 도움을 준 뒤, 파시즘의 승리를 확실히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파시스트 국가가 성립한 뒤에도 아나키스트는 이탈리아 안팎에서 저항을 계속했다. 1936년 아나키스트나 비아나키스트 등 많은 이탈리아인이 프랑코에게 저항하고자 스페인으로 향했다(자세한 것은, 움베르토 마르조치Umberto Marzochhi 저 『스페인을 생각하다: 스페인 시민전쟁에서의 이탈리아인 아나키스트 지원병Remembering Spain:Italian Anarchist Volunteers in the Spanish Civil War』을 참조).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나키스트는 이탈리아 빨치산 운동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 반파시스트 운동이 반자본주의 분자에게 지배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영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방한」지역의 정치적 입장에 저명한 파시스트들을 배속시킨 이유이다(이런 지역은 빨치산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연합군은 마을을 원래의 거주자로부터 「해방」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의 파시즘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탈리아 파시즘은 생디칼리즘의 산물이라거나 생디칼리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놀랍다. 아나키스트들 조차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밥 블랙Bob Black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스트는 대개 파시즘으로 전향했다」는 것이며, 데이비드 D 로버츠David D. Roberts가 1979년에 행한 연구 「생디칼리즘의 전통과 이탈리아의 파시즘The Syndicalist Tradition and Italian Fascism」가 이 주장을 지지하는 문헌이라고 한다[Anarchy after Leftism, p. 64]. 피터 사바티니Peter Sabatini는 『사회적 아나키즘Social Anarchism』지에서의 서평에서 같은 말을 했고, 생디칼리즘의 「궁극의 실패」는 「그것이 파시즘의 매체로 변질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Social Anarchism, no. 23, p. 99].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무슨 진실이 있는 것일까?
블랙Black의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생디칼리스트라는 말이 USI(이탈리아 생디카 노조)의 멤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스트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파시즘으로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버츠David D. Robert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직 노동자의 대다수는, 생디칼리스트의 어필에 응할 수 없고, 무의미한 자본주의 전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이탈리아의) 군사개입에 계속 반대했다. 생디칼리스트는 USI 내부의 대다수를 납득시키지도 못했고, 대다수는 USI의 아나키스트 지도자인 아르만도 보르기Armando Borghi의 중립주의를 선택했다. 그 후, 드 암브리스De Ambris가 군사개입 노선의 소수파를 거느리고 연맹을 탈퇴했으며, 연맹은 분열되었다.[The Syndicalist Tradition and Italian Fascism, p. 113]
하지만 「생디칼리스트」가 전전의 운동에 관계했던 지식인과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1차 세계대전 개시 후에 「주도적 생디칼리스트가 곧바로 거의 만장일치로 군사개입의 지지를 표명했다」[Roberts, 전게서, p. 106]는 것은 진실이다. 이러한 전쟁 찬성의 「주도적 생디칼리스트」의 상당수는 확실히 파시스트가 되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지도자」(대다수는 따르기조차도 하지 않았는데도!)에게 주의를 돌렸고, 이것이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스트는 대개 파시즘으로 전향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하는 등 놀랍기만 하다. 더 나쁜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탈리아의 아나키스트와 생디칼리스트는 파시즘에 대해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잘 싸운 사람들이다. 결국 블랙과 사바티니는 운동 전체를 중상한 것이다.
동시에 흥미로운 일이지만 이런 「주도적 생디칼리스트」는 아나키스트가 아니었고,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도 아니었다. 로버츠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생디칼리즘의 신조는 분명히 사회당 내부에서 활동하며, 개혁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던 지식인 일군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이런 지식인은 「분명히 아나키즘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르크스주의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 「생디칼리스트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속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정말로 바라고 - 활동하려고 해서 - 있었던 것이다」[전게서,p, 66, p. 72, p. 57, p. 79]. 칼 레비Carl Levy에 의한 이탈리아 아나키즘의 해설에 의하면, 「다른 생디칼리즘 운동과는 달리,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즘은 제2 인터내셔널의 정당에 연결되어 있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비타협적인 사회당원들로부터 모여졌으며, 남부 생디칼리스트 지식인들은 공화주의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하나의 구성분자는 노동자당의 잔재였다」[For Anarchism:History, Theory, and Practice, David Goodway(Ed.), 수록의 “Italian Anarchism:1870-1926”, p. 51]. 즉, 파시즘으로 전향한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스트는 우선 첫 번째로, 생디칼리스트 조합에 있는 대다수를 자신들을 따르도록 할 수 없었던 소수의 지식인이며, 두 번째로 마르크스주의자와 공화주의자였던 것이다. 아나키스트도 아니었고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도 아니며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조차도 아니었다.
칼 레비에 따르면, 로버츠의 책은 「생디칼리스트 인텔리겐치아 intelligentsia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몇 명의 생디칼리스트 지식인들이 새로운 내셔널리즘 운동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거나 동정을 갖고 시인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남부의 생디칼리스트 지식인들이 포퓰리스트populist나 공화주의의 수사를 사용하던 것과 유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디칼리스트 지식인과 국가의 조직자organiser가 너무 많이 강조되고 있었다」. 생디칼리즘은 「그 장기적인 활력을 국가의 리더쉽에 의존하지 않았다」[전게서,p,77,p.53,p.51]. USI의 멤버를 살펴보면 「대개 파시즘으로 전향한」그룹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전력으로 파시즘과 싸우고 파시스트의 대규모 적인 폭력의 대상이 된 일군의 사람들을 발견한다.
요약하자.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생디칼리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상기한 것과 같이, USI는 파시스트와 싸우고 UAI나 사회당이라고 하는 급진주의자와 함께 파시스트에게 파괴되었다. 얼마 안 되는 전쟁 전의 마르크스주의 생디칼리스트가 나중에 파시스트가 되었으며, 「국가적 생디칼리즘」을 제기했다고 해서 생디칼리즘과 파시즘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아나키스트 가운데 나중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자가 있다고 해서 아나키즘을 마르크스주의로의 「매개수단」이라고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당연한 일이지만 파시즘에 대해 가장 일관되고 가장 성공한 적대자는 아나키스트였다. 이들 두 운동만큼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한 쪽은 자본주의를 섬긴 전체 국가주의에 찬동하고, 다른 한쪽은 자유로운 비자본주의 사회에 동참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특권과 권력이 위협받자 자본가와 지주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에 구원을 청했다. 이 과정은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예를 네 개만 들면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칠레가 그렇다). |
|
|
|
|
|
|
|
 |
A.5-4 러시아 혁명의 아나키스트들 |
|
|
 |
A.5-4 러시아 혁명의 아나키스트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의 아나키즘은 크게 성장하고 아나키즘 사상에 관한 많은 실험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러시아 혁명은 보통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싸운 대중운동이 아니라, 레닌이 러시아에 자신의 독재체제를 밀어붙이는 수단이었다고 간주되고 있다. 진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러시아 혁명은 밑으로 부터의 대중운동이었다. 많은 사상조류가 존재하고 수백 만이라는 노동자(도시와 마을의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도)가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슬프도다! 그러한 희망과 꿈은 볼셰비즘당의 - 처음엔 레닌의, 후에는 스탈린의 - 독재 치하에서 분쇄된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도 그러하지만 러시아 혁명은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격언의 좋은 본보기이다. 자본주의자에 의한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1917년부터 1921년까지의, 아나키스트 볼린이 말하는 「알려지지 않은 혁명」을 - 보통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밑으로 부터 생긴 혁명을 - 무시하고 있다. 레닌주의자의 설명은 기껏해야 노동자의 자율적 활동을 찬양하는 정도이며, 그것도 당의 노선과 일치하고 있을 때만의 것이었다. 당의 노선에서 벗어나자마자 철저하게 노동자의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그리고 그것을 비열한 동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레닌주의자의 설명은 노동자가 볼셰비즘에 앞설 때(1917년 봄과 여름처럼)는 근로자를 찬양하지만 볼셰비즘이 권력을 잡고 노동자가 볼셰비즘의 정책에 반대하게 되면 노동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더 심한 경우 레닌주의자의 설명은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을 전위당 활동의 배경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나키스트가 보면 러시아 혁명은 전형적인 사회혁명이었다. 거기서는 근로자의 자치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비에트와 공장위원회 등의 계급조직에 의해 러시아 대중은 계급에 지배된 히라에르키형 국가주의 체제의 사회에서 자유·평등·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로 전환하려 했다. 이처럼 혁명의 처음 몇 달은 다음의 바쿠닌의 예측을 확인했던 것 같다. 「미래의 사회조직은 오직 노동자의 자유제휴나 자유연합에 의해서, 밑에서 위로 만들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조합에서 코뮌·지방·전국으로, 마지막으로 국제적이고 전세계적인 대연합으로」[Michael Bakunin:Selected Writings, p. 206]. 소비에트와 공장위원회는 바쿠닌의 사상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아나키스트는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었다.
짜르Tsar 타도의 시작은 대중의 직접행동이었다. 1917년 2월 페트로그라드Petrograd의 여성들이 빵 소요을 일으켰다. 2월 18일 페트로그라드의 퓨티로브Putilov 공장노동자가 파업을 벌였다. 2월 22일까지 파업은 다른 공장으로도 확대됐다. 이틀 뒤 20만 명의 노조가 파업을 갖고, 2월 25일까지 파업은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것이었다. 이날 시위자와 군대와의 사이에 처음으로 피투성이 충돌이 있었다. 2월 27일에 변곡점이 찾아왔다. 몇 개의 중대가 혁명적 대중 쪽에 붙어 다른 부대를 물리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제수단을 잃고 황제는 퇴위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 운동은 매우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정당은 따돌림을 당했다. 거기에는 볼셰비즘도 포함됐다. 「볼셰비키의 페트로그라드 조직은 짜르를 타도하는 운명을 짊어진 혁명 직전에, 파업의 호소에 반대했다. 다행스럽게도 노동자는 볼셰비키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 파업을 속행했다. 노동자가 볼셰비키의 지도에 따랐다고 한다면 그때에 혁명이 생겼을지 어땠을지 의심스럽다」[Murray Bookchin,Post-Scarcity Anarchism, p. 194].
새로운 「사회주의」국가가 혁명을 막는데 충분한 힘을 갖기까지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의 흐름 속에서 실행되었던 것이다.
좌익에게 있어서, 짜리즘Tsarism의 종언은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가 곳곳에서 오랫동안 행해온 활동의 정점이었다. 인간의 진보적 사고가 전통적 억압을 이긴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의 좌익은 이것을 충분히 칭찬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의 상황은 더욱 진전되고 있었다. 작업장·길거리·대지에서 민중은 봉건주의를 정치적으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봉건적 착취가 경제에 존속하고 있는 한, 짜리즘을 타도했다고 해서 참된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노동자는 작업장을, 농민들은 대지를 탈취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속에서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조직·노동조합·협동조합·직장위원회·평의회(러시아말로는 소비에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초 이러한 조직은 소환 가능한 대리인을 갖고 서로 연합한다는 아나키즘의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었다. 말할 것 없이 모든 정치정당과 정치조직이 이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의 두 당파(멘셰비키와 볼셰비키Mensheviks and the Bolsheviks)는 이 사회혁명당(농민을 지지기반으로 한 대중주의 정당)과 아나키스트 모두 똑같이 활동적이었다. 아나키스트는 이 운동에 참여해 모든 경향을 자기관리로 유도하고 임시정부의 타도를 촉구했다. 혁명을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사회적인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레닌이 국외추방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런 노선으로 생각했던 정치경향은 아나키즘뿐이었다.
레닌은 자신의 당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고 혁명을 전진시켰다. 이는 그때까지의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분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원래 볼셰비키로서 멘셰비키로 전향한 사람이 비판했듯이, 레닌은 「30년 간 텅 비어 있던 유럽의 옥좌에 입후보한 것이다. - 바쿠닌의 옥좌로!」[Alexander Rabinowitch,Prelude to Revolution, p. 40에서 인용]. 볼셰비키는 이제 방향전환을 하고, 대중의 지지를 차지하며 직접행동을 옹호하고, 대중의 급진적 행동을 지원하며, 그때까지는 아나키즘에 연관된 각종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다.(「볼셰비키는, 그때까지 아나키스트가 특히 여러 차례 표명했던 슬로건을 내걸기 시작했다」[Voline,The Unknown Revolution, p. 210]). 곧바로 볼셰비키는 소비에트와 공장위원회 선거에서 많은 표를 획득하게 되었다. 알렉산더 버크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볼셰비키가 큰소리로 말했던 아나키스트의 모토는, 확실히 결과를 냈다. 대중은 볼셰비키의 깃발을 신뢰했던 것이다」[What is Anarchism?, p. 120].
당시 아나키스트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아나키스트는 공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에서 특히 활동적이었다(자세한 내용은 모리스 브린턴M. Brinton 저 『볼셰비키와 노동자 관리The Bolsheviks and Workers Control』를 참조). 아나키스트는 노동자와 농민이 유산계급을 수용하고 모든 형태의 정부를 폐기하며 자신들의 계급조직 - 소비에트·공장위원회·협동조합 등 - 을 사용해 사회를 아래부터 다시 조직하도록 주장했다. 아나키스트는 투쟁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알렉산더 라비노비치Alexander Rabinowitch는 (1917년 7월 봉기의 연구에서)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대중 차원에서는 특히(페트로그라드의)수비대와 크론슈타트 해군기지 안에서는 볼셰비키와 아나키스트와의 구별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무정부 공산주의자와 볼셰비키는 무학으로 힘이 없이 불만을 품은 같은 인구계층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1917년 여름에 무정부 공산주의자는 몇 가지 중요한 공장과 연대에서 누리던 지지와 함께, 흔들림 없이 일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만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아나키스트의 호소는 몇 군데 공장과 군대에서는 볼셰비키 자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만큼 컸던 것이다.[전게서, p. 64]
실제로 한 주도적 볼셰비키 당원은 1917년 6월(아나키스트의 영향력의 고조에 대해)다음처럼 말했다. 「자신들을 아나키스트로부터 갈라놓는 것은 자신들을 대중에서 떼어 놓게 되어 버릴 수도 있다」[Alexander Rabinowitch, 전게서, p. 102에서 인용].
아나키스트는 10월혁명으로 볼셰비키와 함께 행동하고 임시정부를 전복했다. 그러나 일단 볼셰비키당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자가 권력을 쥐자 사태는 일변했다. 아나키스트도 볼셰비키도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구호를 사용했으나 두 세력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 볼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스트의 입과 붓에서 나오는 구호는 성실하고 구체적이었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의 원칙에 부합하고 그런 원칙에 완전히 합치된 행동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볼셰비키의 경우, 같은 구호는 리버타리안의 구호와는 전혀 다른 현실적 해결책을 의미하고 있으며, 구호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상과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The Unknown Revolution, p. 210].
예컨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을 생각해 보자. 아나키스트에게 이는 바로 문자 그대로의 것 - 임무를 맡게 되거나 주민소환이 가능한 대리인을 기초로 해서, 직접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노동자 계급조직 - 을 의미했다. 볼셰비키에게 이 구호는 소비에트의 위에 볼셰비키 정부를 만들어 내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아나키스트가 선언한 것처럼 『권력』이 정말로 소비에트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볼셰비키 당에 속할 수는 없고, 볼셰비키가 상상하는 것처럼 볼셰비키당에 속한다고 하면 소비에트에 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Voline, 전게서, p. 213]. 소비에트를 중앙정권(볼셰비키) 정부의 포고를 실행할 뿐인 기관으로 축소하고 정부(즉, 현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를 전 러시아 - 소비에트 회의가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서, 「모든 권력」은 평등해지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인 것이다.
「생산의 노동자 관리」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10월혁명 이전에 레닌은 「노동자 관리」를 단순히 「자본가보다 뛰어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자 관리」라는 점에서 보고 있었다[Will the Bolsheviks Maintain Power?, p. 52].
공장위원회의 연합을 통한 노동자에 의한 생산관리 그 자체(즉 임금노동의 폐지)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아나키스트와 노동자 공장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S.A스미스S.A. Smith는 올바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레닌은 「이 말(노동자 관리)을 공장위원회가 쓰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레닌의 「제안은 특징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주의이며 중앙집권주의였다. 한편 공장위원회의 실천은 본질적으로 현장주의로 자율적이었던 것이다」[Red Petrograd, p. 154]. 아나키스트에게 「노동자 조직이(보스보다도)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면 노동자 조직은 모든 생산을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간산업의 철폐를 즉석에서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그것을 집단적 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나키스트는 『생산관리』라는 모호하고 불명료한 구호를 거부한 것이다. 아나키스트가 지지한 것은 집단적 생산조직에 의한 민간산업 - 점차적이지만 즉각적인 - 수용이었다」[Voline, 전게서 p. 221].
일단 권력을 잡게 되자 볼셰비키는 노동자 관리가 갖는 대중적 의미를 조직적으로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국가주의 개념으로 대체해 갔다.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썼다. 「소비에트 권력의 처음 몇 개월 동안 세 차례, (공장)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델을 현실화하려 했다. 각각의 지점에서 당 지도부는 그들의 발언을 막았다. 그 결과 경영권한과 관리권한 양쪽을 중앙당국에 종속하고 중앙당국이 만들어 낸 각종 국가기관에 부여하게 된 것이다」[Thomas F.Remington,Building Socialism in Bolshevik Russia, p. 38]. 이런 과정으로 인해 결국 레닌은 1918년 4월(국가가 위에서부터 지명한 경영자를 사용한) 「독재적」권력으로 무장한 「원맨 경영」에 찬동하고 그것을 도입했던 것이다. 이 과정은 모리스 브링턴Maurice Brinton 저 『볼셰비키와 노동자 관리 The Bolsheviks and Workers'Control』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동시에 볼셰비키의 실천과 그 이데올로기와의 명확한 연결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민중활동이나 민중사상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도 제시했다.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피터 아시노프Peter Arshinov는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1917년 10월혁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혁명에 참가한 노동자 대중,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무정부 공산주의자가 하나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사회혁명의 열정으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거기에서부터 완전한 발전을 뒤엎어 혁명의 숨통을 끊어버린 정치정당(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자)이 주었다. 10월에 관한 이들 두 가지 해석은 크게 떨어져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10월은 평등과 자주관리의 이름으로 기생계급의 권력을 진압하는 것이다. 볼셰비키의 10월은 혁명적 인텔리겐치아 정당에 의한 권력 탈취, 그리고 「국가사회주의」와 대중을 지배하는 「사회주의적」방법의 도입이다.[The Two Octobers]
당초 아나키스트는 볼셰비키를 지지했다. 왜냐하면 볼셰비키는 그 국가구축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소비에트를 지지했기 때문이다(사회주의 역사가 사무엘 하버Samuel Farber는 아나키스트는 「당초, 10월혁명에서 볼셰비키의 무명의 동맹 파트너였다」[Before Stalinism, p. 126].고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지는 곧 시들어 버렸다. 볼셰비키가 실제로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거꾸로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확보하려 했으며, 토지와 생산자원의 집단소유가 아니라, 정부소유를 요구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이미 말한대로 볼셰비키는 노동자관리, 자주관리 운동을 조직적으로 약화시키고 「독재적 권력」으로 무장한 「원맨 관리」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형 작업장 관리행태를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다.
소비에트에 관해서 말하자면 볼셰비키들은 그들이 가진 제한적인 독립과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훼손했다. 1918년 봄과 여름 동안 「소비에트의 선거에서 볼셰비키의 대패」에 대해서 「볼셰비키 무장 세력은 그런 지방 선거의 결과를 뒤집었다」.
또한, 「1918년 3월에 끝나는 임기 내내 정부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총선을 끊임없이 연기했다. 분명히 정부는 야당이 표를 많이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다」[Samuel Farber, 전게서, p. 24, p. 22]. 페트로그라드의 선거에서 볼셰비키는 「그때까지 누렸던 소비에트에서의 과반수를 잃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최대 정당이었다. 그러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선거 결과는 무의미했었다. 「볼셰비키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노조 및 지구 소비에트, 공장위원회 및 지구 노동자회의, 적군부대, 해군부대에 상당수의 대표가 있어 볼셰비키의 승리가 보장되었기」때문이다[Alexander Rabinowitch, “The Evolution of Local Soviets in Petrograd”, pp. 20-37,Slavic Review, Vol.36, No. 1, p. 36f]. 즉, 볼셰비키는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소비에트의 민주적인 성질을 압도함으로써 약체화 시켰다. 소비에트에서의 거절에 직면해 볼셰비키는 자신들에 「소비에트 힘」이 당의 권력과 같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볼셰비키는 소비에트를 파괴해야만 했다. 그리고 파괴한 것이다. 소비에트 시스템는 이름 뿐인 「소비에트」로 되어 버렸다. 사실 1919년 이후 레닌과 트로츠키 등의 주도적 볼셰비키는 자신들이 당의 독재를 만들어 낸 것을 인정하고, 그 이상으로 그러한 독재는 어떤 혁명에 있어서도 필수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었다(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의 발흥 후에도 당 독재를 지지했었다).
게다가 적군은 이미 민주적 조직이 아니었다. 1918년 3월 트로츠키는 장교와 병사위원회 선거를 폐지했다.
선거의 원리는 정치적으로 무익하며 기술적으로 부적당하고 지금까지도 현실에서 법령에 의해서 폐지되어 왔다.[Work, Discipline, Order]
모리스 브링턴Maurice Brinton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Treaties of Brest-Litovsk 이후에 군사 군무위원에 임명된 트로츠키는 곧바로 적군을 재편성했다. 불복종에 대한 사형은 그때까지는 비난을 받아 왔지만 부활했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장교는 경례, 특별한 경칭, 별개의 막사와 같은 특권을 갖게 됐다. 장교의 선거를 포함한 민주적 조직형태는 즉각 철폐된 것이다.[The Bolsheviks and Workers'Control, p. 37]
놀라지 마라, 사무엘 하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레닌 등의 볼셰비키 본류의 지도자가 근로자 관리의 상실이나 소비에트에서의 민주주의의 상실을 개탄했다는 증거가 없고, 적어도 레닌이 1921년에 전시 공산주의가 NEP로 치환되었을 때 밝힌대로 이러한 상실을 후퇴라고 언급했다는 증거도 없다」[Before Stalinism, p. 44].
10월혁명 후에, 아나키스트는 볼셰비키 체제를 비난하고 모든 보스(자본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로 부터 대중을 최종적으로 해방하는 「제3 혁명」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아나키스트는 볼셰비즘의 수사학rhetoric(예를 들면 레닌의 「국가와 혁명State and Revolution」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은)과 그 현실과의 근본적 모순을 폭로했다. 권력을 가진 볼셰비즘은 바쿠닌의 예언을 증명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는 공산당 지도부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독재」가 된 것이다.
아나키스트의 영향력은 강해지기 시작했다. 프랑스인 장교의 자크 사돌Jacques Sadoul은 1918년 초에 이렇게 썼다.
야당 가운데 아나키스트 단체가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전투적이며 아마 가장 인기가 있다고 생각된다. 볼셰비키는 불안한 것이다. [Daniel Guerin,Anarchism, pp. 95-6에서 인용]
1918년 4월 볼셰비키는 경쟁상대인 아나키스트를 물리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1918년 4월 12일 체카Cheka(1917년 12월 레닌이 창설한 비밀경찰)가 모스크바의 아나키스트 센터를 공격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아나키스트도 그 후 곧바로 공격당했다. 좌익에 있는 가장 시끄러운 적을 탄압하는 동시에 볼셰비키는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대중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소비에트, 언론의 자유, 적대하는 정치정당이나 정치단체, 직장이나 대지에서의 자주관리 - 이들 모두가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파괴됐다. 강조해야 하지만 이것들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1918년 5월 말에 내전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레닌주의 지지자 대부분은 볼셰비키의 권위주의를 비난했다. 내전 중, 이 과정은 가속해 볼셰비키는 모든 방면의 반대자를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권력을 쥐면 그 「독재」를 행사한다고 공언했던 바로 그 계급의 파업과 항의행동도 탄압한 것이다!
이 과정이 내전 발발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국가」 등 말의 모순이라는 아나키즘 이론을 추인하고 있다. 볼셰비키가 노동자의 권력을 당의 권력으로 바꾼 것(그리고 이 둘이 투쟁한 것)을 아나키스트는 놀라지 않았다. 국가란 권력의 위임이다. 즉, 「노동자의 권력」을 발현하는 「노동자의 국가」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노동자가 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권력은 노동자의 손에 있다. 국가가 존재한다면 권력은 만인의 손이 아니라, 정상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있다. 국가는 소수자 지배 때문에 설계된다. 이 기본적 성질·구조·설계 때문에 어떠한 국가도 노동자 계급(즉, 대다수) 자주관리의 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키스트는 노동자 평의회로부터 이루어지는 아래로 부터의 연합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혁명의 매체이며 자본주의와 국가가 폐기된 후에 사회를 관리하는 수단이다.
섹션 H에서 논하고 있듯이 볼셰비키가 민중노동자 계급정당에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독재자로 타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국가권력의 현실과 정치사상의 결합(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사회관계)은 이런 타락을 낳지 않을 수 없었다. 전위주의·자발성의 공포·정당권력과 노동자 계급 권력과의 동일시를 따르는 볼셰비즘 정치사상은 필연적으로 이 정당이 그것이 대표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충돌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이 정당이 전위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후위」가 된다. 즉, 노동자 계급이 볼셰비키의 정책에 저항하거나 소비에트 선거에서 볼셰비키를 거부하거나 한다면 노동자 계급은 「동요하고」 있으며, 「프티 부르」와 「후위」 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전위주의는 엘리트주의를 낳고, 국가권력과 결합해서 독재가 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늘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권력이란 권력을 소수자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회에서의 계급분단을 낳는다. 권력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분단이다. 그러므로 볼셰비키는 일단 권력을 잡게 되자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러시아 혁명은 마라테스타의 다음 주장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란 법제정을 위임받아 개개인을 법에 따르도록 하게하는 집단적 권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군의 사람들이며, 이미 특권계급으로 민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어떤 당국기관도 그렇겠지만 정부는 본능적으로 그 권력을 확대하고 민중에 의한 관리를 능가하며, 정부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부의 특수 이권을 우선하려 한다. 특권적 입장에 위치함으로서 정부는 이미 민중과 대립한다. 민중의 장점은 정부에 의해 처분되어버리는 것이다」[Anarchy, p. 34]. 볼셰비키가 구축한 것 같은 고도로 중앙집권형의 국가는, 설명 책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분리를 가속한다. 대중은 이미 영감이나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규율」(즉, 명령에 따르는 능력)이 결여되고 혁명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 버린다. 러시아의 어느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국가에 의해서 점차 노예로 되고 있다. 민중은 새롭게 발흥한 행정자 계급의 하인으로 바뀌고 있다. 이 새로운 계급이 주로 이른바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sia의 모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볼셰비키당이 새로운 계급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선의 의도와 열정도 중앙집권형 권력시스템에 내재하는 모든 악에 의해서 반드시 분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와 노동자와의 분리, 관리직과 노동자와의 분단은, 중앙집권화와 논리적으로 직결하는 것이다.[The Anarchists in the Russian Revolution, pp. 123-4]
이런 이유로 아나키스트는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의 정치사상의 발전이 고르지 않다는데 동의하면서, 「혁명가」가 노동자를 위해 권력탈취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노동자가 자신들이 실제로 사회를 운영할 때에만 혁명은 성공한다. 아나키스트에게 이것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유효한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 자신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자주적인 행동에 의해서다. 노동자는 구체적인 행동과 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신들 자신의 계급조직으로 통합되고, 혁명가에 의해 지원을 받지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혁명가는 대중의 위에서가 아니라 대중의 한 가운데서 전문직·기술직·방위 등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것이다」[Voline, 전게서, p. 197]. 노동자 권력을 당의 권력으로 바꿈으로써 러시아 혁명은 최초의 치명적 단계를 밟았다. 러시아에 있는 아나키스트가 다음에(1917년 11월 이후에)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 것이 현실로 된 것은 놀랄만하지 않다.
자신들의 권력이 강화되고 「합법화된다」면 볼셰비키(중앙집권 주의로 권위주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는 중앙에 의해 부과된 정부의 독재적 방법을 사용해, 이 나라와 민중의 생활을 재정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볼셰비키는 전 러시아에 당의 의지를 지시하고 전국에 명령을 내릴 것이다. 너희들의 소비에트와 그 외 각종의 지역 조직은 점차 중앙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단순한 실행기관이 되고 말 것이다. 노동자 대중에 의한 건강적이고 건설적인 일 대신에, 아래로부터의 자유결합 대신에,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장치의 도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위로부터 작용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일소하려 할 것이다. [Voline, 전게서, p. 235에 의한 인용]
이른바 「노동자의 국가」는 참가형의 것으로도, 노동자 계급인민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마르크스 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했다)으로도 될 수 없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가구조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수지배의 도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구조를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는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은(또 해방의 수단이 되는 「새로운」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도)불가능하다. 크로포트킨이 말했듯이, 아나키스트는 「국가조직은 소수자가 대중에 미치는 권력을 확립하고 조직화하는 세력이므로, 이런 특권을 파괴하는 기능을 하는 세력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Anarchism, p. 170]. 1918년에 쓰여진 아나키스트의 팸플릿의 말을 인용하자.
볼셰비즘은 나날이, 단계적으로 국가권력이 양도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그 이름과 그 「이론」, 그 종복을 바꿀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며 전제정치라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Paul Avrich,"The Anarchists in the Russian Revolution,"pp. 341-350,Russian Review, vol.26, issue no. 4, p. 347에서 인용]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고 수개월 만에 혁명은 죽었다.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볼셰비키와 USSR이 「사회주의」를 대표하게 됐다. 비록 그것이 진짜 사회주의 기반을 조직적으로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에트를 국가기구로 변환함으로써, 소비에트 권력을 정당권력으로 바꿈으로써, 공장위원회의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군대와 직장의 민주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적대자와 노동자 투쟁을 탄압함으로써, 볼셰비키는 노동자 계급을 노동자 계급 자신의 혁명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볼셰비키의 이념과 실천이란 그 자체로, 혁명의 타락과 최종적인 스탈린주의의 발흥에 관한 중대한 요인이며, 때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아나키스트가 수십 년 전에 예측했던 것처럼 내전 개시 이전의 수개월 동안 볼셰비키의 「노동자 국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에게 대한 권력이 되었고 근로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지고, 소수자 지배(이 경우에는 당에 의한 지배)의 도구로 되었다. 내전이 이 과정을 가속시키고, 곧바로 당의 독재 체제가 도입되었다(실제로 지도적인 볼셰비키는 당의 독재는 어떤 혁명에서도 필수라고 논하기 시작했다). 볼셰비키는 자국 내에서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자를 진압했다. 크론슈타트 봉기와 우크라이나의 마프노주의 운동을 분쇄함으로써 사회주의에 쐐기를 박고 소비에트를 정복한 것이다.
1921년 2월의 크론슈타트 봉기는 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막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이 봉기에 관한 완전한 논의에 대해서는 부록의 「크론슈타트 반란이란 무엇이었는가?」를 참조).
1921년 2월, 페트로그라드에서 파업을 벌이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크론슈타트 수병이 봉기했다. 그들은 15개 항목의 결의를 내걸고, 그 첫째 항목은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요구였다. 볼셰비키는 크론슈타트 반란을 반혁명이라고 헐뜯으며 반란을 분쇄했다. 아나키스트들에게 있어서 이는 중요했다. 내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탄압을 정당화할 수 없고(내전은 몇 달 전에 끝났으므로), 또한 이 반란은 「진정한」사회주의를 요구한 보통 사람들의 대규모 봉기였기 때문이다. 볼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크론슈타트는 민중이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신을 석방하고 사회 혁명을 실행하려는 완전히 첫 번째의 독자적인 시도였다. 이는 노동자 대중 자신이 직접 행했던 것이다. 정치적 양치기들, 즉 지도자와 조언자 등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세 번째 혁명, 사회혁명에의 첫걸음이었다.[Voline, 전게서, pp. 537-8]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나키즘 사상이 가장 잘 응용되고 있었다. 마프노주의 운동의 비호 하에 있는 지역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민중이 자신들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활을 직접 조직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자결이었다. 독학의 농민 네스톨 마프노의 지도 아래, 이 운동은 적과 백 양쪽의 독재와 싸웠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에게도 저항했다. 「민족자결」 즉 새로운 우크라이나 국가 창설의 요청에 반대해, 마프노는 우크라이나와 전세계 노동자 계급자결을 호소했다. 마프노는 동료인 농민과 노동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고무했다.
정복하느냐 죽느냐 - 이것이야말로 이 역사적 순간에 우크라이나 농민과 노동자가 처한 딜레마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실패를, 새로운 주인의 손에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실패를 반복하기 위해 정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의지와 진실에 관한 자신의 관념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하기 이한 것이다.[Peter Arshinov,History of the Makhnovist Movement, p. 58에서 인용]
이 목적을 보증하기 위해서 마프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해방한 마을과 도시에 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자유 소비에트를 창설시켰다. 그럼으로써 노동자는 자치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알렉산드롭스크Aleksandrovsk의 예를 보자. 마프노주의자가 이 도시를 개방하면 그들은 「곧바로 노동자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권유했다. 노동자가 이 도시생활을 조직하고 자신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조직으로 공장의 기능을 편성하도록 제안되었다. 최초의 회의 후, 곧바로 다음 회의가 열렸다. 근로자에 의한 자주관리의 원칙대로 생활을 조직할 때의 문제점이 음미되고, 근로자 대중에 의해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노동자 대중은 모두, 자주관리의 생각을 최대의 열의를 갖고 환영했다. 철도 노동자가 첫 발을 내디뎠다. 그들은 이 지방의 철도 네트워크를 조직할 책임을 가진 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단계에서부터 알렉산드롭스크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자주관리의 모든 기관을 창설한다는 문제에 조직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전게서, p. 149].
마프노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자유는 자신의 것이며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자신들에 적합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행동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고 생활의 전면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 이는 노동자나 농민 자신에게 맡기면 된다. 마프노주의자에게 가능한 것은 지원하는 것과 상담에 응해주는 것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배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Peter Arshinov, Guerin, 전게서, p. 99에서 인용]. 알렉산드롭스크에서 볼셰비키는 마프노주의자에게 서로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제안했다. 볼셰비키의 레우콤(Revkom:혁명 위원회)이 정치적 업무를 담당하고 마프노주의자는 군사업무를 담당 하면 좋다는 것이다. 마프노는 그들에게 조언했다. 「노동자에게 노예의 의향을 떠넘기는 것은 그만두고, 더 제대로 된 일을 하는게 어떤가」[Peter Arshinov inThe Anarchist Reader, p. 141].
동시에 마프노주의자는 자유농업 코뮌을 조직했다. 이는 「확실히 수는 많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참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훌륭했던 것은 가난한 농민만으로 이런 코뮌을 만든 것이었다. 마프노주의자는 농민에게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으며 자유코뮌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했다」[Arshinov,History of the Makhnovist Movement, p. 87]. 마프노는 지주 귀족의 재산을 폐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지의 소비에트와 그 지역회의·지방회의가 농민공동체의 전 구역에서 토지사용을 평등하게 한 것이었다[전게서, pp. 53-4].
그 이상으로, 마프노주의자는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 혁명의 발전·군사활동·사회정책에 관한 논의에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그들은 정치적·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자유 소비에트·노조·코뮌 같은 것을 논하기 위해 노동자·병사·농민의 대리인들의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다. 알렉산드롭스크를 해방했을 때에는 농민과 노동자의 지방회의를 개최했다. 마프노주의자가 1919년 4월에 농민·노동자 및 반정부 활동가의 제3회 지방회의를 개최하려던 때, 그리고 1919년 6월에 여러 지방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려 했을 때 볼셰비키는 이들의 회의를 반혁명이라고 간주하고 금지하려고 했으며, 법을 어기고 있다며 그 조직책과 대리인을 공표했다.
마프노주의자는 이들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볼셰비키에 대답해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몇 명의 자칭 혁명가가 만든 법률 등, 자칭 혁명가보다 더 혁명적인 민중전체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등, 존재할까?」 그리고 「혁명이 방어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인가? 당의 이익인가? 아니면 자신의 피로 혁명을 움직이는 민중의 이익인가?」 마프노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들의 근거로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들의 일을 논의하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이 갖는 불가침의 권리이자 혁명에 의해서 쟁취된 권리라고 생각한다」[전게서, p. 103 and p. 129].
나아가 마프노주의자는 「언론·사상·출판·정치결사의 자유라는 혁명적 원리를 충분히 채용했다. 마프노주의자가 점거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그들은 모든 금지사항을 없애고 약간의 권력에 의해 보도기관과 정치조직에 부과되던 모든 제한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민중에 대한 독재를 강제하려는 『혁명 위원회』의 형성을 금지하는 것, 마프노주의자가 생각한 유일한 제한은 이것이며, 볼셰비키 사회혁명당 좌파, 기타 국가주의자들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된 것이었다」[전게서, p. 153, p. 154].
마프노주의자는 볼셰비키에 의한 소비에트 개악을 거부하고, 대신 「권위나 독단적 법률이 없는 노동자의 자유롭고 완전히 독립된 소비에트제」를 제안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노동자 자신이 자신의 소비에트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소비에트는 노동자 자신의 의지와 소망을 실행하는 것이다. 즉, 지배하는 소비에트가 아니라, 『행정상의』소비에트인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는 국가와 함께 폐지된다. 대지와 직장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것이어야 한다. 즉, 사회화되어야 한다」[전게서, p. 271, p. 273].
군대 그 자체는 적군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었다(물론 내전의 가공할 성질의 결과, 몇 가지 점에서 이상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 그러나 트로츠키의 적군이 강제하던 체제와 비교하면 마프노주의자는 훨씬 민주적인 운동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아나키스트의 자주관리 실험은 피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볼셰비키는 마프노주의자(「백군」과 제정 지지자에 맞서 싸운 과거의 동맹자)가 필요 없게 되자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 중요한 운동은 이 FAQ의 부록 「왜 마프노주의운동은 볼셰비즘에 대한 대안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가?」에서 충분히 논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마프노주의 운동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명백한 교훈을 강조해 두려한다. 즉, 볼셰비키가 달성하려던 독재정책은 객관적 정황으로 인해 마프노주의 운동에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볼셰비즘의 정치사상은 마프노주의자의 결정에 명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같은 내전에서 활동적이었지만, 마프노주의자는 볼셰비즘이 그랬던 것처럼 정당권력이라는 같은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자유·민주주의·권력을 촉구하는 것에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그리고, 그러한 정책에 대한 볼셰비즘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면서)성공했던 것이다. 좌익에서 일반에 인정된 안목에서 보면 볼셰비즘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마프노주의의 경험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권좌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한다. 이것은 이용 가능한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는 객관적 장애물과 같은 정도로, 역사의 결과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의 일부이다. 분명히, 사상은 확실히 중요하며 그러므로 마프노주의자는 볼셰비즘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있었다는(지금도 있다)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대안이 아나키즘인 것이다.
그 후 1987년까지 한 번도 모스크바에서 아나키스트의 시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마지막 시위행진은 1921년 크로포트킨이 죽었을 때였다. 이 시위에서는 크로포트킨의 관의 뒤를 만 명 이상이 행진했다. 시위행진을 한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곳에 자유는 없다」,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일이다」라고 제시한 흑기를 내걸었다. 행진이 부티르카 형무소Butyrka prison 앞을 지나칠 때, 수감자들은 아나키스트의 노래를 부르며 독방의 쇠창살을 흔들었다.
러시아에 있는 아나키스트가 볼셰비키 체제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1918년의 일이었다. 아나키스트는 이 새로운 「혁명적」 체제에 탄압된 최초의 좌익 그룹이었다. 러시아 밖에서는 아나키스트는 볼셰비키를 계속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볼셰비키 체제의 억압적 성질에 대해서 아나키스트 정보 소식통으로부터 소식이 들어 올 때 까지 였다(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찬동의 정보 소식통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정적인 보도를 경시하고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보도가 오게 되자 전세계의 아나키스트는 볼셰비즘과 그 정당권력과 억압 시스템을 부정했다. 볼셰비즘의 경험은 다음의 바쿠닌의 예측을 확인한 것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란 「진짜 학자와 가짜 학자로 구성된 극소수의 신흥 귀족계급이 행하는 고도로 전제적인 대중지배」를 의미한다. 「민중이 학습하지 않으면 정부의 보살핌에서 해방되더라도 통치되는 군중 속에 통째로 포함될 것이다」[Statism and Anarchy, pp. 178-9].
1921년 이후 러시아 외부의 아나키스트는 USSR을 「국가자본주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러시아 내부의 아나키스트는 1918년 이후 이렇게 불렀다). 각각의 보스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서방에서 개개의 보스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소비에트 국가관료제가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에게 「러시아 혁명은 경제적 평등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대처는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정당의 독재 치하에 있는 러시아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일당독재의 철칙 하에서의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공산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이 대처는 실패에 그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도입되지 않았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Anarchism, p. 254]
러시아 혁명과 아나키스트가 이룬 역할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이 FAQ의 부록 「러시아 혁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록에서는 크론슈타트 봉기와 마프노주의 뿐 만 아니라 이 혁명이 실패한 이유, 이 실패에 볼셰비키의 이데올로기가 한 역할, 볼셰비즘에 대한 대안의 존재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하의 책도 추천한다. 볼린 저 『알려지지 않은 혁명The Unknown Revolution』, 그리고리 페트로비치 막시모프Grigori Petrovitch Maximov 저 『가동 중인 길로딘The Guillotine at Work』, 알렉산더 버크만 저 『볼셰비키의 신화The Bolshevik Myth』와 『러시아의 비극The Russian Tragedy』, 모리스 브링턴 저 『볼셰비키와 노동자 관리The Bolsheviks and Workers Control』, 아이다 메트Ida Mett 저 『크론슈타트 봉기The Kronstadt Uprising』, 피터 아시노프 저 『마프노주의 운동사The History of the Makhnovist Movement』, 엠마 골드만 저 『러시아에 대한 나의 환멸My Disillusionment in Russia』 과 『자서전Living My Life』.
이들 책의 대부분은 러시아 혁명 중에 활약한 아나키스트에 의해 쓰여 졌으며, 그들 대부분은 볼셰비키에 의해 투옥되고 서방으로 추방되었다. 추방으로 끝난 것은 모스크바에 온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의 대표단이 국제적 압력을 가해 준 덕분이었다. 볼셰비키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를 레닌주의로 끌어들이려고 설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표단의 대부분은 리버타리안 정치에 충실하고 볼셰비즘을 거부하도록 자신들의 조합을 설득하고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끊었다. 1920년대 초까지 모든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연합이 아나키스트와 함께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이며 당 독재라고 거부했다.
|
|
|
|
|
|
|
|
 |
A.5-3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구축 |
|
|
 |
A.5-3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구축
세기가 바뀌기 직전의 유럽에서 아나키즘 운동은 일상생활에 아나키즘 조직론을 응용한다는 계획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것 중 하나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혁명적 대중노조(생디칼리즘 혹은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으로 알려져있다)의 구축이다. 선구적인 프랑스 생디칼리스트 투사의 말로는 생디칼리즘 운동은 「아나키즘의 실천적 학교」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투쟁의 실험실」이며 「아나키한 노선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여러 리버타리안 조직」으로 조직함으로써, 생디칼리즘 조합은 자본주의 체재 하에서 자본주의와 싸우고,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체하는 「자유로운 생산자의 자유제휴」를 창조한 것이다[Fernand Pelloutier, No Gods, No Masters, vol.2, p. 57, p. 55, p. 56].
생디칼리스트 조직의 세부는 나라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었지만, 근본은 마찬가지였다. 노동자가 자기 자신이 조합(혹은 프랑스어로 조합을 의미하는 신디케이트syndicates의 뜻)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별 조직이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었지만, 직능조합이나 동업조합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조합은 그 조합원이 직접 관리하고, 산업과 지역에 근거해 하나로 연합했다. 그러므로 어떤 조합은 마을·지방·국가의 모든 노조와 연합하는 동시에 같은 산업의 조합 모두와도 연합해서 하나의 전국조합(예를 들어 탄광 노동자나 금속 노동자와 같은)이 되는 것이다. 각각의 조합은 자율적이며, 조합 임원은 모두 비상근이다(그리고 노조활동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는 그 평균 임금이 지급됐다). 생디칼리즘의 전술은 직접행동과 연대이며 그 목적은 새로운 자유사회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조합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의 존속기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단순한 과도기의 현상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주의 경제의 배아이며, 사회주의 일반의 초등학교이다」. 「노동자의 경제 투쟁조직」이 그 멤버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일 매일의 빵을 위한 투쟁 속에서 직접행동을 벌이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생활을(리버타리안) 사회주의 계획을 통해 사회생활의 재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단계도 멤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Rudolf Rocker,Anarcho-Syndicalism, p. 59, p. 62]. IWW의 표현을 사용하면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은 낡은 껍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89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의 시기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특히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에서 아나키스트들은 혁명적인 조합을 결성했다. 이어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아나키스트도 생디칼리스트 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다(특히 쿠바·아르헨티나·멕시코·브라질에서). 거의 모든 공업국에서 어떤 생디칼리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과 남미에는 최대 최강의 운동이 있었다. 이들 조합은 아나키스트의 방침에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의 연방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들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갈수록 자본가와 싸우고, 사회개조를 요구해 국가와 싸웠지만 동시에 혁명적 파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려했던 것이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수십 만 노동자들이 아나키즘 사상을 일상생활에 응용해, 아나키는 공상적인 꿈 이야기가 아니라 대규모로 조직을 만드는 실천적 방법이라고 증명한 것이다. 아나키스트의 조직방법은 회원의 참가·권한·전투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개혁을 요구한 싸움을 성공시키고 계급의식을 진전시켰다. 이것은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성장과 노동운동에 대한 그 영향력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산업노동자(IWW)는 지금도 조합 활동가들을 분발시키고 있으며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조합가와 구호를 제공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운동으로서의 생디칼리즘은 사실상 1930년대에 끝나버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생디칼리스트 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심한 탄압을 받았다. 전후 곧바로 이 운동은 그 절정기를 맞이했다. 이 투쟁의 파도는 이탈리아에서 「붉은 시대red years」로 알려져 있으며 거기서는 공장 점거운동(섹션 A.5-5를 참조)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들 조합이 각국에서 잇달아 궤멸된 시대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미디어·국가·자본가 계급이 전력으로 뒷받침한 탄압의 폭풍에 의해서 IWW가 궤멸했다. 유럽에서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무기 - 파시즘을 사용해 공격을 속행했다. 파시즘은 노동자 계급이 구축한 조직을 물리적으로 두들겨 부수기 위해 자본주의가 일으킨(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독일에서)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예에 자극 받아 전후 급속히 전 유럽으로 퍼진 급진주의 때문이었다. 부르주아 계급은 수많은 거의 혁명상태를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파시즘을 부탁한 것이었다.
이런 나라들에서 파시즘과(대다수는 영웅적으로) 싸워서 패한 아나키스트는 망명을 하던가, 지하로 숨어들어 가던가, 암살의 희생이 되던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던가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총 10만 명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 CGT가 파시즘에 대항하는 수많은 반란을 개시했다. 1934년 1월 CGT는 혁명적 총파업을 호소하고 5일 간의 폭동으로 발전했다.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군을 투입했다. CGT의 투사는 이 폭동에서 걸출한 용감한 역할을 했지만 CGT는 완전히 두들겨 맞고, 그 후 40년간 포르투갈은 계속해서 파시스트 국가였다[Phil Mailer,Portugal:The Impossible Revolution, pp. 72-3]. 스페인에서는(가장 유명한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 CNT가 마찬가지로 싸웠다. 1936년까지 조합원 수는 150만 명에 이르렀다. 못 가진 자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힘과 권리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계급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파시즘을 받아들인 것이었다[섹션 A.5-6를 참조].
생디칼리즘은 파시즘뿐 아니라 레닌주의가 가진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직면했다. 러시아 혁명이 언뜻 보기에 승리로 보이기에 많은 활동가들이 권위주의적 정치를 믿게 되었다. 이는 특히 영어권 국가들에서 현저했으며 프랑스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영국의 톰 맨Tom Mann,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갈라허William Gallacher, 미국의 윌리엄 포스터William Foster와 같은 저명한 생디칼리스트 활동가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다(적어 둬야 하지만 후자 두 명은 스탈린주의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어 공산당은 고의로 리버타리안 조합을 비판하고, 항쟁과 분열을 선동했다(예를 들어 IWW가 그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스탈린주의자는 파시즘이 동유럽에서 시작한 것의 마무리를 하고 불가리아와 폴란드 같은 곳에서 아나키즘 운동과 생디칼리즘 운동을 파괴했다. 쿠바에서는 카스트로Castro도 레닌의 실례에 따라 바티스타Batista 와 마차도Machado의 독재에서조차 이루지 못했던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즉 영향력을 가진 아나키즘 운동과 생디칼리즘 운동을 분쇄한 것이다(1860년대 그 시작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프랭크 페르난데스Frank Fernandez 저 『쿠바의 아나키즘Cuban Anarchism』을 참조).
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불가리아·포르투갈의 대규모로 강력한 아나키즘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파시즘에 의해서 궤멸되었다(그러나 싸우지 않고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강조해야 한다). 필요하게 되면 자본가들은 노동운동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자본주의에게 안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위주의 국가를 지지했다.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뿐이었다. 스웨덴에서는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SAC가 지금도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활동적인 다른 많은 생디칼리스트 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관료주의의 조합에 등을 돌리면서 커져 오고 있다. 관료주의 조합의 지도자들은 조합원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에 더 흥미가 있는 것 같았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에서 생디칼리스트 조합은 다시 일어서고 아나키즘 사상이 일상생활에서도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생디칼리즘의 뿌리는 창생기의 아나키즘 사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등장한 것은 1890년대 이후였다. 생디칼리즘이 비참한 「행동에 의한 프로파간다」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발전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대로이다. 이 시대에는 각각의 아나키스트가 민중봉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또는 파리 코뮌 참가자 등 반역자의 대량학살을 보복하기 위해서 정부요인을 암살했다(자세한 것은 섹션 A.2-18을 참조). 이것이 역효과의 실패로 끝나고, 아나키스트는 자신들의 뿌리와 바쿠닌의 사상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크로포트킨과 마라테스타와 같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것처럼 생디칼리즘은 제1 인터내셔널 리버타리안파가 갖고 있던 사상을 부활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바쿠닌은 이렇게 논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힘을 조직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직화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자신의 활동이어야 한다.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직업,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의 전투적 국제연대를 끊임없이 조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고립된 개인이나 지역으로서의 자신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전세계의 협력이 있다면, 자신이 막강하고 확고한 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어느 미국인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똑같은 투쟁심이 지금, 생디칼리즘 운동과 IWW운동의 최선의 표현 속에서 숨 쉬고 있다」. 어느 쪽 운동이나 「바쿠닌이 그 생애를 통해서 획득하려고 노력했던 이상인 세계 규모로서의 강력한 부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Max Baginski,Anarchy!An Anthology of Emma Goldman's Mother Earth, p. 71]. 생디칼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바쿠닌은 다음의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직업별 조직, 이 조직끼리의 연합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생생한 배아를 자력으로 만들어 낸다. 이것이 부르주아 세계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 조직과 연합은 사상뿐 아니라 미래 그 자체의 사실도 창조하는 것이다」[Rudolf Rocker, 전게서, p. 50에서 인용]. 이 생각은 다른 리버타리안도 거듭 말하고 있다. 파리 코뮌에서 맡은 역할 덕분에 살해당한 유진 벌린Eugene Varlin은 협동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1870년에 기업조합syndicates은 사회 재구축을 위한 「천연 원소」라고 주장했다. 「신디케이트syndicates를 생산자 협동조직으로 변환하기 쉽다. 사회개혁과 생산편성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신디케이트인 것이다」[Martin Phillip Johnson,The Paradise of Association, p. 139에서 인용].
섹션 A.5-2에서 논하는 것처럼 시카고의 아나키스트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었다. 노동운동을 아나키를 실현하는 수단, 자유사회의 틀이라고 보는 것이다. 루시 파슨스Lucy Parsons(앨버트 파슨스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민 구제조합·노동조합·노동의회의 집회 등은 이상적인 아나키즘 사회의 태아 집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Albert R.Parsons,Anarchism:Its Philosophy and Scientific Basis, p. 110에 수록]. 이런 생각이 IWW의 혁명적 조합주의에 이어졌다. 어느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IWW 창립대회 의사록에는 다음처럼 적혀 있다. 참가자는 단지 『시카고 이념』을 의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과 산업별 조합주의를 시작하려는 시카고의 아나키스트들의 투쟁과의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의식했다」. 시카고 이념은 「미국 최초의 생디칼리즘 표현」이었다[Salvatore Salerno,Red November, Black November, p. 71].
생디칼리즘과 아나키즘은 별개의 사상이 아니라 같은 사상의 다른 해석이다(완전한 논의는 섹션 H.2.8을 참조). 모든 생디칼리스트가 아나키스트는 아니고(생디칼리즘을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자도 있다), 모든 아나키스트가 생디칼리스트가 아니(그 이유에 대해서는 섹션 J.3-9를 참조)지만,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모두 노동운동과 기타 민중운동에 참여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운동 내부에서 리버타리안형의 조직과 투쟁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나키스트는 생디칼리스트 조합의 안팎에서 자신들의 사상의 타당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혁명은 그 시작부터 모든 사회적 부를 노동자가 장악하고, 이를 공유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해야 한다. 이 혁명이 성공하는 것은 노동자를 통해서만, 각지의 도시 노동자, 전원 노동자가 자신들 자신이 이 목적을 실행하는 것에 의한 것뿐이다. 그것을 위해 노동자는 혁명 전의 시기에 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노동자 조직이 있어서 비로소 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Selected Writings on Anarchism and Revolution, p. 20]. 이런 민중의 자주관리 조직이야말로 아나키의 행동인 것이다. |
|
|
|
|
|
|
|
 |
A.5-2 헤이마켓의 희생자 |
|
|
 |
A.5-2 헤이마켓의 희생자
5월 1일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옛 소련을 비롯한 어디에서나 스탈린주의 관료제에 휘말렸지만 노동운동의 축제인 메이데이는 세계연대의 날이다. 과거의 투쟁을 상기하고 보다 좋은 미래로의 희망을 시위하는 때이다. 한 사람의 피해는 모든 사람의 피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날이다.
메이데이의 역사는 아나키즘 운동, 보다 좋은 세계를 요구한 노동자 인민의 투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실제로 시카고의 아나키스트 4명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한 싸움에서 노동자를 조직했기 때문에 1886년에 처형된 것이 기원이다. 즉, 메이데이는 「아나키의 행동」의 산물이다. 세계를 변혁하고자 노동조합에 참여해 직접행동을 하던 노동자 투쟁의 성과인 것이다.
메이데이는 188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884년 미국 캐나다 직능 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Organised Trades and Labor Un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1881년에 설립되어 1886년에 미국 노동총연맹으로 개칭했다)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886년 5월 1일 이후 하루의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해야 한다. 이 결의에 준거해서 각각의 규칙을 방향 짓도록, 이 지구 전역의 노동자 조직에 요청한다」. 이런 요청을 지지해서 1886년 5월 1일의 파업이 호소되었다. 노조가 이 호소를 5월 1일에 파업을 벌일 것으로 선택한 이유의 일부에는 아나키스트의 존재가 있었다.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직접행동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아나키스트는 생각했다. 그들에게 8시간 노동과 같은 개량을 요구한 투쟁 그 자체만으로는 미흡했다. 그들은 그러한 투쟁을 사회혁명과 자유사회의 창조에 의해서만 종결하고 지속적인 계급전쟁에서 단 하나의 싸움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이념 하에 그들은 조직을 만들고 싸웠던 것이다.
시카고에서만 4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벌였다. 파업실행의 위협 덕분에 45,000명 이상이 파업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받았다. 1886년 5월 3일 매코믹하베스터 기계회사McCormick Harvester Machine Company에 피켓을 들고 진을 치고 있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해 적어도 한 명을 사망케 하고 5~6명의 중상자, 기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다음날 아나키스트는 이 만행에 항의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의 대중집회를 호소했다. 시장에 의하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간섭해야 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180명의 경관이 도착해 집회해산을 명령했다. 그 순간 군중을 향해 발포를 시작한 경찰대에 폭탄이 던져진 것이다. 경찰에 의해 얼마나 많은 시민이 죽고 부상당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공포시대가 시카고에 들이닥쳐다. 집회장·조합사무소·인쇄소·개인의 자택까지 경찰이 밟고 들어왔다(대개는 아무런 영장도 없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습격으로 저명한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는 일제 검거됐고 용의자의 대부분은 폭행을 당했으며, 매수된 자도 있었다. 영장 없는 수사에 대해서 따졌을 때, 주 법무관 J 그린넬J. Grinnell이 발표한 공식성명은 「우선 가택수색을 한 뒤 그 후 법을 알아보았다」였다 [“Editor's Introduction”, The Autobiographies of the Haymarket Martyrs, p. 7].
8명의 아나키스트가 살인의 공범자로 재판에 회부됐다. 피고인의 누구누구가 폭탄을 던졌다든가, 그것을 계획했다는 주장은 전혀 없었고, 그 대신에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법률이 심리되고 있습니다. 아나키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피고인들이 선택되고, 대배심에 의해서 발탁된 뒤 기소된 것은,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른 수 천 명에게 죄가 없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죄는 없습니다. 배심원 신사 여러분!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본보기로 교수형을 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제도나 우리 사회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전게서, p. 8].
배심원은 특별법원의 직원이 선정하고, 주 법무관이 임명했다. 한 명은 숨진 경찰의 친척, 나머지는 실업가였다. 특별법원의 직원이 「이 사건은 내가 맡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다. 이 녀석들은 틀림없이 교수형이 될 것」[전게서]이라고 공언했던 증거를 변호인이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당연히 피고인들은 유죄가 선고 되었다. 7명이 사형, 한 명이 금고 15년이었다.
국제적 항의 운동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7명 중 두 사람은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전세계적 항의도 미국 국가를 막지는 못 했다. 5명 중 한 명(루이스 링Louis Lingg)은 집행인을 속이고 사형집행 전날 자살했다. 나머지 4명(엘버트 파슨즈Albert Parsons, 오거스트 스파이즈August Spies, 아돌프 피셔Adolph Fischer, 조지 엥겔George Engel)은 1887년 11월 11일에 교수형을 당했다. 노동운동사에서 그들은 헤이마켓의 희생자로서 이름을 남기고 있다. 장례 행렬의 길에는 15,000명에서 5만 명이 줄을 이루고 추정 1만 명에서 25,000명이 매장을 지켜봤다.
1889년 파리 국제 사회주의자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대표단은 5월 1일을 노동자의 명절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노동자 계급투쟁을 기념하고 「시카고의 순교자 8명」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후, 메이데이는 국제연대의 날이 되었다. 1893년 신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와 전세계 노동자 계급이 알고 있었음을 공식 인정하고 희생자들은 분명히 결백하고 「재판은 불공정했다」고 하면서 사면을 주었다.
재판 당시, 당국은 이러한 탄압으로 노동운동의 등뼈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희생자인 한 사람 오거스트 스파이즈는 사형판결을 받은 뒤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학대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참과 빈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운동, 노동운동을, 우리를 교수형으로 만들어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너희들의 견해라고 한다면, 사형에 처하는게 좋다! 여기서 너희들은 불꽃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너희들의 배후에서, 너희들의 눈앞에서, 여기저기서 불길이 타오를 것이다. 이는 지하의 불이다. 너희들이 끌 수는 없다[전게서, pp.8-9].
당시 그리고 그 후 수년 간에 걸쳐, 특히 미국에서 국가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반역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나키즘으로 끌어들였다. 헤이마켓 사건 이후 아나키스트는 메이데이를(즉 5월 1일을 - 개혁주의 노조와 노동계 정당은 메이데이 행진을 5월의 첫째 일요일로 변경했지만)축하하고 있다. 우리가 메이데이를 축하하는 것은 전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지배계급에게 그 취약성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다. 네스톨 마프노Nestor Makhno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날 미국의 노동자는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유산계급의 국가와 자본이 갖는 부정한 질서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려고 했다.
시카고의 노동자는 자신들의 삶과 투쟁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결집했다.
오늘날에도 노동자는 5월 1일을 자신들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해방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모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The Struggle Against the State and Other Essays, pp. 59-60]
아나키스트는 메이데이의 진정한 기원에 충실하고 억압받는 자의 직접행동으로 그 기원을 축하한다. 억압과 착취는 저항을 낳는다. 아나키스트에게 메이데이는 이런 저항과 힘을 국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이 힘은 오거스트 스파이즈의 마지막 말로 나타나며, 시카고의 발트하임Waldheim 묘지에 있는 헤이마켓 희생자의 비에도 새겨져 있다.
오늘 너희들이 강요하는 침묵 이상으로 우리의 침묵이 더 강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국가와 기업가 계급이 시카고의 아나키스트들의 교수형에 집착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대규모로 급진적인 조합운동의 「지도자」라고 간주되었다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 1884년 시카고의 아나키스트들은 세계 최초의 아나키스트 일간신문 『Chicagoer Arbeiter-Zeiting』을 발간했다. 이 신문을 쓰고, 읽고, 소유하며 발행한 것은 독일 이민의 노동자 계급운동이었다. 이 일간지·주간지(『Vorbote』)·일요판(『Fackel』)의 총 발행 부수는 1880년의 13,000부에서 1886년의 26,980부로 배 이상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을 향한 아나키스트 주간지도 존재했다(영어·보헤미아어·스칸디나비아어)
아나키스트들은 중앙 노동조합(시카고시에 있는 11개 주요 노조가 포함된)결성에 대해서도 매우 활동적이었다. 엘버트 파슨즈(희생자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것을 「미래의 『자유사회』의 배아집단」으로 하려 했다. 아나키스트들은 국제노동자협회(IWPA 흑색 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불렸다)의 구성원이기도 했다. 그 창립대회에는 26개 도시의 대표가 참가했는데, 곧바로 IWPA는 「특히 중서부에서 노동조합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반 노조원에 의한 직접행동」이라는 생각과 「자본주의의 완전 파괴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신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핵으로서 기능하는」노동조합이라는 생각은 시카고 이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이념이 이후의 1905년에 시카고에서 창립된 세계산업노동자IWW를 자극한 것이다)[“Editor's Introduction,” The Autobiographies of the Haymarket Martyrs, p. 4].
이 사상은 1883년 IWPA피츠버그 회의에서 제기된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첫째: 모든 수단 - 정력적이고 가차 없는 혁명적 국제행동 -을 이용해 기존 계급지배를 파괴한다.
둘째: 협동 생산조직을 바탕으로 자유사회를 구축한다.
셋째: 상거래와 이윤 창출 없이 등가물을 생산조직이 생산조직 간에 자유롭게 교환한다.
넷째: 남녀 모두를 위한 비종교적이며 과학적이고 평등한 기반에 근거한 교육을 체계화한다.
다섯째: 성별과 인종에 의한 차별 없이, 만인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제공한다.
여섯째: 모든 공무는 연합적 기반에 근거하고, 자율(독립)코뮌과 협동조직 간의 자유 계약에 의해서 규정된다[전게서 p. 42].
조합의 조직화와 함께, 시카고의 아나키즘 운동은 다양한 사교클럽, 야유회·강좌·댄스·문고와 같은 많은 활동도 조직했다. 이러한 활동의 도움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중심에 확실히 노동자 계급의 혁명문화가 형성됐다. 지배계급과 그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운동의 지속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특히 1877년 대규모 노동자 봉기의 기억이 새로웠던 점도 있다. 1886년과 마찬가지처럼 이 반란은 국가폭력에 직면했다. - 이 파업 운동과 헤이마켓 사건의 상세한 것은 J 브레처 지음 『파업!Strike!』을 참조). 그 결과가 국가와 자본가 계급이 운동의 「지도자」로 여긴 사람들의 탄압·날조·재판·국가살인이었다.
헤이마켓 사건의 희생자와 그들의 삶과 사상을 더욱 알기 위해서는 『헤이마켓 희생자의 자서전The Autobiographies of Haymarket Martyrs』이 기본 문헌이다. 유일한 미국 출생의 희생자 앨버트 파슨즈는 자신들이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해설한 책 『아나키즘: 그 철학과 과학적 기초Anarchism: Its Philosophy and Scientific Basis』를 썼다. 역사가 폴 애브리치Paul Avrich저 『헤이마켓의 비극The Haymarket Tragedy』은 이 사건을 면밀하게 해설하고 있어 유용하다.
|
|
|
|
|
|
|
|
 |
A.5-1 파리 코뮌 |
|
|
 |
A.5-1 파리 코뮌
1871년의 파리 코뮌은 아나키즘 사상과 아나키즘 운동 양쪽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쿠닌은 당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즉 아나키즘)는 파리 코뮌에 있어서 첫 번째의 인상적이고 실천적인 실증을 기획했다. (그것은)노예 취급받는 모든 사람들(원래 노예가 아니었던 대중은 어디에 있다는 건가?)에게 해방과 번영으로의 유일한 길을 제시한 것이다. 파리는 부르주아 급진주의의 정치적 전통에 치명적 일격을 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Bakunin on Anarchism, pp. 263-4].
파리 코뮌은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패배한 후에 생겼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국민군의 대포가 시민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 정부군을 파견하려 했다. 코뮌에 참가했던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베르사이유 정부군 병사들이 대포를 빼앗으려는 것을 알자 몽마르트의 남녀들은 놀랄만한 기동력을 발휘해 언덕에 몰려들었다. 언덕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것으로 확신했지만, 희생이 될 각오를 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야유를 퍼붓는 군중에 발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총구를 상관에게 향했다. 그것은 3월 18일의 일이었다. 이렇게 코뮌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3월 18일은 왕당파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민중이거나 어느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중의 것이 된 것이다」[Red Virgin:Memoirs of Louise Michel, p. 64].
파리 국민군이 호소한 자유선거에서 파리 시민은 코뮌 평의회를 선출했다. 평의회에서는 자코뱅파와 공화파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회주의자(그 대부분은 블랑키스트Blanquists -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자 - 와 아나키스트 프루동 지지자였다)는 소수였다. 평의회는 파리의 자치를 선언한 뒤 프랑스를 코뮌(즉 지역사회)의 연방으로서 재생시키려 했다. 코뮌 내부에서 선출된 평의원은 소환이 가능하고, 보수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같았다. 더구나 평의원들에게는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파면되게 되어 있었다.
이 운동이 아나키스트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이유는 분명하다. 아나키즘 사상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리 코뮌의 실례는 혁명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관한 바쿠닌의 예언에 많은 점에서 많이 닮아있는 것이다. 대도시가 자치를 선언하고 그 자체를 조직하고, 실례에 의해 선도하며, 다른 곳도 계속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Bakunin on Anarchism 수록의 『Letter to Albert Richards』를 참조]. 파리 코뮌은 보텀업bottom-up에 의한 조직화라는 새로운 사회창조 과정을 개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권력의 분산으로 향하는 일격」이었다[Voltairine de Cleyre, “The Paris Commune,” Anarchy! An Anthology of Emma Goldman's Mother Earth, p. 67].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 르클뤼스Reclus 형제, 유진 벌린Eugene Varlin(나중에 탄압으로 살해되었다)등 많은 아나키스트가 파리 코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협동조합으로 직장을 재개하는 등 코뮌이 개시한 개혁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나키스트의 협동노동의 이념이 실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월까지 43개의 직장이 협동조합형으로 운영되게 되었으며, 루브르 미술관은 노동자 평의회가 운영하는 군수공장이 되었다. 프루동의 말에 동조하면서 기계공 조합의 집회나 금속노동자 협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의 경제적 해방은 노동자 협회의 형성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입장을 단순한 임금 노동자에서 동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노동조직에 관한 코뮌위원회」에서의 자신들의 대리인에게 다음의 목표를 지지하도록 명령했다.
노예제도의 마지막 흔적인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철폐
공제조합과 양도 불가능한 자본으로의 노동의 조직화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코뮌에서 「평등이 공허한 말이 돼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증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The Paris Commune of 1871:The View from the Left, Eugene Schulkind(ed.), p. 164]. 기술직 조합은 4월 23일의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 했다. 코뮌의 목적은 「경제적 해방」이어야 하는 이상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를 철폐하기」위해 「연대책임을 가진 협동조직을 통해서 노동자를 조직해야」한다[Stewart Edwards,The Paris Commune 1871, pp. 263-4에서 인용].
코뮌 참가자는 자주관리형 근로자 협동 조직뿐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직접민주적 지역의회(섹션)와 유사한 인기있는 조직인 민중클럽이나 민중조직의 네트워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했다. 「모두 자신의 시민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문을 통해서, 자치를 하자」고 어느 클럽의 신문은 주장했다. 코뮌은 집결한 민중의 표현이라고 여겨졌다. (다른 신문을 인용하면) 「코뮌의 힘은 속박과 예속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지구(지역 안)에 존재한다」. 프루동의 지지자이자 친구이기도 했던 예술가 귀스타프 쿠르베Gustave Courbet가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파리는 「진정한 파라다이스이다. 모든 사회단체가 연합으로 스스로를 확립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다」[Martin Phillip Johnson,The Paradise of Association, p. 5, p. 6에서 인용].
이어 코뮌의 「프랑스 국민에 대한 선언」에는 많은 중요한 아나키즘 사상과 같은 생각이 제시되었다. 사회의 「정치적 통일」을 「모든 지역 발의의 자발적 제휴, 만인의 행복·자유·안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한 개개인의 에너지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합류」에 따른 것으로 생각했다[Edwards, 전게서, p. 218에서 인용]. 코뮌 참가자가 마음에 그린 신사회의 기반은 「각자에게 완전한 권리를 보증하고 각각의 프랑스인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코뮌의 완전 자치였다」[“Declaration to the French People”, George Woodcock,Pierre-Joseph Proudhon:A Biography, pp. 276-7에서 인용]. 코뮌연방이라는 이 비전과 함께 바쿠닌은 정말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파리 코뮌은 「국가의, 대담하고 명확하게 계획된 부정」이었다[Bakunin on Anarchism, p. 264].
그 이상으로, 연합에 관한 코뮌의 생각은 분명히 프랑스 급진주의 사상에 대한 프루동의 영향력을 반영했다. 실제로 지역의 선거인이 낸 명령위탁에 구속되고, 어떤 때라도 경질대상이 되는 대리인 연합에 기초한 코뮌형 프랑스라는 파리 코뮌의 비전은 프루동의 사상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프루동은 1848년에 「구속력 있는 위임의 실시」에 찬동하고[No Gods, No Masters, p. 63], 저서 『연합의 원리The Principle of Federation』에서는 코뮌 연합에 찬동했다).
즉,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파리 코뮌은 아나키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프루동과 바쿠닌이 상술한 협동생산 이론은 의식적으로 혁명실천이 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코뮌이 연합주의와 자율을 요구하는 가운데 아나키스트는 다음의 것을 보았던 것이다. 「미래의 사회조직은 노동자의 자유 협동조직이나 연합에 의해 아래에서 위로 실행될 것이다. 협동조직으로 시작되어 코뮌으로, 지방으로, 국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대연합으로 도달하는 것이다」[Bakunin, 전게서, p. 270]. 그러나 파리 코뮌은 아나키스트에게 충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코뮌은 내부에서 국가를 부정하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부정했지만. 코뮌 참가자들은 자코뱅적인 방법(바쿠닌의 신랄한 말투)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었다. 표트르 크로포트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유 코뮌을 선언했을 때, 파리 사람들은 아나키즘의 주요 원칙을 선언했다」하지만 「그들은 좌절하고 말았다」. 그리고 「낡은 시의회를 흉내 내 코뮌 평의회에」몸을 던졌다. 즉, 파리 코뮌은 「국가의 전통과 대의제 정부의 전통과 결별」하지 않고, 「그 독립과 자유연합을 선언함으로써 코뮌이 착수했을 간단한 것에서부터 고도의 것으로의 조직화를 코뮌 내부에서 도달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이윽고 코뮌 평의회가 관료적 형식주의로 꼼짝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참사를 일으키고 「대중과 계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감성」을 잃게 되었다. 「혁명의 중심세력 - 민중 - 에서 떨어짐으로서 무력해 지고, 그 자체도 민중의 발의를 무효화하고 말았던 것이다」[Words of a Rebel, p. 97, p. 93, p. 97].
또한 경제개혁의 시도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근로현장을 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즉 자본을 수용하는 것)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협동조합이 서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동조직을 만드는 일도 없었다. 볼테린 드 클라이어소가 강조하듯이, 파리는 「경제적 압제를 물리치지 못했다. 파리가 도달할 수 있었을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그것은 「자유 커뮤니티의 경제현상은, 세계의 자본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무용하고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실제 생산자와 분배자 집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전게서 p. 67]. 파리가 프랑스군에 계속 포위된 이상, 코뮌 참가자들이 다른 것에 급급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크로포트킨의 말을 빌리자면 그 자세야 말로 파멸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경제문제를 뒤로 미루고, 코뮌이 승리한 후에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후 곧바로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중산층의 피에 굶주린 복수가 시작되자 경제분야에서도 동시에 민중이 승리하지 않으면 민중 코뮌의 승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증명됐던 것이다[전게서, p. 74].
아나키스트는 여기서 분명한 결론을 끌어냈다. 「만약 독립 코뮌을 통치하는 중앙정부 등이 불필요하고, 중앙정부를 파기해 자유연합에 의해 전국을 통일할 수 있다면, 중심이 되는 자치단체 정부 역시 불필요하고 유해하다. 바로 같은 연합원리가 코뮌 내부에서도 기능할 것이다」[Kropotkin,Evolution and Environment, p.75]. 1789년~1793년의 혁명에서의 파리 「지구」와 마찬가지로 (크로포트킨 저 『프랑스 대혁명 Great French Revolution』을 참조) 직접민주주의 대중집회의 연합을 조직함으로서 코뮌 내부에서 국가를 폐기하지 않고, 파리 코뮌은 대의제 정부를 유지하고 거기에 시달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동하는 대신에 통치자를 신뢰하고 주도권을 그들에게 위임했다. 선거의 필연적 결과를 처음 제시해 준 것이다」. 그리고 평의회는 곧바로 「혁명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 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는 혁명적으로 될 수 없다는 정치적 공리」를 증명했던 것이다[Anarchism, p. 240, p. 241, p. 249].
평의회는 그들을 선출한 민중들로부터 점점 고립되었다. 그 결과 갈수록 무의미해졌다. 무의미하게 되면 될수록 권위주의적 경향이 대두되고, 다수를 차지하던 자코뱅파는 「혁명」을(테러에 의해) 「방어」한다는 「공안위원회」를 창설하려 했다. 소수파인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자는 그 위원회에 반대했으며, 다행스럽게도 파리 시민도 현실에서 그것을 무시했다. 파리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군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군은 자본주의 문명과 「자유」라는 이름 하에 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5월 21일 정부군은 파리시에 돌입, 7일 동안 장렬한 시가전이 이어졌다. 보병부대와 부르주아지 무장 자경단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마음껏 살육을 저질렀다. 시가전으로 25,000명 이상이 살해되고 항복 후에도 다수가 처형됐다. 그 시체는 집단묘지에 방치되었다. 모욕의 정점은 부르주아들이 코뮌 탄생지인 몽마르뜨 언덕에 부르주아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급진주의자와 무신론자의 반란을 메우기 위해서 세운 샤크레 쾨르Sacr? Coeur 성당이었다.
아나키스트에게 파리 코뮌의 교훈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분권형 커뮤니티 연방은 자유사회에 필수적인 정치형태라는 것이다(「이것 ?독립코뮌- 이야말로 사회혁명이 취해야 할 형태이다」[Kropotkin, 전게서, p. 163]). 두 번째로, 「코뮌보다 상위의 정부가 필요한 이유 따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뮌 내부의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즉, 아나키스트의 커뮤니티는 자유롭게 서로 협력하는 마을집회와 직장집회의 연합에 기초한 것이다. 세 번째로,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을 사회혁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장 먼저 코뮌을 강화 한다며 사회혁명은 뒷전으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혁명에 의해서 코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Peter Kropotkin,Words of a Rebel, p. 97].
아나키즘의 관점에서의 파리 코뮌에 대해서 더 알려면 『반역자의 말Words of a Rebel』에 수록된 크로포트킨의 에세이 「파리 코뮌The Paris Commune」 과 『바쿠닌의 아나키즘Bakunin on Anarchism』에 수록되어 있는 바쿠닌 저 「파리 코뮌과 국가의 이념The Paris Commune and the Idea of the State」을 참조하기 바란다.
|
|
|
|
|
|
|
|
 |
A.5 「아나키 행동」의 실례는 무엇인가 |
|
|
 |
A.5 「아나키 행동」의 실례는 무엇인가
아나키즘은 지난 두세기 동안 세계를 바꾸려 했던 무수한 혁명가들의 활동이나 다름없다. 여기에서는 이 운동의 정점 몇 가지를 논한다. 그것들은 모두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아나키즘은 세계를 철저하게 바꾸는 것에 관여하고 있다. 현행 시스템 내에서 아나키즘적 경향의 성장과 발전을 촉구함으로서 현행 시스템의 비인간성을 완화하는 것만이 아니다. 순수한 아나키즘 혁명은 아직 일어난 적이 없지만 아나키즘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다수의 아나키스트가 참여한 혁명은 많이 있었다. 그러한 혁명은 모두 괴멸됐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나키즘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반대세력(공산당 또는 자본가 어느 쪽이 지원했던)때문이었다. 압도적인 세력 앞에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이들 혁명은 아나키스트의 창조적 자극이자 아나키즘이 실행 가능한 사회이론이며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의 증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혁명이 공유하는 것은 프루동의 말을 사용한다면, 「아래로 부터의 혁명」 즉, 「집단적 활동, 대중적 자발성의 사례」라는 사실이다. 자유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억압 받는 사람들 자신의 행동에 의한 아래로 부터의 사회변혁뿐이다. 프루동은 「민중에 의해 아래로 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혁명이 얼마나 진지하고 지속적일까?」라고 묻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나키스트는 「아래로부터의」혁명가인 것이다. 이 섹션에서 논할 사회혁명과 대중운동은 민중의 자치활동, 자기해방의 실례이다(프루동은 1848년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스스로를 해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George Woodcock,Pierre-Joseph Proudhon:A Biography, p. 143, p. 125에서 인용]. 모든 아나키스트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적 변혁이라는 프루동의 이념, 억압 받는 사람들 자신의 행동에 의한 새로운 사회의 창조에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국가조직 그 자체의 적이며, 민중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민중자신의 자율적이고 완전히 자유로운 협동조직에 의해서, 어떤 간수의 감시도 없이 아래로부터 조직을 만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창조할 때뿐이라고 믿고 있다」[Marxism, Freedom and the State, p. 63]. 섹션 J.7에서는 아나키스트가 생각하는 사회혁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회혁명에는 무엇을 수반하게 되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 혁명운동의 대부분은 아나키스트가 아닌 사람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겠지만,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기 전 그것의 생명선이었던 대중운동이나, 아나키스트들이 그 대중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파리 코뮌, 이탈리아의 공장 점거, 스페인의 집산체를 들어 본 사람도 거의 없다. 허버트 리드Read, Hebert가 쓰고 있듯이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역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생긴 사건의 기록이다. 이것이 신문의 제목이 됐으며 공식기록에 성문화한다. 이것을 지상의 역사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 이러한 공적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에 선행하지만 공식기록에는 문장화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역사이다」[William R.McKercher,Freedom and Authority, p. 155에서 인용]. 대개 당연한 일이지만 대중운동이나 반란은 「지하역사」의 일부이며, 엘리트의 역사, 즉 왕·여왕·정치가 부자의 보고서에서 보기 좋게 무시되는 사회사이다. 이런 모리배의 명성은 다수의 사람들을 분쇄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지금부터 말하는 「아나키 행동」의 실례가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볼린Voline이 말하는 「알려지지 않은 혁명」의 일부임을 의미한다. 볼린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러시아 혁명의 보고라는 제목에서였다. 러시아 혁명에서 민중 자신에 의한 독자적이고 창조적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이 활동을 말로 나타내기 위해 이 말을 쓴 것이다. 볼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혁명을 연구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혁명의 깊은 곳에서 소리도 없이 조용히 일어나는 이런 발전을 신용하지 않고 무시한다. 기껏해야, 그들은 몇 마디를 전달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숨겨진 사실들이 정말로 중요하며, 고려 중인 사건이나 그 시대에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것이다」[The Unknown Revolution, p. 19]. 아나키즘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난 수세기에 걸친 「지하의 역사」와 「알려지지 않은 혁명」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FAQ의 본 섹션에서 그 공적이 부각될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실례는 대규모 사회실험이지만 자본주의 하에서의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아나키스트의 충실한 실천활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표트르 크로포트킨(『상호부조론Mutual Aid』)과 콜린 워드(『아나키의 실천Anarchy in Action』)는 「보통사람들」이 많은 경우 아나키즘을 의식하지 않고, 공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등자로 협동하는 많은 방식을 보고하고 있다. 콜린 워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나키즘 사회, 권력 없이 조직되는 사회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눈 밑에 묻힌 씨앗처럼 국가와 그 관료제, 자본주의와 그 소비, 특권과 그 불공정, 내셔널리즘과 그 자살과 같은 충성심, 종교적 차이와 그 미신적인 분리주의, 이들의 중압 하에 묻혀있는 것이다」[Anarchy in Action, p. 14].
아나키즘은 단지 미래사회와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사회투쟁에도 관여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주활동과 자기해방이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많은 평론가들이 아나키즘 운동을 과거의 일로 쓰게 되고 말았다. 전쟁 전부터 전쟁 기간까지, 파시즘이 유럽 아나키즘 운동을 소멸시켰을 뿐 아니라 전후에도 서쪽에서는 자본주의자, 동쪽에서는 레닌주의자가 아나키즘 운동의 부활을 가로막은 것이다. 같은 시기에 아나키즘은 미국·라틴 아메리카·중국·한국(아나키즘적 내실을 가진 사회혁명이 한국전쟁 전에 탄압받았다)·일본에서도 탄압을 받았다. 최악의 탄압에서 벗어난 국가도 하나 둘 있기는 있었지만, 냉전과 국제적 고립이 어울려 스웨덴의 SAC 같은 리버타리안의 조합은 개혁주의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60년대는 새로운 투쟁의 10년이었다. 전세계에서 「신좌익」은 자신의 사상을 찾아 여러 가지 사상에 눈을 돌렸으며 아나키즘에도 주목했다. 1968년 5월 프랑스의 대격동에서 걸출한 많은 인물이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생각했다. 이런 운동 그 자체는 소멸해 버렸지만 이를 극복한 사람들은 그 사상을 견지하고 새로운 운동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 프랑코가 죽자 스페인에서는 아나키즘이 대규모로 재생했다. 프랑코 사후의 첫 CNT행사에는 무려 50만 명이 참가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다시 민주주의가 제한되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는 아나키즘이 성장했다. 최종적으로 80년대 후반, 레닌주의의 소련에 최초의 일격을 가한 것은 아나키스트였다. 1928년 이후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항의시위는 1987년 아나키스트가 한 것이다.
오늘의 아나키즘 운동은 아직 약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수 십 만의 혁명가를 조직하고 있다. 스페인·스웨덴·이탈리아에는 리버타리안 노조운동이 있으며, 대략 25만 명을 조직하고 있다. 다른 여러 유럽 국가도 수 천 명의 능동적 아나키스트가 존재한다. 아나키스트 그룹이 처음 나타난 나라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와 터키 등이 그렇다. 남미에서 아나키즘 운동은 대규모 부활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아나키스트 그룹 「코리오 A Corrio A」(서클 A)가 배포하는 연락 리스트에는 거의 전세계에 걸친 100이상의 조직이 기록되어 있다.
아마 아나키즘의 부활은 북미가 가장 낙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모든 리버타리안 조직은 현저하게 성장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성장이 가속해 간다면 새로운 아나키의 실천사례도 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나키스트 조직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FAQ의 이 파트의 중요성은 적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유토피아 주의」(공상적 이상주의)라는 그럴듯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열린 아나키즘의 많은 실례를 부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아나키의 실천사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책 속에 눈에 안 띄게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학교나 대학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언급 하더라도 왜곡되어 있다). 말할 것 없이 여기서 소개하는 실례도 바로 그러한 몇 안 되는 실례이다.
아나키즘은 많은 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 모든 사례를 보고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소개 할 뿐이다. 소개하는 실례가 유럽 중심주의적이라고 생각되면 미안하기 그지없다.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서 다음의 것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서의 생디칼리스트의 반란(1910-1914)과 직장대표제(the shop steward)운동(1917-21), 독일(1919-21), 포르투갈(1974), 멕시코 혁명, 쿠바 혁명에서의 아나키스트, 제2차 세계대전 중, 대전 후의 한국에서의 반일본제국주의(미제, 러시아제국주의) 투쟁, 헝가리 동란(1956), 1960년대 후반의 「취업거부」투쟁 (특히 1969년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the hot Autumn」), 영국의 탄광파업(1984-85), 영국의 인두세 반대 투쟁(1988-92), 프랑스의 1986년과 1995년의 파업, 80년대와 90년대의 이탈리아의 COBAS운동, 21세기 초기 아르헨티나 반란에서의 민중집회와 자주관리형 직장점거. 그 외 수많은 투쟁에 아나키즘의 자주관리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아나키스트가 주체적 역할을 하거나 지도적 역할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사상은 운동 그 자체로부터 성장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에게 혁명과 대중투쟁은 「억압받는 자의 축제」이다. 그 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세상 모두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다.
|
|
|
|
|
|
|
|
 |
A.4-4 아나키즘에 가까운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이 있는가 |
|
|
 |
A.4-4 아나키즘에 가까운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이 있는가
앞의 섹션에서 초점을 맞춘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자에 마르크스 주의자는 없다.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가 권위주의인 이상, 이것은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학파의 전부가 권위주의이라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방계 중에는 자주관리 사회라는 아나키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평의회 공산주의Council Communism, 상황주의Situationism, 자율주의Autonomism가 그것이다. 아마 유의미하게, 아나키즘에 가장 가까운 이 몇 안 되는 마르크스주의 경향은 아나키즘 자체의 분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차례차례로 토론할 것이다.
평의회 공산주의는 1919년 독일혁명으로 태어났다. 당시 이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소비에트의 실례에 감화되어 중앙집권주의·기회주의·마르크스주의 사민주류파에 역겨워하면서 바쿠닌 이후 아나키스트가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반의회주의·직접행동주의·권력분산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제1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에 적대한 리버타리안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노동자 평의회의 연합이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보고, 따라서 그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투적 직장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레닌은 이러한 운동과 그 옹호자를 통렬한 비판서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 Left-wing Communism:An Infantile Disorder』으로 공격했다. 평의회 공산주의자 헤르만 고르터Herman Gorter는 『동지 레닌에 대한 공개서한An Open Letter to Comrade Lenin』에서 이 책을 공격했다. 1921년까지, 평의회 공산주의자는 전국 공산당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양쪽으로부터 정식으로 제명됐고 볼셰비키와 결별했다.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러시아를 국가사회주의 정당의 독재이며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도 아나키스트와 같지만 평의회 공산주의자는 신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은 혁명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민중 자신의 활동이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파멸할지의 하나라고 논하고 있다. 아나키스트도 그렇지만 그들 또한 볼셰비키에 의한 소비에트의(노동조합도) 탈취는 혁명의 전복이며 억압과 착취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평의회 공산주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폴 매틱 시니어Paul Mattick Sr의 저작이 필수적이다. 그는 『마르크스와 케인즈Marx and Keynes』, 『경제위기와 위기이론Economic Crisis and Crisis Theory』,『경제학 정치학 인플레 시대Economics, Politics and the Age of Inflation』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관한 저술가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1919년과 1920년 독일 혁명 이후, 계속해서 평의회 공산주의자였다. 그의 저서 『반볼셰비키 공산주의Anti-Bolshevik Communism』와 『마르크스주의:부르주아 계급의 마지막 은신처인가?Marxism:The Last Refuge of the Bourgeoisie?』는 그의 정치사상의 뛰어난 입문서이다. 또한 안톤 판네쾨크Anton Pannekeok의 저작도 필수다.
그의 고전, 『노동자 평의회Workers'Councils』는 평의회 공산주의를 첫 번째 원칙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철학자로서 레닌Lenin as Philosopher』에서는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레닌의 주장을 해부하고 있다(서지 브리 키아너Serge Bricianer 저 『팡넥크와 노동자 평의회 Pannekoek and the Workers'Councils』는 팡넥크의 사상발전을 연구한 최상의 책이다). 영국에서 전투적 여성 참정권론자 실비아 팬크허스트Sylvia Pankhurst는 러시아 혁명으로 평의회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기 알드레드Guy Aldred와 같은 아나키스트와 함께 영국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레닌주의의 수입에 반대했다(영국에서의 리버타리안 공산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크 쉬프웨이Mark Shipway 저 『반 의회주의 공산주의:영국의 노동자 평의회 운동, 1917년~1945년Anti-Parliamentary Communism:The Movement for Workers Councils in Britain, 1917~45』을 참조). 오토 륄레Otto Ruhle와 칼 코르쉬Karl Korsch도 이 전통의 중요한 사상가이다.
평의회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상황주의자는 자신들의 사상을 중요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그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활동하고 평의회 공산주의 사상과 초현실주의surrealism 등의 급진주의 예술을 조합해, 전후 자본주의의 훌륭한 비판을 가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카스토리아디스Castoriadis와는 달리, 상황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로 계속 보고, 소외가 자본주의 생산에 위치하는 것에서 일상생활로 옮겨감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으로 발전시켰다. 그들은 「스펙터클The Spectacle」이란 표현을 만들어, 민중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소외되어 청중의 역할, 관객의 역할을 연기하게 된 사회 시스템을 기술했다.
즉 자본주의가 존재being에서 소유having로, 그리고 현재는 스펙터클을 동반해 소유having에서 출현appearing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먼 장래의 혁명을 기다릴 수 없다. 오히려 여기서 자신을 해방해야 하며 사회내부에서 할당된 역할에서 사람들을 벗어나도록 평범하고 보통의 상태를 혼란시키는 사건 - 상황situations을 만들어 내야 한다. 주권자인 서민의 집회와 자주관리 위원회에 기초한 사회혁명은 궁극적인 「상황situations」이며, 모든 상황주의자의 목적이기도 했다.
아나키즘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이들 두 이론의 차이는 비교적 작은 것이며, 아나키즘에 대한 상황주의자의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많은 아나키스트는 상황주의자에 의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혁명적인 목적으로 현대예술과 문화를 전복시키고 일상생활의 혁명을 요구했다. 공교롭게 상황주의는 스스로를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을 초월하려는 시도로 자신을 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나키즘에 포섭되어 버렸다. 기 드보르Guy Debord 저, 『스펙터클 사회Society of the Spectacle』와 라울 바나이엠Raoul Veneigem 저 『일상생활의 혁명The Revolution of Everyday Life』은 상황주의의 고전이다.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선집Situationist International Anthology』(켄 나브Ken Knabb 편집)은 나브 자신의 『퍼블릭 시크렛Public Secrets』과 마찬가지로 상황주의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필수 서적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주의Autonomist계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이는 평의회 공산주의, 코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 상황주의 등의 저작을 사용하면서 계급투쟁을 자본주의 분석의 핵심에 두고 있다. 자율주의는 원래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발달해 많은 조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아나키즘에 가까운 것도 있다. 자율주의의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가는 아마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그의 저서 『마르크스를 넘은 마르크스Marx Beyond Marx』에서 「돈은 하나의 얼굴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보스의 얼굴이다」는 멋진 문구를 만들었다)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범위 내의 것이다.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상을 가진 자율주의자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하리 크리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크로포트킨 사상의 뛰어난 요약본을 쓰고, 무정부 공산주의와 자율주의계 마르크스주의와 유사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크로포트킨?자주적 가격 안정정책·마르크스 주의의 위기 Kropotkin, Self-valorisation and the Crisis of Marxism』『아나키즘 연구 Anarchist Studies』제2권 제3호]. 그의 『자본론을 정치적으로 읽는다 Reading Capital Politically』는 자율주의와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 텍스트이다.
하리 크리버에게 있어 「자율주의계 마르크스주의」는 다양한 운동·정치·사상가의 총칭적 이름이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자율적인 노동자 - 분명히 자본으로부터 자립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식적 조직(예컨대 노동조합이나 정치정당)으로부터도 자립하고 있다 - 가 가진 힘, 나아가 다른 그룹으로부터도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특정의 노동자 계급 그룹(예를 들어 남성으로부터 자율적인 여성)이 가진 힘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autonomy」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 민중이 자신의 이익을 정의하고 자신들을 위해 투쟁하며, 비판적으로 착취에 대한 단순한 반응을 넘어 계급투쟁을 형성하고, 미래를 정의하는 듯한 방식으로 공세로 나오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본주의를 생각하면서 그 핵심에 노동자 계급의 힘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내에서 계급투쟁에서뿐만 아니라 그 힘의 관계에서도 노동자 계급의 힘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직장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노동자가 공장이나 사무실 안에서 감속slowdowns·파업strikes·태업sabotage을 통해서 작업의 부담에 저항하는 것처럼, 무급인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이 작업으로 환원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자율주의자에게 공산주의의 창조는,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계급 자체활동의 발전에 의해 계속 창조되는 것이다.
사회적 아나키스트와의 유사성은 분명하다. 자율주의자는 왜 그렇게 까지 시간을 걸고 마르크스를 분석하고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사상을 정당화하고 있을까? 그렇게 해야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평의회 공산주의에 대한 레닌의 정보에 따라 자율주의자를 아나키스트라고 낙인찍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에게 이러한 마르크스의 인용 모두는 우습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마르크스가 정말 자율주의자라고 한다면, 왜 자율주의자는 마르크스가 「정말로」의미한 것을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 다시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왜, 마르크스는 처음부터 그것을 확실히 말하지 않은 것일까? 자신의 통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인용(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마르크스의 코멘트(문득 입으로만 할 경우도 있지만)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마르크스가 처음에 말해야지만 그것은 진실이 되는 것일까? 두 사람의 죽은 독일인의 텍스트에 그 정치가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의자의 통찰이 어떤 것이든, 그 마르크스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1920년대에 레닌의 인용을 이용해 트로츠키와 스탈린 사이에서 열린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라는 초현실적인 논란처럼, 어느 사상이 옳은가가 아니라 단순히 서로 동의한 권위자(레닌이든 마르크스이든)가 그 사상을 갖고 있는지가 증명될 뿐이다. 아나키스트는 자율주의자에게 권하고 싶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대하면서 거기에 어떤 자율성을 행사하면 어떨까.
아나키즘에 가까운 리버타리안 = 마르크스주의자에는 에리히 프롬Erich Fromm과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도 있다. 둘 다 마르크스를 프로이트와 조합해, 자본주의의 급진주의 분석과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인격장애를 제기하려 했다. 에리히 프롬은 『자유의 공포The Fear of Freedom』, 『독립한 인간Man for Himself』,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소유냐 존재냐?To Have or To Be?』와 같은 저작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설득력과 통찰에 찬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개인을 형성하고 자유와 진짜 삶에 대한 심리적 장애를 키우고 있는지를 논하고 있다. 그의 저작은 윤리·권위주의적 인격(무엇이 그 원인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꾸나)·소외·자유·개인주의와 같은 수많은 중요한 주제topics를 논하고 있으며 좋은 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논한 것도 있다.
자본주의와 「소유having」 생활양식에 대한 프롬의 분석은 엄청난 통찰로 가득하다. 특히 오늘날의 소비주의의 맥락에서는 그렇다. 프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노동하고 함께 조직을 만드는 방식은 자신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자신들의 발달·건강(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는 인간성보다 재산을 갈망하고 자기결정이나 자기실현보다는 복종과 지배의 여러 이론을 고집하고 있는 사회의 정신성을 의문시한다. 그가 한 현대 자본주의의 냉혹한 고발은 자본주의야말로 현재 만연해 있는 고립과 소외의 주된 원천임을 나타내고 있다. 프롬에게 있어서 소외는 시스템의 핵심이다(사유 자본주의이든 국가자본주의이든). 자신이 자기실현을 하는 한 인간은 행복한 것이며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는 생명이 없는 것(재산)이 아니라, 인간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프롬의 사상은 마르크스의 인도주의적 해석에 뿌리박고 있다. 그리고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마르크스의 사상의 권위주의적 타락이라며 거부하고 있다(「사회주의의 파괴는 (중략) 레닌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상으로 그는 지방분권형 리버타리안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와 중앙집권화를 마르크스가 바람직하다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나키스트는 옳았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오류, 그리고 그들의 중앙집권적 방향성은, 그들이 푸리에Fourier, 오언Owen, 프루동, 크로포트킨보다 훨씬 심리적으로도 지적으로도, 18세기와 19세기 중산층의 전통에 뿌리박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중앙집권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에 관한 마르크스의 「모순」도 그렇지만, 프롬에게 있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란다우어Landauer와 같은 사람들 이상으로 훨씬 「부르주아」사상가였다. 역설적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회주의의 레닌주의적 발전은 국가와 정치권력이라는 부르주아 개념으로으로의 회귀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오언, 프루동이라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표현한 새로운 사회주의 개념은 아니었다」[The Sane Society, p. 265, p. 267 and p. 259]. 따라서 프롬의 마르크스주의는 근본적으로 리버타리안으로 인도주의이며 사회를 보다 좋게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통찰은 매우 중요하다.
프롬과 마찬가지로 빌헬름 라이히Wilheim Reich는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 양쪽에 근거한 사회심리학을 고심해서 만들려고 했다. 라이히에게 있어서 성적억압은 사람들을 권위주의에 영향 받기 쉽게 만들고, 기꺼이 권위주의 체제에 복종하게 한다. 그가 나치즘을 이같이 분석한(『파시즘의 대중 심리학The Mass Psychology of Fascism』에서) 것은 유명한데 그의 통찰은 다른 사회와 운동에도 적용된다(예를 들면 미국의 종교 우익이 미성년의 섹스에 반대하면서 섹스를 병·불결함· 죄와 관련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적억압 때문에 우리는 「인격의 갑옷character armour」이라 불리는 것을 발달시키고 있다. 이 갑옷이 억압을 내부화하고 히에라르키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사회적 조건은 가부장제 가족에 의해서 창출되며 그 최종결과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강화와 영구화, 그리고 그 안에 끌려 들어가는 고분고분한 개개인의 대량생산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주요 사회구조를 시인할 뿐 아니라 교사·목사·고용주·정치가의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개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기도 하는 여러 운동과 제도를 어떻게 해서 지지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바꿔 말하면 자기자신에 반하여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의 종속적 입장을 방어하려고만 할 정도까지 억압을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히에게 성의억압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순응하고 권위주의적 질서가 야기하는 모든 비참함과 타락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에 복종하는 개인을 낳는다. 그 최종 결과는 자유의 공포이며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신구조다.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동적이고 비정치적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인격구조 내부에 만들어 냄으로써 성의 억압은 정치권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성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히에라르키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억압이 내부화할 것인지에 관한 그의 분석은, 어째서 그 정도까지 많은 억압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입장과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 집단적 인격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은 사회변혁에 대한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새로운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중의 인격구조가 어떻게 그 진정한 이익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를 의식해야만 비로소 그 인격구조와 싸울 수 있으며, 사회적 자기 해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리스 브링턴Maurice Brinton 저 『정치 속의 불합리The Irrational in Politics』는 라이히의 사상을 간결하게 잘 소개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이 가진 통찰을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와 연결 짓고 있다.
|
|
|
|
|
|
|
|
 |
A.4-3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회주의 사상가는 있는가 |
|
|
 |
A.4-3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회주의 사상가는 있는가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서 발전했기 때문에 아나키즘이 아닌 사회주의 전통에 아나키즘의 공감자가 많이 있다.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의 뒤를 이어 최초의 영국 사회주의자(소위 리카도파 사회주의자)는 아나키스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토마스 호지스킨Thomas Hodgskin은 프루동의 상호주의와 비슷한 사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윌리암 톰슨William Thompson은 「상호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군」에 근거한 비국가형 공동체적 사회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는 무정부 공산주의anarcho-communism와 비슷했다(톰슨은 상호주의자였지만, 비자본주의 시장조차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 그 후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존 프랜시스 브레이John Francis Bray도 급진적 농지개혁 운동가인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토지를 기본으로 한 공동체형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일반적으로 아나키즘과 관련된 많은 생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브라이언 모리스Brian Morris) 지음 『생태학과 아나키즘Ecology and Anarchism』 수록의 「토머스 스펜스의 농민사회주의The Agrarian Socialism of Thomas Spence」를 참조). 그 이상으로 초기의 영국 노동조합 운동은 바쿠닌과 제1 인터내셔널 리버타리안파의 40년이나 전에 「단계적으로 생디칼리즘 이론을 발전시켰다」[E.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 912]. 노엘 톰프슨Noel Thompson이 쓴 『인간의 진정한 권리The Real Rights of Man』는 이러한 사상가와 운동 모두를 잘 요약했으며 E P 톰프슨 저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은 당시의 노동자 계급 생활(정치)에 관한 고전적 사회사이다.
리버타리안 사상은 1840년대 영국에서 사멸하지 않았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길드 사회주의자라는 의사 생디칼리스트도 있었다. 그들은 노동자에 의한 산업관리와 함께 지방분권형 공동체 시스템을 옹호했다. 조지 콜George Douglas Howard Cole의 『길드 사회주의 재론Guild Socialism Restated』은 홉슨S.G. Hobson과 알프레드 리처드 오라지Alfred Richard Orage와 같은 저자들을 포함하는 이 학파 중 가장 유명한 저작이다(제프리 오스테르가르Geoffrey Ostergaard저 『노동자 관리의 전통The Tradition of Workers'Control』은 길드 사회주의 사상을 잘 정리하고 있다).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도 길드 사회주의의 지지자이자 아나키즘 사상에 이끌려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마르크스 주의에 관한 상당한 정보의 풍부한 사려 깊은 논의를 『자유로의 길Roads to Freedom』이라는 고전적 저작 속에서 하고 있다.
러셀은 가까운 장래에 아나키즘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었지만 그는 아나키즘을 「사회가 가까이해야 할 궁극의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길드 사회주의자로서 그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경영을 관리할 때까지 어떠한 진짜 자유와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좋은 사회에 대한 그의 비전은 모든 아나키스트가 지지하는 것이다. 즉, 「창조적 정신이 생생하고, 삶이 즐거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모험이 되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탈취하려는 소망이 아니라, 건설의 충동에 근거하는 세상이다. 애정이 무제한으로 활동하고, 사랑이 지배본능을 쫒아내고 삶을 가꾸며 정신적 기쁨으로 삶을 채우는 모든 본능의 자유로운 발달과 행복으로 잔혹함과 질투가 불식되는 세상이어야 한다」[quoted by Noam Chomsky,Problems of Knowledge and Freedom, pp. 59-60, p. 61 and p. x].
많은 주제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의 사상과 사회적 활동주의는 노엄 촘스키(그의 『지식과 자유의 여러 문제Problems of Knowledge and Freedom』는 러셀이 다룬 소재 몇 가지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를 포함한 많은 사상가에 영향을 주었다.
또 다른 중요한 영국 리버타리안 사회주의 사상가·활동가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이다. 모리스는 크로포트킨의 친구이자 「사회주의자동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반의회주의자들을 이끌고 있었다. 자신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모리스와 대부분의 무정부 공산주의자의 사상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모리스는 자신은 공산주의자로 그에게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에서 해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나키스트」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예술과 공예」운동의 탁월한 멤버였던 모리스는 작업을 인간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그것은 가장 유명한 에세이의 제목을 인용하면 「유용한 일 vs 쓸모없는 고역Useful Work vrs Useless Toil」의 주장으로서였다. 그의 유토피아 소설 『유토피아 소식News from Nowhere』은 매력적인 리버타리안 공산주의 사회를 그렸으며 그 사회에선 산업화가 공동체의 공예형 경제로 대체되고 있다. 이 유명한 유토피아의 문맥에 놓인 모리스의 사상을 논한 것으로는, 『윌리엄 모리스와 유토피아 소식:현대에 있어서의 비전William Morris and News from Nowhere : A Vision for Our Time』(스티븐 콜맨Stephen Coleman, 패디 오 설리번Paddy O’Sullivan 공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인 사상가 코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카스토리아디스는 원래는 트로츠키주의자로 스탈린주의 러시아는 타락한 노동자 국가라는 트로츠키의 전혀 잘못된 분석을 검토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레닌주의를 이어서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를 거부하게 됐다. 이것이 그를 리바타리안의 결론으로 이끌고, 중요한 문제는 생산수단 소유자가 아니라 히에라르키라고 보게 했다. 즉, 계급투쟁은 권력을 가진 쪽과 권력에 지배되는 측과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거부하게 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그 가치분석을 생산문제의 핵심에 있는 계급투쟁에서 추출하고 있었다(즉, 계급투쟁을 무시했던 것이다).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의 이 해석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율주의자 뿐이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s Castoriadis는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미래사회를 철저한 자율성, 전반적 자주관리, 아래에서 위로 조직된 근로자 평의회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세 권의 전집(『정치·경제 저작집Political and Social Writings』)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리버타리안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읽을거리이다.
미국의 급진주의 역사가 하워드 진Howard Zinn은 자기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나키즘의 전통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그는 허버트 리드의 저작인 미국판에 『아나키즘 Anarchism』이라는 훌륭한 입문 에세이를 썼다). 그의 고전인 『미국 인민사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복종과 비폭력 직접행동에 관한 그의 글도 매우 중요하다. 이 리버타리안 사회주의학자에 의한 뛰어난 엣세이집은 『진 독본The Zinn Reader』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고 있다. 아나키즘에 가까운 저명한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자로는 에드워드 카펜터Edward Carpenter(예컨대 실라 로보섬Sheila Rowbotham저 『에드워드 카펜터: 신생활의 예언자 Edward Carpenter:Prophet of the New Life』참조)와 시몬 베유Simone Weil (『억압과 자유Oppression and Liberty』)가 있다.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회주의를 노동자 자주관리에 근거하고 있는 시장사회주의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중앙집권형의 계획입안을 거부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프루동과 같은 사람들이 옹호하던 산업민주주의와 시장사회주의 사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단, 이러한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의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앙집권형 계획 입안에 적대하는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연결고리에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앨런 엥글러Allan Engler (『탐욕의 사도Apostles of Greed』)와 데이비드 슈바이카르트David Schweickart(『반자본주의Against Capitalism』와 『자본주의 이후에After Capitalism』)는 자본주의에 대한 유효한 비판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적으로 조직된 작업장에 뿌리를 둔 사회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사상 안에 정부와 국가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주의자는 경제적 자주관리를 그 경제 비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보다도 아나키즘에 근접하고 있다. |
|
|
|
|
|
|
|
 |
A.4-2 아나키즘에 가까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있는가 |
|
|
 |
A.4-2 아나키즘에 가까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있는가
앞의 섹션에서 말했듯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쪽의 전통에 아나키즘 이론과 이상에 가까운 사상가가 있다. 이것은 아나키즘이 이들 양쪽과 특정 생각과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섹션A.4-3과 A.4-4에서 확실히 드러나겠지만 아나키즘은 사회주의의 전통의 일부이며 이 전통과 가장 공통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주로 엘리트주의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로크Locke의 저작과 그가 고무한 전통은 히에라르키·국가·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캐럴 페이트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지배자와 자본주의 경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아나키스트에게 호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회계약에 관한 그의 비전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자유주의 국가의 비전도 마찬가지다. 페이트먼이 자세히 말하고 있듯이 그 자유주의 국가는 「상당량의 유형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만이 정치에 관여하는 사회멤버」이며 「분명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유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존재한다. 대다수인 무산자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성인이 된 시점에서 출생국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에 의해 소수자에 의한 지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p. 141, p. 71, p. 78 and p. 73].
그러므로 아나키즘은 자본주의 찬동형 자유주의의 전통이라 부를 수 있는 것과는 대립한다. 이 전통은 로크에서부터 시작된 조류이며 히에라르키에 관한 그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데이비드 엘러먼이 언급했듯이, 「동의에 근거하여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해 사과하는 완전한 자유주의적 전통이 있는데, 이는 주권자에 대한 통치권을 벗어나는 자발적인 사회적 계약에 근거한다」. 경제학에서 이것은 임금노동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 독재정치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근대적인 직장제한 버전이 고용계약인 것이다」[The Democratic Worker-Owned Firm, p. 210]. 이 자본주의 찬동형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인을 선택할 자유, 아니면 행운이 따르는 소수자라면 자신이 주인이 될 자유 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는 어떤 때라도 만인이 자기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소유한다」고 하는 「자기 소유」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팔(양도하는)수가 있는 것이다. 섹션 B.4에서 논하듯이 이것은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작업장이든 결혼생활이든)에서 독재지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응해 현대에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등과 관련된 우익 「리버타리안」의 전통이 있다.
그들은 국가를 사유재산의 단순한 옹호자, 그 사회제도가 만들어 내는 히에라르키의 집행자로 환원하려고 한다. 따라서 어떻게 상상하해 봐도 그들을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상가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자유주의」로 불리는 것은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의 전통이며, 아나키즘과 마찬가지로 목청을 높이는 자본주의 찬동의 최소국가 옹호자들과는 거의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최소국가옹호론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공격을 기꺼이 비난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토지와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똑같은 제한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가의 「자유」를 기꺼이 방위하려고 한다.
봉건주의는 소유와 지배를 조합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서 생계를 세우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익 「리버타리안」의 전통을, 단순히 봉건주의의 (자주적인)근대형태라고 말하는 점에서 과장으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토지와 농노에 대한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과 싸웠던 봉건영주 정도의 리버타리안인 것이다.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리버타리안』의 교리는,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중략) 내가 보면 이것은 어떤 부당한 권위,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완전한 전제정치 형태의 옹호에 귀착하는 것처럼 보인다」[Marxism, Anarchism, and Alternative Futures, p. 777]. 그 이상으로, 벤자민 터커가 그들의 전임자들에 대해서 말했듯이,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오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국가 규제를 환호로 공격하고 있는 반면, 소수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법률(과 규제와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 전통은 하나 더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이전의 것이며, 아나키즘의 열망과 많은 점에서 공통하고 있다.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 사상은 계몽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 뿌리는 루소의 『
불평등에 관한 대화Discourse on Inequality』, 훔볼트의 『국가 행동의 한계The Limits of State Action』, 프랑스 혁명을 옹호했을 때의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자유는 자유의 성숙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유의 성숙이 달성될 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기치 않은 새로운 불공정 시스템인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계몽주의의 급진적 인도주의 메시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유지하고 확충한 것은 리버타리안 사회주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은 출현하고 있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왜곡되었다.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를 사회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반대시킨 바로 같은 전제 때문에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것은(빌헬름 폰)훔볼트의 고전적 저작 『국가 행동의 한계The Limits of State Action』에서 분명하다. 이 저작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에 선행하고 그를 고무한 것이다. 이 자유주의 사상의 고전은 1792년에 완성하고 시기상조이긴 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반자본주의이다. 그 사상은 산업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어 볼품없이 희석되어 버렸음에 틀림없다. [“Notes on Anarchism”, For Reasons of State, p. 156]
촘스키는 「언어와 자유Language and Freedom」라는 에세이(『국가의 사유For Reasons of State』와 『촘스키 독본The Chomsky Reader』에 수록되어 있다)에서 더욱 자세히 이것을 논하고 있다. 훔볼트와 밀처럼 이러한 「자본주의 이전」의 자유주의자에는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같은 급진주의자도 포함된다. 페인은 직공과 소규모 농가(즉 전 자본주의 경제)에 근거해 대충 대충의 사회적 평등, 그리고 물론 최소한의 정부를 가진 사회를 마음으로 그리고 있다.
그의 사상은 전세계의 급진적인 노동자 계급을 자극했다. 에드워드 파머 톰슨E. P. Thompson이 생각나게 한 것처럼 페인의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의 노동자 계급운동의 기본적 텍스트」였다. 정부에 대한 그의 사상은 「아나키즘 이론에 가까운」 한편, 그의 개량계획은 「20세기의 사회입법으로 향하는 기점이 됐다」[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 99, p. 101 and p. 102]. 자유에 대한 관심과 사회공정에 대한 관심의 조합이 그를 아나키즘에 가깝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애덤 스미스Adam Smith이다. 우익(특히 「리버타리안」 우익분자)은 그를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사상은 그것보다 복잡하다. 예컨대 노엄 촘스키는 스미스는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회의 평등이 아닌 완벽한 평등, 조건의 평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Class Warfare, p. 124]. 스미스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사를 자연의 방향성에 따른 채로 하는 사회,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가 의미하는 것은 「이익이 곧바로 타인의 고용차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노동자 고용과 주식운용은 완전히 평등해지거나, 지속적으로 평등해지는 경향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그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국가의 지원에 적대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면 그는 노동분업이 갖는 마이너스 효과에 대항하기 위해 공교육을 옹호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주인과 그 노동자와의 차이를 규제하려고 할」때는 항상 「입법부가 상담하는 것은 항상 주인인 것이다. 법률이 노동자 편을 들고 있을 때는 그것은 항상 올바르고 공평하다. 그러나 주인의 편을 들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법률」이 주인의 단결을 무시하는 한편, 얼마나 노동자의 단결을 「너무 격렬하게」 「처벌」하고 있는지를 기록했다(「공평하게 다룬다면 주인도 똑같이 취급될 것이다」[The Wealth of Nations, p. 88 and p. 129]). 즉, 스미스는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에 반대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소수자를 위해, 소수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다수가 아닌 소수를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살아있어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발전을 목격했을 때, 자신의 사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유방임주의인 채로 했는지는 의문이다. 스미스의 이런 중요한 업적은 고전적인 자유주의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쉽게 무시된다.
촘스키에 의하면, 스미스는 「계몽주의에 뿌리를 갖기 전 자본주의·반자본주의의 사람」이었다.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전적 자유주의자 (토머스)제퍼슨 신봉자와 스미스 신봉자들은 자신들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권력의 집중화에 반대했다. 그들은 이후에 발전했던 형태의 권력집중화를 이해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 싫어했던 것이다. 제퍼슨은 좋은 예이다. 그는 앞에서 발전하고 있는 권력의 집중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금융기관과 공업회사(이것들은 그의 시대에는 성립하지 않았다)가 혁명달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전게서.Cit., p. 125].
머레이 북친이 말하는 것처럼 「초기 미국역사에서 독립농민 - 지주의 정치적 요구와 이익에 가장 명확하게 공명한 것은」 제퍼슨이었다 [The Third Revolution, vol.1, pp. 188-9]. 바꿔 말하면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형태에 공명했던 것이다. 또한 제퍼슨은 「귀족」과 「민주주의자」를 대비시키고 있다. 전자는 「민중을 두려워하고, 민중에게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권력을 민중으로부터 끌어내어 상층계급의 손에 넘기자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자는 「민중과 일체가 되고, 민중을 신뢰하고, 민중을」 항상 「가장 현명」하지는 않더라도 「정직하고 안전하며 공익의 수탁자라고 간주하고 있다」[Chomsky, Powers and Prospects, p. 88에서 인용]. 촘스키가 지적했듯이 「귀족은 제퍼슨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명백한 모순을 인정하면서 당황스럽게 여겼던 자본주의 국가의 지지자들이었다」[전게서 p88].
제퍼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때때로 사소한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온전하고 건강한 정부에 필요한 약이다. 자유의 나무는 시간과 함께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재충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Howard Zinn,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p. 94에서 인용]. 그러나 그의 리버타리안으로서의 자격은 그가 합중국 대통령이자 노예 소유자였다는 이 두 가지로 인해 훼손되고 있지만, 미국 국가 이외의 다른 「건국의 아버지」와 비교하면 그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적 형태의 것이다.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 「모든 건국의 아버지는 민주주의를 미워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일부 예외였다. 다만 극히 일부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미국 국가는(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을 인용하면) 「대다수로부터 화려한 소수를 지키기 위해」만들어졌다. 또는 존 제이John Jay의 원리를 반복하면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Understanding Power, p. 315]. 미국이 과두정치가 아니라(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전적 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인식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있다. 개인의 자유를 선언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하면 실제 그 자유를 조직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지지할 수 있는가? 이런 이유로, 밀은 결혼은 「일방적인 권력이나 타자에 대한 복종 없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평등한 공감을 지닌」 평등자 간의 자발적 결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부장적 결혼을 공격했다. 모든 결합 속에는 「절대적인 주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비즈니스에서의 협력관계」에서 「모든 협력관계에서 한쪽이 그 관계 전부를 완전히 제어하고 다른 한쪽은 한쪽이 만들어 낸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다」[“The Subjection of Women,”quoted by Susan L. Brown,The Politics of Individualism, pp. 45-6].
더욱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예는 자유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데 결함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한쪽이 권력을 갖고, 다른 쪽은 따를 뿐이라는 관계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이 다음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결합형태는 인간이 계속해서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결합이 지배자로서의 자본가와 경영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한 노동자 사이에 존재할 수는 없다. 평등, 자본의 집단소유, 자기 자신들이 선택하고 해임할 수 있는 경영자 밑에서의 노동이란 점에서 노동자 자신의 결합인 것이다」[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 147]. 노동시간의 독재적 관리는 「자기 자신,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그 개인은 주권자다」는 밀의 격언과 양립하지 않는다. 중앙집권 정부와 임금노동에 대한 밀의 반대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보다도 그의 사상을 아나키즘에 가까운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고 있다. 「미래의 사회원리」란 「개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과, 지구상의 원자재를 공유하는 것, 협동의 혜택에 만인이 평등하게 관여하는 것을 연결하는 방법」인 것이다[Peter Marshall, Demanding the Impossible, p. 164에서 인용]. 개성을 옹호한 저작, 『자유론On Liberty』은 오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전적 저작이며 사회주의적 모든 경향에 대한 그의 분석(『사회주의에 관한 장Chapters on Socialism』)은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찬반양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프루동과 마찬가지로 밀은 근대 시장사회주의의 선구자이며 지방분권과 사회참여의 확고한 지지자였다. 촘스키에 의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 있어서는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에 반대했으며 그것은 자유·다양성·자유제휴를 요구한 인간의 욕구에 관한 것 보다 깊은 여러 전제를 갖고 있던 결과이다. 같은 여러 전제로 인해 생산·임금노동·경쟁·『소유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자본주의의 모든 관계는 모두 근본적으로 반인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리버타리안 사회주의는 계몽주의가 갖는 자유주의적 이상의 상속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Notes on Anarchism』, Op.Cit., p. 157].
즉, 아나키즘은 이전의 자본주의적·민주주의적 자유주의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자의 희망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무너졌다. 루돌프 로커Rudolf Rocker의 분석을 인용하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탁월한 정치개념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원래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낡은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원래의 모든 원리를 - 더욱이 자유주의의 원래의 모든 원리를 - 실제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방향을 취하면, 어느 쪽도 포기되어야 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좌우명은 「법 아래의 만인의 평등」이며 자유주의의 좌우명은 「우리 길을 갈 권리right of man over his own person」이다. 어느 것이나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현실에 난파되어 버렸다. 만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소수의 소유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넘기지 않으면 안 되고, 구매자를 찾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빈궁상태에 빠져야 하는 이상, 이른바 「법 아래에서의 평등」등 위선적 속임수에 불과하다. 법은 사회적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에서 배고프기 싫으면 타인의 경제적 독재에 따라야 할 때에, 「우리 길을 갈 권리」등 말할 수 없는 것이다[Anarcho-Syndicalism, p. 10]. |
|
|
|
|
|
|
|
 |
A.4-1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상가가 있는가 |
|
|
 |
A.4-1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상가가 있는가
있다. 아나키즘에 근접한 사상가는 많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온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온 사람도 있다. 이는 놀랄만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아나키즘은 어느 쪽 이념과도 관련되어 있다. 확실히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자유주의 전통에 가깝고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실제로 니콜라스 월터Nicolas Walt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자유주의가 발전한 것인지, 사회주의가 발전한 것인지, 혹은 그 쌍방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원한다. 사회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는 평등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즘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순한 혼합은 아니다. (중략)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About Anarchism, p. 29 and p.31]. 그는 로커가 「아나르코 생디칼리즘 Anarcho-Syndicalism」에서 말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즘과 다른 이론과 관계를 볼 때 이것이 유용하게 되겠지만, 아나키즘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쪽에 대해 아나키즘 측으로부터의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해야 한다. 아나키즘의 특이성을 다른 철학으로 덮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섹션 A.4-2에서는 아나키즘에 가까운 자유주의 사상가가 논의되고 섹션 A.4-3에서는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회주의자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리버타리안 사상을 자신들의 정치운동에 주입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조차도 있으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섹션 A.4-4에서 논하겠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분류할 수 없는 사상가도 있어 이 섹션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논한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엘러만David Ellerman은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인상적인 저작을 썼다. 그의 사상은 초기의 영국 리카도Ricardian파 사회주의와 프루동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민주적 노동자 소유기업The Democratic Worker-Owned Firm」과 「경제의 재산과 계약Property and Contract in Economics」에서 그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며 권리를 근거로 하는 한편, 노동-재산을 근거로 자주관리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오늘의 경제적 민주주의자는, 직장에서의 민주적 자주관리에 찬동하고 민중을 임대하고 있는 제도를 폐기하려는 새로운 노예 폐지론자이다」. 그의 「비판은 새로운 게 아니다. 불가침의 권리라는 계몽의 원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자기 노예화에 대한 자발적 계약에 반대하는 노예 폐지론자에 의해, 그리고 비민주적 정부를 옹호한 자발적 왜소화에 반대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자에 의해 채용되고 있었던 것이다」[The Democratic Worker-Owned Firm, p. 210].
아나키스트뿐만 아니라 임금노예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자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저작을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엘러 맨 만이 협동의 이점을 강조하는 인물은 아니다. 협동의 이점에 관한 알피 콘Alfie Kohn의 중요한 저작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아나키스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경쟁사회를 넘어No Contest:the case against competition」와 「보수에 따른 벌Punished by Rewards」에서 콘은(광범위한 경험적 증거를 사용해)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쟁의 결점과 경쟁이 갖는 마이너스 효과를 논하고 있다. 그는 저작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모든 문제를 다루고, 경쟁은 알려진 만큼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페미니스트 이론 중에서 캐럴 페이트먼Carole Pateman은 가장 분명하게 리바타리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다. 엘러 맨과는 관계없이 페이트먼은 직장과 사회전체의 양쪽에서의 자주관리형 제휴association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루소의 주장에 관한 리바타리안 분석을 토대로 그녀는 계약론의 획기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어떤 주제를 페이트먼의 작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경우 그것은 자유이며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자유란 자기결정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복종의 결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최초의 주요 작품인 『참가와 민주주의 이론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이후 참여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선구적 연구인 이 책에서 그녀는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한계를 소상하게 밝히고 루소, 밀, 콜의 저작을 분석하고 관여하는 개인이 실제 참가하는 것의 이익에 대해서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다.
『정치적 책무의 문제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에서 페이트먼은 자유에 관한 「자유주의」의 주장을 논하고 거기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찾고 있다. 자유주의자에게 있어서 개인은 타자에게 지배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한번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 국가는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그녀는 분석을 심화해, 지배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자유와 같아져야 하는 이유를 의문시하며 참여 민주주의 이론을 제기했다. 이 이론에서는, 민중이 집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이것은, 국가가 아닌 자신의 동료인 시민에 대한 전단적 의무이다) 것이 된다. 크로포트킨을 논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론이 확실히 관련된 사회적 아나키즘의 전통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페이트먼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성의 계약The Sexual Contract』을 썼으며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이론이 갖는 성차별주의를 해부했다. 「계약주의적」이론이라 불리는 것(고전적 자유주의와 우익「리버타리아니즘libertarianism(자유지상주의)」)」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치적 개인의 자유제휴가 아니라 소수자가 다수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권위·히에라르키·권력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를 이끌어내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결혼·임금노동에 관한 그녀의 분석은 완전히 리바타리안이며, 자유는 지배에 동의하는 이상의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리베럴의 역설인 것이다. 사람들은 계약에 동의하기 위해서 자유롭다고 가정되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타인의 의사결정에 복종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섹션 A.4-2를 참조).
그녀의 생각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서양문화의 핵심적 신념 몇 가지에 대해 도전했으며, 주된 계몽주의 정치철학자에 대한 그녀의 비판은 강력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보수적 자유주의적 전통의 비판뿐 아니라 좌익에도 마찬가지로 내재하는 가부장제·히에라르키의 비판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 이외에도 『여성의 혼란The Disorder of Women』이라는 제목의 수필집도 출간되고 있다.
이른바 「반세계화」운동 속에서는, 나오미 클레인Naomi Klein이 리버타리안 사상을 의식하고 있다.(여기서 「이른바」라고 하는 것은 반세계화 운동의 회원이 인터내셔널 리스트이며, 소수자에 의해 소수자를 위해 위로부터 내리 눌린 세계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저작은 세계화에 대한 리버타리안의 공격이다.
그녀가 처음으로 주목된 것은 『브랜드 따위 필요 없다No Logo』의 저서를 통해서였다. 이 책은 소비자 자본주의의 성장을 도표로 표시하고 자본주의의 고급스런 브랜드의 배후에 비열한 현실이 있음을 폭로하고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저항 역시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현장을 모르는 학자가 아니라 운동의 적극적 참가자다. 그녀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세계화, 그 귀결, 반 세계화 시위의 물결에 대한 수필집 『담장과 윈도Fences and Windows』속에서 보고되고 있다.
클레인의 문장은 잘 쓰여져 있으며 흥미진진하다.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의 현실, 「부자와 권력 사이는 물론 미사여구와 현실의 사이, 말 하는 것과 행해지는 것과의」차이, 「세계화의 약속과 그 실제 귀결과의 차이」를 꼽았다. 그녀는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얼마나, 시장(즉 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되어있으며, 증대하는 국가권력과 억압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선거에서 뽑히지도 않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어떻게 그 나라의 인기 있는 의회를 「반민주주의」라고 낙인찍을 수 있는가. 자유에 관한 미사여구가 사적권력을 옹호하고 증대시키는 도구로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가(그녀는 우리에게 생각게 해주는 것이다. 「(세계화)논의에서 항상 빠져 있는 것은 권력의 문제다. 세계화 이론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권력의 문제다. 누가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속이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더는 문제가 없다고 속이는 것일까」)[Fences and Windows, pp 83-4 and p. 83].
그리고 어떻게 전세계의 사람들이 저항하는지. 그녀는 다음처럼 말한다. 「(운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변되거나 말이 나오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아래로 부터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며 「투명성·설명책임·자기결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창설된 운동, 자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자유롭게 하는 운동」이다. 즉 「권력과 부를 더욱더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집중시키는 (중략) 기업 주도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형 의사결정의 잠재적 가능성 - 그것이 노조를 통해서든, 지역을 통해서든, 농장을 통해서든, 촌락을 통해서든 아나키스트의 콜렉티브를 통해서든, 원주민 자치를 통해서든 - 을 형성하는」대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강력한 아나키스트 원리다.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사람들이 자신의 일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모든 세계에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클라인에 따르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나키스트이거나 알던 모르던 간에 아나키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전게서, p. 77, p. 79 and p. 16].
아나키스트는 아니지만 그녀는 진정한 변혁은 아래로부터 더 나은 세상을 찾아 싸우는 노동자 계급의 자주활동에 의해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권력의 분산이 이 책의 열쇠라는 생각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신이 기술한 사회운동의 「목표」는 「스스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로서 권력의 집중화에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문화 (중략) 직접참여에 의해서 증폭되고 강해지는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녀는 운동에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도록 권하지는 않는다. 또한 (좌익처럼)자신들 평등자를 위해 의사결정을 해 주는 소수의 지도자들을 고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목표는 멀리서 부터의 보다 좋은 지배와 지배자가 아니라, 땅에 발을 디딘 가까운 민주주의다」). 클라인은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이다. 참된 사회변혁은 풀 뿌리에 있는 기능, 「자기결정·경제적 지속성 및 참가형 민주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전제로 클라인은 리버타리안 사상을 널리 청중에게 제시하는 것이다[전게서, p. xxvi, p. xxvi-xxvii, p. 245 and p. 233].
저명한 리버타리안 사상가에는 헨리 데이빗 소로Henry David Thoreau,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있다. 즉, 아나키즘과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며 리버타리안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논하고 있는 사색가는 많이 있다. 크로포트킨이 백 년 전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러한 저작자는 「국가와 자본주의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한다는 같은 방향을 향해 현대사상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속에 아나키즘이 얼마나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가를 나타낼 생각에 가득 차 있다」[Anarchism, p. 300]. 그 이후 유일하게 바뀐 게 있다면 더 많은 저작자의 이름이 첨가되었다고 하는 것뿐이다.
피터 마샬은 아나키즘사에 관한 그의 저작 『불가능한 요구 Demanding the Impossible』에서 우리가 이 섹션과 이후의 섹션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아나키스트의 리버타리안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상을 논하고 있다. 크리포드 하퍼Clifford Harper의 『아나키: 그래픽 가이드Anarchy:A Graphic Guide』 또한 더 많이 연구 할 경우에는 유용한 가이드이다.
|
|
|
|
|
|
|
|
 |
A.4 아나키즘의 주요 사상가는 누구인가 |
|
|
 |
A.4 아나키즘의 주요 사상가는 누구인가
제라드 윈 스탠리Gerard Winstanley 의 (『새로운 정의의 법The New Law of Righteousness』1649)과 윌리엄 고도윈William Godwin의 (『정치적 정의의 연구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1793)가 처음으로 아나키즘 철학을 전개한 것은 17세기와 18세기의 일이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일관된 사상으로 아나키즘이 나타난 것은 19세기 후반에 되고서였다. 이 작업은 주로 4명의 선구적 사상가에 의해 시작되었다. 독일인 막스 스티르너(Max Stirner:1806-1856), 프랑스인 피에르 조세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1809-1865), 거기에 두 명의 러시아인 미하일 바쿠닌(Michael Bakunin:1814-1876)과 표트르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1842-1921)이다. 그들은 노동자 대중 속에 널리 유포하던 사상을 거론하며 글로 표현한 것이다.
독일 낭만주의 철학의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슈티르너의 아나키즘(『유일자와 그 소유The Ego and Its Own』에서 기술됨)은 극단적 개인주의 즉 에고이즘이었다. 그것은 국가·재산·법률·의무 등보다, 무엇보다도 유일자로서의 개인을 상위로 생각한다. 그의 사상은 여전히 아나키즘의 초석이다. 슈티르너는 자본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가를 에고이스트의 입장에서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양쪽을 공격하고 사회적 아나키즘과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기초를 만든 것이다. 국가와 자본주의에 대신하는 것으로, 막스 스티르너는 「에고이스트의 연합union of egoists」을 주장했다. 「에고이스트의 연합」은 자신의 자유를 최대로 하고 자신의 욕망(슈티르너는 「교제intercourse」라고 부른 연대를 바라는 감정을 포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일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자유로운 조직이다. 이러한 연합은 비히에라르키형의 것이 될 것이다. 슈티르너는 많은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멤버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명백한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은 실제로 이기주의의 조직인가? 한 쪽이 다른 쪽의 노예나 농노이면서 단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에고이스트』일 수 있을까?」[No Gods, No Masters, vol.1, p. 24]
개인주의는 당연히 여러 사회조건을 변혁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선언한 최초의 사람, 피에르 조세프 프루동이다. 그의 상호주의·연합주의·노동자 자주관리와 노동자협회association 사상은 대중운동으로의 아나키즘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아나키즘의 세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조정되는지를 확실히 제시했다. 프루동에 의한 연구가 반국가·반자본주의 운동으로, 그리고 사상으로서의 아나키즘의 근본적 성질을 정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쿠닌, 크로포트킨, 터커Tucker는 모두 프루동 사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공언했다. 그의 사상은 사회적 아나키즘과 개인주의 아나키즘 양쪽의 직접적 원천이며, 각각의 흐름이 상호주의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면,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상호주의의 연합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는 비자본주의 시장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프루동의 주요 저작에는 『소유란 무엇인가What is Property』, 『경제적 제모순의 시스템System of Economical Contradictions』, 『연합의 원리The Principle of Federation』,『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능력The Political Capacity of the Working Classes』이 있다. 상호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자세히 논하는 것은 『혁명의 일반개념 The 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이다. 프루동의 사상은 프랑스 노동운동과 1871년 파리 코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루동의 사상을 확립한 것은 미하일 바쿠닌이다. 바쿠닌은 자신의 사상은 단순히 프루동의 사상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그 최종 결과까지 일직선으로 밀어붙였을」뿐이라고 겸허하게 말했다[Michael Bakunin:Selected Writings, p. 198]. 그러나 그는 아나키즘의 발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낮게 보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바쿠닌은 근대 아나키즘 활동주의, 아나키즘 사상의 발전에서 중심인물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무계급 사회를 창조하는 수단으로서 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전투적 노동운동으로의 참여, 집산주의, 대중폭동, 혁명이었다. 그 이상으로, 그는 프루동의 성차별sexism을 부정하고 아나키즘이 적대하는 사회악 리스트에 가부장제를 덧붙였다. 또 바쿠닌은 인간성과 개성이 지닌 사회적 성질을 강조하고 자유주의가 말하는 추상적 개인주의를 자유의 부정이라며 거부했다. 그의 사상은 20세기에 많은 급진 노동운동에서 유력한 것으로 됐다. 실제로 그의 사상의 대부분은 후년에 생디칼리즘 혹은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이라 불리게 된 것과 거의 같았다. 바쿠닌은 많은 노동조합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36년 대규모 아나키스트 사회혁명이 일어난 스페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쿠닌의 저작에는 『아나키와 국가주의Anarchy and Statism』(그의 생전에 간행된 유일한 책이다), 『신과 국가God and the State』, 『파리 코뮌과 국가이념The Paris Commune and the Idea of the State』등이 있다. 샘 달고프Sam Dolgoff가 편집한 『바쿠닌의 아나키즘Bakunin on Anarchism』은 그의 주요 저작의 뛰어난 선집이다. 브라이언 모리스 저 『바쿠닌: 자유의 철학Bakunin: The Philosophy of Freedom』은 바쿠닌의 생애와 사상을 잘 소개하고 있다.
표트르 크로포트킨은 교육 받은 과학자이자 근대 여러 조건에 관한 세련되고 상세한 아나키스트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미래사회에 대한 주도면밀한 처방전, 무정부 공산주의communist-anarchism로 연관시켰다. 이것은 지금도 아나키스트 가운데 계속해서 가장 널리 지지받는 이론이다. 개인이 발달하고 성장할 최선의 수단은 상호부조라고 그는 보고 있으며, 인간끼리의 경쟁(이종과의 경쟁도)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바쿠닌과 마찬가지로, 크로포트킨도 경제적 계급투쟁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민중운동, 특히 노동조합에 아나키스트가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뮌이라는 프루동과 바쿠닌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그들의 통찰을 일반화하고 자유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생활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 비전을 가져온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즘을 「현재 사회에서 확실히 나타나」 아나키를 향하는 「새로운 진화를 나타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러 경향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따르려 했다. 동시에 아나키스트가 「자신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노동자 조직 안에서 선전하고, 이러한 조합이 의회입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본에 대한 직접적 투쟁을 하도록 촉구하」도록 강력히 권했다[Anarchism, p. 298 and p. 287]. 바쿠닌처럼 그도 혁명가였으며 바쿠닌처럼 그의 사상도 전세계에서 자유를 찾는 투쟁을 자극했다. 크로포트킨의 주요 저서에는 『상호부조론Mutual Aid』, 『빵의 쟁취The Conquest of Bread』, 『전원·공장·작업장Field·Factories·and Workshops』,『현대과학과 아나키즘Modern Science and Anarchism』, 『자주행동론Act for Yourselves』,『국가 : 그 역사적 역할The State:Its Historic Role』, 『반역자의 말Words of a Rebel』등이 있다.
그의 혁명적 팸플릿 선집은 『아나키즘Anarchism』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고 있으며, 그의 사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읽을거리다.
이러한 「아나키즘 창시자들」의 이론은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면에서 서로 결부되고 있으며 각각이 어느 정도까지 사회생활의 다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사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타인의 유일성과 자유를 인정하고 타인과 단결하는 것에 의해서만 자신의 유일성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상호주의는 자신과 타인과의 일반적 관계에 관계하고 있다. 함께 일하고 협력함으로써 타인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아나키즘 아래에서의 생산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협동하는 집산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정치적·사회적 세계에서의 공통의 이익은 코뮌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강조해야 하겠지만 다양한 아나키즘 사상의 흐름은 각각의 아나키스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지는 않았다. 즉, 아나키스트는(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자면) 「바쿠닌 주의자」도 「프루동 주의자」도 「크로포트킨 주의자」도 아니다. 마라테스타를 인용하면 아나키스트는 「사상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간에 하나의 원리를 구현하는 습관에 반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바쿠닌을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며 우리의 영감이다」고 부르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다[Errico Malatesta:Life and Ideas, p. 199 and p. 209]. 마찬가지로 저명한 아나키스트 사색가가 쓴 것이 모두 자동적으로 리버타리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바쿠닌이 아나키스트가 된 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뿐이었다(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가 아나키스트가 되기 이전의 인생을 이용해서 아나키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프루동은 1850년에 아나키즘을 외면하고 1865년의 죽음 직전에 아나키즘적(엄밀히 아나키즘은 아니지만)위치로 돌아왔다. 마찬가지로, 크로포트킨과 터커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을 지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것은 아나키즘과 무관하다. 따라서 예를 들면 프루동이 성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나키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아나키스트를 납득시키지 못한다. 루소의 여성에 대한 의견이 프루동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주의자이었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슨 일에서도 그렇지만 현대 아나키스트는 그 이전의 아나키스트의 저작을 분석하고 도그마가 아니라 영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아나키즘 이론의 발전에 건설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유명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비리버타리안적인 생각은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한 아나키즘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죽은 아나키스트 사상가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런 접근은 확실히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물론 아나키즘 사상은 크로포트킨이 죽었을 때 발전을 멈춘 것은 아니다. 또 아나키즘은 위의 네 명만이 발명했던 것도 아니다. 아나키즘은 본질적으로 많은 사상가·활동가와 함께 진화하는 사상이다. 예를 들면 바쿠닌과 크로포트킨이 살아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사상의 다양한 측면을 다른 리버타리안 활동가들로부터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바쿠닌은 1860년대의 프랑스 노동운동에 있었던 프루동 신봉자의 실천적 활동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크로포트킨은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이론의 발전에 가장 관계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바쿠닌의 사후에 제1 인터내셔널의 리버타리안파로 발전하면서 자신이 아나키스트가 되기 전에 발전했던 사상의 가장 유명한 해설자였던 것에 불과하다. 즉, 아나키즘은 전세계 몇 만이라는 사색가와 운동가의 산물이며, 개개인은 사회변혁을 목표로 하는 일반운동의 일부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아나키즘 이론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던 것이다. 여기에서 수많은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독일 출신의 저명한 아나키스트는 슈티르너만이 아니다. 수많은 독창적인 아나키즘 사상가가 있다. 구스타프 란다우어Gustav Landuer는 그 급진적 견해로 인해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곧바로 자신은 아나키스트라고 공언했다. 그에게 있어서 아나키는 「국가·교회·자본이라는 우상의 인간해방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유연합과 조합, 권위의 부재」를 바람직하다고 하고, 「위로부터의 수평화, 관료제인 국가사회주의」와 투쟁했다. 그의 사상은 프루동과 크로포트킨의 결합이었다. 자주관리형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의 발전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가 유명한 것은 다음의 통찰에 의해서이다. 「국가는 한 조건이다.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이다. 인간끼리의 행동양식이다. 우리는 다른 관계를 협의해서 결정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다」[Peter Marshall,Demanding the Impossible, p. 410 and p. 411에서 인용]. 그는 1919년의 뮌헨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독일 국가가 혁명을 파괴하던 중에 살해됐다. 저서 『사회주의를 향해For Socialism』는 그의 주요 사상을 잘 정리했다.
또 다른 저명한 독일인 아나키스트는 요한 모스트Johann Most다. 원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선거에서 당선된 제국의회 의원이던 그는 투표의 무익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황제Kaiser와 성직자에 반대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축출된 뒤 아나키스트가 되어 미국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한 때는 엠마 골드만과 함께 활동했다. 그는 사상가라기보다는 선전자였으며 그 혁명적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자극받아 아나키스트가 됐다. 그리고 런던의 이스트 엔드East End의 유대인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제본업자 루돌프 로커Rudolf Rocker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그의 자서전 『런던에서의 세월The London Years』을 참조).
그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의 결정적 입문서를 쓰고 『아나키즘과 소비에트주의Anarchism and Sovietism』와 같은 러시아 혁명의 분석, 『스페인의 비극The Tragedy of Spain』같은 스페인 혁명을 옹호한 팸플릿도 썼다. 그의 『내셔널리즘과 문화Nationalism and Culture』는 정치 사상가와 권력정치의 양쪽의 분석과 함께 시대를 넘어선 인간문화를 면밀하게 분서하고 있다. 그는 내셔널리즘을 상세히 분석하고 국가가 원인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난센스이기 때문에 인종과학을 부정하는 것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엠마 골드만과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이 지도적 아나키즘 사상가·활동가였다. 골드만은 슈티르너의 에고이즘과 크로포트킨의 공산주의와의 최량의 부분을 연결해, 열정적이고 강력한 이론으로 통합했다. 동시에 아나키즘을 페미니즘 이론·페미니즘 활동주의의 중심으로 위치 매김 했을 뿐만 아니라 생디칼리즘도 옹호했다(『수필집:아나키즘 등Anarchism and Other Essays』라는 책과 (『붉은 엠마가 말한다Red Emma Speaks』라는 수필·논문·강연 모음을 참조). 알렉산더 버크만은 엠마의 평생의 반려자이며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What is Anarchism?』(『무정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What is Communist Anarchism?』 와 『아나키즘 입문ABC of Anarchism』으로도 알려졌다)라는 아나키즘 사상의 고전적 입문서를 썼다. 골드만과 마찬가지로 그도 노동운동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참여를 지지하며 많은 글을 쓰고 강연을 했다(『어느 아나키스트의 인생Life of An Anarchist』은 그의 최고의 문장·책·팸플릿으로 이루어진 뛰어난 선집이다). 1919년 12월 그와 골드만은 미국에서 러시아로 추방됐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미국인의 상당한 부분을 급진화시켰다. 그들은 너무 너무 위험해서 자유의 땅에 계속 머물 수가 없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바로 2년 후 미국에서 여권이 도착해 그들은 러시아를 출발했다. 내전 후인 1921년 3월 크론슈타트 반란을 볼셰비키가 학살하면서 볼셰비키 독재는 그 땅에서 혁명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마침내 확신한 것이다. 볼셰비키의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원리원칙에 충실해있던 두 사람의 진짜 혁명가를 쫓아낼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러시아 밖으로 나오자 버크만은 이 혁명의 파멸에 대해 많은 논문을 쓰고(『러시아의 비극The Russian Tragedy』과 『크론슈타트 반란The Kronstadt Rebellion』을 포함), 일기를 『볼셰비키의 신화The Bolshevik Myth』라는 단행본 형태로 출판했다.
골드만은 유명한 저작 『러시아에서의 나의 환멸My Disillusionment in Russia』을 저술하고, 유명한 자서전 『자신의 뜻에 따르고 산다 Living My Life』를 출판했다. 또한 그녀는 시간을 내어서, 크론슈타트에 관한 트로츠키의 거짓말을 『트로츠키는 정색하고 우겼다Trotsky Protests Too Much』에서 논박하고 있다.
버크만과 골드만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저명한 활동가·저작가가 있었다. 볼테린 드 클레어Voltairine de Cleyre는 미국 아나키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논문·시·강연에서 미국의 아나키즘 이론과 국제 아나키즘 이론을 심화시켰다. 그녀의 저작에는 『아나키즘과 미국의 전통Anarchism and American Traditions』과 『직접행동Direct Action』이라는 고전이 있다. 『볼테린 드 클레어 독본The Voltairine de Cleyre Reader』에는 이런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과 유명한 시가 수록되고 있다. 또한 「아나키! 엠마 골드만의 『Mother Earth』선집Anarchy!An Anthology of Emma Goldman's Mother Earth」이라는 책은 그녀의 저작뿐 아니라 당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의 저작도 수록되어 있는 뛰어난 선집이다. 또한 1886년에 국가에 의해 살해당한 시카고 희생자들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그녀가 행한 연설의 선집도 흥미롭다 (「제 1회 노동절 : 헤이마켓의 연설 1895년~1910년The First Mayday The Haymarket Speeches 1895-1910」를 참조). 그녀는 병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매년 11월 11일에 희생자를 그리며 연설을 했다. 전 세대의 아나키스트 사상은 시카고 희생자가 상징하고 있지만 이 사상에 관심있는 사람은 앨버트 파슨스Albert Parsons 저 『아나키즘: 그 철학과 과학적 기반Anarchism: Its Philosophy and Scientific Basis』이 필독이다.
미 대륙의 다른 장소에서는 리카르도 플로레스 마곤Ricardo Flores Magon이 1910년 멕시코 혁명의 기초를 만드는 기여를 했다. 그는 1905년에(이상한 이름이지만) 멕시코 자유당Mexican Liberal Party을 설립했다. 그리고 실패에 끝났지만 1906년과 1908년 두 차례 디아스Diaz 독재정권에 대한 봉기를 조직했다. 자신의 신문 『대지와 자유 Tierra y Libertad』를 통해서 그는 사파타의 농민군뿐 아니라 발전 중이었던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혁명을 사회혁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혁명은 「공장이나 광산 등의 소유」뿐만 아니라 「대지를 인민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만이 민중이 확실히 「속지 않게」해준다. 농민들(사파티스타 군)에 대해서 말하던 중에 리카르도의 동생인 엔리케Enriqu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농민들은 「많든 적든 아나키즘에 경도하고」있으며 누구나 「직접행동론자」이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와 농민들은 협력할 수 있다. 「그들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부자·당국·성직자를 내몰고」, 「모든 공적기록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증서도 불태워버리고」, 동시에 「사유재산을 특징짓는 울타리를 무너뜨렸다」. 즉, 아나키스트는 「자신들의 원리원칙을 선전하고」, 사파티스타는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것이다[David Poole,Land and Liberty, p. 17 and p. 25에서 인용]. 리카르도는 미국의 교도소에서 정치범으로 죽었지만 공교롭게도 멕시코 국가에서는 혁명의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아나키즘 운동이 있었으며, 가장 뛰어난 아나키스트 저술가를 배출했다. 엔리코 마라테스타Errico Malatesta는 50년간 전세계의 아나키즘을 위해 싸우고, 아나키즘 이론 속에서도 최선의 저작을 썼다. 실천적이고 자극적인 그의 사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간결하게 적힌 팸플릿 『아나키Anarchy』가 필독이다. 그의 여러 논문은 「아나키즘 혁명The Anarchist Revolution」과 「엔리코 마라테스타: 삶과 사상Errico Malatesta: His Life and Ideas」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모두 버논 리차드Vernon Richards이 편집했다. 그의 대화극 『농민과 함께Fra Contadini:A Dialogue on Anarchy』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1920년에는 이탈리아에서 10만부가 출판됐다. 이 해 마라테스타는 인생의 전부를 걸고 투쟁한 혁명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당시 마라테스타는 『Umanita Nova』(이탈리아에서 첫 번째 일간 아나키스트 신문으로 발간 즉시 발행 부수가 5만부가 되었다)를 편집했으며 2만 명 정도의 전국 아나키스트 조직 「Unione Anarchica Italiana」을 위한 프로그램을 썼다. 공장 점거 중 치른 활동으로 인해 그는 80명의 아나키스트 운동가와 함께 67세에 체포됐다. 이외에도 중요한 이탈리아인 아나키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루이지 파브리Luigi Fabbri는 마라테스타의 친구이지만 그 저작은 안타깝게도 『아나키즘에 대한 부르주아 계급의 영향Bourgeois Influences on Anarchism』과 『아나키와「과학적」공산주의Anarchy and 「Scientific」Communism』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루이지 갈레아니Luigi Galleani는 매우 강력한 반조직의 무정부 공산주의를 만들고 『아나키즘의 종언?The End of Anarchism?』속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공산주의는 개인이 자기를 규제하고,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경제적 기반에 불과하다」. 카밀로 베르네리Camillo Berneri는 스페인 혁명 중에 공산당에게 살해당하기 전, 이탈리아의 아나키즘과 연결된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아나키즘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크로포트킨의 연합주의 사상에 대한 그의 연구(『표토르 크로포트킨: 그 연합 주의 사상Peter Kropotkin: His Federalist Ideas』)는 유명하다. 그의 딸 마리 루이즈 버너리Marie Louise Berneri는 젊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때까지 영국의 아나키즘 잡지에 계속 기고했다. (저서 『동쪽도 서쪽도 아닌:저작집 1939-48Neither East Nor West: Selected Writings:1939-48』 및 『유토피아의 편력Journey Through Utopia』를 참조).
일본에서는 두 세계 대전 사이에 핫타 슈조八太舟三가 크로포트킨의 무정부 공산주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순정 아나키즘True anarchism」으로 불리는 아나키즘을 그는 창조했다. 이는 핫타와 그의 동지가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던 농민 주체의 국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었다. 생디칼리즘의 특정 측면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노동자를 조합으로 조직함과 동시에 농민과 함께 활동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초석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의 각성 이외의 그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새로운 사회는 공업과 농업을 결합시킨 분권형 코뮌에 근거했다. 핫타의 동지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촌락은 단순한 공산농촌인 것을 중지하고 농업과 공업이 융합된 협동사회가 될 것이다」. 핫타는 이상적인 과거로 회귀하려는 생각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키스트는 「중세 예찬론자에 완전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생산수단으로의 기계의 사용을 요구한다. 실제로 더 정교한 기계의 발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John Crump,Hatta Shuzo and Pure Anarchism in Interwar Japan, p. 122-3, and p. 144에서 인용].
개인주의 아나키즘의 분야에서의 「교황」은 의심할 것없이 벤자민 터커다. 터커는 저서 『책 대신Instead of Book』에서 자유의 적이라 생각되는 것 모두를 지성과 위트를 사용해 공격하고 있다(대부분이 자본주의자이지만, 약간의 사회적 아나키스트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터커는 크로포트킨 등의 무정부 공산주의자를 아나키즘에서 파문했지만 크로포트킨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터커는 조시아 워렌Josiah Warren,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 스테판 펄 앤드류스Stephen Pearl Andrews, 윌리엄 B 그린William B. Greene과 같은 저명한 사상가를 바탕으로, 프루동의 상호주의를 자본주의 이전의 미국이 갖고 있던 여러 조건에 맞춘 것이다(자세한 것은 루돌프 로커의 저서 『미국 자유의 선구자들Pioneers of American Freedom』을 참조). 국가의 개입으로 자본주의를 구축한다는 국가의 의지로 부터 근로자·직공·소규모 농가를 지키기 위해 터커는 자본가의 착취는 완전히 자유로운 비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개의 독점을 쓰지만 터커는 상호은행, 그리고 토지와 자원의 권리인 「점유와 사용」이라는 방식으로 그런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사회주의 진영에 확고히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는(프루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불로소득은 절도라고 인식하고 이윤·집세나 지대·이자에 반대했다. 그는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What is Property』와 『경제적 모순의 시스템System of Economical Contradictions』뿐만 아니라, 바쿠닌의 『신과 국가God and the State』를 영어로 번역했다. 터커의 동료인 조셉 라바디Joseph Labadie는 활동적인 노동조합 주의자임과 동시에 터커의 신문 『자유Liberty』에의 기고자이기도 했다. 그의 아들 로렌스 라바디Lawrence Labadie는 터커가 죽은 뒤 개인주의 아나키즘의 등불을 물려받았다. 그는 「인생의 어느 단계든 자유는 인간을 행복한 상태로 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고 믿었다.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Leo Tolstoy는 종교적 아나키즘을 주창한 가장 유명한 작가이며 종교적 아나키즘이 지닌 정신적·평화적인 사상을 확산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간디와 같은 저명한 사람들과 도로시 데이Dorothy Day 주변의 「가톨릭 노동자 그룹」에게 영향을 주면서,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앙의 급진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주류 기독교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권위주의와 히에라르키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다른 급진 자유주의자인 크리스찬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주류 교회들에 의해 숨겨져 있던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시각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 결과, 기독교 아나키즘은 톨스토이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신앙은 정부를 폐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톨스토이 저서 『신의 왕국은 너의 안에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과 피터 마샬Peter Marshall의 저서 『윌리엄 블레이크:몽상적 아나키스트William Blake:Visionary Anarchist』를 참조)
최근에는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민주주의의 저지Deterring Democracy』, 『필요한 환상Necessary Illusions』, 『신구 세계질서World Orders, Old and New』, 『불량 국가군Rogue States』, 『패권인가 생존인가Hegemony or Survival』등) 와 머레이 북친(『욕망 충족의 아나키즘Post-Scarcity Anarchism』, 『자유의 생태학The Ecology of Freedom』, 『생태조화 사회를 향해서Towards an Ecological Society』, 『사회의 재구축Remaking Society』 외)이 정치이론·정치분석의 전면에서 사회적 아나키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친의 활동은 그린 사상의 중심에 아나키즘을 두고 생태조화 사회를 창출하는 운동을 신비화하려고 하거나, 없애려 하는 사람들의 강적이 되었다. 『머레이 북친 독본The Murray Bookchin Reader』은 그의 대표적 저작 선집이다. 촘스키의 가장 유명한 저작은 미국의 제국주의와 미디어의 기능을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비판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는 아나키즘의 전통과 아나키즘 사상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썼다. 가장 유명한 논문은 『국가의 이유For Reasons of State』에 수록되어 있는 「아나키즘에 관한 주석Notes on Anarchism」이며 부르주아 역사가에게 아나키스트의 사회혁명을 옹호한 논문은 『미국 권력과 새로운 상급관리들American Power and the New Mandarins』에 수록되어 있는 「객관성과 자유로운 학문Objectivity and Liberal Scholarship」이다. 그의 더 확실하게 아나키즘을 표현한 에세이는 『급진주의의 우선사항Radical Priorities』과 『언어와 정치Language and Politics』에서 읽을 수 있다. 촘스키의 사상에 관한 뛰어난 입문서는 『권력을 이해하기Understanding Power』와 『촘스키 독본The Chomsky Reader』이다.
영국에도 많은 중요한 아나키즘 사상가가 있다. 허버트 리드(아마, 작위를 받아들인 유일한 아나키스트일 것이다!)는 아나키즘 철학과 이론에 관해서 몇 가지 저작을 썼다.(에세이 집 『아나키와 질서 Anarchy and Order』를 참조). 그의 아나키즘은 자신의 미학적 관심에서 직접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자신은 헌신적인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아나키즘의 다양한 전통적 주제에 신선한 통찰과 표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키즘계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했다(기사의 선집에 대해서는 『프리덤 프레스에서의 저작집: 혼자만의 매니페스토 등A One-Man Manifesto and other writings from Freedom Press』를 참조). 또한 한 사람의 평화주의 아나키스트는 알렉스 컴포트Alex Comfort다. 『섹스의 희열Joy of Sex』을 썼을 뿐 아니라 컴포트는 활동적인 평화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였다. 그는 리버라티안의 관점에서 특히 평화주의·정신의학·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에 대해서 썼다. 그에 의한 아나키즘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저작은 『권위와 비행Authority and Delinquency』이며, 아나키즘에 관한 팸플릿과 기사의 선집은 『권력과 죽음에 대항하는 저작집Writings against Power and Death』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영국인 아나키스트는 콜린 워드Colin Ward다. 그가 아나키스트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글래스고Glasgow에 주재하며 현지의 아나키스트 그룹과 만났을 때였다. 아나키스트가 되고나서 그는 폭넓은 아나키즘계 잡지나 신문에 기고했다. 그는 『프리덤Freedom』지의 편집자인 동시에 1960년대 영향력을 갖고 있던 월간지 『아나키Anarchy』도 편집했다(워드가 고른 기사의 선집은 『아나키의 십년 간A Decade of Anarchy』이라는 책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유명한 저작은 무엇보다도 『아나키의 실천Anarchy in Action』이다. 거기에서 자본주의 속에서 조차도 일상생활에 아나키즘적 성질이 있음을 밝히고, 입증함으로써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Mutual Aid」을 현대적으로 한 것이었다. 주택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저작에서는 사유화와 국유화라는 두개의 해악에 대해, 집단적 자구와 주거의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예를 들어 『주택에 대해서 말하기Talking Houses』와 『주택: 아나키스트의 접근 Housing: An Anarchist Approach』를 참조). 그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나키즘의 시점을 던지고 있다. 물의 이용(「물에 비춰진:사회적 책임의 위기Reflected in Water: A Crisis of Social Responsibility」), 수송(「이동의 자유:자동차 시대 후에Freedom to go: after the motorage」), 복지 국가(「사회정책론: 아나키스트의 대응Social Policy: anarchist response」 등이 그것이다. 그의 저서 『아나키즘 입문Anarchism:A Very Short Introduction』은 아나키즘과 아나키즘에 대한 워드의 관점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다. 『아나키를 말하다 Talking Anarchy』는 그의 사상과 인생의 뛰어난 개론서이다. 마지막으로 앨버트 멜쳐Albert Meltzer와 니콜라스 월터Nicolas Walter도 언급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아나키즘계 잡지에 수시로 기고하고 둘 다 잘 알려진 간결한 아나키즘 입문서(각각 『아나키즘: 찬성론과 반대론 Anarchism: Arguments for and against』과 『아나키즘에 대해서About Anarchism』)를 썼다.
더 계속할 수도 있다. 더욱 많은 저작자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술가 외에도 수천의 「보통」아나키스트 투사가 있었다. 책 따위는 한권도 쓰지 않았더라도 그 상식과 활동주의가 사회 속에서 반역의 영혼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구세계의 껍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크로포트킨은 말했다.「아나키즘은 민중 속에서 생겨났다. 아나키즘은 민중의 것인 이상 생생하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창조적 힘이 될 것이다」[Anarchism, p. 146].
아나키즘 사상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했다고 해서 아나키즘 운동 속에 운동가와 지식인과의 어떠한 분단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완전히 다르다. 순수한 사상가라든가 순수한 활동가와 같은 아나키스트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크로포트킨은 그 활동으로 인해 투옥됐다. 마라테스타도 골드만도 그렇다. 마프노는 러시아 혁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잘 알려 졌지만 혁명 중과 혁명 후에 아나키즘 신문과 잡지에 이론적 논문을 실었다. 같은 말을 루이즈 미셸에게도 할 수 있다. 파리 코뮌 도중 그리고 그 후의 프랑스 아나키즘 운동의 구축에 있어서 그녀는 전투적으로 활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버타리안 신문과 잡지에 논문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심 있는 사람이 직접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읽을 수 있도록, 중요한 아나키스트 사상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
|
|
|
|
|
|
|
 |
A.3-9 아나르코 윈시주의란 무엇인가 |
|
|
 |
A.3-9 아나르코 윈시주의란 무엇인가
섹션 A.3-3에서 논의한 것같이,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상황주의자 Situationist 켄 크나브Ken Knabb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 「해방된 세계에서는 컴퓨터와 같은 현대기술을 사용해 위험한 작업이나 지루한 작업을 줄일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더 흥미로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확실히 「어떤 종류의 기술 - 원자력은 그 가장 큰 예다 - 은 실제로 너무나 위험해서 반드시 즉시 정지당하게 된다. 멍청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쓸모없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많은 산업은 당연히 그 상업적 근거가 사라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술에는 그것이 현재는 오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선천적인 결점은 거의 없다. 그것은 단지, 그 기술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민중 관리 하에 두며, 몇 가지 생태학적 개선을 도입해 자본주의의 목적이 아닌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설계 하는 문제인 것이다」[Public Secrets, p. 79 and p. 80]. 즉, 대부분의 에코 아나키스트eco-anarchists는 적정 기술의 사용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사회를 창조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우) 소수의, 그러나 잔소리가 심한, 자칭 그린 아나키스트Green anarchists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존 저잔John Zerzan, 존 무어John Moore,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 같은 저작자들은 아나키즘의 하나의 비전을 해설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권력과 억압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나르코 원시주의anarcho-primitivism」라고 불리고 있으며, 무어에 의하면 단순히 「아나키즘의 관점에서 문명 전체를 비판하고, 인간생활을 종합적으로 변용하기 시작하려는 급진적 조류의 간략표현」이라고 한다[Primitivist Primer].
이 조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가장 극단적인 요소는 모든 형태의 기술, 노동분업, 가축화, 「진보」, 산업주의, 그들이 말하는 「대중사회」를 종식시키려 하고 있으며, 상징문화(즉 수numbers·언어· 시간·예술)까지도 중지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기의 특징을 포함한 모든 시스템을 「문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문명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기술수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 농업을 거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이외의 모든 기술을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생으로 수렵채취 생활양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나키가 존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한 공업생산에 근거하는 아나키스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깨끗이 무시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원시주의자primitivist 잡지 『그린 아나키Green Anarchy』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적 자율과 야성적 존재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대규모 조직과 사회에 적대하고, 거부할 이유가 있다. 대규모 조직과 사회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더라도 제국주의·노예·히에라르키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원시주의자는 「현대에 있어서 문명의 주요한 발현」이라는 이유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문명이야말로 조직적 권위주의·강제적 예속·사회적 고립의 기원이었다. 따라서 문명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사회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화된 강제를 폐기할 수는 없다. 산업을 민주화하기 위해 집산화하는 등, 모든 대규모 조직은 조직의 멤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방향성과 형태를 채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참된 아나키스트는 산업과 기술에 반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히에라르키형의 모든 제도·영토의 확대·생의 기계화는 모두 대량생산의 관리와 처리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시주의자에게 있어서 「자급자족하는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커뮤니티만이, 권위의 강요 없이 다른 존재(그것이 인간이든 아니든)와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커뮤니티는 부족사회와 같은 본질적 특징을 갖게 된다. 「인류 역사의 99% 이상에서, 인간은 소규모이며 평등주의적인 확대 가족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생필품을 직접 대지에서 얻었던 것이다」[Against Mass Society].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며 거의 또는 전혀 히에라르키가 없는 부족 커뮤니티에 감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시주의자는 「미래의 원시인」(존 저잔의 책 제목을 사용하면)을 보고 싶다고도 생각한다. 존 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나르코 원시주의가 생각하는 미래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모든 원시적 문화는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미래는 모든 원시적 문화에서 도출되는 모든 요소를 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나르코 원시주의의 세계는 그 이전의 모든 아나키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전게서].
원시주의자에게 있어서 다른 형태의 아나키즘은 단지 현재 우리가 견디고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보다 나쁜 잔학행위를 뺐을 뿐인,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본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주 관리형 소외 인 것이다. 따라서 존 무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고전적 아나키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문명을 탈취하고 어느 정도 그 구조를 손질해 그 최악의 학대와 억압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전적 아나키즘의 미래의 시나리오에서는 문명에 있는 생명체의 99%는 현재와 같은 상태이다. 실로 고전적 아나키즘이 문제시하고 있는 문명의 여러 측면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므로 생활패턴 전체가 변화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나르코 원시주의의 관점에서 다른 급진주의를 보면 자신을 혁명적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모두가 개혁주의처럼 보인다」[전게서].
그 대답으로 「고전적 아나키스트」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첫 번째로 「최악의 학대와 억압」이 자본주의 사회의 1%를 차지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일 뿐이다. 그 이상으로 이것은 이 체제가 기꺼이 동의하는 옹호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전적」 아나키즘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분명히 무어의 주장은 난센스다. 고전적 아나키즘의 목적은 사회를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까지 바꾸는 것이지, 사회의 미미한 여러 측면들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니다. 원시주의자는 자본주의를 폐기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폐기 후에도 이전과 99% 같은 일을 할 계속하려 하고 있다는 등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다르다. 바꿔 말하면 보스를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인 첫걸음인 것이다! 세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무어의 주장에서는 좋은 사회라는 자신의 비전이 달성되려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대량살육이 이뤄져야 한다.
아시다시피 원시주의는 전통적 아나키즘 운동이나 그 사상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양자의 비전은 단지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사상을 권위주의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있다. 당연히 원시주의 사상과 다른 아나키즘 사상이 화해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 다른 아나키스트는 원시주의가 단기적으로 실용적인지 -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조차도 의문시하고 있다. 원시주의 지지자들은 원시주의를 아나키즘의 가장 진보한 급진적 형태라고 제시하려 하지만, 다른 아나키스트는 그 만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원시주의는 신봉자를 바보 같은 처지로 끌어들이는 혼란스러운 이데올로기이며, 그 이상으로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다른 아나키스트는 보고 있다. 이런 아나키스트는 켄 크나브에 의한 다음 코멘트에 동의할 것이다. 원시주의는 「너무나 많은 명백한 자기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비판할 필요도 없는 공상」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과거의 사회와의 관련성은 의심스럽고, 현재의 가능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좋다. 과거시대가 좋은 생활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대기술은 너무도 우리의 생활전면에 엮여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지구 규모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사멸시킬 정도의 것이다」[전게서, p.79].
왜냐하면 우리는 고도로 산업화되어 서로 관련된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렵채취 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농업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스킬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상으로, 필요한 스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60억 명이 수렵 채취자로 산다는 게 가능한지 어떤지는 극도로 의심스럽다. 브라이언 모리스Brian Morri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래는 『원시적』이라고 한다. 현재 거의 60억 명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수렵 채취형 라이프 스타일은 1제곱 마일에 1∼2명을 부양할 수 있을 뿐이라는 증거가 있는데)」존 저잔John Zerzan같은 원시주의자는 말하지 않는다[Anthropology and Anarchism,'p. 35-41, Anarchy:A Journal of Desire Armed, no. 45, p. 38].
따라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촘스키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가 현재 구조화되고, 조직화되어있기 때문에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의 대량학살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죽는 구조, 그리고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 한 그것을 정말로 심각한 것이다 [Chomsky on Anarchism, p. 226].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원시주의 지지자의 대부분은, 지구는 수렵 채집으로 60억 명의 생활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 동의한다. 이것은 인구 수준이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원시주의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원시주의자」의 반란은 두 개의 선택지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평가는 주장한다. 그 반란은 거의 순간적으로 원시주의 시스템으로 변화를 가져오거나, 또는 장기간에 걸친 이행 기간을 포함하는가의 하나다. 전자는 결과적으로 수십억 명을 아사시키고, 동시에 대규모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 후자는 「문명」과 그 산업적 유산이 안전하게 폐기되고 인구수준은 자연스럽게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다시 손에 넣는다.
안탑깝게도 대부분의 원시주의자 작가들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첫 번째 선택지, 즉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예를 들어 무어는 「문명이 붕괴됐을 때」(「문명 자체의 결단이든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든 그 두 가지 조합을 통해서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극도로 빠른 과정을 뜻하며 평범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고,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문명붕괴가 야기하는 사회붕괴는 쉽고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진공상태를 불러일으키며, 파시즘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가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을 오늘 중에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전게서]. 「붕괴」, 불안」,「사회붕괴」에 기초한 혁명 등, 대중 참가와 사회 실험에 기초한 사회혁명의 수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시주의는 반조직 도그마를 전개한다. 무어는 전형적인 예이지만, 그 주장은 이렇다. 「아나르코 원시주의자에게 있어서 조직은 단순한 소음, 특정 이데올로기를 권좌에 두는 갱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원시주의자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권력관계의 폐기, 모든 종류의 당이나 조직의 폐기」를 위해 싸운다[전게서]. 그러나 조직이 없이는 어떠한 현대사회도 작동할 수 없다. 곧바로 전면적인 붕괴가 초래될 것이다. 대중의 기아뿐 아니라 원전의 멜트다운, 주변환경에 대한 산업 폐기물의 침투, 도시와 거리의 붕괴, 시골에서 찾을 수 있는 야채와 과일 그리고 동물을 둘러싸고 싸우는 굶주린 사람들의 큰 무리와 같은 생태계 붕괴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반조직 도그마가 융화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안정된 전진이 아니라 문명을 거의 하루아침에 「붕괴」시킨다는 생각뿐이다. 마찬가지로 조직이 없이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대체방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붕괴」가 필연적으로 몰고 올 공포에 직면하더라도 이 문제를 간파하고 과도기의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게 된 원시주의자는 거의 없다.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원시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여기」에서 「저쪽」으로의 과도기의 필요성을 수용해버리면 아나키즘의 전통에서 원시주의를 자동적으로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유는 간단하다. 무어의 주장으로는 「대중사회」에는 「인공적이고 기술화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다양한 형태의 강제와 관리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포함된다[전게서]. 이것이 진실이라면 원시주의의 과도기는 어떠한 것이든 정의상 리버타리안은 아니다. 단기간에 자발적 수단에 의해 인구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농업과 대부분의 공업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도 도시에서도, 도시로부터의 즉시적이고 전반적인 탈출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유산에는 그 자체로 붕괴시킬 수 없는 것도 있다.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원전을 멜트다운하는 대로 놔두는 것 등은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상으로 지배 엘리트가 저항 없이 그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결국, 히에라르키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로 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두 말할 것 없이 모든 조직과 산업을 본질적으로 권위주의라고 하며 회피하는 혁명이 이것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또 하나의 확실한 예를 들면, 스페인 혁명 중에 프랑코의 파시스트군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군사물자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가 자신들의 일터를 개조해 이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대중사회」는 혁명 성공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그 결과 원시주의자의 견해로 보자면 「여러가지 형태의 강제와 관리」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강제·관리·히에라르키에 근거한 이행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시스템은 장래에는 무국가 사회 속에 소멸한다고 공언하는 이데올로기도 있다. 이 이데올로기도 원시주의와 마찬가지로 산업과 대규모 조직은 히에라르키와 권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주의이다. 「고전적」아나키스트에게 있어서 바쿠닌의 「아나키」 찬성론에 반대해 엥겔스가 주장했던 것을 자칭 아나키스트가 되풀이 하는 것은 얄궂다고 할 수 밖에 없다(산업이 자율성을 배제한다는 엥겔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섹션 H.4를 참조).
그러면, 원시주의의 주된 문제를 알 것이다. 리버타리안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현실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켄 크나브Ken Knabb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처음에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과잉신용을 정당하게 의문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추상적이고 종말론적인 방식으로 밖에 현재의 시스템과 관여하지 못하게 되고 원시시대의 파라다이스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정당화할 수 없는 절망적 신념에 도달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제기하게 되는 현실문제 모두를 자신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Knabb, 전게서, p. 80 and p. 79]. 유감스럽게도 원시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현실 혁명의 출발점을 본질적으로 권위주의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원시주의로 향하는 과도기에는 「대중사회」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는 이상, 원시주의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한다.
히에라르키 사회가 많은 기술을 오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술」을 주된 문제로 여기고 그 종언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를 논하지 않고 온갖 불공정과 억압을 하루아침에 폐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급진적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사회변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비판을 만족시킬 만큼 혁명적인 대중운동은 지금까지 없었고, 따라서 시도해 볼 의미조차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켄 크나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타협·권위·조직·이론·기술 등에 대한 「완전한 반대」를 자랑스럽게 공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혁명적 관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것이다 -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전복할 수 있을지, 혁명 후의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게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은 없는 것이다. 단순한 혁명 등 자신들의 불변적인 존재론적 반역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급진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의 결여를 정당화하려는 자 조차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호언장담은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의 방관자를 끌어들일지는 모르지만, 그 최종 귀결은 단지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만들 뿐이다. [전게서, pp. 31-32]
게다가 원시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제기되는 수단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르코 원시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는 어느 정도의 자유, 어떤 종류의 자유가 전망되는가 하는 점에서, 인간 경험 중에서 선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저항과 폭동의 형태를 한정할 수는 없다」[전게서]. 비원시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것은 원시주의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는지를 자기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강조하지만 무엇이 용인 가능한 저항형태로 여겨지는지에 관해 제한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단이 목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수단은 권위주의적 목적을 만들어 낸다. 전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모종의 전술을 지지하는 것은 반권위주의 견해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 잡지 『그린 아나키스트Green Anarchist』에서 볼 수 있다. 이 잡지는 「원시주의Primitivism」의 한쪽의 극으로 인간사회의 「수렵채취」형태로의 회귀를 선호한다고 논하고, 기술은 확실히 그 본질에서 히에라르키적이라고 하며 적대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원시주의」사상은 본질적으로 매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리버타리안 수단에 의해서(즉,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창조하고 있는 개개인의 자유선택에 의해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정황을 실제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상, 아나키즘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그린 아나키스트Green Anarchist』잡지는 에코 전위주의를 발달시키게 되었다. 루소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들을 억지로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잡지가 (비아나키스트인) 유나바머(unabomber: 대학·공항 전문폭탄범)를 지지하고 당시 두 편집자의 한 쪽은 어떤 기사(「비합리주의자The Irrrrationalists」)로 그 논리 귀결에 도달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폭탄범들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더 많은 정부사무소를 공격하지 않았다. 도쿄에서의 도쿄 사린 숭배집단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유감이지만, 공격 일 년 전에 가스를 테스트했을 때, 정체를 들키고 말았다」[Green Anarchist, no. 51, p. 11]. 이런 발언을 옹호하는 글이 다음 호에 게재되어 미국의 『아나키: 무장한 욕망 Anarchy:A Journal of Desire Armed』지(48호∼52호)에서 이루어진 그 후의 편지 왕래에서는, 또 다른 한 명의 편집자(당시)는 이 구역질 날 정도의 권위주의적 난센스를 「극도의 탄압 상황 하에서」 행해진 「자연 발생적 저항」의 실례와 비슷한 단순한 난센스라고 정당화했다. 아나키즘 원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수단이 그 목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일까? 즉 전술 속에는 리버타리안적이지 않은 것, 리버타리안적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전술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에코 아나키스트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원시주의자」 아나키스트는 반기술·반문명 그 자체라기보다는 (데이비드 왓슨의 표현을 빌리면) 「원주민족 생활양식의 긍정」, 그리고 기술·이성·진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사회생태학의 접근보다도 훨씬 비판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이러한 에코 아나키스트는, 「진보」라고 하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원시적 루트에 직선적으로 귀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도그마적 원시주의」도 거절하고, 「계몽과 반계몽 양쪽의 사상과 전통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에코 아나키스트에 있어서, 원시주의는 「국가 발흥 이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 하에서의 현실의 생활 여러 조건에 대한 정당한 반응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들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현명한 전통」 (예를 들면 미국 원주민 부족 등의 토착민족과 관련한 전통)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사고하고 경험할 때의 세속적 양식을 포기할 수 없고, 하고 싶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생활 경험을, 그리고 왜 우리는 사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의문을 세속적인 말로 환원할 수는 없다. 그 이상으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의 사이의 경계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역사라는 변증법적 이해는 영적으로 가득 찬 이성을 긍정할 것이다. 이 이성은 이상el ideal 때문에 죽은 무신론의 스페인 혁명가뿐 아니라 종교적 평화주의인 양심의 죄수, 라코타Lakota의 고스트댄서, 도교의 은자, 처형당한 수피교 신비주의자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David Watson, Beyond Bookchin: Preface for a future social ecology, p. 240, p. 103, p. 240 and pp. 66-67].
이러한 「원시주의자」 아나키즘은 여러 잡지와 관련이 있지만 주로 『제5권력Fifth Estate』과 같은 미국 잡지와 관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에코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는 화재를 일으킨 불꽃으로 복합체의 중심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것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유기적 인간사회가 경제 - 도구문명과 그 대규모 기술에 강제적으로 순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명과 기술은 히에라르키적으로 외적인 것이라 할 뿐 아니라 점차 『세포적』으로 되어 내부적인 것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원인과 이차적 모든 결과라는 기회론의 히에라르키에 이 과정 여러 요소를 반복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David Watson, 전게서, pp. 127-8]. 이러한 이유로, 「원시주의」 아나키스트는 기술의 모든 면에 대해 더 비판적이다. 인간성과 지구의 해방을 위해 본질적인 적정기술의 사용이라는 사회적 생태학의 요구에도 비판적인 것이다. 데이비드 왓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술사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기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는 새로운 자본의 형태를 낳는다. 기술을 결정하는 사회적 여러 관계의 명확한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 등은 비역사적이며 비변증법적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단순주의적인 하부구조, 상부구조라고 하는 도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전게서, p. 124].
즉, 기술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효과의 대부분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히에라르키형 권력을 보강하는 경향을 갖는 기술이 선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권력자이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억압된 사람들은 권력자에 대항하도록 기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뛰어난 습관을 갖고 있으며, 기술변혁과 사회투쟁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 섹션 D.10을 참조).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그것을 누가 사용하더라도 특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적정기술의 사용조차도 입수 가능한 기술 중에서 선택한다는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기술의 모든 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자유·권능·행복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어떤가에 따라 그것을 수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생태학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접근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차이는 심각한 정치적 포인트가 아니라 강조점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중에서, 브라이언 모리스Brian Morris가 말하는 것 같은 이데올로기에 납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과거 약 8천 년간」을 「폭정, 히에라르키형 통제, 모든 자발성을 결여한 기계적 관례」라고 하여 거부한다. 「이러한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 전부(농업·예술·철학·기술·과학·도시생활·상징적 문화)를 존 저잔John Zerzan은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진보를 숭배하는 이유 따위는 없지만 모든 변혁과 발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억압적이라고 거부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존 저잔의 『인류학적 문헌의 자의적 선택selective culling of the anthropological literature』[Morris, 전게서, p. 38]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다」고 하는 입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원주민족 사회는 일반적으로 매우 아나키즘적이지만, 그런 사회 속에는 국가주의적이고 소유주의적인 것으로 발전한 사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 이전의 아나키가 가진 중요한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 주로 착상되고, 또 그것을 도입하려는 미래의 아나키스트 사회 등 정답은 아닌 것이다.
원시주의는 두 가지의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혼동하고 있다. 즉, 원시 생활양식으로의 문자 그대로의 회귀를 지지하는 입장과, 원시생활로부터의 실례를 사회비판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이다. 아나키스트 가운데 두 번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는 현 상태가 보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과거의 문화와 사회는, 참된 인간사회가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힐 수 있는 긍정적인 여러 측면(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원시주의」가 단지 권위에 따른 기술을 의문시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론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현명한 의문은 대체로, 첫 번째 입장 가운데 - 아나키즘 사회는 수렵채취 사회로의 문자 그대로의 회귀가 된다는 생각 속에 - 포섭되어 버린다. 원시주의자의 저작을 읽으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시주의자 중에는 자신이 대망하는 사회모델은 석기시대가 아니며 또한 수렵채취로의 회귀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비판에 의해, 그 이외의 선택지를 배제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원시주의는, 단순한 「아나키즘의 사변」(존 무어John Moore의 말을 빌리면)에 대한 비판과 같은 것이라고 시사되는 점에서, 좀처럼 신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조직·대중사회·문명을 본질적으로 권위주의라고 악마화하는 이상, 과도기나 자유사회에서 조차 이들을 이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의견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비판은 행동양식과 자유사회 비전으로 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제시되더라도 그저 의심스러울 뿐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의 수렵채취 부족과 원예농업으로 이행한 커뮤니티를 아나키의 실례라고 칭송하는 것이라면, 비판자들로부터 원시주의자는 미래에 있어서도 같은 시스템을 원한다고 결론짓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 산업·기술·대중사회·농업을 원시주의자가 비판하면 할수록 이 견해는 강해질 것이다.
「원시주의자」가 「원시주의」의 두 형태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를 분명히 말할 때까지 다른 아나키스트들이 그 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을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노동자 관리·국제연결·연방형 조직(원시주의자는 새로운 「통치」의 형태라고 해서 항상 깨끗이 거부하고 있다) 없이, 대규모 기아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아나키스트는 그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혁명이 현 사회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직면할 것이다. 아나키즘은 이를 인정하고 사회를 변환하는 수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시주의는 그러한 작은 여러 문제로부터 도망하고, 그 결과 변환수단을 거의 제언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시주의」의 여러 형태는 아나키즘이 아니다. 「수렵채취」 사회로의 회귀는 사회 인프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규모 기아를 몰고 오고,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행운」의 소수자가 「야생」이 될 수 있으며, 병원·서적·전기 같은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원시주의자인 아나키스트는 자유사회에 있는 만인은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히 다르다. 아나키스트 사회는 자유실험에 근거한다. 다양한 사람과 그룹이 자신들에게 최적의 생활양식을 선택하게 된다. 기술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 생활양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될 뿐이다. (적정)기술의 혜택을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아나키스트는 개발도상 세계에서, (자본주의)문명의 맹공격과 (자본주의적)진보의 요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원시주의자」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존 저잔 지음 『미래의 원시인 Future Primitive』과 데이비드 왓슨 저 『북친을 넘어Beyond Bookchin』,『거대 기계에 대항해Against the Mega-Machine』를 참조하기 바란다. 켄 크나브의 에세이 『원시주의의 빈곤The Poverty of Primitivism』은 브라이언 올리버 셰퍼드Brian Oliver Sheppard의 『아나키즘 vs 원시주의 Anarchism vs Primitivism』와 마찬가지로 원시주의에 대한 뛰어난 비판이다. |
|
|
|
|
|
|
|
 |
A.3-8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
|
|
 |
A.3-8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역사가 조지 리차드 에스엔웨인George Richard Esenwein의 말을 사용하면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Anarchism without adjectives」은 그 가장 넓은 의미로는 「하이픈hyphen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나키즘 형태, 즉 공산주의적communist, 집산주의적collectivist, 상호주의적mutualist, 개인주의적individualist과 같은 수식 라벨이 없는 “주의”를 말한다. 타인에게는 단순히 다양한 아나키스트 학파의 공존을 허용한 자세로 단순하게 이해되었다」[Anarchist Ideology and the Working Class Movement in Spain, 1868-1898, p. 135].
이런 표현은 쿠바 태생의 페르난도 타리다 델 마르멜Fernando Tarrida del Marmol이 1889년 11월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스페인에서 공산주의 아나키스트와 집산주의 아나키스트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당시 양쪽의 아나키스트는 이들 두 개 이론의 이점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은, 아나키즘의 모든 경향 사이에 보다 큰 관용성을 나타내는 시도이며, 아나키스트는 사전에 획책한 경제계획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 비록 이론상이라 하더라도 -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게 하려했다. 즉, 아나키스트의 경제적 선택은 자본주의와 국가를 폐기하기 위해 「이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자유스러운 실험은 자유사회의 한 가지 규칙이다.
「the anarquismo sin adjetives」(「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anarchism without adjectives」)으로 알려진 이론적 관점은, 운동 그 자체 속에서 이루어진 격론의 부산물 중 하나였다. 논의의 근원은 1876년 바쿠닌의 사후, 공산주의 아나키즘의 발전 속에서 볼 수 있다. 공산주의 아나키즘Communist Anarchism은 집산주의적 아나키즘Collectivist Anarchism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다(『바쿠닌의 아나키즘Bakunin on Anarchism』수록의 자메 기욤James Guillaume의 유명한 논문 『새로운 사회질서 구축에 대해On Building the New Social Order』에서, 집산주의는 그 경제시스템을 자유 공산주의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침 바쿠닌이 프루동의 저작을 발전시키고 심화하고 풍부하게 한 것처럼 공산주의 아나키스트는 에리스트 레클루스Elisee Reclus, 카를로 카피에로Carlo Cafiero, 엔리코 마라테스타Errico Malatesta (가장 저명한) 표트르 크로포트킨이라는 아나키스트와 관련되어 있었다.
급속하게 공산주의 아나키스트의 생각은 유럽 아나키즘의 주요 경향으로서 집산주의 아나키즘을 대체하게 됐다. 하지만 스페인은 예외였다. 여기서의 큰 문제는 공산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다만, 리카르토 멜라Ricardo Mella에게는 이것이 문제의 일부였지만), 공산주의 아나키즘에 의한 전략과 전술의 수정에 관여하고 있었다. 당시(1880년대) 공산주의 아나키스트가 강조한 것은 아나키스트 투사의 지역적(순수)지부였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주의에는 반대했다(단, 크로포트킨은 달랐으며, 전투적 노동자 조직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아나키스트는 다소 반 조직적이기도 했다.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투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던 스페인 집산주의자로부터 많은 논의를 부른 것은 당연했다.
이런 알력 사태는 곧바로 스페인 밖으로까지 퍼졌고 파리의 『반역자La Revolte』지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많은 아나키스트는 마라테스타의 다음과 같은 이론에 동의하게 됐다. 「단순한 가설에 대해 싸움에 빠지는 것은, 조심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올바르지 않다」[Max Nettlau, A Short History of Anarchism, pp. 198-9에서 인용]. 시간과 함께,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네틀라우Nettlau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미래의 경제발전을 예언할 수 없다」[전게서, p. 201]고 하는데 동의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사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비전보다도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반대)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대부분의 공산주의 아나키스트는 노동운동을 무시하면 자신들의 생각이 확실히 노동자 계급에 도달하지 않게 된다고 보고, 대부분의 집산주의 아나키스트는 공산주의 이념에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혁명 후 얼마가 지난 후가 아니라 곧바로 공산주의가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쪽의 아나키스트 집단도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 마라테스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래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특징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므로, 그 특징을 너무 강조해 소규모의 분파로 갈라질 이유 따위는 없다. 이런 특징은 현재의 우리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조정점이나 조합 등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자유사회에서는 「개개의 연합과 합의의 방법이나 형식·노동조직과 사회생활의 조직은 균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것들을 예견하거나, 그것들에 대해 결정하거나 할 수는 없다」[Nettlau, 전게서, p. 173에서 인용].
마라테스타는 계속한다. 「무정부 집산주의와 무정부 공산주의 간의 문제는 필요조건의 문제, 방법과 합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도덕의식이 출현하고, 현재 합법적 노예제와 강제가 인간에 있어서 불쾌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시스템을 인간에게 불쾌한 것으로 해 주는 것」이다. 새로운 도덕의식이 생기면, 「어떤 사회형식이 되든지, 사회조직의 기반은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근본원리를 고수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한, 「단순한 말이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입씨름하는」것이 아니라 「공정·평등·자유로의 방침을 혁명 후의 사회에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Nettlau, 전게서, p. 173 and p. 174에서 인용].
역시 미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적 아나키스트 사이에 격론이 있었다. 벤저민 터커는 공산주의적 아나키스트는 아나키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존 모스트John Most는 터커의 생각과 같은 말을 했다. 리카르토 멜라Ricardo Mella와 페르난도 타리다 델 마르멜Fernando Tarrida del M?rmol과 같은 사람들이 아나키스트 그룹 간의 관용성이라는 생각을 밀고 나가면서, 볼테린 드 클라이어Voltairine de Cleyre 같은 아나키스트도 「자신을 단순히 『아나키스트』라고 부르게 되고, 마라테스타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없어지면 가장 적절한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다종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Peter Marshall, Demanding the Impossible, p. 393]. 그녀의 말에서는 모든 종류의 경제시스템이 「지역별로 유효한 방식으로 시도」될 것이다. 「민중의 본능과 습관이 모든 지역사회에서 자유선택 속에서 표현되는 것을 볼 것이다. 독자적인 환경이 독자적인 적합형태를 불러 올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유와 실험만이, 최선의 사회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단지 『아나키스트』로 밖에 부르지 않는 것이다」[「The Making of An Anarchist」, The Voltairine de Cleyre Reader, pp. 107-8].
이런 논란은 아나키스트 운동에 영속적 영향을 미쳤다. 볼테린 드 클라이어, 마라테스타, 네틀라우, 에리스트 레클루스와 같은 저명한 아나키스트는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이란 표현 속에 짜여진 관용적인 견해를 채용했다(네틀라우 지음 『아나키즘 소사A Short History of Anarchism』의 195쪽부터 201페이지는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 덧붙인다면, 이것은 오늘날의 아나키즘 운동 내에서 주류의 입장이며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다른 모든 경향이 「아나키스트」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은 특정 아나키스트 이론을 선호한다고 하고, 어째서 다른 종류의 이론이 실패하는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단지, 여러 가지 아나키즘 형태(공산주의, 생디칼리즘, 종교적 등)는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을 지지하고 그 외의 것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관용성이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이라는 표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 두자. 「아나르코」캐피탈리스트「anarcho」capitalists 가운데는 자신의 이념이 아나키즘 운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과 관련된 관용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그들의 논법에 의하면, 아나키즘은 국가의 배제만 관련된 것이지 경제는 이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을 쓰는 것은 억지다. 왜냐하면,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은 반자본주의적(즉 사회주의적)인 경제타입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라테스타에게 있어서 공산주의 아나키즘이란 「다른 해결책이나 장래의 사회조직을 예견하고, 계획하는 아나키스트」도 있었지만, 이러한 아나키스트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권력과 사유재산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인 것이다. 「여러 사고의 학파가 가진 모든 배타주의를 포기하자」고 그는 주장했다. 「방법과 수단에 대해 합의하고 전진」하자[Nettlau, 전게서, p. 175에서 인용]. 바꿔 말하면 자본주의는 국가와 함께 배제돼야 한다고 논의된 것으로, 이것이 논의되고 비로소 자유실험이 발달한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즉, 국가에 대한 투쟁은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것 보다 더 큰 투쟁의 일부일 뿐, 이 큰 목적에서 떼어 놓지 못했던 것이다. 「아나르코」캐피탈리스트가 국가와 함께 자본주의의 배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따라서, 이른바 「아나르코」캐피탈리스트「anarcho」capitalists에 대해서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왜 「아나르코」캐피탈리즘이 아나키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섹션 F를 참조).
그렇다고 해서 혁명 이후 「아나르코」캐피탈리즘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다. 혁명 후의 체제 하에서 국가사회주의나 신권정치를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같다. 히에라르키를 지지하는 이런 소수집단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 일정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조차도, 모두 함께 같은 시기에 아나키스트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시스템은 아나키즘도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형용사가 없는 아나키즘」도 아니라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
|
|
|
|
|
|
|
|
 |
A.3-7 종교적 아나키스트는 있는가 |
|
|
 |
A.3-7 종교적 아나키스트는 있는가
있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종교와 신의 개념을 완전히 반인간적이며, 지상의 권위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종교 신자 중에는 그 생각이 아나키즘의 귀결에 이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모든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적 아나키스트는 국가에 반대하며 사적 소유권과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나키즘은 반드시 무신론은 아니다. 실제로 자크 엘륄Jacques Ellul에 의하면 「성서적 사고는 직접적으로 아나키즘을 이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가들과 일치하는 유일한 『반정치의 정치적』입장이다」[Peter Marshall, Demanding the Impossible, p. 75에서 인용].
종교적 사상에서 자극받은 아나키즘은 여러 유형이 있다. 피터 마샬Peter Marshall이 썼듯이 「아나키즘적 감성의 최초의 명확한 표명은 기원전 6세기경 고대 중국의 도교 신자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불교 특히 선종은 강력한 리버타리안 정신을 갖고 있다」[전게서, p. 53 and p. 65]. 반세계화 운동가인 스타호크Starhawk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은 아나키즘 사상을 이교도와 심령주의자 영향과 결합시킨다. 그러나 종교적 아나키즘은 대개 기독교 아나키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기독교 아나키스트는 「왕과 통치자는 인간을 지배한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예수가 신도들에게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 이외의 권위는 없다」고 한 바울의 격언은 확실히 사회에서의 국가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진정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국가는 신의 권위를 빼앗고 있다. 자기 자신을 통치하고(톨스토이의 유명한 책의 제목을 사용하면) 「신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각자의 책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자발적 빈곤, 부가 파멸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예수의 발언, 세상은 인간이 함께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주장 등은 모두 사유재산 및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의 근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교회(그 후 국가종교로 흡수되기는 했지만, 노예 해방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의 기반은 물품의 공산주의적 공유였다. 이 테마는 급진적 기독교 운동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 성서는 억압받은 사람들의 급진적인 리버타리안적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열망은 후년 아나키스트나 마르크스주의자의 용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의 1381년의 농민봉기에서 존 볼John Ball 목사는 다음과 같은 평등주의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Peter Marshall, 전게서, p. 89에서 인용].
「아담이 땅을 파고, 이브가 실을 짜던 시대,
신사와 같은 게 있었을까?」
기독교 아나키즘의 역사에는 중세의 「자유로운 정령의 이교신앙 Heresy of the Free Spirit」, 「다양한 농민반란」, 「16세기의 재세례파Anabaptists」가 있다. 기독교 신앙에 있는 리버타리안의 전통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저작에서 18세기에 다시 부상했고, 미국인 아담 볼루Adam Ballou는 1854년에 쓴 『실천적 기독교 사회주의Practical Christian Socialism』에서 아나키즘의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독교 아나키즘이 아나키즘 운동사 속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일파가 된 것은, 유명한 러시아인 저술가 레프 톨스토이Leo Tolstoy의 저작에 의해서다.
톨스토이는 성경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톨스토이는 아나키즘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지배한다는 것은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힘의 행사란 힘을 사용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라지 않는 것을, 힘을 행사하는 쪽의 사람이 확실히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타자에게 행하는 것, 즉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p. 242]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타자를 지배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 반국가주의 입장에서, 아래로부터 자주 조직된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톨스토이가 주장한 것은 당연했다.
정부 관리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삶을 결정할 수 있고, 관리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The Anarchist Reader, p. 306]
톨스토이는 억압에 대한 비폭력 행동을 주장하며 각자의 정신적 전환이야말로 아나키스트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했다. 막스 네틀라우Max Nettlau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톨스토이가 강조한 위대한 진실은 행복·선량함·연대 - 이것들 모두가 사랑이라 불리는 ? 의 힘은 우리 자신 속에 인식되어, 우리 자신의 행동 속에서 일깨우고 발달시키며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A Short History of Anarchism, pp. 251-2].
모든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톨스토이는 사적 소유권과 자본주의에 비판적이었다. 헨리 조지Henry George(그의 생각은 프루동의 사상과 함께 톨스토이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와 같이, 그는 토지의 사적 소유에 반대하고 「토지 소유와 그 후의 가격인상이 옹호되지 않았다면 민중은 이렇게 좁은 곳에 몰려들지 않았으며, 세계에 지금도 수 없이 남아 있는 자유의 천지에 점재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 이상으로, 「(토지 소유에 대한)이 투쟁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의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들이다」[전게서, p. 307]. 톨스토이는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폭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재산은 「관습·공적의견·정의와 상호교환의 감정에 의해서 항상 보호되고 있으므로 폭력으로 보호될 필요는 없다」[전게서]).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한 소유자의 소유물로 되어 있는 몇 만 에이커의 삼림지대 - 옆에 있는 몇 천이나 되는 사람들은 연료조차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 는 폭력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공장과 노동도 그렇고, 그곳에서는 노동자가 몇 세대에 걸쳐 계속 속아왔으며 지금도 속고 있다. 게다가 한 사람만 소유하고 있는 수백만 부셸bushels의 곡식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기근 때 가격을 세 배로 올려서 팔기 때문에 곡물을 비축하는 것이다[전게서, p. 307].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개개인을 파멸시킨다. 자본가는 「노예의 감독」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생각에서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본가가 될 수 없다. 「공장주란 근로자로부터 착취한 가격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이며, 그 행위 모두가 강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노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우선 가장 먼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활을 파멸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p. 338 and p. 339]. 톨스토이가 협동조합은 「폭력 일당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도덕적으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활동」[Peter Marshall, 전게서, p. 378에서 인용]이라고 주장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폭력에 대한 반대에서, 톨스토이는 국가와 사적 소유권을 거부하고 사회 안에서 폭력을 종식시켜 공정한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평화주의 전략을 주장했다. 네틀라우에 의하면 톨스토이는 「악에 대한 저항을 주장하고, 저항 방법의 하나 - 능동적 힘에 의한 것 - 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추가하고 있었다. 불복종, 수동적 힘을 통한 저항이다」[전게서, p. 251]. 자유사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분명히 영향을 받았던 것은 지방 러시아인의 생활과 크로포트킨(『전원·공장·작업장Fields, Factories and Workshops』등), 프루동, 아나키스트는 아니었지만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저작이었다.
톨스토이의 생각은 간디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영국을 인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비폭력 저항을 쓰도록 국민들을 자극했다. 게다가 농민 코뮌연합으로서의 자유 인도라는 간디의 비전은, 자유사회에 관한 톨스토이의 아나키스트 비전과 닮았다(다만, 간디는 아나키스트가 아니었음을 여기서 강조해야 한다). 미국의 가톨릭 노동자 그룹도 톨스토이(그리고 프루동)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1933년에 이 그룹을 창립한 도로시 데이Dorothy Day는 단호한 기독교 평화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였다. 톨스토이와 종교 아나키즘 전반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의 해방신학 운동에서 볼 수있다. 이 운동은 기독교 사상을 노동자 계급과 농민 사이에 있는 사회적 활동주의와 결부시킨다.(다만 기술해 둬야겠지만 해방신학은 아나키스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국가사회주의적 생각에 자극받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아나키즘 안에는 아나키즘의 결론을 종교에서 도출하는 소수파의 전통이 있다. 그러나 섹션 A.2-20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종교에 반대하고, 아나키즘은 무신론이며 성경의 견해가 역사적으로 히에라르키와 관계하고 세속 지배자의 옹호와 관계하고 있는 것은 우연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무신론자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것이든 초자연의 것이든, 어떤 존재를 찬미하거나 숭배하는 것은 항상 자기예속과 노예상태이며, 이것이 사회적 지배를 만들어 낸다. 북친이 쓰고 있듯이 『인간이 자신보다도 “높은” 무언가의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에 히에라르키는 자유에 대한 최초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Brian Morris, Ecology and Anarchism, p. 137].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신을 멸해야 한다는 바쿠닌의 말에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동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권위주의 사상이 아니라 리버타리안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무신론 아나키스트는 성경은 온갖 종류의 학대를 옹호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고 지적한다. 기독교 아나키스트는 이런 것과 어떻게 타협을 하고 있을까? 기독교 아나키스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도인 것일까, 아나키스트인 것일까? 평등을 지지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서를 충실히 지지하는 것일까?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 따위는 없을 것이다. 성서가 신의 말이라면, 신·그 권위·그 법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성서가 취하고 있는 더욱 극단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등 아나키스트에게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성서가 말하는 법을 실행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기독교도인 보스의 대부분은, 동료인 신자를 억지로 7일간 노역 시키고 만족하고 있다. 성경에서의 벌로는 죽을 때까지 돌에 맞게 되었을 것이다(「6일 동안은 일을 해도 좋다. 그러나 7일째에는 주님의 성스러운 완전히 쉬는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출애굽기』 35:2). 기독교 아나키스트는 신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런 벌을 옹호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결혼식 날 밤에 처녀가 아니었던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나라를 아주 나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명시된 운명인 것이다[『신명기』22:13-21]. 기독교 아나키스트는 여성의 혼전 섹스는 죽을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버릇없이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 말도, 어머니 말도 듣지 않고, 징계해도 듣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은 모두 돌멩이를 던져 그를 죽인다」는 운명을 져야 하는 것일까?(『신명기』 21:18-21) 성경이 여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아내들이여, 주를 믿는 사람답게 남편을 섬겨라」[『골로새서』3:18].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도 명령을 받고 있다. 「부인들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린도전서』14:34-35]. 남성 지배가 분명히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들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11:3].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기독교 아나키스트는 비아나키스트 신자와 비슷하게 매우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부자는 (적어도 자신에게 있어서의) 빈곤의 필요성을 공언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교회와 마찬가지로) 큰 기쁨으로 잊고 있는 것 같다. 예수의 다음 경고를 큰 기쁨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행여 온전해지고 싶다면 가서 갖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부를 쌓게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마태』19:21]. 기독교 우파의 제자들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지도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내친 김에 말하자면 자신의 정신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누가복음』6:30, 『마태』5:42] 라는 격언을 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초의 기독교 신도들이 실천하고 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지도 않는다[『사도행전』4:32]. 기독교 아나키스트가, 비아나키스트의 신자는 성서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공격받는 비아나키스트 신자가 같은 것을 기독교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
그 이상으로,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의 역사와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성경은 불공정과 싸우는 곳이 아니라 불공정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아일랜드, 남미의 일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스페인 등, 교회가 사실상의 정치권력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아나키스트는 강력하게 반종교인 것이 많았다. 교회는 이의와 계급투쟁을 억압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현실적 역할이 성경이 아나키즘의 텍스트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톨스토이주의적 평화주의를 도그마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제악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을 (때로는)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아나키즘 사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측면으로서 개인적인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일반적 전략으로서 비폭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톨스토이 주의자에게 동의할 것이다(하지만, 강조해 두지만, 다른 선택사항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자기 방위로서의 폭력의 사용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아나키스트는 거의 없다). |
|
|
|
|
|
|